목차
1. 함안, 의령 개관
2. 무기연당
3. 아라고분군
4. 대산리 석불
5. 어계고택과 채미정
6. 정암나루와 충익사
7. 보천사터 삼층석탑과 부도
8. 임나일본부설과 가야사
2. 무기연당
3. 아라고분군
4. 대산리 석불
5. 어계고택과 채미정
6. 정암나루와 충익사
7. 보천사터 삼층석탑과 부도
8. 임나일본부설과 가야사
본문내용
이들은 철 생산이 풍부한 가야산의 야로 철광(冶爐鐵鑛)을 소유·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유적은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다. 고령 세력의 선도적 발전에 힘입어 김해·함안·고성 등의 가야남부제국에도 복구의 기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고령 세력은 옛 가야지역을 상당히 복구하며 대가야국(大加耶國)으로 이름을 고치고 13개 소국을 포괄하는 연맹체, 즉 후기 가야연맹체를 형성하였다.
후기 가야
고령지방에 전하는 대가야 시조신화는 대가야국 이진아시왕과 금관국 수로왕의 형제설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고령 세력이 김해의 가야국을 대신하여 가야연맹의 맹주로 대두하는 정치 이념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의 가라국(대가야국)왕 하지(荷知)는 479년에 독자적으로 중국 남제(南齊)에 교역하여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기도 하였으니, 적어도 내륙의 대가야가 섬진강 하구를 통하여 중국과 교역할 정도로 내적 및 외적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야는 481년에는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미질부(경북 포항 흥해)까지 쳐들어온 고구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다.대가야는 5세기 후반 이래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상·하기문(전북 임실과 장수군 번암면 일대와 남원)과 상·하다리(전남 여수, 돌산), 사타(전남 순천), 모루(전남 광양) 등지의 세력과 종속적 연합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기 초에 백제는 무령왕대를 맞이하여 남진정책을 추구하였으니, 대가야는 백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섬진강 하류를 통하는 왜와의 교역체계를 만들고자 한 백제는 가야연맹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대가야는 백제의 공세에 밀려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을 상실했으며, 대사(경남 하동 고전)와 자타(경남 진주) 등지에 성을 쌓고 백제와 대립하게 되었다.『일본서기』에서 6세기 초 당시의 후기 가야연맹 제국 이름을 확인한다면, 가라국=대가야(경북 고령), 자타국(경남 진주), 다라국(경남 합천), 산반하국(경남 합천 초계), 사이기국(경남 의령 부림), 임례국(경남 의령), 걸손국(경남 산청 단성), 졸마국(경남 함양), 고차국(경남 고성), 안라국(경남 함안), 탁순국(경남 창원), 금관국=남가라국(경남 김해), 탁기탄국(경남 창녕 영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한 수혈식 석곽묘 및 가야 토기의 분포권과도 일치한다.백제와 대립 관계에 서게 된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 청혼을 하여 결혼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신라 법흥왕의 계획된 책동에 의하여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무력 공세를 통하여 밀양·영산의 탁기탄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뒤이어 532년에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 530년대 후반에 창원의 탁순국도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러자 백제도 군대를 투입하여 함안 안라국 주변의 걸탁성과 칠원의 구례모라성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야남부제국은 각기 신라와 백제에게 분할 점령당하였는데 신라는 점령지를 군현으로 편입시킨 데 비하여 백제는 가야소국의 독립성을 그대로 둔 채 간섭만 하게 된 점이 다르다.6세기 중엽에 후기 가야연맹은 고령 대가야국과 함안 안라국 중심의 남북 이원체제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측의 압력에 시달렸다. 백제 성왕은 가야연맹 7~8개국의 사신단을 541년과 544년 두 차례에 걸쳐 백제 왕성으로 불러들여 사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각자의 이해 관계가 달라서 양측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국 백제의 끊임없는 설득과 문물 증여에 따라 백제의 뜻이 관철되면서 550년을 전후하여 가야연맹은 백제의 부용국의 위치로 전락하였다.그러자 대가야의 악사(樂師)인 우륵이 가야금을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그러나 554년의 관산성(충북 옥천)전투에서 백제-가야-왜 연합군은 신라에게 패배하였으며, 특히 많은 수의 군대를 잃은 가야연맹은 멸망 직전에까지 몰렸다. 그후 562년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급습으로 멸망하면서 가야연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5. 가야의 멸망 원인과 유민의 활약
가야연맹은 초기에 김해 가야국이 중심이 되어 철기 생산을 기반으로 한 해운 교역을 주로 함으로써 신라를 능가할 정도의 문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백제나 신라와 달리 400년경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그 문화 중심지가 몰락하였는데, 이것이 가야연맹 멸망의 일차적 원인이었다. 그후 가야연맹은 문화의 중심과 주체 세력을 고령 대가야로 옮겨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차 몰락의 후유증으로 백제와 신라 등 주변 지역에 비하여 중앙집권체제의 마련이 상대적으로 늦어져서 대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없었으니, 이것이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가야연맹제국은 백제나 왜의 복속 상태에 빠진 적 없이 600여 년에 걸쳐 발전하였고, 멸망 후 그들의 힘은 신라에 합쳐져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유신(金庾信)이 신라 왕실의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그뿐만 아니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던 6세기 중엽의 한강 유역 점령 과정에서도 가야의 후예들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금관국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아들 노종(奴宗=弩里夫=內禮夫智=世宗)과 무력(武力),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道設智=設智=都設智) 등은 신라 장군으로서 활약이 많았다.신라의 발전은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가야의 문화와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그들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즉, 가야는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신라 문무왕은 김해에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능을 정비해준 것이며, 도설지왕의 후손인 순응(順應)은 802년에 애장왕의 조모 성목왕후의 후원을 받아 해인사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해인사와 가까운 월광사터에는 대가야의 시조인 정견모주(正見母主)와 마지막 왕인 월광태자(月光太子)에 관련된 유적과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후기 가야
고령지방에 전하는 대가야 시조신화는 대가야국 이진아시왕과 금관국 수로왕의 형제설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고령 세력이 김해의 가야국을 대신하여 가야연맹의 맹주로 대두하는 정치 이념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의 가라국(대가야국)왕 하지(荷知)는 479년에 독자적으로 중국 남제(南齊)에 교역하여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기도 하였으니, 적어도 내륙의 대가야가 섬진강 하구를 통하여 중국과 교역할 정도로 내적 및 외적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야는 481년에는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미질부(경북 포항 흥해)까지 쳐들어온 고구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다.대가야는 5세기 후반 이래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상·하기문(전북 임실과 장수군 번암면 일대와 남원)과 상·하다리(전남 여수, 돌산), 사타(전남 순천), 모루(전남 광양) 등지의 세력과 종속적 연합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기 초에 백제는 무령왕대를 맞이하여 남진정책을 추구하였으니, 대가야는 백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섬진강 하류를 통하는 왜와의 교역체계를 만들고자 한 백제는 가야연맹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대가야는 백제의 공세에 밀려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을 상실했으며, 대사(경남 하동 고전)와 자타(경남 진주) 등지에 성을 쌓고 백제와 대립하게 되었다.『일본서기』에서 6세기 초 당시의 후기 가야연맹 제국 이름을 확인한다면, 가라국=대가야(경북 고령), 자타국(경남 진주), 다라국(경남 합천), 산반하국(경남 합천 초계), 사이기국(경남 의령 부림), 임례국(경남 의령), 걸손국(경남 산청 단성), 졸마국(경남 함양), 고차국(경남 고성), 안라국(경남 함안), 탁순국(경남 창원), 금관국=남가라국(경남 김해), 탁기탄국(경남 창녕 영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한 수혈식 석곽묘 및 가야 토기의 분포권과도 일치한다.백제와 대립 관계에 서게 된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 청혼을 하여 결혼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 신라 법흥왕의 계획된 책동에 의하여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무력 공세를 통하여 밀양·영산의 탁기탄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뒤이어 532년에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 530년대 후반에 창원의 탁순국도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러자 백제도 군대를 투입하여 함안 안라국 주변의 걸탁성과 칠원의 구례모라성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야남부제국은 각기 신라와 백제에게 분할 점령당하였는데 신라는 점령지를 군현으로 편입시킨 데 비하여 백제는 가야소국의 독립성을 그대로 둔 채 간섭만 하게 된 점이 다르다.6세기 중엽에 후기 가야연맹은 고령 대가야국과 함안 안라국 중심의 남북 이원체제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측의 압력에 시달렸다. 백제 성왕은 가야연맹 7~8개국의 사신단을 541년과 544년 두 차례에 걸쳐 백제 왕성으로 불러들여 사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각자의 이해 관계가 달라서 양측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국 백제의 끊임없는 설득과 문물 증여에 따라 백제의 뜻이 관철되면서 550년을 전후하여 가야연맹은 백제의 부용국의 위치로 전락하였다.그러자 대가야의 악사(樂師)인 우륵이 가야금을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그러나 554년의 관산성(충북 옥천)전투에서 백제-가야-왜 연합군은 신라에게 패배하였으며, 특히 많은 수의 군대를 잃은 가야연맹은 멸망 직전에까지 몰렸다. 그후 562년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급습으로 멸망하면서 가야연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5. 가야의 멸망 원인과 유민의 활약
가야연맹은 초기에 김해 가야국이 중심이 되어 철기 생산을 기반으로 한 해운 교역을 주로 함으로써 신라를 능가할 정도의 문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백제나 신라와 달리 400년경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그 문화 중심지가 몰락하였는데, 이것이 가야연맹 멸망의 일차적 원인이었다. 그후 가야연맹은 문화의 중심과 주체 세력을 고령 대가야로 옮겨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차 몰락의 후유증으로 백제와 신라 등 주변 지역에 비하여 중앙집권체제의 마련이 상대적으로 늦어져서 대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없었으니, 이것이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가야연맹제국은 백제나 왜의 복속 상태에 빠진 적 없이 600여 년에 걸쳐 발전하였고, 멸망 후 그들의 힘은 신라에 합쳐져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유신(金庾信)이 신라 왕실의 김춘추와 함께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그뿐만 아니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던 6세기 중엽의 한강 유역 점령 과정에서도 가야의 후예들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금관국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아들 노종(奴宗=弩里夫=內禮夫智=世宗)과 무력(武力),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道設智=設智=都設智) 등은 신라 장군으로서 활약이 많았다.신라의 발전은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가야의 문화와 인물들을 흡수하면서 그들과의 협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즉, 가야는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신라 문무왕은 김해에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능을 정비해준 것이며, 도설지왕의 후손인 순응(順應)은 802년에 애장왕의 조모 성목왕후의 후원을 받아 해인사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해인사와 가까운 월광사터에는 대가야의 시조인 정견모주(正見母主)와 마지막 왕인 월광태자(月光太子)에 관련된 유적과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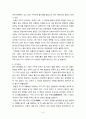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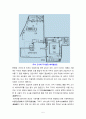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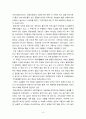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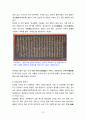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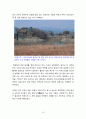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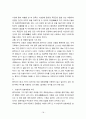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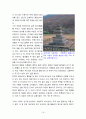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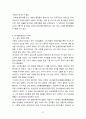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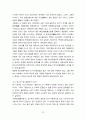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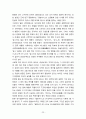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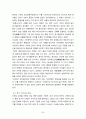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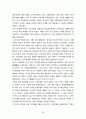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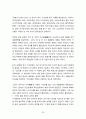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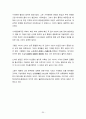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