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양군 개요
2. 봉감 모전오층석탑
3. 현2동 모전오층석탑
4. 현1동 십이지삼층석탑
5.화천리 삼층석탑
6. 삼지동 삼층모전석탑
7. 서석지(瑞石池)
2. 봉감 모전오층석탑
3. 현2동 모전오층석탑
4. 현1동 십이지삼층석탑
5.화천리 삼층석탑
6. 삼지동 삼층모전석탑
7. 서석지(瑞石池)
본문내용
무지개를 잘라 물결 이는 한가운데 뉘었으니
신선과 진인들이 오가네.
탁영반(濯纓盤) 밝고 맑은 물 아래 바위 편평한 모양이 옥쟁반보다 멋있구나.
먼지 묻은 갓끈을 한 번 씻으니
신선 되려 신단을 먹을 마음도 없네.
화예석(花石) 무궁화가 화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아침에 피어 저녁이면 지니
옥으로 깎은 꽃 하나 피워 계절 없이 즐김과 어찌 같으리.
희접암(蝶巖) 훨훨 나는 한 마리 분나비 활짝 핀 꽃을 따라 붙으려 하네.
봉운석(封雲石) 바다 학이 푸른 개울에 내려 깃을 씻고
아침 해 찬란한 빛 대그릇 모양 오색구름 맞이하는 곳이네.
조천촉(調天燭) 그 형상이 옥대와도 같네. 서 있는 모습이 수려하여 특이한데
맑은 광채가 두루 가까운 곳, 먼 곳에 비쳐
여섯 길조를 이미 얻어 뻗쳤고
만방이 이 이치를 따르네.
이와 같은 풍경은 신선도에 자주 등장하는 풍경이다. 바위의 묘사 중에 나비가 나는 풍경은, 선계와 인간계의 경계를 알 수 없다는 비유로 흔히 사용되는 장자의 나비의 꿈을 차용한 것으로, 정영방이 도교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정원을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옥에 대한 비유가 많은 것은 신선을 모시는 건물을 옥당이라 부른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신선들을 태우고 다닐 뿐 아니라 신선들이 사자 역할을 한다는 학은 봉운석으로 표현되어 신선계를 상징한다.
경정에 이어지는 주일재와 사우단의 묘사 또한 회화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재 안에서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이 문인화를 펼쳐 놓은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이다.
매화와 국화는 눈 가운데 뜻이요
소나무와 황죽은 서리 내린 후의 색이로다.
올타리 아래 빛나는 국화, 창 밖에 아름다운 매화!
이처럼 서석지는 외원의 문암에서부터 내원의 사우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두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조경하였다.
- 시작과 끝의 하나 됨
서석지의 가장 큰 특징은 내원과 외원의 조화이다. 우선 내원과 외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외원에는 구포암· 나월암· 입석· 골립암· 문암 등의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이다. 구포암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고 편평한 바위로서 거북의 등처럼 생겼는데 개울 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형상이다. 나월암은 청기천 주변의 바위로서 개울가를 두르고 있는 작고 나지막한 바위들이다. 하늘로 높이 치솟은 기둥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입석은 자금병의 긴 절벽과 마주하고 있는 바위로 내원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의 뼈대를 드러낸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골립암은 산줄기의 끝에 위치하여 석가산을 연상하게 한다. 문암은 개천 가운데 홀로 솟아 있는 바위로 사각형이다.
내원의 서석지 안에도 여러 형상의 바위들이 있는데 외원의 바위들과 유사한 바위들을 찾을 수 있다. 구포암은 넓고 편평한 신유석과 비슷하고 나월암은 봉운석, 수륜석은 연지 가장자리의 바위들과 비슷하다. 압석은 촛대를 연상하여 이름붙인 조천촉과 비슷하다. 골립암은 사우단 주변의 바위들인 화예석· 난가암· 희접암 등과 유사하다. 문암은 그 위치로 보아서는 바둑판 모양의 기평석과 유사하다. 외원에는 자금병이 있는데 개천을 따라 길게 늘어선 병풍과 같다. 서석지 안에도 이처럼 병풍같이 길게 늘어선 형태의 바위 군이 있는데 봉운석과 와룡암이다.
이처럼 서석지 안의 돌들과 외원에 흩어져 있는 기괴한 형상의 돌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는데, 이것은 내원을 외원의 축소판같이 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내원과 외원이 서로 합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완전히 다른 원칙에 의해 내원과 외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독립적으로 나열한다는 원칙에 의해 내원과 외원을 구성한 것이다. 그 원칙은 별도로 괴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석맥을 살려 지당을 만들고, 그 석맥을 통해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는 독창적인 조원법이다.
- 시를 읊는 산보
서석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시로 풀어내고 있다. 마치 소쇄원48영이 정원의 모든 요소에 시를 붙여 열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이다. 이처럼 발걸음이 닿는 모든 부분에 시를 붙이는 것은 시를 통해 전체적 구조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안에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같이 풍경을 감상하는 길이 있긴 하지만 정원의 전체적 구도는, 그림 같은 정원이 아니라 시적 구조를 가진 정원이다. 다시 말해 바라보기 위한 정원이라기보다는 걸어다니며 시를 읊기 위한 정원이므로 최초의 정원 구상에서부터 다른 차원인 것이다. 이런 시적 구조를 따르는 정원은 시가 그렇듯 시각을 포함해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원은 눈으로 감상하는 정원에 비해 좀더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시가 본질적으로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이런 보보행음(步步行吟)의 구조는 정원 산책을 통한 시 감상과 더불어 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에서 볼 수 있다. 이로서 옛 선인들이 정원 산책을 일종의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원의 각 요소에 시와 함께 붙여진 명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받든다는 뜻의 경(敬)자를 쓴 경정(敬亭)이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뜻의 극기재(克己齋), 자연의 절개를 본받자는 뜻의 사우단(四友壇), 오로지 한 뜻을 받들자는 주일재(主一齋) 등은 곧 정신 수양과 정원 산책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 소나무 지붕
서하헌의 시에 “암재여우화(巖齋如羽化)”라는 시구는 바위를 집으로 삼는 호탕한 기개에서 나온 표현이다. 실제로 서석지 바위들에 붙인 이름을 보면 바둑을 두는 기평석, 불을 밝히는 조천촉, 글을 읽는 상경석, 신선들의 거처인 선유석 등 바위를 거처 삼아 즐기는 풍류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멀리서 바위들을 내려다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 바위들을 거닐며 오히려 바위 위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는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사우단을 바위 사이로 집어넣어 소나무를 드리운 것은 따라서 소나무를 지붕 삼고 바위를 집으로 삼는 시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선과 진인들이 오가네.
탁영반(濯纓盤) 밝고 맑은 물 아래 바위 편평한 모양이 옥쟁반보다 멋있구나.
먼지 묻은 갓끈을 한 번 씻으니
신선 되려 신단을 먹을 마음도 없네.
화예석(花石) 무궁화가 화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아침에 피어 저녁이면 지니
옥으로 깎은 꽃 하나 피워 계절 없이 즐김과 어찌 같으리.
희접암(蝶巖) 훨훨 나는 한 마리 분나비 활짝 핀 꽃을 따라 붙으려 하네.
봉운석(封雲石) 바다 학이 푸른 개울에 내려 깃을 씻고
아침 해 찬란한 빛 대그릇 모양 오색구름 맞이하는 곳이네.
조천촉(調天燭) 그 형상이 옥대와도 같네. 서 있는 모습이 수려하여 특이한데
맑은 광채가 두루 가까운 곳, 먼 곳에 비쳐
여섯 길조를 이미 얻어 뻗쳤고
만방이 이 이치를 따르네.
이와 같은 풍경은 신선도에 자주 등장하는 풍경이다. 바위의 묘사 중에 나비가 나는 풍경은, 선계와 인간계의 경계를 알 수 없다는 비유로 흔히 사용되는 장자의 나비의 꿈을 차용한 것으로, 정영방이 도교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정원을 감상했음을 알 수 있다. 옥에 대한 비유가 많은 것은 신선을 모시는 건물을 옥당이라 부른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신선들을 태우고 다닐 뿐 아니라 신선들이 사자 역할을 한다는 학은 봉운석으로 표현되어 신선계를 상징한다.
경정에 이어지는 주일재와 사우단의 묘사 또한 회화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재 안에서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이 문인화를 펼쳐 놓은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이다.
매화와 국화는 눈 가운데 뜻이요
소나무와 황죽은 서리 내린 후의 색이로다.
올타리 아래 빛나는 국화, 창 밖에 아름다운 매화!
이처럼 서석지는 외원의 문암에서부터 내원의 사우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두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조경하였다.
- 시작과 끝의 하나 됨
서석지의 가장 큰 특징은 내원과 외원의 조화이다. 우선 내원과 외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외원에는 구포암· 나월암· 입석· 골립암· 문암 등의 기괴한 형상의 바위들이다. 구포암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고 편평한 바위로서 거북의 등처럼 생겼는데 개울 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형상이다. 나월암은 청기천 주변의 바위로서 개울가를 두르고 있는 작고 나지막한 바위들이다. 하늘로 높이 치솟은 기둥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입석은 자금병의 긴 절벽과 마주하고 있는 바위로 내원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의 뼈대를 드러낸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골립암은 산줄기의 끝에 위치하여 석가산을 연상하게 한다. 문암은 개천 가운데 홀로 솟아 있는 바위로 사각형이다.
내원의 서석지 안에도 여러 형상의 바위들이 있는데 외원의 바위들과 유사한 바위들을 찾을 수 있다. 구포암은 넓고 편평한 신유석과 비슷하고 나월암은 봉운석, 수륜석은 연지 가장자리의 바위들과 비슷하다. 압석은 촛대를 연상하여 이름붙인 조천촉과 비슷하다. 골립암은 사우단 주변의 바위들인 화예석· 난가암· 희접암 등과 유사하다. 문암은 그 위치로 보아서는 바둑판 모양의 기평석과 유사하다. 외원에는 자금병이 있는데 개천을 따라 길게 늘어선 병풍과 같다. 서석지 안에도 이처럼 병풍같이 길게 늘어선 형태의 바위 군이 있는데 봉운석과 와룡암이다.
이처럼 서석지 안의 돌들과 외원에 흩어져 있는 기괴한 형상의 돌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는데, 이것은 내원을 외원의 축소판같이 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내원과 외원이 서로 합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완전히 다른 원칙에 의해 내원과 외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독립적으로 나열한다는 원칙에 의해 내원과 외원을 구성한 것이다. 그 원칙은 별도로 괴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석맥을 살려 지당을 만들고, 그 석맥을 통해 주변의 자연을 끌어들이는 독창적인 조원법이다.
- 시를 읊는 산보
서석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시로 풀어내고 있다. 마치 소쇄원48영이 정원의 모든 요소에 시를 붙여 열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이다. 이처럼 발걸음이 닿는 모든 부분에 시를 붙이는 것은 시를 통해 전체적 구조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안에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같이 풍경을 감상하는 길이 있긴 하지만 정원의 전체적 구도는, 그림 같은 정원이 아니라 시적 구조를 가진 정원이다. 다시 말해 바라보기 위한 정원이라기보다는 걸어다니며 시를 읊기 위한 정원이므로 최초의 정원 구상에서부터 다른 차원인 것이다. 이런 시적 구조를 따르는 정원은 시가 그렇듯 시각을 포함해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원은 눈으로 감상하는 정원에 비해 좀더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시가 본질적으로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이런 보보행음(步步行吟)의 구조는 정원 산책을 통한 시 감상과 더불어 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에서 볼 수 있다. 이로서 옛 선인들이 정원 산책을 일종의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원의 각 요소에 시와 함께 붙여진 명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받든다는 뜻의 경(敬)자를 쓴 경정(敬亭)이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뜻의 극기재(克己齋), 자연의 절개를 본받자는 뜻의 사우단(四友壇), 오로지 한 뜻을 받들자는 주일재(主一齋) 등은 곧 정신 수양과 정원 산책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 소나무 지붕
서하헌의 시에 “암재여우화(巖齋如羽化)”라는 시구는 바위를 집으로 삼는 호탕한 기개에서 나온 표현이다. 실제로 서석지 바위들에 붙인 이름을 보면 바둑을 두는 기평석, 불을 밝히는 조천촉, 글을 읽는 상경석, 신선들의 거처인 선유석 등 바위를 거처 삼아 즐기는 풍류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멀리서 바위들을 내려다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각 바위들을 거닐며 오히려 바위 위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는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사우단을 바위 사이로 집어넣어 소나무를 드리운 것은 따라서 소나무를 지붕 삼고 바위를 집으로 삼는 시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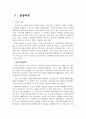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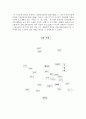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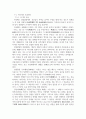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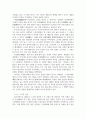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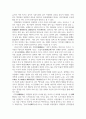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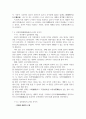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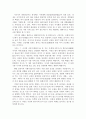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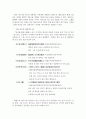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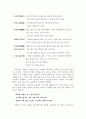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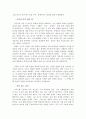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