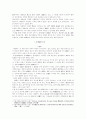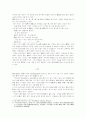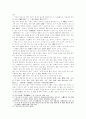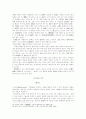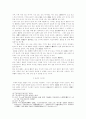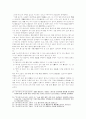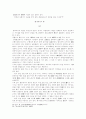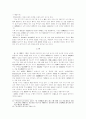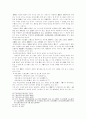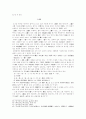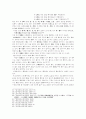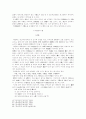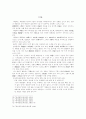목차
머 리 말
Ⅰ.생사윤회의 인
1.무명
2.애
3.번뇌의 상
Ⅱ.깨달음의 인
1.보제심
2.행의 그침
3.염으로 다스림
Ⅲ.깨달음의 연
1.신
2.삼학
3.지관
Ⅳ.깨달음의 과정
1.수행의 단계
2.현상의 단계
Ⅴ.깨달음의 과
1.사과
2.신통
맺 는 말
Ⅰ.생사윤회의 인
1.무명
2.애
3.번뇌의 상
Ⅱ.깨달음의 인
1.보제심
2.행의 그침
3.염으로 다스림
Ⅲ.깨달음의 연
1.신
2.삼학
3.지관
Ⅳ.깨달음의 과정
1.수행의 단계
2.현상의 단계
Ⅴ.깨달음의 과
1.사과
2.신통
맺 는 말
본문내용
인다.
Ⅴ.깨달음의 果
1.四果
아함에는 급고독장자처럼 큰 보시와 공양을 하고, 부처님께 須陀洹의 도를 얻었다는 것도 보이고, 일체 모든 行에 대해 無常想, 苦想, 無我想등의 觀想을 통해 斯陀含을 얻은 것
) 『잡아함경』(대정장2, 270중)
도 보이며, 定學을 수행하면 阿那含까지 얻을 수 있음도 보았다.
아함에서 阿那含도는 대개 四念處다음이나, 四禪, 四無色定, 四無量心다음에 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平靜을 얻은 四禪의 位가 아직 阿羅漢은 아니라는 점이다.
四禪을 얻은 후에도 四無量心이나 四無色定을 거쳐서 神通을 얻고, 四聖諦를 觀한 후에 해탈하는 과정
) 『중아함경』(대정장1, 724중)
이 설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不動心이 되어 비록 비추기는 하지만, 완전히 익은 비춤은 아니기 때문에, 觀의 수행을 통해 비춤을 성숙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번뇌가 멸한 완전한 雙寂雙照가 되고, 이미 성취되면 雙寂雙照한다는 것도 잊게 되어, 자연스런 비춤이 항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四諦는 부처님의 四諦가 아니고 자신의 四諦인 것이다. 四無色定은 수행법이 아니고, 觀이 열리는 過程이다. 따라서 설사 한 境界를 본 사람도 부단히 觀의 수행을 익혀, 완전한 비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자신이 본 것을 끊임없이 觀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선종에서 보림이라 한다.
장아함에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홉 가지가 없다고 하는 데 다음과 같다.
"不殺, 不盜, 不 , 不妄語, 不捨道, 不隨欲, 不隨 , 不隨怖, 不隨癡"
) 『장아함경』(대정장1, 75중)
아함에서는 定을 통해 阿那含을 얻고, 不動心을 얻으면 神通이 난다고 한다
禪宗의 見性은 제 4禪에서 처음 無心이 일어난 境地이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不動心을 얻어 神通이 저절로 열린다. 대승에서는 見道를 初地로 배대하고, 不動心을 8地에 놓고 있다. 능가경에서는 不動地를 얻으면, 神通自在하여 隨意受生身을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깨끗하게 쓰면, 보시나 觀想法이나 4念處수행을 다하지 않아도 몰록 一切 煩惱를 除하는 것, 이것이 禪宗의 敎理이다.
"도를 배움에 항상 自性을 觀하면,
곧 모든 부처님과 한 가지로 같아지네.
우리 祖師는 오직 이러한 頓法을 전했으니,
널리 원하건대 自性을 보아 一體가 되도록 하라."
) 『육조단경』 앞의책, pp.102-103.
2.神通
아함에는 세존뿐만 아니라 가섭과 아나율등 제자들까지도 모두 신통을 보이고 있다. 신통과 깨달음은 모두 방일하지 않는데서 나올 수 있다
) 『잡아함경』(대정장2, 151하)
고 경전에는 보이고 있다.
韓國禪에는 禪宗이 발달해서 自性의 神通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神通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아함에서 神通은 대개 아나함을 얻은 후에 열거
) 『잡아함경」(대정장2, 247중)
되고 있는데, 중아함에서는 3明인 宿命通, 天眼通, 漏盡通이 아나함 이후 不動心을 얻은 다음에 차례대로 얻어지는 것
) 『중아함경』(대정장1, 747하)
으로 보이고 있다.
아함에서 阿那含은 四禪이나 四念處, 四無量心 또는 四無色定과 四如意足다음에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결같이 마음이 平靜해져서 그러한 平靜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法界는 차별이 없어서 모두 털어 버린 자에게만 모든 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아함에서 漏盡智는 四聖諦를 진리대로 알고 보아, 欲有漏, 有有漏, 無明漏心에서 해탈하여, 해탈한 줄 알고 나의 生이 다하고, 梵行이 이미 서고 할 바를 이미 지어 後有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漏盡智를 證得하는 것이라고 하여, 神通가운데 가장 늦게 얻어짐을 보이고 있다.
한 독일 여성이 인도에서 요가를 배웠는데, 그 스승은 神通이 있어서 처음에 무척 존경하고 가르침대로 잘 따라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스승은 여인을 끊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후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 禪院 이곳 저곳을 다녀 보았는데, 한국의 禪師들은 신통은 보지 못했지만 더 존경이 간다고 하며, 인사동에서 발우를 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현상을 자재하는 신통은 禪定을 성취하면 얻을 수 있지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漏盡通은 不動心 이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佛子는 生死解脫이 목적이므로 神通에 惑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不動心에서 얻어 지는 신통은 三明이다. 三明 가운데 宿命通은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신통이며, 天眼通은 미래의 일이 미리 보이는 신통이며, 漏盡通는 天眼通 다음에 얻어 지며 一切 煩惱가 다한 것
) 『중아함경』(대정장1, 748상-중)
을 말한다.
돈오입도요문론에는 마음이라는 집착도 버릴 것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언제 해탈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진흙 물로 때를 씻는 것 과 같다. 반야는 현묘하여 본래 스스로 생 함이 없으니, 큰 작용이 나타남에 시절을 논하 지 않는다.''범부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성품을 본 사람은 곧 범부가 아니다. 上乘을 깨달으면 범부도 초월하고 성인도 초월한다......어리석은 사람은 먼 겁을 기다려 증득하지 만, 깨달은 사람은 몰록 본다.'"
) 『돈오입도요문론』,앞의책, p.241.
선어록에는 마음이라는 집착도 破하게 함을 보이고 있다.
맺 는 말
이미 증득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배을 지고 가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아직 미숙한 이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래로 허공에 누각을 지어보았다. 허공만 본 사람은 누각이 있었는지를 알 것이고, 허공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모래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함에서는 相을 보였고, 大乘에서는 相을 파했고, 禪宗에서는 本體를 보였다.
禪宗의 법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마땅한 스승이 없어 다시 相을 보여 體을 알고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번뇌를 쌓았다.
강을 건너는 모래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Ⅴ.깨달음의 果
1.四果
아함에는 급고독장자처럼 큰 보시와 공양을 하고, 부처님께 須陀洹의 도를 얻었다는 것도 보이고, 일체 모든 行에 대해 無常想, 苦想, 無我想등의 觀想을 통해 斯陀含을 얻은 것
) 『잡아함경』(대정장2, 270중)
도 보이며, 定學을 수행하면 阿那含까지 얻을 수 있음도 보았다.
아함에서 阿那含도는 대개 四念處다음이나, 四禪, 四無色定, 四無量心다음에 설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平靜을 얻은 四禪의 位가 아직 阿羅漢은 아니라는 점이다.
四禪을 얻은 후에도 四無量心이나 四無色定을 거쳐서 神通을 얻고, 四聖諦를 觀한 후에 해탈하는 과정
) 『중아함경』(대정장1, 724중)
이 설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不動心이 되어 비록 비추기는 하지만, 완전히 익은 비춤은 아니기 때문에, 觀의 수행을 통해 비춤을 성숙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번뇌가 멸한 완전한 雙寂雙照가 되고, 이미 성취되면 雙寂雙照한다는 것도 잊게 되어, 자연스런 비춤이 항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四諦는 부처님의 四諦가 아니고 자신의 四諦인 것이다. 四無色定은 수행법이 아니고, 觀이 열리는 過程이다. 따라서 설사 한 境界를 본 사람도 부단히 觀의 수행을 익혀, 완전한 비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자신이 본 것을 끊임없이 觀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선종에서 보림이라 한다.
장아함에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은 아홉 가지가 없다고 하는 데 다음과 같다.
"不殺, 不盜, 不 , 不妄語, 不捨道, 不隨欲, 不隨 , 不隨怖, 不隨癡"
) 『장아함경』(대정장1, 75중)
아함에서는 定을 통해 阿那含을 얻고, 不動心을 얻으면 神通이 난다고 한다
禪宗의 見性은 제 4禪에서 처음 無心이 일어난 境地이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不動心을 얻어 神通이 저절로 열린다. 대승에서는 見道를 初地로 배대하고, 不動心을 8地에 놓고 있다. 능가경에서는 不動地를 얻으면, 神通自在하여 隨意受生身을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깨끗하게 쓰면, 보시나 觀想法이나 4念處수행을 다하지 않아도 몰록 一切 煩惱를 除하는 것, 이것이 禪宗의 敎理이다.
"도를 배움에 항상 自性을 觀하면,
곧 모든 부처님과 한 가지로 같아지네.
우리 祖師는 오직 이러한 頓法을 전했으니,
널리 원하건대 自性을 보아 一體가 되도록 하라."
) 『육조단경』 앞의책, pp.102-103.
2.神通
아함에는 세존뿐만 아니라 가섭과 아나율등 제자들까지도 모두 신통을 보이고 있다. 신통과 깨달음은 모두 방일하지 않는데서 나올 수 있다
) 『잡아함경』(대정장2, 151하)
고 경전에는 보이고 있다.
韓國禪에는 禪宗이 발달해서 自性의 神通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神通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아함에서 神通은 대개 아나함을 얻은 후에 열거
) 『잡아함경」(대정장2, 247중)
되고 있는데, 중아함에서는 3明인 宿命通, 天眼通, 漏盡通이 아나함 이후 不動心을 얻은 다음에 차례대로 얻어지는 것
) 『중아함경』(대정장1, 747하)
으로 보이고 있다.
아함에서 阿那含은 四禪이나 四念處, 四無量心 또는 四無色定과 四如意足다음에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결같이 마음이 平靜해져서 그러한 平靜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얻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法界는 차별이 없어서 모두 털어 버린 자에게만 모든 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아함에서 漏盡智는 四聖諦를 진리대로 알고 보아, 欲有漏, 有有漏, 無明漏心에서 해탈하여, 해탈한 줄 알고 나의 生이 다하고, 梵行이 이미 서고 할 바를 이미 지어 後有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漏盡智를 證得하는 것이라고 하여, 神通가운데 가장 늦게 얻어짐을 보이고 있다.
한 독일 여성이 인도에서 요가를 배웠는데, 그 스승은 神通이 있어서 처음에 무척 존경하고 가르침대로 잘 따라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스승은 여인을 끊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후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 禪院 이곳 저곳을 다녀 보았는데, 한국의 禪師들은 신통은 보지 못했지만 더 존경이 간다고 하며, 인사동에서 발우를 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현상을 자재하는 신통은 禪定을 성취하면 얻을 수 있지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漏盡通은 不動心 이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佛子는 生死解脫이 목적이므로 神通에 惑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不動心에서 얻어 지는 신통은 三明이다. 三明 가운데 宿命通은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신통이며, 天眼通은 미래의 일이 미리 보이는 신통이며, 漏盡通는 天眼通 다음에 얻어 지며 一切 煩惱가 다한 것
) 『중아함경』(대정장1, 748상-중)
을 말한다.
돈오입도요문론에는 마음이라는 집착도 버릴 것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언제 해탈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진흙 물로 때를 씻는 것 과 같다. 반야는 현묘하여 본래 스스로 생 함이 없으니, 큰 작용이 나타남에 시절을 논하 지 않는다.''범부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성품을 본 사람은 곧 범부가 아니다. 上乘을 깨달으면 범부도 초월하고 성인도 초월한다......어리석은 사람은 먼 겁을 기다려 증득하지 만, 깨달은 사람은 몰록 본다.'"
) 『돈오입도요문론』,앞의책, p.241.
선어록에는 마음이라는 집착도 破하게 함을 보이고 있다.
맺 는 말
이미 증득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배을 지고 가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아직 미숙한 이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래로 허공에 누각을 지어보았다. 허공만 본 사람은 누각이 있었는지를 알 것이고, 허공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모래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함에서는 相을 보였고, 大乘에서는 相을 파했고, 禪宗에서는 本體를 보였다.
禪宗의 법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마땅한 스승이 없어 다시 相을 보여 體을 알고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번뇌를 쌓았다.
강을 건너는 모래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