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생을 거듭하면서 인연에 따라 싹터 또 다른 업을 쌓아 간다. 아뢰야식은 윤회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하였다. 자기가 지은 업의 세력에 의해 삼계에 생사윤회한다면 그 업의 영향이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는 어디에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아뢰야식은 업력을 보존하는 能藏이며 수동적으로 보존하므로 所藏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현재의 생명체로서 내외의 현실을 전개하는 주체가 되며 동시에 윤회의 주체가 된다. 아뢰야식은 그 체성이 단절되지 않고 과보를 받는다고 하여 果報識이라고도 하고 삼세에 윤회하면서 다른 과보를 받게 함으로 異熟識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아집이 있는 동안의 명칭이므로 수행을 통해 아집이 없어지면 8식은 남아 있어도 그 명칭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식사상에 의하면 경험세계는 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식의 相分일 뿐이다. 그럼에도 상분을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는 인식상태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식작용 자체도 항상 생성소멸하는 의타적 존재로서 이를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하며 이렇게 식의 본성을 깨닫고 나면 외계 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이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이것이 유식의 三性說이다. 그런데 변계소집의 망상은 허공의 꽃처럼 체성이 없으므로 相無性이고 의타기성은 因緣生이라 고정적인 자성이 없으므로 生無性이고 원성실성은 일체 유무의 상을 떠나서 진리의 수승한 바탕인 동시에 無自性이므로 승의무성이다. 이처럼 삼성과 삼무성은 서로 연관을 가지며 일체 만법이 偏有와 偏空을 떠난 비유비공의 중도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식학파는 자아집중의 수행을 통해 모든 사물이 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제8식에 심어져 있는 업보의 씨앗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후에 이것은 法相宗으로 이어지지만 그 복잡한 교리로 소멸되고 만다.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
여래장사상은 중국 화엄종의 현수법장(賢首法藏)이 대소승경론을 소승 중관 유식 여래장사상으로 크게 4등분하면서부터 대승불교의 한 학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이미 인도에서부터 출현 전개되어 온 바 있다. 그 대표적 경전으로는 여래장경, 대반열반경, 승만경 부증불감경이 있으며 보성론 불성론 대승기신론 등은 여래장 사상의 중요한 논서이다.
여래장사상이란 일체 중생은 여래를 감추고 있다는 사상이다.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一切衆生 悉有佛性). 중생은 그 마음 속에 불성이 있고 여래를 감추고 있으며 여래의 태아가 그 속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신론에는 중생이 가진 청정심과 염오심을 眞如心과 生滅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진여문의 진여심을 여래장이라고 하고 생멸문의 생멸심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진여에는 더러움이나 허망한 것이 전혀 없어 공하다 하여 공여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공적이 원만구족한 까닭으로 불공여래장이라고 한다. 이 여래장을 의지하여 생멸심이 있으니 불생불멸의 진여가 생멸과 화합한 것이 아뢰야식이다.
생멸세계는 진여, 여래장이 연을 따라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연기현상을 진여연기 또른 여래장연기라고 한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진여에 무명풍이 불어 현상세계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파도가 바닷물과 다르지 않듯이 현실세계가 진여와 다른 것이 아니다. 허위의 삼계 속에는 진여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보면 진여와 현실은 다르나 진여에서 보면 진여와 현실은 다르지 않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나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 중생은 부처가 되는 수행을 닦을 수 있다. 먼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의 수행(오행)을 닦아 네 가지 신심을 일으키며, 나아가 진여법을 생각하는 곧은 마음(直心)과 선행을 쌓으려는 깊은 마음(深心), 중생을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마음(大悲心)을 일으키려는 發心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여래장사상은 화엄, 선종을 위시하여 모든 대승사상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데 진여가 무명의 연을 만나 진여의 체가 그대로 일어나 생멸변화하는 萬有가 되니 이 生滅 迷界에 있는 진여를 여래장이라 한다고 할 때, 무명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이 여래장연기설에 이어 법계연기사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유식사상에 의하면 경험세계는 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식의 相分일 뿐이다. 그럼에도 상분을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는 인식상태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식작용 자체도 항상 생성소멸하는 의타적 존재로서 이를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하며 이렇게 식의 본성을 깨닫고 나면 외계 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 이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이것이 유식의 三性說이다. 그런데 변계소집의 망상은 허공의 꽃처럼 체성이 없으므로 相無性이고 의타기성은 因緣生이라 고정적인 자성이 없으므로 生無性이고 원성실성은 일체 유무의 상을 떠나서 진리의 수승한 바탕인 동시에 無自性이므로 승의무성이다. 이처럼 삼성과 삼무성은 서로 연관을 가지며 일체 만법이 偏有와 偏空을 떠난 비유비공의 중도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식학파는 자아집중의 수행을 통해 모든 사물이 식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제8식에 심어져 있는 업보의 씨앗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후에 이것은 法相宗으로 이어지지만 그 복잡한 교리로 소멸되고 만다.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
여래장사상은 중국 화엄종의 현수법장(賢首法藏)이 대소승경론을 소승 중관 유식 여래장사상으로 크게 4등분하면서부터 대승불교의 한 학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이미 인도에서부터 출현 전개되어 온 바 있다. 그 대표적 경전으로는 여래장경, 대반열반경, 승만경 부증불감경이 있으며 보성론 불성론 대승기신론 등은 여래장 사상의 중요한 논서이다.
여래장사상이란 일체 중생은 여래를 감추고 있다는 사상이다.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一切衆生 悉有佛性). 중생은 그 마음 속에 불성이 있고 여래를 감추고 있으며 여래의 태아가 그 속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신론에는 중생이 가진 청정심과 염오심을 眞如心과 生滅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진여문의 진여심을 여래장이라고 하고 생멸문의 생멸심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진여에는 더러움이나 허망한 것이 전혀 없어 공하다 하여 공여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공적이 원만구족한 까닭으로 불공여래장이라고 한다. 이 여래장을 의지하여 생멸심이 있으니 불생불멸의 진여가 생멸과 화합한 것이 아뢰야식이다.
생멸세계는 진여, 여래장이 연을 따라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연기현상을 진여연기 또른 여래장연기라고 한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진여에 무명풍이 불어 현상세계가 벌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파도가 바닷물과 다르지 않듯이 현실세계가 진여와 다른 것이 아니다. 허위의 삼계 속에는 진여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보면 진여와 현실은 다르나 진여에서 보면 진여와 현실은 다르지 않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나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상에 따라 중생은 부처가 되는 수행을 닦을 수 있다. 먼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의 수행(오행)을 닦아 네 가지 신심을 일으키며, 나아가 진여법을 생각하는 곧은 마음(直心)과 선행을 쌓으려는 깊은 마음(深心), 중생을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마음(大悲心)을 일으키려는 發心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여래장사상은 화엄, 선종을 위시하여 모든 대승사상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데 진여가 무명의 연을 만나 진여의 체가 그대로 일어나 생멸변화하는 萬有가 되니 이 生滅 迷界에 있는 진여를 여래장이라 한다고 할 때, 무명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이 여래장연기설에 이어 법계연기사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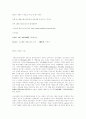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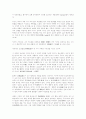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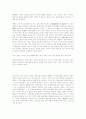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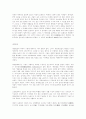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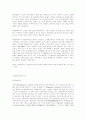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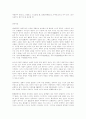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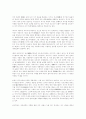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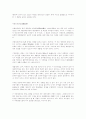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