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사개설
2.양백준의 〈맹자사전〉의 부사
1). 형용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2). 동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3). 수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4). 명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5). 대명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6). 연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7). 양백준의 〈부사사전〉에 없는 부사
三. 맺음말
2.양백준의 〈맹자사전〉의 부사
1). 형용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2). 동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3). 수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4). 명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5). 대명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6). 연사를 부사로 판단한 것
7). 양백준의 〈부사사전〉에 없는 부사
三. 맺음말
본문내용
知道 適足以爲患. 《呂氏春秋·本生》
권세와 돈이 있지만 (그것을 간직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면 단지 우환이 되기에 충분하다.
\'滋\'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는 \'更, 愈\'로 풀이하고 있는데, 副詞라고 정의하지는 않았다. 《孟子》에는 모두 두 번의 例가 나온다.
孟,公上-0107/1 曰若是則弟子之惑 滋甚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猶未洽於天下
\"그렇다면 弟子의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 文王의 德을 가지고도 백년 뒤에 崩하셨는데도 아직 天下에 교화가 되지 않았다.\"
孟,告下-0603/2 魯之削也滋甚 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
魯나라의 侵削됨이 더욱 심하였으니, 이와 같이 賢者가 나라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
\'愈\'의 경우에는 《孟子》에 총 9차례 나온다. 그 중 副詞는 2개 밖에 없는데, 이를 楊伯峻은 \'更, 越\'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문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문헌도 참고로 예를 든다.
孟,告下-0304/1 曰凱風 親之過小者也 小弁 親之過大者也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凱風\'은 어버이의 과실이 적은 것이요, \'小弁\'은 어버이의 과실이 큰 것이니, 어버이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소원해지는 것이다.
吾三相楚而心愈卑 每益祿而施愈博. 《荀子·堯問》
나는 세 번 楚나라 재상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더욱더 겸손해졌고, 매번 봉록은 증가되었으나 베풂은 더욱 넓어졌다.
\'良\'의 경우에는 \'眞, 誠\'라고 풀고 있으나 副詞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孟子》에는 副詞로 쓰인 例가 1개 밖에 없어서 다른 문헌에서 예문을 찾아보기로 한다.
孟,告上-1702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良貴가 아니니, 趙孟이 귀하게 해준 것을 趙孟이 능히 천하게 할 수 있다.
諸侯皆以趙氏孤兒良已死. 《史記·趙世家》
여러 장군들은 모두 조씨의 고아가 확실히 죽었다고 여겼다.
中國其良絶矣. 《漢書·五行志》
중원 지방은 정말로 단절되었다.
\'勿\'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 \'不要\'라고 풀이하고 있다. 《맹자》에 나온 24번이 모두 부사이다.
孟,梁上-0506 故曰仁者無敵 王請勿疑
그러므로 \'仁者\'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한 것이니, 王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소서.
孟,梁下-0502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則 勿毁之矣
孟子께서 대답하셨다. \"明堂이란 王者의 堂이니, 왕께서 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부수지 마소서.\"
孟,盡下-3401 孟子曰 說大人則 之 勿視其巍巍然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大人을 遊說할 때에는 하찮게 여기고 그 드높음을 보지 말아야 한다.
\'未\'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 \'不曾, 還沒有:同\"不\"\'라고 풀고 있다.
孟,梁上-0105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仁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義롭고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孟,梁上-0606/3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지금 天下의 人牧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孟,梁上-0708/1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仁을 하는 方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遂\'의 경우에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는 \'連詞\'로 파악하고 있으나, 動詞 앞에서 \'결국, 마침내\'라는 의미로 쓰이고, 副詞語 이외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마땅히 副詞로 보아야할 것이다.
孟,公下-0205/2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 若不相似然
진실로 장차 조회를 하시려다가 王命을 듣고서 마침내 결행하지 않으셨으니, 禮와 서로 같지 않은 듯 합니다.
孟, 上-0308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詩經》에 이르기를 \'우리 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私田에 미친다.\'하였으니, 오직 助法에 公田이 있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한다면 비록 周나라도 또한 助法을 쓴 것입니다.
孟, 上-0412/3 彼所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저는 이른바 豪傑의 선비라는 것이다. 그대의 형제가 그를 섬기기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스승이 죽자, 마침내 배반하는구나!
孟,離下-0304/2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 遂收其田里
연고가 있어 떠나면, 군주가 그를 속박하며, 또 그가 가는 곳에 궁하게 하고, 떠나는 날에 마침내 그의 田里를 환수하였다.
\'何必\'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動詞 앞에서 \'何必\'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副詞語 이외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마땅히 副詞로 보아야할 것이다.
孟,梁上-0103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孟子께서 대답하셨다. \"王은 하필이면 利를 말하십니까? 단지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孟,梁上-0106 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
王께서는 다만 仁義를 말씀하실 따름이지,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
一.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呂叔湘의 \'副詞의 주요 작용은 부사어가 되어,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다\'라는 정의와, 朱德熙의 \'副詞는 단지 副詞語 역할을 하는 허사\'라는 정의를 기초로 하여 \'楊伯峻의 《孟子譯注》\'에 나오는 副詞를 分析하였다.
楊伯峻의 《孟子譯注》에서 副詞라고 표기한 단어는 總86개이고, 이 중에 27개의 단어는 副詞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59개의 단어에 副詞임에도 副詞로 인정하지 않은 단어 14개를 더해서 73개의 단어가 《孟子》에 나온 副詞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十三經注疎》. 中華書局. 1996.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6.
이기동 譯解 《孟子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成百曉 譯註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9.
鄧福南 著, 송용준 譯 《現代中國語文法의 諸問題》중문. 1991.
馬智强 《孟子全譯》 江蘇古籍出版社. 1998.
金良年 撰 《孟子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郭錫良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陳甲坤 編 《四書索引》 寶庫社. 1997.
北京大學圖書館索引編纂硏究部 編 《孟子索引》 北京大學出版社. 1992.
권세와 돈이 있지만 (그것을 간직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면 단지 우환이 되기에 충분하다.
\'滋\'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는 \'更, 愈\'로 풀이하고 있는데, 副詞라고 정의하지는 않았다. 《孟子》에는 모두 두 번의 例가 나온다.
孟,公上-0107/1 曰若是則弟子之惑 滋甚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 猶未洽於天下
\"그렇다면 弟子의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 文王의 德을 가지고도 백년 뒤에 崩하셨는데도 아직 天下에 교화가 되지 않았다.\"
孟,告下-0603/2 魯之削也滋甚 若是乎賢者之無益於國也
魯나라의 侵削됨이 더욱 심하였으니, 이와 같이 賢者가 나라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
\'愈\'의 경우에는 《孟子》에 총 9차례 나온다. 그 중 副詞는 2개 밖에 없는데, 이를 楊伯峻은 \'更, 越\'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문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문헌도 참고로 예를 든다.
孟,告下-0304/1 曰凱風 親之過小者也 小弁 親之過大者也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凱風\'은 어버이의 과실이 적은 것이요, \'小弁\'은 어버이의 과실이 큰 것이니, 어버이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소원해지는 것이다.
吾三相楚而心愈卑 每益祿而施愈博. 《荀子·堯問》
나는 세 번 楚나라 재상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더욱더 겸손해졌고, 매번 봉록은 증가되었으나 베풂은 더욱 넓어졌다.
\'良\'의 경우에는 \'眞, 誠\'라고 풀고 있으나 副詞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孟子》에는 副詞로 쓰인 例가 1개 밖에 없어서 다른 문헌에서 예문을 찾아보기로 한다.
孟,告上-1702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良貴가 아니니, 趙孟이 귀하게 해준 것을 趙孟이 능히 천하게 할 수 있다.
諸侯皆以趙氏孤兒良已死. 《史記·趙世家》
여러 장군들은 모두 조씨의 고아가 확실히 죽었다고 여겼다.
中國其良絶矣. 《漢書·五行志》
중원 지방은 정말로 단절되었다.
\'勿\'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 \'不要\'라고 풀이하고 있다. 《맹자》에 나온 24번이 모두 부사이다.
孟,梁上-0506 故曰仁者無敵 王請勿疑
그러므로 \'仁者\'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한 것이니, 王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소서.
孟,梁下-0502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則 勿毁之矣
孟子께서 대답하셨다. \"明堂이란 王者의 堂이니, 왕께서 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부수지 마소서.\"
孟,盡下-3401 孟子曰 說大人則 之 勿視其巍巍然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大人을 遊說할 때에는 하찮게 여기고 그 드높음을 보지 말아야 한다.
\'未\'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 \'不曾, 還沒有:同\"不\"\'라고 풀고 있다.
孟,梁上-0105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仁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義롭고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孟,梁上-0606/3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지금 天下의 人牧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孟,梁上-0708/1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仁을 하는 方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遂\'의 경우에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는 \'連詞\'로 파악하고 있으나, 動詞 앞에서 \'결국, 마침내\'라는 의미로 쓰이고, 副詞語 이외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마땅히 副詞로 보아야할 것이다.
孟,公下-0205/2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 若不相似然
진실로 장차 조회를 하시려다가 王命을 듣고서 마침내 결행하지 않으셨으니, 禮와 서로 같지 않은 듯 합니다.
孟, 上-0308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詩經》에 이르기를 \'우리 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私田에 미친다.\'하였으니, 오직 助法에 公田이 있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한다면 비록 周나라도 또한 助法을 쓴 것입니다.
孟, 上-0412/3 彼所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저는 이른바 豪傑의 선비라는 것이다. 그대의 형제가 그를 섬기기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스승이 죽자, 마침내 배반하는구나!
孟,離下-0304/2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 遂收其田里
연고가 있어 떠나면, 군주가 그를 속박하며, 또 그가 가는 곳에 궁하게 하고, 떠나는 날에 마침내 그의 田里를 환수하였다.
\'何必\'의 경우에는 楊伯峻의 《孟子詞典》에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動詞 앞에서 \'何必\'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副詞語 이외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마땅히 副詞로 보아야할 것이다.
孟,梁上-0103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孟子께서 대답하셨다. \"王은 하필이면 利를 말하십니까? 단지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孟,梁上-0106 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
王께서는 다만 仁義를 말씀하실 따름이지,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
一.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呂叔湘의 \'副詞의 주요 작용은 부사어가 되어,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다\'라는 정의와, 朱德熙의 \'副詞는 단지 副詞語 역할을 하는 허사\'라는 정의를 기초로 하여 \'楊伯峻의 《孟子譯注》\'에 나오는 副詞를 分析하였다.
楊伯峻의 《孟子譯注》에서 副詞라고 표기한 단어는 總86개이고, 이 중에 27개의 단어는 副詞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59개의 단어에 副詞임에도 副詞로 인정하지 않은 단어 14개를 더해서 73개의 단어가 《孟子》에 나온 副詞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十三經注疎》. 中華書局. 1996.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6.
이기동 譯解 《孟子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成百曉 譯註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9.
鄧福南 著, 송용준 譯 《現代中國語文法의 諸問題》중문. 1991.
馬智强 《孟子全譯》 江蘇古籍出版社. 1998.
金良年 撰 《孟子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郭錫良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陳甲坤 編 《四書索引》 寶庫社. 1997.
北京大學圖書館索引編纂硏究部 編 《孟子索引》 北京大學出版社.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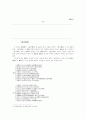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