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동방철학자의 `우주체계`
1. 이·태극·도의 형이상학적
본체세계
2. 이오지기의 형이하적 현실세계
3. 퇴계의 동방철학 우주체계의
천도관에 대한 이론적 기여
Ⅲ. `인도`의 심성론·도덕론·교육론
및 정치론
Ⅳ. 천인학의 이상적 세계
Ⅱ. 동방철학자의 `우주체계`
1. 이·태극·도의 형이상학적
본체세계
2. 이오지기의 형이하적 현실세계
3. 퇴계의 동방철학 우주체계의
천도관에 대한 이론적 기여
Ⅲ. `인도`의 심성론·도덕론·교육론
및 정치론
Ⅳ. 천인학의 이상적 세계
본문내용
정치\"
) 上同
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122-
이 밖에 그는 군주가 仁政과 德治를 시행하는 데에는 또 인재의 선용이 요구되고 일단의 현명한 신하들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업무는 결코 한 개인의 능력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 나라의 국체는 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한 몸에서 머리는 위에 있어서 통솔하고 군림하고, 배와 가슴은 가운데서 (명령을) 이어받아 소임을 수행하고, 귀와 눈운 두루 통달하여 호위하고 따르나니, 그런 뒤에야 몸이 편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주인 되는 임금은 한 나라의 원수요, 대신은 그 배와 가슴입니다. 台諫은 귀와 눈입니다. 이 세가지가 서로 합하여 이루는 것은 실로 국가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추세요, 천하의 고금에 한결같이 공통되는 바입니다.\"
) 上同
셋째, 仁政이 순탄하게 실시되기 위해서 퇴계는 또 \"天\"의 권위를 빌려 군왕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코자 하였다. 이는 비록 종교적인 미신의 색채를 띠고 있으나 봉건군주가 독재전제하려는 체제아래에서 군왕의 사치와 탐욕 그리고 독단적 전횡을 여하히 견제하느냐 하는 고심이 깊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123-
Ⅳ. 天人學의 理想的 世界
퇴계선생의 天道(자연철학)와 人道에 대한 이론을 종합해 볼 때, 그의 天人學의 이상적 세계는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즉 그것은 이미 천도의 常(元亨利貞)을 깨우친 데 이르러서 이를 또 人性의 綱(인의예지)이라는 성인의 차원과 부합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질과 사욕의 속박을 받지 않고 완전히 심성을 全德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퇴계의 聖學十圖 의 취지는 이와 같은 이상적 인격의 성인을 배양하고 조장하는데 있다. 이에 仁은 심성의 全德을 대표하고, 또한 천도의 常과 인성의 綱을 가장 훌륭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의 大德은 生이라고 말한다\"고 했거니와 仁은 이 \"生生\"의 뜻을 가장 훌륭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기 그 구실을 갖게 하고 제각기 그 生을 수행하게 된다. \"자기가 立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立하게 하고, 자기가 達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달하게 한다.\"
) 《論語》, <雍也>
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데서 곧 \"천지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 된다\"
) 全書 (一), <聖學十圖>
고 했듯이 천지자연과 인간사회가 화해하고 일치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퇴계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개 성학은 仁을 구하는 데 있다.\"
) 上同
이 또한 바로 퇴계선생이 왜 仁을 이상적 인격의 상징으로 삼고, 天人學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려 했는지의 의도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퇴계선생이 天人學에 관한 연구에서 어떻게 하면 천지자연과 인류사회로 하여금 화해하고 일치하는 이상적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모색은 매우 그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天人學의 사상체계가 갖는 의의는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라는 것이다. 이퇴계는 자연과 사회 및 인생의 이상을 일체로 융합하여,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구조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저술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여전히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된다\"는 화해와 일치의 이상적 세계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는 후대인에게 유익한 시사를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화해와 일치라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과정 중에서 야기되는 산업오염과 생태계 균형의 파괴같은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사회발전에 엄중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퇴계의 天人관계와 같은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함께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124-
둘째, 仁을 이상적 인격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또 天人간의 화해일치라는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삼는 데 있어서도 이는 일정한 현실적 및 심오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仁이란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推己及人)에서 구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立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立하게 하고, 자기가 達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達하게 한다\"는 데서 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타인에게 미치는 바가 없고, 심지어 인간이 의존하여 살고 번영하려는 생태계의 균형과 평화스런 환경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不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농락하고 부국이 貧國을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무고한 생령들을 살해하는 데 끊임이 없다.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수많은 민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고 피흘리는 전쟁을 조장하고 도발한다. 만일 퇴계선생이 주장하는 仁을 본받을 수 있다면 개인관계나 국제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여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문명의 발전과 평화로운 환경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창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퇴계선생이 주장한 仁은 이미 그가 생존하던 시대적 의의를 훨씬 넘어서 있다.
-125-
퇴계선생의 天人學이라는 이상적 세계와 그의 영향력은 일찍이 1920년 근대의 진보적 사상가로 알려진 梁啓超선생에 의하여 보여졌다. 그리고 분명히 梁啓超선생은 <퇴계선생 성학십도贊詩>
) (譯者註) 이 贊詩는 1920년경 梁啓超가 중국 尙德女子大學에서 「성학십도」 를 간행하였을 때 그 「圖」末에 붙여진 贊詩의 全篇이다. 한편 이 贊詩의 한 글번역문은 李家源선생의 글을 이용하였다.
(「퇴계학보」 창간호, 1973, pp.6∼7)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높디 높으신 우리 李夫子님
예 잇고 뒤를 열어 古今을 꿰뚫으셨오,
열 폭 그림 속에 理學要訣 전하시어
百世에 길이 人心을 열으셨오,
글과 거문고는 朱子를 따르셨고
風月같은 그 襟懷는 濂溪에 비기었오,
높은 德聲 넓은 敎化 三百年에 미치시니
온누리 사람들 뉘아니 공경하리.
-126-
(이 남 영 譯)
) 上同
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122-
이 밖에 그는 군주가 仁政과 德治를 시행하는 데에는 또 인재의 선용이 요구되고 일단의 현명한 신하들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업무는 결코 한 개인의 능력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 나라의 국체는 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한 몸에서 머리는 위에 있어서 통솔하고 군림하고, 배와 가슴은 가운데서 (명령을) 이어받아 소임을 수행하고, 귀와 눈운 두루 통달하여 호위하고 따르나니, 그런 뒤에야 몸이 편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주인 되는 임금은 한 나라의 원수요, 대신은 그 배와 가슴입니다. 台諫은 귀와 눈입니다. 이 세가지가 서로 합하여 이루는 것은 실로 국가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추세요, 천하의 고금에 한결같이 공통되는 바입니다.\"
) 上同
셋째, 仁政이 순탄하게 실시되기 위해서 퇴계는 또 \"天\"의 권위를 빌려 군왕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코자 하였다. 이는 비록 종교적인 미신의 색채를 띠고 있으나 봉건군주가 독재전제하려는 체제아래에서 군왕의 사치와 탐욕 그리고 독단적 전횡을 여하히 견제하느냐 하는 고심이 깊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123-
Ⅳ. 天人學의 理想的 世界
퇴계선생의 天道(자연철학)와 人道에 대한 이론을 종합해 볼 때, 그의 天人學의 이상적 세계는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즉 그것은 이미 천도의 常(元亨利貞)을 깨우친 데 이르러서 이를 또 人性의 綱(인의예지)이라는 성인의 차원과 부합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질과 사욕의 속박을 받지 않고 완전히 심성을 全德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퇴계의 聖學十圖 의 취지는 이와 같은 이상적 인격의 성인을 배양하고 조장하는데 있다. 이에 仁은 심성의 全德을 대표하고, 또한 천도의 常과 인성의 綱을 가장 훌륭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의 大德은 生이라고 말한다\"고 했거니와 仁은 이 \"生生\"의 뜻을 가장 훌륭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기 그 구실을 갖게 하고 제각기 그 生을 수행하게 된다. \"자기가 立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立하게 하고, 자기가 達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달하게 한다.\"
) 《論語》, <雍也>
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데서 곧 \"천지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 된다\"
) 全書 (一), <聖學十圖>
고 했듯이 천지자연과 인간사회가 화해하고 일치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이퇴계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개 성학은 仁을 구하는 데 있다.\"
) 上同
이 또한 바로 퇴계선생이 왜 仁을 이상적 인격의 상징으로 삼고, 天人學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려 했는지의 의도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퇴계선생이 天人學에 관한 연구에서 어떻게 하면 천지자연과 인류사회로 하여금 화해하고 일치하는 이상적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모색은 매우 그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天人學의 사상체계가 갖는 의의는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라는 것이다. 이퇴계는 자연과 사회 및 인생의 이상을 일체로 융합하여,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구조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저술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여전히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된다\"는 화해와 일치의 이상적 세계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는 후대인에게 유익한 시사를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계와 인간사회의 화해와 일치라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과정 중에서 야기되는 산업오염과 생태계 균형의 파괴같은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사회발전에 엄중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퇴계의 天人관계와 같은 완전한 구조의 이론적 사유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함께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124-
둘째, 仁을 이상적 인격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또 天人간의 화해일치라는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삼는 데 있어서도 이는 일정한 현실적 및 심오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仁이란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推己及人)에서 구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立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立하게 하고, 자기가 達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達하게 한다\"는 데서 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타인에게 미치는 바가 없고, 심지어 인간이 의존하여 살고 번영하려는 생태계의 균형과 평화스런 환경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不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농락하고 부국이 貧國을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무고한 생령들을 살해하는 데 끊임이 없다.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수많은 민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고 피흘리는 전쟁을 조장하고 도발한다. 만일 퇴계선생이 주장하는 仁을 본받을 수 있다면 개인관계나 국제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여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문명의 발전과 평화로운 환경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창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퇴계선생이 주장한 仁은 이미 그가 생존하던 시대적 의의를 훨씬 넘어서 있다.
-125-
퇴계선생의 天人學이라는 이상적 세계와 그의 영향력은 일찍이 1920년 근대의 진보적 사상가로 알려진 梁啓超선생에 의하여 보여졌다. 그리고 분명히 梁啓超선생은 <퇴계선생 성학십도贊詩>
) (譯者註) 이 贊詩는 1920년경 梁啓超가 중국 尙德女子大學에서 「성학십도」 를 간행하였을 때 그 「圖」末에 붙여진 贊詩의 全篇이다. 한편 이 贊詩의 한 글번역문은 李家源선생의 글을 이용하였다.
(「퇴계학보」 창간호, 1973, pp.6∼7)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높디 높으신 우리 李夫子님
예 잇고 뒤를 열어 古今을 꿰뚫으셨오,
열 폭 그림 속에 理學要訣 전하시어
百世에 길이 人心을 열으셨오,
글과 거문고는 朱子를 따르셨고
風月같은 그 襟懷는 濂溪에 비기었오,
높은 德聲 넓은 敎化 三百年에 미치시니
온누리 사람들 뉘아니 공경하리.
-126-
(이 남 영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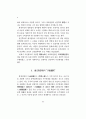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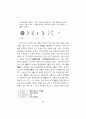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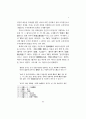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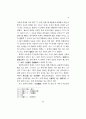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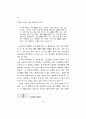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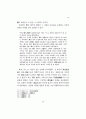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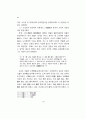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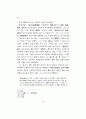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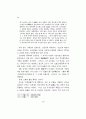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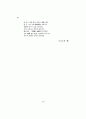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