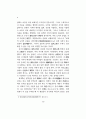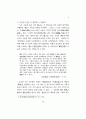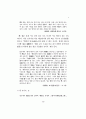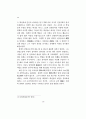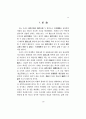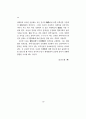목차
Ⅰ. 개 설
Ⅱ. 퇴계리기론중의 당연지리에
관한 문제
Ⅲ. 퇴계심성론중의 당연지리에
관한 문제
Ⅳ. 퇴계의 덕업과 실연지리
Ⅴ. 결 논
Ⅱ. 퇴계리기론중의 당연지리에
관한 문제
Ⅲ. 퇴계심성론중의 당연지리에
관한 문제
Ⅳ. 퇴계의 덕업과 실연지리
Ⅴ. 결 논
본문내용
허수아비에게 음식을 권하며 소근거리는 광경은, 퇴계의 불안과 차마 볼 수 없는 마음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그는 깨달았다. 「理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이에 그는 자발적으로 사돈을 설복하여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改嫁 여부에 있어서는 며느리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맡겼다.
-173-
牟宗三先生이 이 일을 얘기할 때 퇴계의 통달을 칭찬한 바 있었다. 퇴계의 이러한 통달은 자신으로 하여금 세속의 陋習을 타파하고 참된 도덕을 표현케 했다. 주의할 만한 것은 퇴계의 이러한 통달은 바로 그의, 사실의 진상에 대한 明察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사실의 진상과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퇴계의 政績 중에서도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퇴계가 48세時에 단양군수가 되었는데 부임 초기에 단양은 이미 삼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의 위협아래 허덕이고 있었으며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퇴계小傳의 작자는 우리에게 당시의 官家풍속이 원님은 동헌에 높이 앉아 있으면서 모든 일을 아전의 보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퇴계가 부임할 때까지 한 사람의 원님도 직접 마을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실정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재난을 잘 구휼하고 확실하게 민간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비록 자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몸소 마을마다 찾아 다녔다. 가는 곳마다 곧 백성들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었다. 퇴계의 이러한 행동은 가난에 찌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퇴계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저절로 넘쳐 흐르는 愛心으로서 官과 民의 마음을 유합시킴으로서 상하가 단결하여 同心合力하여 재난을 극복케 했던 것이다. 의심할 것 없이 퇴계가 관가풍속의 積習을 돌파하고, 眞道德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政積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그가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174-
퇴계가 단양군수직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훌륭한 성취가 있었다. 그는 단양고을에 수량이 풍부하나 장마철만 되기만 하면 하천이 범람하고, 가뭄이 들면 또 건조하여 재난이 된다는 데 주의하였다. 실사구시적이었던 퇴계는 이에 洑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내어 水利를 개선하였다. 보는 일종의 저수지이다. 그것은 장마철의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물 때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능은 오늘날의 댐과 같은 것이다. 지금도 단양천에 複道沼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이야말로 퇴계가 당시에 백성을 위해 만들었던 저수지인 것이다.
參見李退溪小傳·頁四二.
보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農田水利 방면의 지식에 속하며 土木工程의 과학기술과도 관련된다. 분명히 이것은 實然之理의 일에 속하지 當然之理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계가 보를 만든다는 데 생각이 미친 까닭은, 오히려 백성들의 곤궁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려는 그의 도덕의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보의 建造는 자연히 퇴계의 인간애로 하여금 구체적인 결과가 있게 하였던 것이다.
Ⅴ. 結 論
오늘 우리는 當然之理와 實然之理 두 방면으로 퇴계理學을 성찰하여 아래와 같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퇴계의 도덕·학문에 있어서의 걸출한 성취는, 일면으로는 그가 敬으로써 몸가짐을 하고 늘 도덕심의 虛 明覺을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當然之理의 감응과 실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면으로는 그가 실사구시, 격물치지적이었기 때문에 實然之理 방면에 있어 대로 明辨을 하여 자기의 지식을 확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當然之理의 자각 및 실천과 實然之理의 明察 및 認知는, 퇴계理學에 있어 어느 한쪽도 없앨 수 없는 것이란 말이다.
-175-
우리가 만약 퇴계학이 현대사회 및 문화건설에 대해 응당 있어야할 지도작용을 발휘하게 하여 한다면 當然之理 방면에 있어 지식의 탐구 및 토론이나 오직 개념적인 辨析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매 일개인의 생명 실제에 귀착하여, 존재적 層面에서 생명의 문제를 正視하고, 진실한 마음, 진실한 세계에 직면하여 정정당당히 일어서서 자신으로 하여금 천지 어느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의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해야한다. 도덕심의 자각은 當然之理의 當體呈現이며 모든 자율 도덕적 실천의 근원이다. 이것이 이른바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先立乎其大)」는 것이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存養省察·敬以自特 같은 공부에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며, 理氣의 문제, 四七의 論辨이 玄虛에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實然之理 방면에 있어 마땅히 힘써야 할 중점은 현대화적인 정치건설과 과학기술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퇴계가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했던 것과 성심으로 洑를 만들었던 정신을 다시 한 걸음 확장하는 것이다.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는 것은 일종의 객관정신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리를 분명히 알게하고 지식을 확충케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주관적인 편집과 독단까지도 없애 준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적 胸襟이며 또한 유학전통 가운데의 和而不同의 정신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자제력을 길러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더 높은 차원에로의 會通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권리와 의무의 분계선을 긍정하여 현대사회의 법치 기초를 다진다. 洑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과학기술이다. 그것은 체계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과학지식의 발전과 성취는 국가현대화에 있어 없어선 안될 이용·후생의 사업이다.
오늘날 우리는 實然之理가 퇴계理學의 일부임을 긍정한다. 이는 현대화의 정치건설, 과학기술건설이 인류생활 가운데서 더욱 근원적이며 우월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도덕실천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같다. 이 중요한 인식은 우리의 퇴계學에 대한 연구에 있어 융통할 바를 알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현대문화의 건설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176-
(김 언 종 譯)
-173-
牟宗三先生이 이 일을 얘기할 때 퇴계의 통달을 칭찬한 바 있었다. 퇴계의 이러한 통달은 자신으로 하여금 세속의 陋習을 타파하고 참된 도덕을 표현케 했다. 주의할 만한 것은 퇴계의 이러한 통달은 바로 그의, 사실의 진상에 대한 明察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사실의 진상과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퇴계의 政績 중에서도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퇴계가 48세時에 단양군수가 되었는데 부임 초기에 단양은 이미 삼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의 위협아래 허덕이고 있었으며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퇴계小傳의 작자는 우리에게 당시의 官家풍속이 원님은 동헌에 높이 앉아 있으면서 모든 일을 아전의 보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퇴계가 부임할 때까지 한 사람의 원님도 직접 마을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실정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재난을 잘 구휼하고 확실하게 민간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비록 자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몸소 마을마다 찾아 다녔다. 가는 곳마다 곧 백성들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었다. 퇴계의 이러한 행동은 가난에 찌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퇴계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저절로 넘쳐 흐르는 愛心으로서 官과 民의 마음을 유합시킴으로서 상하가 단결하여 同心合力하여 재난을 극복케 했던 것이다. 의심할 것 없이 퇴계가 관가풍속의 積習을 돌파하고, 眞道德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政積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그가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174-
퇴계가 단양군수직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훌륭한 성취가 있었다. 그는 단양고을에 수량이 풍부하나 장마철만 되기만 하면 하천이 범람하고, 가뭄이 들면 또 건조하여 재난이 된다는 데 주의하였다. 실사구시적이었던 퇴계는 이에 洑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내어 水利를 개선하였다. 보는 일종의 저수지이다. 그것은 장마철의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물 때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능은 오늘날의 댐과 같은 것이다. 지금도 단양천에 複道沼의 자취가 남아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이야말로 퇴계가 당시에 백성을 위해 만들었던 저수지인 것이다.
參見李退溪小傳·頁四二.
보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農田水利 방면의 지식에 속하며 土木工程의 과학기술과도 관련된다. 분명히 이것은 實然之理의 일에 속하지 當然之理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계가 보를 만든다는 데 생각이 미친 까닭은, 오히려 백성들의 곤궁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려는 그의 도덕의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보의 建造는 자연히 퇴계의 인간애로 하여금 구체적인 결과가 있게 하였던 것이다.
Ⅴ. 結 論
오늘 우리는 當然之理와 實然之理 두 방면으로 퇴계理學을 성찰하여 아래와 같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퇴계의 도덕·학문에 있어서의 걸출한 성취는, 일면으로는 그가 敬으로써 몸가짐을 하고 늘 도덕심의 虛 明覺을 가지고 있다가 때때로 當然之理의 감응과 실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면으로는 그가 실사구시, 격물치지적이었기 때문에 實然之理 방면에 있어 대로 明辨을 하여 자기의 지식을 확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當然之理의 자각 및 실천과 實然之理의 明察 및 認知는, 퇴계理學에 있어 어느 한쪽도 없앨 수 없는 것이란 말이다.
-175-
우리가 만약 퇴계학이 현대사회 및 문화건설에 대해 응당 있어야할 지도작용을 발휘하게 하여 한다면 當然之理 방면에 있어 지식의 탐구 및 토론이나 오직 개념적인 辨析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매 일개인의 생명 실제에 귀착하여, 존재적 層面에서 생명의 문제를 正視하고, 진실한 마음, 진실한 세계에 직면하여 정정당당히 일어서서 자신으로 하여금 천지 어느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의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해야한다. 도덕심의 자각은 當然之理의 當體呈現이며 모든 자율 도덕적 실천의 근원이다. 이것이 이른바 「먼저 그 큰 것을 세운다(先立乎其大)」는 것이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存養省察·敬以自特 같은 공부에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며, 理氣의 문제, 四七의 論辨이 玄虛에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實然之理 방면에 있어 마땅히 힘써야 할 중점은 현대화적인 정치건설과 과학기술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퇴계가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했던 것과 성심으로 洑를 만들었던 정신을 다시 한 걸음 확장하는 것이다. 사실의 진상을 중시하는 것은 일종의 객관정신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리를 분명히 알게하고 지식을 확충케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주관적인 편집과 독단까지도 없애 준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적 胸襟이며 또한 유학전통 가운데의 和而不同의 정신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자제력을 길러주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더 높은 차원에로의 會通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권리와 의무의 분계선을 긍정하여 현대사회의 법치 기초를 다진다. 洑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과학기술이다. 그것은 체계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과학지식의 발전과 성취는 국가현대화에 있어 없어선 안될 이용·후생의 사업이다.
오늘날 우리는 實然之理가 퇴계理學의 일부임을 긍정한다. 이는 현대화의 정치건설, 과학기술건설이 인류생활 가운데서 더욱 근원적이며 우월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도덕실천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같다. 이 중요한 인식은 우리의 퇴계學에 대한 연구에 있어 융통할 바를 알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현대문화의 건설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176-
(김 언 종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