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몇 가지 전제
2.화제 선택의 조건
3.진술 방식의 고려사항
4.문체의 효과
5.미적 자질의 성향
6.판소리다움을 위하여
2.화제 선택의 조건
3.진술 방식의 고려사항
4.문체의 효과
5.미적 자질의 성향
6.판소리다움을 위하여
본문내용
주는 인상은 역시 생활이나 인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웃음의 세계를 웃음으로 일관하는 별개의 세계로 설정한 데 기인하지 않는가 싶다. 판소리의 웃음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에서 서구적 발상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세계관의 비교적 우열론과는 별개로 판소리의 전통이나 양식적 특성을 그렇지 않았다는 데 기반을 둘 때 사설이 판소리다와지지 않을까 한다.
판소리다움을 위하여
판소리 사설의 창작을 판소리가 지닌 자질을 기반으로 살펴 보았다. 판소리의 자질로서 중시한 것은 이야기적 성격과 미적 구조물로서의 성격이었다.
이러한 자질을 기반으로 하면서 판소리의 창작은 판소리의 문법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판소리의 문법은 다른 공연 문화 양식과 판소리를 구분해 주는 종차(種差)로서의 자질이라고 보는 태도의 표명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전적.논리적으로 정의하려 할 때 그 종차를 드러냄으로써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러한 정의 방식이 대상의 설명에 적절한 형식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판소리가 지닌 판소리만의 문법이 지닌 가치를 옹호해 줄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정당화를 통해 입론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필연적으로 판소리의 문화적 속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판소리의 문법은 이론적 가상이 아니라 사실적 실체 안에 내재한 것이다. 그것이 그러함으로써 판소리는 판소리답게 인식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판소리의 창작자이자 연창자이며 또 판소리의 청중들이다. 판소리가 대중 공연물인 이상 판소리는 대중문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새삼 확인된다.
<춘향가>를 대중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무방하게 생각하면서도 <춘향전>의 대중문화적 성격은 한사코 외면하는 태도가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거듭 말하거니와 <춘향전>은 순수하게 증류된 정전주의적(正典主義的) 문학성
\'정전주의(正典主義)\'라는 말은 정전에 대하여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급문화.소수문화 중시의 태도를 가리킨다. Antony Easthope는 그의 저서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4)에서 이러한 태도가 더 이상 문학 연구의 외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으로만 논의될 대상은 아니다. 이 점은 나머지 판소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판소리가 지닌 대중문화적 성격은 그 사설의 창작이 대중문화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할 것인가는 천재들인 예술가의 몫이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시사를 얻을 수 있다면, 채만식의 소설이 거둔 성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태평천하(太平天下)>에 대하여 문학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찬사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판소리의 전통적 문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하면 소설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판소리의 대중문화적 성공 가능성은 이를 통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판소리 사설 창작의 방법을 고구(考究)한 이 글이 맡은 임무가 판소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일 수는 없다. 그러나 <춘향가>를 배경 맥락으로 지니면서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그만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듯이, 맥락을 가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도막소리까지도 문화 목록으로 등재되는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이 가능하다. 그것이 역사적 체험이거나, 당대적 삶의 반영인 허구이거나 향수자(享受者)의 문화적 배경에만 부합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판소리가 지닌 문법에 어느 만큼 뿌리 깊은 나무로 서느냐일 따름이다.
그러한 세계관의 비교적 우열론과는 별개로 판소리의 전통이나 양식적 특성을 그렇지 않았다는 데 기반을 둘 때 사설이 판소리다와지지 않을까 한다.
판소리다움을 위하여
판소리 사설의 창작을 판소리가 지닌 자질을 기반으로 살펴 보았다. 판소리의 자질로서 중시한 것은 이야기적 성격과 미적 구조물로서의 성격이었다.
이러한 자질을 기반으로 하면서 판소리의 창작은 판소리의 문법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판소리의 문법은 다른 공연 문화 양식과 판소리를 구분해 주는 종차(種差)로서의 자질이라고 보는 태도의 표명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전적.논리적으로 정의하려 할 때 그 종차를 드러냄으로써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러한 정의 방식이 대상의 설명에 적절한 형식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판소리가 지닌 판소리만의 문법이 지닌 가치를 옹호해 줄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정당화를 통해 입론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필연적으로 판소리의 문화적 속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판소리의 문법은 이론적 가상이 아니라 사실적 실체 안에 내재한 것이다. 그것이 그러함으로써 판소리는 판소리답게 인식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판소리의 창작자이자 연창자이며 또 판소리의 청중들이다. 판소리가 대중 공연물인 이상 판소리는 대중문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새삼 확인된다.
<춘향가>를 대중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무방하게 생각하면서도 <춘향전>의 대중문화적 성격은 한사코 외면하는 태도가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거듭 말하거니와 <춘향전>은 순수하게 증류된 정전주의적(正典主義的) 문학성
\'정전주의(正典主義)\'라는 말은 정전에 대하여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급문화.소수문화 중시의 태도를 가리킨다. Antony Easthope는 그의 저서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4)에서 이러한 태도가 더 이상 문학 연구의 외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으로만 논의될 대상은 아니다. 이 점은 나머지 판소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판소리가 지닌 대중문화적 성격은 그 사설의 창작이 대중문화적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할 것인가는 천재들인 예술가의 몫이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시사를 얻을 수 있다면, 채만식의 소설이 거둔 성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태평천하(太平天下)>에 대하여 문학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찬사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판소리의 전통적 문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하면 소설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판소리의 대중문화적 성공 가능성은 이를 통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판소리 사설 창작의 방법을 고구(考究)한 이 글이 맡은 임무가 판소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일 수는 없다. 그러나 <춘향가>를 배경 맥락으로 지니면서 임방울의 \'쑥대머리\'가 그만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듯이, 맥락을 가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도막소리까지도 문화 목록으로 등재되는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이 가능하다. 그것이 역사적 체험이거나, 당대적 삶의 반영인 허구이거나 향수자(享受者)의 문화적 배경에만 부합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판소리가 지닌 문법에 어느 만큼 뿌리 깊은 나무로 서느냐일 따름이다.
추천자료
 조선후기의 문학양상
조선후기의 문학양상 실학과 조선후기 문학의 전개 양상
실학과 조선후기 문학의 전개 양상 한국 고전의 흐름과 분석
한국 고전의 흐름과 분석 전통음악의 이해(악기별, 전퉁음악의 갈래)
전통음악의 이해(악기별, 전퉁음악의 갈래) 전북지역주요 문화재 답사를 다녀와서
전북지역주요 문화재 답사를 다녀와서 [구비문학론]민요의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론]민요의 현재적 의미 [채만식][풍자소설]채만식과 풍자소설(채만식의 소설관과 풍자소설, 채만식의 시대비판과 풍...
[채만식][풍자소설]채만식과 풍자소설(채만식의 소설관과 풍자소설, 채만식의 시대비판과 풍... 우리 민속과 숲과 소나무
우리 민속과 숲과 소나무 <시와 여성주의>
<시와 여성주의> 개화기의 우국문학
개화기의 우국문학 변강쇠가 연구
변강쇠가 연구 채만식 <태평천하>를 읽고 인물의 이야기 요약 및 ‘가족 문제’에 초점을 둔 등장인물간의 갈...
채만식 <태평천하>를 읽고 인물의 이야기 요약 및 ‘가족 문제’에 초점을 둔 등장인물간의 갈... [정통문화와 상징] 장승에 대한 이해 - 장승의 개념, 장승의 기원 및 어원, 장승의 기능, 장...
[정통문화와 상징] 장승에 대한 이해 - 장승의 개념, 장승의 기원 및 어원, 장승의 기능,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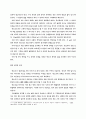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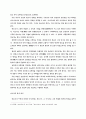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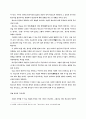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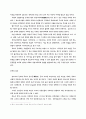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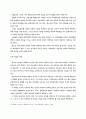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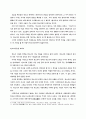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