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 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所以도 아니요, 鄕黨朋友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所以도 아니요, 그 소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물론 측은지심도 발동할 때는 七情과 마찬가지로 外感內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乘氣處에서 본다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所從來는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外感에 있지 않고 또 \'內校·要譽·惡其聲\'이라는 감성적인 감정에도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本來性인 \'仁의 理\'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外感이 機綠이 되어 仁의 理가 스스로 측은지심을 발동시킨다. 그러므로 측은지심은 그러한 감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本然之性(仁의 理)에 기인하는 특수한 감정이요, 이른바 \'道德的 感情\'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理性이 \'自己 感應的 感情\'(selbstgewirktes Gefuhl>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四端은 內感外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퇴계는 그러한 관계를 純理發處와 乘氣處라는 개념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純理發處란 이성의 自己感應을 말하고 乘氣處란 감정작용의 機綠을 뜻한다.
-340-
그러면 측은지심이 \'仁의 端\'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仁은 本然之性의 所當然之則이요 도덕적 의지의 객관적인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 원리를 주관에 매개하여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동기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의지규정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곧 측은지심이라는 도덕적 감정이다. 그러므로 仁의 端이란 所當然之則을 주관화하여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동기라 하겠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義의 端\'인 \'羞惡之心\'이나 \'禮의 端\'인 \'辭讓之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명될 수 있다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음에 四端理發과 七情氣發의 이원대립이 없으면, 도덕의 자율성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四端理發의 정당성을 선험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所當然之則은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 즉 현상계에 있어서 자유의 인과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 문제는 이론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본성의 근원적인 사실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四端의 매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요 자연의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義理之行의 도덕적 요구 즉 所當然之則이 있는 이상, 우리는 자유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그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처럼 所當然之則에 따르는 의지와 자유로운 의지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現象界의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다. 이것에 대하여 所當然之則 즉 자기 자신의 법칙에 스스로 따른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다. 이것이 곧 자율이다. 자율이란 本然之性의 자기입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本然之性의 自發性 즉 理發에 기인하는 四端의 매개에 의하여 규정될 때 비로소 행위의 도덕성은 실현된다. 반대로 氣發 즉 氣質之性에 기인하는 七情이 所當然之則의 성립조건으로서 의지를 규정할 때 그것은 타율이다. 그러므로 本然之性의 자율은 도덕적 행위의 최고원리이요 타율적인 氣質之性은 행위의 도덕성을 파괴한다.
-341-
이상과 같은 所論에 대하여 아마 이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七情도 理氣를 겸하고 有善有惡이니 비록 그것이 氣의 發이라 하더라도, 제자리에 맞는 것은 理의 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氣의 發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위의 도덕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七情의 中節이 善이라고 하는 주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七情과 人欲은 羅正庵이 말하는 것처럼 氣의 운동의 결과로서 필연적이며 不可已·不可易인 것이라면, 그것이 스스로 所當然之則에 적합하기도 하고 적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發하여 절도에 맞는다고 할 경우에 中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땅히 理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性은 氣質에 떨어질 땐 \'偏私가 이김이 없지 않고\', 七情은 비록 理氣를 겸한다 할지라도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기 때문에 \'他를 管攝할 수 없으며\' 惡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다. 이 말은 理가 氣를 제어할 수 없으며 本然之性이 形氣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中節이라는 것은 本然之性이 그러한 타율에서 벗어나 氣質之性을 主宰한다는 것이니, 비록 七情이 理氣를 겸한다 할지라도 主宰하는 본성은 氣質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七情이 理氣를 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四端理發과 七情氣發의 이원성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42-
Ⅳ.
이상으로써 理와 氣,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四端과 七情의 이원대립이 도덕성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하는 까닭은 대략 해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이원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 속에 天理와 人欲, 善과 惡의 대립투쟁이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 노력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심령의 평화와 안식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惡이 善을 능가하고 義人이 惡人 못지 않게 禍를 입는다는 가공할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윤리적 이원론은 마침내 도덕적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곧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惡에로의 경향을 간파하고 이것과 투쟁하는 도덕적 생활에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所當然之則은 엄숙하고 그 완전한 실현은 요원한 목표이지만, 그러나 퇴계는 마침내 도덕적 생활의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340-
그러면 측은지심이 \'仁의 端\'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仁은 本然之性의 所當然之則이요 도덕적 의지의 객관적인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 원리를 주관에 매개하여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동기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의지규정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곧 측은지심이라는 도덕적 감정이다. 그러므로 仁의 端이란 所當然之則을 주관화하여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동기라 하겠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義의 端\'인 \'羞惡之心\'이나 \'禮의 端\'인 \'辭讓之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명될 수 있다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음에 四端理發과 七情氣發의 이원대립이 없으면, 도덕의 자율성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四端理發의 정당성을 선험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所當然之則은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 즉 현상계에 있어서 자유의 인과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 문제는 이론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본성의 근원적인 사실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四端의 매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요 자연의 인과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義理之行의 도덕적 요구 즉 所當然之則이 있는 이상, 우리는 자유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른바 \'그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처럼 所當然之則에 따르는 의지와 자유로운 의지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現象界의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다. 이것에 대하여 所當然之則 즉 자기 자신의 법칙에 스스로 따른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다. 이것이 곧 자율이다. 자율이란 本然之性의 자기입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本然之性의 自發性 즉 理發에 기인하는 四端의 매개에 의하여 규정될 때 비로소 행위의 도덕성은 실현된다. 반대로 氣發 즉 氣質之性에 기인하는 七情이 所當然之則의 성립조건으로서 의지를 규정할 때 그것은 타율이다. 그러므로 本然之性의 자율은 도덕적 행위의 최고원리이요 타율적인 氣質之性은 행위의 도덕성을 파괴한다.
-341-
이상과 같은 所論에 대하여 아마 이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七情도 理氣를 겸하고 有善有惡이니 비록 그것이 氣의 發이라 하더라도, 제자리에 맞는 것은 理의 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氣의 發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위의 도덕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七情의 中節이 善이라고 하는 주장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七情과 人欲은 羅正庵이 말하는 것처럼 氣의 운동의 결과로서 필연적이며 不可已·不可易인 것이라면, 그것이 스스로 所當然之則에 적합하기도 하고 적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發하여 절도에 맞는다고 할 경우에 中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땅히 理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性은 氣質에 떨어질 땐 \'偏私가 이김이 없지 않고\', 七情은 비록 理氣를 겸한다 할지라도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기 때문에 \'他를 管攝할 수 없으며\' 惡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다. 이 말은 理가 氣를 제어할 수 없으며 本然之性이 形氣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中節이라는 것은 本然之性이 그러한 타율에서 벗어나 氣質之性을 主宰한다는 것이니, 비록 七情이 理氣를 겸한다 할지라도 主宰하는 본성은 氣質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七情이 理氣를 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四端理發과 七情氣發의 이원성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42-
Ⅳ.
이상으로써 理와 氣,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四端과 七情의 이원대립이 도덕성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하는 까닭은 대략 해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이원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 속에 天理와 人欲, 善과 惡의 대립투쟁이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면, 우리의 도덕적 노력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심령의 평화와 안식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惡이 善을 능가하고 義人이 惡人 못지 않게 禍를 입는다는 가공할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윤리적 이원론은 마침내 도덕적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곧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惡에로의 경향을 간파하고 이것과 투쟁하는 도덕적 생활에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所當然之則은 엄숙하고 그 완전한 실현은 요원한 목표이지만, 그러나 퇴계는 마침내 도덕적 생활의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추천자료
 철학적 고찰중 소유와 존재의 차이
철학적 고찰중 소유와 존재의 차이 은자 철학자 양주
은자 철학자 양주 법철학적으로 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법철학적으로 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철학] 죽음과 슬픔 탄생과 죽음의 순환관계
[철학] 죽음과 슬픔 탄생과 죽음의 순환관계 퇴계 철학의 특징
퇴계 철학의 특징 [계몽주의철학]시대에 따른 유토피아 문학작품의 특성과 변화
[계몽주의철학]시대에 따른 유토피아 문학작품의 특성과 변화 [교육철학]격몽요결과 교육, 율곡의 격몽요결, 율곡 교육
[교육철학]격몽요결과 교육, 율곡의 격몽요결, 율곡 교육 중국 철학의 인성론
중국 철학의 인성론 (특수교육철학)유교, 불교, 기독교에 나타난 장애 및 장애인관
(특수교육철학)유교, 불교, 기독교에 나타난 장애 및 장애인관 [고전철학]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
[고전철학]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종교적 윤리, 박애정신, 상호부조, 시민참여 정신, 자발적 참여주의
자원봉사활동의 철학-종교적 윤리, 박애정신, 상호부조, 시민참여 정신, 자발적 참여주의 흄의 철학 (인물론,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 도덕감, 사회적 유용성, 공리주의)
흄의 철학 (인물론,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 도덕감, 사회적 유용성, 공리주의) 철학과 윤리
철학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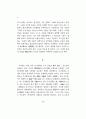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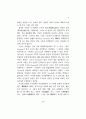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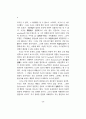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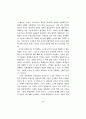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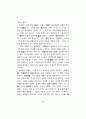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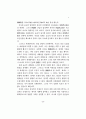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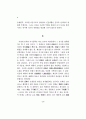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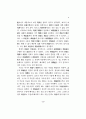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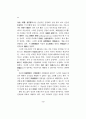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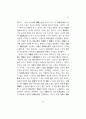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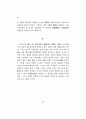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