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주자의 설
Ⅲ. 고봉의 설
Ⅳ. 퇴계의 설
Ⅴ. 율곡의 설
Ⅵ. 결 논
Ⅱ. 주자의 설
Ⅲ. 고봉의 설
Ⅳ. 퇴계의 설
Ⅴ. 율곡의 설
Ⅵ. 결 논
본문내용
판해 왔다. 이는 庚午(1570)11월 15일의 일이었다. 고봉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物理가 그 極處에 도달하는 것이 物格이고 그것은 雕像이 그 極處에 이르(詣)는 것과 동일하며, 거기에는 雕像의 자립존재와도 닮은 物理의 자립존재가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봉은, 物理의 極處가 그대로 나의 心知에 來到한다고 설명하는 퇴계의 物格釋을 理의 자립존재의 상실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퇴계는 당초에 고봉의 의견에 촉발되어 자기의 物格說을 수정했던 것이나 그와 더불어 고봉과는 상이한 퇴계 독자의 인식론을 전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栗谷의 說
퇴계 작고 후 5년, 고봉 작고 후 3년, 율곡은 40세 (1575)일 때 聖學輯要를 編纂하였는 바, 그는 그 統說 제1에서 大學章句의 3綱領 8條目 부분을 인용하고 朱子의 註 아래에 割註하여
-76-
格字에는 「窮」과 「至」의 두 의미가 있다. 格物의 格에는 窮의 意義가 많으나 物格의 格은 다만 至字의 의의가 있을 뿐이다.
) 『栗谷全書』, 1971,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Ⅰ, p.425, 「格字有窮至兩意. 格物之格, 窮字意多, 物格之格, 只有至字之意.」
고 하였다. 이 「窮」과 「至」의 二義를 「格」자가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퇴계가 이미 鄭子中에게 보낸 서한
) 『陶山全書』Ⅱ, p.366, 『退溪全書』Ⅱ, p.37.
에서 말하고 있으나 율곡의 이 해석은 格物이 事物의 理에 窮至하는 것이고 物格은 物理의 極處에 이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朱子의 註인
物理의 極處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 『栗谷全書』Ⅰ, p.425, 「物理之極處無不到也. 此句與不句對說, 故文藝如此, 其意則物理無不到極處云爾.」
고 한 구 아래에 割註하여,
此句는 下句인 「吾心의 아(知)는 바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한 것과 대구로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文勢는 이와 같다. 그 의의는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일 따름이다.
) 上 同
고 한 것은 율곡의 物格解가 朱註를 바탕으로 「物理가 그 자체의 極處에 도착한다」는 것을 言明한 것이다. 이리하여 율곡은 다시 朱子의 註인
吾心의 아는 바가 충분하지 않은 일은 없다.
) Ibid. 「吾心之所知無不盡也.……物格知至只是一事. 以物理言之, 則謂之知物格, 謂事物之理, 各詣其極也. 以吾心言之, 則謂之知至, 謂吾心隨所詣而無不盡也.」
고 한 句 아래에 割註하여,
-77-
「物格과 知至는 한가지 일에 불과하다. 物理를 기준으로하여 말할 경우에는 物이 이른(格)다」 하는 것이고 사물의 理가 각각 그 極處에 이르는(詣)것을 의미하고 있다. 吾心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경우에는, 「知가 이른(至)다」하는 것으로서 吾心이 이르는(詣) 곳 그대로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上 同
고 하였다. 율곡의 物格說이 朱子의 『大學或問』의 說을 딛고 또 고봉에게 찬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다시 율곡의 語錄을 훑어보면,
格物이라는 것은 사람이 物理를 窮察하여 이것을 막다른 곳으로 이르게(至)하는 일이고,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가 이미 막다른 곳에 이르러 다시 더 窮至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이름이다.
) 『栗谷全書』Ⅱ, p.267, 「格物云者, 人窮物之理, 而使之至於盡處也. 物格云者, 物之理, 己至於盡處, 更無可窮之餘地也……至有物理來至吾心之說, 殊不可曉.」
고 하였는데, 이것은 율곡의 格物, 物格의 解의 결론이다. 따라서 율곡에게는 物理가 도래한다는 說은 없으며, 前文에 이어
物理가 吾心에 來到한다는 說은 특히 이해하기 힘들다
) 上 同
고 한 것은 퇴계의 物理來到說에 대한 율곡의 반론인 것이다.
Ⅵ. 結 論
이상 物格說에 대하여 퇴계와 高峰의 異同을 살피고 또 後出인 율곡의 說에 접근해 보았다. 퇴계는 당초 格物·物格의 解에 대해서도 우리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物格에 대하여 고봉의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설에 영향을 받아 타계하기 2개월반 전에 종래의 自說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새로운 物格說은 고봉의 설과도 다르고, 그것은 「物의 理가 나의 心知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格物을 인식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에로의 上向途程이라고 한다면 물격은 인식대상으로부터 인식주체로의 下向途程이다. 그리고 또 格物·物格은 自力에서 他力에의 자각의 전환점이고, 여기서 心知와 物理의 대립은 통일되며, 融釋脫落·豁然貫通의 경위가 출현하게 된다. 퇴계의 物格解는 朱子·高峯·栗谷의 說에서 진일보하여 그의 독자적 입장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物理來到의 物格說은 그 뒤 丁愚潭(1625∼1706)에게 계승되어
-78-
大體 「格物」이라는 것은 吾心의 知로서 彼物의 理를 格하는 것으로서 物과 나(我) 사이에는 역시 간격이 있다. 「物·格」 뒤에는 物理의 極處가 昭昭然하게 나의 흉중에 도래하여 物과 나는 하나가 된다. 따라서 物格과 知至는 동시의 일에 불과하며, 物은 心에 格하고(이르고) 知는 物에 이른다.(至)
) 裵宗鎬編, 『한국유학자료집(상)』, 「患潭集」, 1980, 서울 연세대학교, p.640, 「夫格物云者, 以吾心之知, 格彼物之理, 物我猶有間, 而物格之後, 則物理之極處, 昭昭然盡到我胸中物.」
고 說하게 하였으며, 또 일본에 있어서 楠本碩水(1832∼1916)가
「至」라는 자는 工夫習練에 속하고, 「到」라는 자는 功能效驗에 속한다. 理가 도래하는 것은 功夫習練의 이르름(至)이다. 때문에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의 極處가 도래하지 않음이 없는 것, 知至라는 것은 吾心의 아는 바가 막다른 데까지 到盡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생각컨대, 「至」라는 것은 我가 彼에게로 가는 것이고 「到」라는 것은 彼가 我에게로 오는 것이다.
) 罔田武彦·荒木見悟編, 『楠本端山·硬水全集』 「硬水先生遺書」 1980, 福罔市, 葦書房ㅡ p.249, 「至字屬工夫, 到字屬功效. 理之到則工夫之至也. 故曰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蓋至者, 我往于彼也. 到者, 彼來于我也.」
고 한 것은 분명히 퇴계의 설을 이은 것이다.
-79-
Ⅴ. 栗谷의 說
퇴계 작고 후 5년, 고봉 작고 후 3년, 율곡은 40세 (1575)일 때 聖學輯要를 編纂하였는 바, 그는 그 統說 제1에서 大學章句의 3綱領 8條目 부분을 인용하고 朱子의 註 아래에 割註하여
-76-
格字에는 「窮」과 「至」의 두 의미가 있다. 格物의 格에는 窮의 意義가 많으나 物格의 格은 다만 至字의 의의가 있을 뿐이다.
) 『栗谷全書』, 1971,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Ⅰ, p.425, 「格字有窮至兩意. 格物之格, 窮字意多, 物格之格, 只有至字之意.」
고 하였다. 이 「窮」과 「至」의 二義를 「格」자가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퇴계가 이미 鄭子中에게 보낸 서한
) 『陶山全書』Ⅱ, p.366, 『退溪全書』Ⅱ, p.37.
에서 말하고 있으나 율곡의 이 해석은 格物이 事物의 理에 窮至하는 것이고 物格은 物理의 極處에 이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朱子의 註인
物理의 極處가 도달하지 않음이 없다.
) 『栗谷全書』Ⅰ, p.425, 「物理之極處無不到也. 此句與不句對說, 故文藝如此, 其意則物理無不到極處云爾.」
고 한 구 아래에 割註하여,
此句는 下句인 「吾心의 아(知)는 바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한 것과 대구로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文勢는 이와 같다. 그 의의는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을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일 따름이다.
) 上 同
고 한 것은 율곡의 物格解가 朱註를 바탕으로 「物理가 그 자체의 極處에 도착한다」는 것을 言明한 것이다. 이리하여 율곡은 다시 朱子의 註인
吾心의 아는 바가 충분하지 않은 일은 없다.
) Ibid. 「吾心之所知無不盡也.……物格知至只是一事. 以物理言之, 則謂之知物格, 謂事物之理, 各詣其極也. 以吾心言之, 則謂之知至, 謂吾心隨所詣而無不盡也.」
고 한 句 아래에 割註하여,
-77-
「物格과 知至는 한가지 일에 불과하다. 物理를 기준으로하여 말할 경우에는 物이 이른(格)다」 하는 것이고 사물의 理가 각각 그 極處에 이르는(詣)것을 의미하고 있다. 吾心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경우에는, 「知가 이른(至)다」하는 것으로서 吾心이 이르는(詣) 곳 그대로 충분하게 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上 同
고 하였다. 율곡의 物格說이 朱子의 『大學或問』의 說을 딛고 또 고봉에게 찬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다시 율곡의 語錄을 훑어보면,
格物이라는 것은 사람이 物理를 窮察하여 이것을 막다른 곳으로 이르게(至)하는 일이고,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가 이미 막다른 곳에 이르러 다시 더 窮至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이름이다.
) 『栗谷全書』Ⅱ, p.267, 「格物云者, 人窮物之理, 而使之至於盡處也. 物格云者, 物之理, 己至於盡處, 更無可窮之餘地也……至有物理來至吾心之說, 殊不可曉.」
고 하였는데, 이것은 율곡의 格物, 物格의 解의 결론이다. 따라서 율곡에게는 物理가 도래한다는 說은 없으며, 前文에 이어
物理가 吾心에 來到한다는 說은 특히 이해하기 힘들다
) 上 同
고 한 것은 퇴계의 物理來到說에 대한 율곡의 반론인 것이다.
Ⅵ. 結 論
이상 物格說에 대하여 퇴계와 高峰의 異同을 살피고 또 後出인 율곡의 說에 접근해 보았다. 퇴계는 당초 格物·物格의 解에 대해서도 우리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物格에 대하여 고봉의 「物理가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설에 영향을 받아 타계하기 2개월반 전에 종래의 自說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새로운 物格說은 고봉의 설과도 다르고, 그것은 「物의 理가 나의 心知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格物을 인식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에로의 上向途程이라고 한다면 물격은 인식대상으로부터 인식주체로의 下向途程이다. 그리고 또 格物·物格은 自力에서 他力에의 자각의 전환점이고, 여기서 心知와 物理의 대립은 통일되며, 融釋脫落·豁然貫通의 경위가 출현하게 된다. 퇴계의 物格解는 朱子·高峯·栗谷의 說에서 진일보하여 그의 독자적 입장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物理來到의 物格說은 그 뒤 丁愚潭(1625∼1706)에게 계승되어
-78-
大體 「格物」이라는 것은 吾心의 知로서 彼物의 理를 格하는 것으로서 物과 나(我) 사이에는 역시 간격이 있다. 「物·格」 뒤에는 物理의 極處가 昭昭然하게 나의 흉중에 도래하여 物과 나는 하나가 된다. 따라서 物格과 知至는 동시의 일에 불과하며, 物은 心에 格하고(이르고) 知는 物에 이른다.(至)
) 裵宗鎬編, 『한국유학자료집(상)』, 「患潭集」, 1980, 서울 연세대학교, p.640, 「夫格物云者, 以吾心之知, 格彼物之理, 物我猶有間, 而物格之後, 則物理之極處, 昭昭然盡到我胸中物.」
고 說하게 하였으며, 또 일본에 있어서 楠本碩水(1832∼1916)가
「至」라는 자는 工夫習練에 속하고, 「到」라는 자는 功能效驗에 속한다. 理가 도래하는 것은 功夫習練의 이르름(至)이다. 때문에 「物格이라는 것은 物理의 極處가 도래하지 않음이 없는 것, 知至라는 것은 吾心의 아는 바가 막다른 데까지 到盡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생각컨대, 「至」라는 것은 我가 彼에게로 가는 것이고 「到」라는 것은 彼가 我에게로 오는 것이다.
) 罔田武彦·荒木見悟編, 『楠本端山·硬水全集』 「硬水先生遺書」 1980, 福罔市, 葦書房ㅡ p.249, 「至字屬工夫, 到字屬功效. 理之到則工夫之至也. 故曰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蓋至者, 我往于彼也. 到者, 彼來于我也.」
고 한 것은 분명히 퇴계의 설을 이은 것이다.
-79-
추천자료
 하곡정제두의 생리설에 대한 이해
하곡정제두의 생리설에 대한 이해 [영어영문학과]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영어영문학과]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slow...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slow...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교육적 시사점 2. 매슬로우(Ma...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교육심리학 공통]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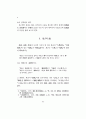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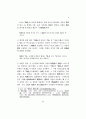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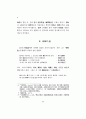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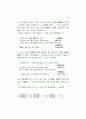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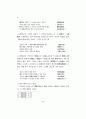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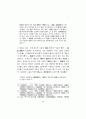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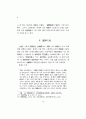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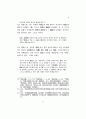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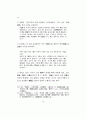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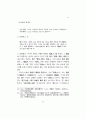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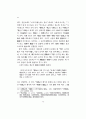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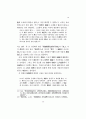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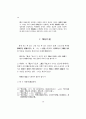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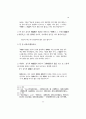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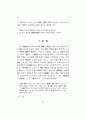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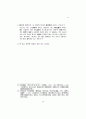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