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1세기 중국
2.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
3. 시장경제 하의 문화계 스케치
4. 지식인과 인문정신의 위기
5.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지적 실험 : <신자유주의>와 <新左派>
6. 21세기 동아시아와 중국의 길
2.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
3. 시장경제 하의 문화계 스케치
4. 지식인과 인문정신의 위기
5.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지적 실험 : <신자유주의>와 <新左派>
6. 21세기 동아시아와 중국의 길
본문내용
화(또는 현대화)에서 사상적 입지를 확보했다면 90년대 지식인들은 80년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사상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국학파\'나 \'포스트주의자\'들과는 달리 \'신좌파\'의 비판은 좀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현실이 이미 자본화된 사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왕후이는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정치 민주화와 당과 정부의 부패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중국의 자본화 이후 국가의 독재 행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정치 부패의 원인 중 하나가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90년대 자유주의가 80년대 계몽주의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볼때, \'신좌파\'가 자유주의의 \'시장 만능론\'과 \'경제의 발전이 민주를 가져다줄 것이다\'라는 자유주의자들의 경제지상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다. 이에 대해 한위하이(韓毓海)는 \"중국 자유주의자들이 자본 주도의 시장 경제를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란 왕왕 노예가 될 자유를 의미할 따름인데도 그것을 평등의 공간으로 상정한다\"라고 지적한다. 汪暉는 자유주의자들의 <선 경제발전 후 민주> 주장이나 <경제발전이 민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민주화의 동력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개방이 중국 사회 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甘陽은 90년대 중국 사상계는 극단적 보수주의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와 평등을 부정하고, 자유를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의 특권>으로 인식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자유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 강자들의 자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일 뿐이며, 약자의 권리와 가난한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90년 초반 다종다양하던 중국의 지식계는 90년대 중후반 들어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유주의가 대세이지만, \'신좌파\'의 새로운 마르크스 조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폭로작업이 차츰 확대되고 있고, 그 흐름을 타는 지식인의 대오 역시 미미하지만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신좌파의 모택동 사상과 모택동 시대 사회주의 재평가\'는 <근대성과 모택동 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究明>과 <모택동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90년대 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서구 자본주의 근대를 넘어선 또 다른 근대를 중국 변혁의 길로 상정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모택동 사상은 근대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성, 따라서 모택동 사회주의와 등소평 사회주의의 구분은 1980년대 인식처럼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근대성 방안, 혹은 근대성의 다른 측면의 전개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汪暉는 모택동의 사상을 <반자본주의 근대화의 근대성 이론>으로 규정한다. 모택동 사회주의는 크게 보면 근대를 지향하는 근대 이데올로기이지만,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왕후이는 모택동 사상을 자본주의 근대성을 초월하여 새로운 근대성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6. 21세기 동아시아와 중국의 길
21세기, 바야흐로 중국은 세계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 문화시장 역시 중국을 향해 진입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의 물결은 중국으로 하여금 21세기 전지구 문화와 전통의 중심이자,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기의 자연과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길을 터 두고 있다. 이에 부응해 중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체로 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서쪽에서 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해양 경제권의 중심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전 지구의 최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지역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雲南省을 거점으로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묶는 大西南經濟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四川省을 거점으로 靑海省과 新疆省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大西北經濟圈 개발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 중국이 覇權主義로 나아갈 것인지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를 깨고 진정한 세계평화의 對抗軸 역할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동아시아 지식인의 지적소통과 민중적 連帶를 동시에 이룩해낼 수만 있다면 진정한 동아시아 連帶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中華>라는 단어가 서구에 대한 상대적 개념에 동아시아 中心이라는 자의식이 더해져 만들어진 의미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와 진정한 橫向意識을 띠면서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제언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화주의는 물론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다투어 참여해왔던 <아시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省察的 검토를 통해 세계체제를 突破해 나갈 진정한 동아시아 連帶 구축의 가능성을 考究해 볼일이다. 이를 위해 근대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속에 녹아 있었던 진정한 連帶 의식의 단초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으로부터 21세기적 連帶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당장 아시아인의 아시아인에 의한 지역 連帶 구축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共生的, 橫向的, 地域的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탄생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만, 기존의 국민국가와 민족적 틀을 유지하면서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검토해보는 가운데 진정한 동아시아적 展望이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內藏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서구의 他者로서의 지위를 벗어 던지고 아시아의 주체로서 지위를 여하히 專有해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자유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 강자들의 자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일 뿐이며, 약자의 권리와 가난한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90년 초반 다종다양하던 중국의 지식계는 90년대 중후반 들어 \'신좌파\'와 \'자유주의자\'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유주의가 대세이지만, \'신좌파\'의 새로운 마르크스 조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폭로작업이 차츰 확대되고 있고, 그 흐름을 타는 지식인의 대오 역시 미미하지만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신좌파의 모택동 사상과 모택동 시대 사회주의 재평가\'는 <근대성과 모택동 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究明>과 <모택동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90년대 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서구 자본주의 근대를 넘어선 또 다른 근대를 중국 변혁의 길로 상정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모택동 사상은 근대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성, 따라서 모택동 사회주의와 등소평 사회주의의 구분은 1980년대 인식처럼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근대성 방안, 혹은 근대성의 다른 측면의 전개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汪暉는 모택동의 사상을 <반자본주의 근대화의 근대성 이론>으로 규정한다. 모택동 사회주의는 크게 보면 근대를 지향하는 근대 이데올로기이지만,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왕후이는 모택동 사상을 자본주의 근대성을 초월하여 새로운 근대성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6. 21세기 동아시아와 중국의 길
21세기, 바야흐로 중국은 세계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 문화시장 역시 중국을 향해 진입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변화의 물결은 중국으로 하여금 21세기 전지구 문화와 전통의 중심이자,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세기의 자연과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길을 터 두고 있다. 이에 부응해 중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체로 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서쪽에서 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해양 경제권의 중심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전 지구의 최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지역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雲南省을 거점으로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 등을 묶는 大西南經濟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四川省을 거점으로 靑海省과 新疆省을 거쳐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大西北經濟圈 개발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 중국이 覇權主義로 나아갈 것인지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를 깨고 진정한 세계평화의 對抗軸 역할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동아시아 지식인의 지적소통과 민중적 連帶를 동시에 이룩해낼 수만 있다면 진정한 동아시아 連帶가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中華>라는 단어가 서구에 대한 상대적 개념에 동아시아 中心이라는 자의식이 더해져 만들어진 의미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와 진정한 橫向意識을 띠면서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제언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화주의는 물론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다투어 참여해왔던 <아시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省察的 검토를 통해 세계체제를 突破해 나갈 진정한 동아시아 連帶 구축의 가능성을 考究해 볼일이다. 이를 위해 근대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속에 녹아 있었던 진정한 連帶 의식의 단초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으로부터 21세기적 連帶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당장 아시아인의 아시아인에 의한 지역 連帶 구축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共生的, 橫向的, 地域的 동아시아 지역공동체가 탄생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만, 기존의 국민국가와 민족적 틀을 유지하면서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검토해보는 가운데 진정한 동아시아적 展望이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內藏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서구의 他者로서의 지위를 벗어 던지고 아시아의 주체로서 지위를 여하히 專有해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추천자료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 문화를 읽고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 문화를 읽고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서평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서평 [중국경제, 한국경제, 경제협력, 한중경제협력 전개과정, 현황, 중국경제성장이 한국에 미치...
[중국경제, 한국경제, 경제협력, 한중경제협력 전개과정, 현황, 중국경제성장이 한국에 미치... [시간][고대중국][아프리카인][천주교][고대중국인의 시간][아프리카인의 시간][천주교의 시...
[시간][고대중국][아프리카인][천주교][고대중국인의 시간][아프리카인의 시간][천주교의 시... [★우수레포트★][중국대외정책] 중국의 시기별 대외 정책의 특징,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두 분...
[★우수레포트★][중국대외정책] 중국의 시기별 대외 정책의 특징,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두 분... 중국인 관광객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 제주도 관광,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의 시장세분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 제주도 관광,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중국과아프리카외교,중국과아프리카외교현황,중국 아프리카 외교역사
중국과아프리카외교,중국과아프리카외교현황,중국 아프리카 외교역사 [민족관][독일인 민족관][중국인 민족관][한설야 민족관][금강산법문 민족관][독일인][중국인...
[민족관][독일인 민족관][중국인 민족관][한설야 민족관][금강산법문 민족관][독일인][중국인... [관료제, 미국 관료제, 프랑스 관료제, 일본 관료제, 중국 관료제, 한국 관료제, 미국, 프랑...
[관료제, 미국 관료제, 프랑스 관료제, 일본 관료제, 중국 관료제, 한국 관료제, 미국, 프랑...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중국 인사제도][일본 인사제도]유럽연합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중국 인사제도][일본 인사제도]유럽연합 인사제도]한국 인사제도,... 중국경제론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 - 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경제론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 - 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사례-오리온 제과 중국시장진출 성공사례,오리온 초코파이의 중국진출,브랜...
중국진출 한국기업사례-오리온 제과 중국시장진출 성공사례,오리온 초코파이의 중국진출,브랜... [중국의 개발협력, 원조에 관한 보고서] 신흥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대외원...
[중국의 개발협력, 원조에 관한 보고서] 신흥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대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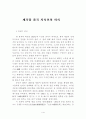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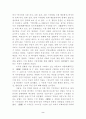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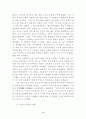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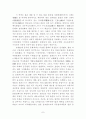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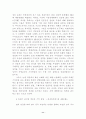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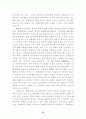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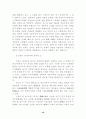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