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언
Ⅱ. 지.행과 格物.치지
Ⅲ. 지행합일설의 정초
1. 심즉리
2. 양지론
Ⅳ. 지행합일설의 원리
Ⅴ. 지행합일설의 전개
1. 치양지
2. 사상마련
3. 만물일체론
Ⅵ. 결 어
Ⅰ. 서 언
Ⅱ. 지.행과 格物.치지
Ⅲ. 지행합일설의 정초
1. 심즉리
2. 양지론
Ⅳ. 지행합일설의 원리
Ⅴ. 지행합일설의 전개
1. 치양지
2. 사상마련
3. 만물일체론
Ⅵ. 결 어
본문내용
어둡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明德이라 한다.」
) 「是其一體之仁也 對小人之心亦必有之 是乃根於天命之性而自然靈昭不昧者也 是故謂之明德」.
나아가 양명은 『대학』의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에 있어서의 明德을 靈昭不昧
) 『王陽明全書』 卷26 「大學問」, 「天命之性而自然靈昭不昧者也 是故謂之明德.」
라 하고 이것은 인간이 本有하는 것으로서 곧 一體之仁이라 풀었다.
양명의 만물일체 사상은 이 明明德과 親民을 언급하면서 더욱 부각된다. 「명명덕은 그 천지만물이 한 몸이라는 體를 세우는 것이다. 친민은 그 천지만물이 한몸이라는 用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명덕은 반드시 친민에 있다. 그리고 백성을 친애함은 곧 그 명덕을 밝히기 위한 까닭이다.」
) 『王陽明全書』 卷26 續編, 「大學問」, 「明明德者 立其天地萬物一體之體也 親民者 達其天地萬物一體之用也 故明明德必在於親民 而親民乃所以明其明德也」.
양명은 體用으로 나누어, 明明德은 천지만물 일체의 體요, 親民은 천지만물 일체의 達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명덕을 밝히려면 먼저 친민을 해야하고 친민은 곧 一體之仁의 진실된 실천으로서 이것의 실천이 바로 明明德이다.
양명은, 이와달리 程朱는 明德을 本으로 親民을 末로하여 兩物 內外가 상대를 이루게 되었다
) 「大學問」, 前揭書, p.3, 「先儒以明明德爲本 新民爲末 兩物而內外相對也」.
고 비판하였다. 즉 명명덕을 통하여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벌써 나와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입장으로
) 「大學問」, p.3, 「新民之意 其與親民不同 則明德之功 自與新民爲二」.
程朱는 『大學』古本의 萬物一體의 사상을 상실하여 明明德과 親民이 본래 一事임을 알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 「大學問」, p.3, 「先儒之說 是蓋不知明德親民之本爲一事」.
그러므로 親民의 親을 新으로 하는 것 부터가 나와 백성, 나와 만물을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가 『대학』을 장구로 나누고 보전을 붙인 것은 성현의 뜻에 크게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격물 치지에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단지 하나의 明德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비록 백성을 친애하지만 역시 덕을 밝히는 일이다. 明德은 이 마음의 덕이며, 이것이 바로 어짊(仁)이다. 仁이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이라도 자기 있을 곳을 잃게 되면 그곳이 곧 나의 仁이 아직 다 발휘하지 못한 곳이다.」
) 同上, 「自格物致知至平天下 只是一箇明明德 雖親民 亦明德事也 明德是此心之德 卽是仁.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使有一物失所 便是吾仁有未盡處」.
양명은 親民을 떠나면 明明德은 단지 「내재적인 깨달음」일 뿐이다고 본 것이다. 즉 내재적인 깨달음 곧 良知가 바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실천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明明德이 본체를 세우는 것(立體)이요, 親民이 통달된 작용(達用)이라면 체용은 떨어질 수 없다. 양명은 이처럼 體와 用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고, 자기완성(成己)은 역시 만물의 완성(成物)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논리를 피력하였다.
) 勞思光著.鄭仁在譯, 『中國哲學史』-宋明篇-, 探求堂, 1987, p.528 참조.
또한 양명은 明德을 仁으로 설명하였다. 仁心이 드러나 작용하는 것은 천지만물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 자리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成物은 成己의 한 부분이요, 내재적인 명덕은 반드시 외재적인 백성을 사랑함의 실천상에서 자신을 완성한다. 「… 성인이 그 마음을 극진히 함(盡心)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 마음을 다하면 집안이 이로써 가지런하게 되고, 나라가 이로써 다스려지고, 천하가 이로써 평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학문은 盡心을 벗어나지 않는다.」
) 『王陽明全書』 卷7, 文錄 4, 重修山除縣學記」, 「… 聖人之求盡其心也 以天地萬物爲一切也 … 凡以裁成輔相 成己爲物 而求盡吾心焉耳 心盡而家以齊 國以治 天下以平 故聖人之學 不出乎盡心.」
양명은 위에서 盡心으로 明德 親民의 뜻을 설명함으로써 만물일체의 대긍정의 관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양명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萬物一體의 明明德, 그것은 致良知와 같은 것이며 더나아가 지행합일의 종착점이다. 아울러 明德과 親民의 통일은 知行合一의 또다른 설명방식이다. 「명덕을 밝히는 것은 본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작용이며 至善에 머무는 것은 그 요점이다」
) 『王陽明全書』 卷8, 文錄5, 書朱子禮卷, 「… 是故明明德 體也 親民 用也 而止至善 其要矣.」
는 말은 양명의 大學之道 삼강령에 대한 이해방식의 적절한 표현이다.
요컨대 양명의 知行合一說은 心卽理의 合一, 相卽, 一體觀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여 致良知로 전개되었다. 그 실현방법으로서 事上磨鍊가 중시된 致良知는 결국 成己 成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에 이르러서는 萬物一體의 실현을 진정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Ⅵ. 결 어
「왕양명의 知行合一說 연구」란 제하의 논고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자는 知.行의 문제와 知行을 언급함에 항상 함께 거론되는 格物.致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고찰하였다. 이에 바탕하여 왕양명 지행합일설의 정초를 이루는 心卽理說과 良知論을 알아본 후 지행합일설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지행합일설이 어떻게 심화되어 전개되었는가를 「致良知」 「事上磨鍊」 「萬物一體論」으로 세분하여 피력하였다.
논고를 통하여 필자는 양명의 지행합일설은 제일 먼저 心卽理를 통하여 주객과 물아의 일치와 통일을 꾀한 바탕 아래, 지와 행의 상즉 또는 합일이 전개되며, 그 합일은 본체상의 일치를 통하여 결국은 그것의 현실 實事上의 일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致良知라는 良知의 체현은 구체적인 物事 實事 속에서의 실증이 중시되었던 바, 양명은 이 런 과정을 통하여 지행합일의 최종 목표를 만물일체라는 세계 대긍정에 두고 그의 사상 전개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논파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통하여 양명철학의 바탕에는 대극적 모든 상대적 요소들이 분해되어 위대한 일치와 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 대한 대긍정과 회귀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본다.
) 「是其一體之仁也 對小人之心亦必有之 是乃根於天命之性而自然靈昭不昧者也 是故謂之明德」.
나아가 양명은 『대학』의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에 있어서의 明德을 靈昭不昧
) 『王陽明全書』 卷26 「大學問」, 「天命之性而自然靈昭不昧者也 是故謂之明德.」
라 하고 이것은 인간이 本有하는 것으로서 곧 一體之仁이라 풀었다.
양명의 만물일체 사상은 이 明明德과 親民을 언급하면서 더욱 부각된다. 「명명덕은 그 천지만물이 한 몸이라는 體를 세우는 것이다. 친민은 그 천지만물이 한몸이라는 用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명덕은 반드시 친민에 있다. 그리고 백성을 친애함은 곧 그 명덕을 밝히기 위한 까닭이다.」
) 『王陽明全書』 卷26 續編, 「大學問」, 「明明德者 立其天地萬物一體之體也 親民者 達其天地萬物一體之用也 故明明德必在於親民 而親民乃所以明其明德也」.
양명은 體用으로 나누어, 明明德은 천지만물 일체의 體요, 親民은 천지만물 일체의 達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명덕을 밝히려면 먼저 친민을 해야하고 친민은 곧 一體之仁의 진실된 실천으로서 이것의 실천이 바로 明明德이다.
양명은, 이와달리 程朱는 明德을 本으로 親民을 末로하여 兩物 內外가 상대를 이루게 되었다
) 「大學問」, 前揭書, p.3, 「先儒以明明德爲本 新民爲末 兩物而內外相對也」.
고 비판하였다. 즉 명명덕을 통하여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벌써 나와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입장으로
) 「大學問」, p.3, 「新民之意 其與親民不同 則明德之功 自與新民爲二」.
程朱는 『大學』古本의 萬物一體의 사상을 상실하여 明明德과 親民이 본래 一事임을 알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 「大學問」, p.3, 「先儒之說 是蓋不知明德親民之本爲一事」.
그러므로 親民의 親을 新으로 하는 것 부터가 나와 백성, 나와 만물을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가 『대학』을 장구로 나누고 보전을 붙인 것은 성현의 뜻에 크게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격물 치지에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단지 하나의 明德을 밝히는 것일 뿐이다. 비록 백성을 친애하지만 역시 덕을 밝히는 일이다. 明德은 이 마음의 덕이며, 이것이 바로 어짊(仁)이다. 仁이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이라도 자기 있을 곳을 잃게 되면 그곳이 곧 나의 仁이 아직 다 발휘하지 못한 곳이다.」
) 同上, 「自格物致知至平天下 只是一箇明明德 雖親民 亦明德事也 明德是此心之德 卽是仁.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使有一物失所 便是吾仁有未盡處」.
양명은 親民을 떠나면 明明德은 단지 「내재적인 깨달음」일 뿐이다고 본 것이다. 즉 내재적인 깨달음 곧 良知가 바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실천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明明德이 본체를 세우는 것(立體)이요, 親民이 통달된 작용(達用)이라면 체용은 떨어질 수 없다. 양명은 이처럼 體와 用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고, 자기완성(成己)은 역시 만물의 완성(成物)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세상은 하나가 된다는 논리를 피력하였다.
) 勞思光著.鄭仁在譯, 『中國哲學史』-宋明篇-, 探求堂, 1987, p.528 참조.
또한 양명은 明德을 仁으로 설명하였다. 仁心이 드러나 작용하는 것은 천지만물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 자리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成物은 成己의 한 부분이요, 내재적인 명덕은 반드시 외재적인 백성을 사랑함의 실천상에서 자신을 완성한다. 「… 성인이 그 마음을 극진히 함(盡心)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 마음을 다하면 집안이 이로써 가지런하게 되고, 나라가 이로써 다스려지고, 천하가 이로써 평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학문은 盡心을 벗어나지 않는다.」
) 『王陽明全書』 卷7, 文錄 4, 重修山除縣學記」, 「… 聖人之求盡其心也 以天地萬物爲一切也 … 凡以裁成輔相 成己爲物 而求盡吾心焉耳 心盡而家以齊 國以治 天下以平 故聖人之學 不出乎盡心.」
양명은 위에서 盡心으로 明德 親民의 뜻을 설명함으로써 만물일체의 대긍정의 관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양명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萬物一體의 明明德, 그것은 致良知와 같은 것이며 더나아가 지행합일의 종착점이다. 아울러 明德과 親民의 통일은 知行合一의 또다른 설명방식이다. 「명덕을 밝히는 것은 본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작용이며 至善에 머무는 것은 그 요점이다」
) 『王陽明全書』 卷8, 文錄5, 書朱子禮卷, 「… 是故明明德 體也 親民 用也 而止至善 其要矣.」
는 말은 양명의 大學之道 삼강령에 대한 이해방식의 적절한 표현이다.
요컨대 양명의 知行合一說은 心卽理의 合一, 相卽, 一體觀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여 致良知로 전개되었다. 그 실현방법으로서 事上磨鍊가 중시된 致良知는 결국 成己 成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에 이르러서는 萬物一體의 실현을 진정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Ⅵ. 결 어
「왕양명의 知行合一說 연구」란 제하의 논고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자는 知.行의 문제와 知行을 언급함에 항상 함께 거론되는 格物.致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고찰하였다. 이에 바탕하여 왕양명 지행합일설의 정초를 이루는 心卽理說과 良知論을 알아본 후 지행합일설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지행합일설이 어떻게 심화되어 전개되었는가를 「致良知」 「事上磨鍊」 「萬物一體論」으로 세분하여 피력하였다.
논고를 통하여 필자는 양명의 지행합일설은 제일 먼저 心卽理를 통하여 주객과 물아의 일치와 통일을 꾀한 바탕 아래, 지와 행의 상즉 또는 합일이 전개되며, 그 합일은 본체상의 일치를 통하여 결국은 그것의 현실 實事上의 일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致良知라는 良知의 체현은 구체적인 物事 實事 속에서의 실증이 중시되었던 바, 양명은 이 런 과정을 통하여 지행합일의 최종 목표를 만물일체라는 세계 대긍정에 두고 그의 사상 전개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논파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통하여 양명철학의 바탕에는 대극적 모든 상대적 요소들이 분해되어 위대한 일치와 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 대한 대긍정과 회귀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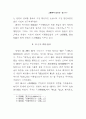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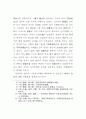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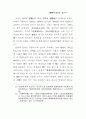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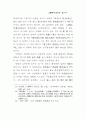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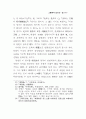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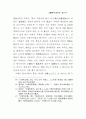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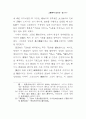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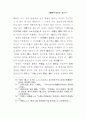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