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불교의 견성
Ⅲ. 원불교의 견성기준
1. 소태산의 견성기준
2. 정산의 견성 5단계
3. 대산의 견성 3단계
Ⅳ. 원불교 견성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Ⅴ. 결 론
Ⅰ. 서 론
Ⅱ. 불교의 견성
Ⅲ. 원불교의 견성기준
1. 소태산의 견성기준
2. 정산의 견성 5단계
3. 대산의 견성 3단계
Ⅳ. 원불교 견성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확률이 희박한 것으로, 견성에만 메달리는 폐단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공하는 소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허송세월하는 수많은 견성탈락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듯 하다.
) 『대종경』 수행품 41장.
따라서 견성이란 부처님 공부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바, 비록 견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깨친 이의 안목을 빌어다가 공부와 사업에 힘쓴다면 이것도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 따라서 성리는 꾸어서라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불교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법문집』제3집,제2편 교법, 4장.
그러나 이런 지적은 불법의 대중화라는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소태산이 견성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 문제가 소흘히 취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원불교 견성기준의 지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와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원불교의 견성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원불교는 어느 정도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불교는 세상을 꿈이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四大가 空하고 五蘊이 空하며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無我의 法에 통달하면 진짜 보살이라고 강조한다.
) 『금강경』 \"通達無我法者 如來說名眞是菩薩\"
인간에게 삶이 꿈이라면 한 번 꿈을 깨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현실이 어느정도 긍정된다면 이런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꿈이 아니라면 현실속에서 평소 성실하게 살며 부처의 행을 본 받아 가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논외로 하고 이 문제에 주목하면 無我나 解脫 涅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태산은 견성에 대한 언급에서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어 십여세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할 것이요 성불을 위하여 큰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인데,
) 이공전, 위의 책, pp.61-62.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고
) 『대종경』 성리품 7장.
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소태산은 견성을 하지 못하고는 항마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지적을한 적이 있다.
이런 견해에 바탕하여 견성문제의 역기능에 주목해보면 전자는 견성은 나이가 들면 쉽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후자는 너무 엄격하여 법사위에 오르는 것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중은 견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거나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견성문제는 도외시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원불교의 견성문제을 불교와 대비하여 살펴본 바, 원불교의 견성기준도 불교에 비하여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하며 또한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見性이 곧 成佛이라는 頓悟頓修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느끼듯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혜개발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견성에 대한 문제를 話頭 삼아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看話禪의 경우 삼일이나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깨친다는 말도 있거니와
) 海眼스님, 『마음이 곧 부처』, 밀알, 1994, p.38.
이 문제를 화두 삼아 연마를 해볼 일이다. 즉 사리연구에 줄을 대는 공부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공부법을 응용하여 여러 대책을 세워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 순리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대책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으로 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견성은 공부인이 순서있게 공부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도록,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견성기준에 촛점을 맞추어 주변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즉 사리연구의 목적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얻자는 것이고, 그 완성이 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의 심화과정으로써 단계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기존의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사실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인체의 생리적인 변화나 우주와 세계를 몸으로써 실감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덧 붙여지면 좋겠다. 따라서 기존의 견성 체험담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를 발굴 조사하여 대중에게 제시하면 좋겠다.
또한 견성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에 대한 가치론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실천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지금 원불교는 교화침체의 현실에 부딪쳐 있는 바, 지혜의 개발이 소흘히 취급된 것도 많은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도가의 명맥(命脈)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다
) 『대종경』 요훈품 41장.
는 경의 말씀을 상기해 보지 않더라도, 지금 원불교는 세속적 집단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의 샘물을 찾아야만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을 짖고 보수하는 일은 자연히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 불법의 주인이 되려는
) 백련선서간행회, 『원오심요(상)』, 장경각, 2537(1993), p.36. \"修造自有人 且與佛法爲主\"
사람이 있어야 하겠으며, 문득 생각을 끊고 반연을 쉬며 또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는 하릴없는 사람이 많아져야 겠다.
) 서산, 위의 책, p.42.
그래야 사업에만 메달리기 쉬운 우리의 공부에 中道가 잡히고 유사불교라는 문밖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대종경』 수행품 41장.
따라서 견성이란 부처님 공부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바, 비록 견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깨친 이의 안목을 빌어다가 공부와 사업에 힘쓴다면 이것도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 같다.
) 따라서 성리는 꾸어서라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불교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법문집』제3집,제2편 교법, 4장.
그러나 이런 지적은 불법의 대중화라는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소태산이 견성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 문제가 소흘히 취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원불교 견성기준의 지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와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원불교의 견성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원불교는 어느 정도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불교는 세상을 꿈이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四大가 空하고 五蘊이 空하며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無我의 法에 통달하면 진짜 보살이라고 강조한다.
) 『금강경』 \"通達無我法者 如來說名眞是菩薩\"
인간에게 삶이 꿈이라면 한 번 꿈을 깨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현실이 어느정도 긍정된다면 이런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꿈이 아니라면 현실속에서 평소 성실하게 살며 부처의 행을 본 받아 가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논외로 하고 이 문제에 주목하면 無我나 解脫 涅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태산은 견성에 대한 언급에서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어 십여세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할 것이요 성불을 위하여 큰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인데,
) 이공전, 위의 책, pp.61-62.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고
) 『대종경』 성리품 7장.
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소태산은 견성을 하지 못하고는 항마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지적을한 적이 있다.
이런 견해에 바탕하여 견성문제의 역기능에 주목해보면 전자는 견성은 나이가 들면 쉽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고, 후자는 너무 엄격하여 법사위에 오르는 것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중은 견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거나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견성문제는 도외시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원불교의 견성문제을 불교와 대비하여 살펴본 바, 원불교의 견성기준도 불교에 비하여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하며 또한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見性이 곧 成佛이라는 頓悟頓修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을 느끼듯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혜개발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견성에 대한 문제를 話頭 삼아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看話禪의 경우 삼일이나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깨친다는 말도 있거니와
) 海眼스님, 『마음이 곧 부처』, 밀알, 1994, p.38.
이 문제를 화두 삼아 연마를 해볼 일이다. 즉 사리연구에 줄을 대는 공부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공부법을 응용하여 여러 대책을 세워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 순리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대책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으로 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견성은 공부인이 순서있게 공부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도록,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견성기준에 촛점을 맞추어 주변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즉 사리연구의 목적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얻자는 것이고, 그 완성이 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의 심화과정으로써 단계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기존의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사실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인체의 생리적인 변화나 우주와 세계를 몸으로써 실감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덧 붙여지면 좋겠다. 따라서 기존의 견성 체험담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를 발굴 조사하여 대중에게 제시하면 좋겠다.
또한 견성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에 대한 가치론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실천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지금 원불교는 교화침체의 현실에 부딪쳐 있는 바, 지혜의 개발이 소흘히 취급된 것도 많은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도가의 명맥(命脈)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혜명(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다
) 『대종경』 요훈품 41장.
는 경의 말씀을 상기해 보지 않더라도, 지금 원불교는 세속적 집단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의 샘물을 찾아야만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을 짖고 보수하는 일은 자연히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 불법의 주인이 되려는
) 백련선서간행회, 『원오심요(상)』, 장경각, 2537(1993), p.36. \"修造自有人 且與佛法爲主\"
사람이 있어야 하겠으며, 문득 생각을 끊고 반연을 쉬며 또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는 하릴없는 사람이 많아져야 겠다.
) 서산, 위의 책, p.42.
그래야 사업에만 메달리기 쉬운 우리의 공부에 中道가 잡히고 유사불교라는 문밖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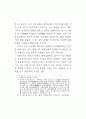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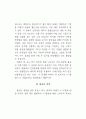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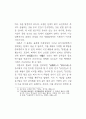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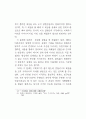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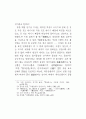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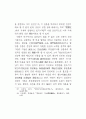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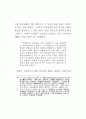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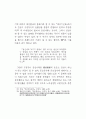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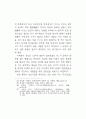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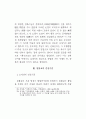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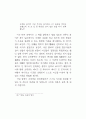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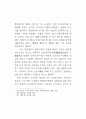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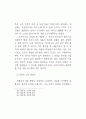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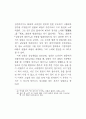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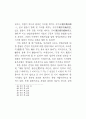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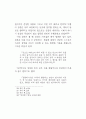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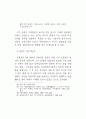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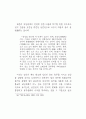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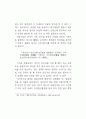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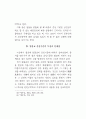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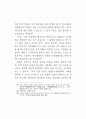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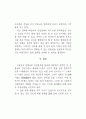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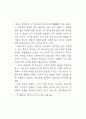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