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역사와 신화의 두 층위
Ⅲ. 건국신화의 서사구조
Ⅳ. 상징체계와 문화체계
Ⅴ. 세계상의 전개
Ⅵ. 결론
Ⅱ. 역사와 신화의 두 층위
Ⅲ. 건국신화의 서사구조
Ⅳ. 상징체계와 문화체계
Ⅴ. 세계상의 전개
Ⅵ. 결론
본문내용
.R.Trask), The Sacread and The Profan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59, p.95.; M.Eliade, Myth and Reality, op.cit., pp.13-14.; cf. David M.Rasmusen, op.cit, pp.64-68.
이 말에 의거해 보면 천부지모관은 바로 우리 민족이 존재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부지모는 \"천 : 지 / 일 : 월 / 남 : 녀 / 상 : 하 / 좌 : 우 / 낮 : 밤\" 등으로 확장되어 존재 천체를 바라보는 일종의 쌍분관의 근저를 이루었다. 실제 이러한 쌍분관이 父性과 母性이라는 인격화를 거쳐 국가까지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천부지모가 인지되고 있는 신화적 심의를 읽을 수 있다.
2. 現世主義
현세주의란 建國神話만 아니라 자연종교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의 建國神話에 이 점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신도 동물도 모두 인간화를 지향하고, 또 실제로 인간화를 경험한다. 그들의 지향이 바로 인간세상인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즉 천상과 지하를 대표하는 天神과 地神이 모두 지상의 인간을 낳은 부모며, 그런 점에서 천상과 지하는 지상에 이르러 완성이 된다. 건국의 주체들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반대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공간이 유토피아라는 神界라면, 建國神話에서는 역으로 신들이 人間界를 지향하며, 또한 인간화를 꿈꾸고 있다. 신조차도 선망하여 지향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분명 살만한 곳임에 틀림없다. 또한 신이 돕고 신이 세운 나라는 완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建國神話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문화적 구성체인 국가가 살만한 곳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현세적 삶의 최적 공간으로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상의 하나인 통치이념의 구축과 관련이 깊다.
3. 統治理念
建國神話가 통치이념이라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통치권적 지배이념은 그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과 관련되는 한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의 민주사상은 민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은 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전제군주사회나 봉건사회의 경우는 사회사상적으로 독재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통치권자의 정통성이 천부적인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장 강력한 정권적 카리스마가 용인되던 사회는 제정일치의 신권사회일 것이며, 통치권 자체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인 만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믿어졌을 것이다. 한국 建國神話의 기저에는 사상적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로 신성불가침의 신권적 지배이념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4. 他界觀
他界와 來世는 동의어다. 공간적 차원에서 타계가 시간적 차원에서 내세가 된다. 현세와 내세(타계)는 우리말로 이승과 저승으로 대별된다. 이승은 하나지만, 저승은 두 가지다.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세계와 죽어서 가는 세계가 모두 저승이다. 한편 前世와 來世는 전혀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둘은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이다. 탄생과 죽음은 이승과 저승을 이동하는 공간적 결계에 장치된 초월적 경험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지만, 그곳은 다름아닌 태어나기 전의 공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전제를 여기에서 얻는다. 우리말 \'돌아가시다\'라는 말이 뜻하듯 죽어서 가는 곳은 곧 처음에 왔던 곳인 셈이다.
우리의 신화에서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타계가 선명히 그려진 예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은 쉽게 찾아진다. 환웅과 해모수는 하늘에서도 오고, 웅녀는 땅속에서 나왔으며, 유화와 알영은 물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허황옥은 바다를 건너 왔다.
온 곳이 곧 갈 곳이라는 전제로 보아, 그 出誕地를 찾는 것이 곳 타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써의 효용성을 지니는 것이다. 건국신화에 투영된 바,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타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속, 물속, 그리고 바다 건너 저 어디 등 중층적인 타계관이 찾아진다.
Ⅵ. 結 論
모든 문학은 구조라는 틀로 짜여 있다. 모든 문장이 문법이라는 틀로 짜져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建國神話 4편에 대한 서사구조의 분석은 建國神話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建國神話는 건국조에 의한 건국적 役事를 설명하는 것이요, 또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직 성원 전체에 의해 신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국조와 관련된 구조적 상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건국주체의 신통기를 통해 그들이 표상하고 있는 바 구조적 상관성을 살폈다.
建國神話의 상징체계와 문화체계는 서사적 전개에 있어 심층적인 층위를 맡은 내적 조직이다. 서열적 조직으로는 \"天上 : 神 : 天父 / 地下 : 動物 : 地母 / 地上 : 人間 : 建國祖\"과 계열적으로는 \"天上 : 地下 : 地上 / 神 : 動物 : 人間 / 天父 : 地母 : 建國祖\"의 조직을 이루면서 전체의 상징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신격이 표상하는 문화체계가 상징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확인되는 바, 초자연과 자연, 그리고 문화라는 층위가 대별된다. 建國神話의 이러한 상징체계와 문화체계는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서, 서사문학적인 심층적 층위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내적 조직인 것이다.
체계란 구조의 다른 한 양태로서 위의 서사구조의 분석과 상징 및 문화체계의 확보는 끝으로 서사문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실천적 메시지, 즉 주제에 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집단전승인 신화의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상이라는 이름하에 고찰했다. 세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는데, 농경민적 세계상 중에 가장 보편적인 천부지모의 세계상, 자연종교의 일반적 지향인 현세주의의 세계상, 建國神話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정권적 정통성과 피지배층의 맹목적 복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통치이념적 세계상, 그리고 건국신화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타계관에 대한 다층적 인식구조 등을 추출하여 의미를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이 말에 의거해 보면 천부지모관은 바로 우리 민족이 존재의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부지모는 \"천 : 지 / 일 : 월 / 남 : 녀 / 상 : 하 / 좌 : 우 / 낮 : 밤\" 등으로 확장되어 존재 천체를 바라보는 일종의 쌍분관의 근저를 이루었다. 실제 이러한 쌍분관이 父性과 母性이라는 인격화를 거쳐 국가까지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천부지모가 인지되고 있는 신화적 심의를 읽을 수 있다.
2. 現世主義
현세주의란 建國神話만 아니라 자연종교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의 建國神話에 이 점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신도 동물도 모두 인간화를 지향하고, 또 실제로 인간화를 경험한다. 그들의 지향이 바로 인간세상인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즉 천상과 지하를 대표하는 天神과 地神이 모두 지상의 인간을 낳은 부모며, 그런 점에서 천상과 지하는 지상에 이르러 완성이 된다. 건국의 주체들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반대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공간이 유토피아라는 神界라면, 建國神話에서는 역으로 신들이 人間界를 지향하며, 또한 인간화를 꿈꾸고 있다. 신조차도 선망하여 지향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분명 살만한 곳임에 틀림없다. 또한 신이 돕고 신이 세운 나라는 완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建國神話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문화적 구성체인 국가가 살만한 곳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현세적 삶의 최적 공간으로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상의 하나인 통치이념의 구축과 관련이 깊다.
3. 統治理念
建國神話가 통치이념이라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통치권적 지배이념은 그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과 관련되는 한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의 민주사상은 민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은 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전제군주사회나 봉건사회의 경우는 사회사상적으로 독재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통치권자의 정통성이 천부적인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장 강력한 정권적 카리스마가 용인되던 사회는 제정일치의 신권사회일 것이며, 통치권 자체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인 만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믿어졌을 것이다. 한국 建國神話의 기저에는 사상적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로 신성불가침의 신권적 지배이념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4. 他界觀
他界와 來世는 동의어다. 공간적 차원에서 타계가 시간적 차원에서 내세가 된다. 현세와 내세(타계)는 우리말로 이승과 저승으로 대별된다. 이승은 하나지만, 저승은 두 가지다.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세계와 죽어서 가는 세계가 모두 저승이다. 한편 前世와 來世는 전혀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둘은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이다. 탄생과 죽음은 이승과 저승을 이동하는 공간적 결계에 장치된 초월적 경험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이지만, 그곳은 다름아닌 태어나기 전의 공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전제를 여기에서 얻는다. 우리말 \'돌아가시다\'라는 말이 뜻하듯 죽어서 가는 곳은 곧 처음에 왔던 곳인 셈이다.
우리의 신화에서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타계가 선명히 그려진 예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러나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은 쉽게 찾아진다. 환웅과 해모수는 하늘에서도 오고, 웅녀는 땅속에서 나왔으며, 유화와 알영은 물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허황옥은 바다를 건너 왔다.
온 곳이 곧 갈 곳이라는 전제로 보아, 그 出誕地를 찾는 것이 곳 타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써의 효용성을 지니는 것이다. 건국신화에 투영된 바,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타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속, 물속, 그리고 바다 건너 저 어디 등 중층적인 타계관이 찾아진다.
Ⅵ. 結 論
모든 문학은 구조라는 틀로 짜여 있다. 모든 문장이 문법이라는 틀로 짜져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建國神話 4편에 대한 서사구조의 분석은 建國神話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建國神話는 건국조에 의한 건국적 役事를 설명하는 것이요, 또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직 성원 전체에 의해 신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국조와 관련된 구조적 상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건국주체의 신통기를 통해 그들이 표상하고 있는 바 구조적 상관성을 살폈다.
建國神話의 상징체계와 문화체계는 서사적 전개에 있어 심층적인 층위를 맡은 내적 조직이다. 서열적 조직으로는 \"天上 : 神 : 天父 / 地下 : 動物 : 地母 / 地上 : 人間 : 建國祖\"과 계열적으로는 \"天上 : 地下 : 地上 / 神 : 動物 : 人間 / 天父 : 地母 : 建國祖\"의 조직을 이루면서 전체의 상징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는 신격이 표상하는 문화체계가 상징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확인되는 바, 초자연과 자연, 그리고 문화라는 층위가 대별된다. 建國神話의 이러한 상징체계와 문화체계는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서, 서사문학적인 심층적 층위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내적 조직인 것이다.
체계란 구조의 다른 한 양태로서 위의 서사구조의 분석과 상징 및 문화체계의 확보는 끝으로 서사문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실천적 메시지, 즉 주제에 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집단전승인 신화의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상이라는 이름하에 고찰했다. 세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는데, 농경민적 세계상 중에 가장 보편적인 천부지모의 세계상, 자연종교의 일반적 지향인 현세주의의 세계상, 建國神話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정권적 정통성과 피지배층의 맹목적 복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통치이념적 세계상, 그리고 건국신화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타계관에 대한 다층적 인식구조 등을 추출하여 의미를 간략히 고찰해 보았다.
추천자료
 뷰티플마인드를 만드는 신화
뷰티플마인드를 만드는 신화 TV리얼리티 : 사실과 허구의 경계
TV리얼리티 : 사실과 허구의 경계 역사 드라마의 역사적 진실 재구성(드라마 '해신'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 드라마의 역사적 진실 재구성(드라마 '해신' 분석을 중심으로) (서평)'그리스 로마신화'에 대한 내용소개, 분석 및 서평(A+독후감)
(서평)'그리스 로마신화'에 대한 내용소개, 분석 및 서평(A+독후감) 종족과 민족 -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종족과 민족 -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여성성의 신화
여성성의 신화 윤대성 노비문서, 출세기, 신화 1900 연구분석
윤대성 노비문서, 출세기, 신화 1900 연구분석 만화 '아키라'의 기호로 살펴보는 일본이라는 신화
만화 '아키라'의 기호로 살펴보는 일본이라는 신화 서평 -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
서평 -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과 마리 앙투아네트 신화 PD수첩(피디수첩)과 황우석 신화,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의 언론윤리상 문제점, PD수첩(피...
PD수첩(피디수첩)과 황우석 신화,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의 언론윤리상 문제점, PD수첩(피... [독후감]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독후감]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괴태(괴테 Goethe)의 생애와 파우스트(Faust)의 신화
괴태(괴테 Goethe)의 생애와 파우스트(Faust)의 신화 2018년 1학기 구비문학의세계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자료)
2018년 1학기 구비문학의세계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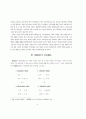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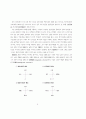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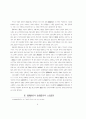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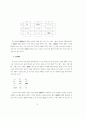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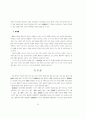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