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참회 - 신앙의 전제
Ⅲ. 정토문에서의 념불과 신행
- 신앙의 내용
Ⅳ. 결사 - 사회적 행위
Ⅴ. 정토의 념불행에 대한 방편의 문제
- 정토문의 일반적 오해에 대한 입장
Ⅵ. 맺음말
Ⅱ. 참회 - 신앙의 전제
Ⅲ. 정토문에서의 념불과 신행
- 신앙의 내용
Ⅳ. 결사 - 사회적 행위
Ⅴ. 정토의 념불행에 대한 방편의 문제
- 정토문의 일반적 오해에 대한 입장
Ⅵ. 맺음말
본문내용
身大水所漂 不知但是夢心所作 謂實流溺生大怖 未覺之時更 作異夢 謂我所見是夢非 實 心性聰故夢內知夢 卽於其溺不生其 而未能知身臥床上 動頭搖手勤求 永覺 永覺之時追 緣前夢 水與流身皆無所有 唯見本來靜臥於床)
14) 정순일, [大乘六情懺悔考], {元曉聖師의 哲學世界},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PP.402-409. 정순일 교수는 이 부분의 해설에서 {大乘起信論疏}의 四覺(不覺, 相似覺, 隨分覺, 究竟覺)과 비교하여 분석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15) 원효는 歸命을 {大乘起信論疏}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중생의 신체 는 一心(이라는 무한의 근원)에서부터 일어 났기 때문에 歸命이란 근원 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근원을 등지고 바깥의 세계로 향해 흩어져 달려나가기만 한다. 이제 목숨을 들어 이 한 몸을 다 바쳐 그 본래의 일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歸命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又復歸命者還源義 所以者 衆生六根 從一心起 而背自原 馳散六塵 今擧命總攝六情 還歸其本一心之原 故曰歸命. {大乘起信論疏記會本}, 韓 佛全1, P.735상-중.)
16) 信解는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사실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기의 유 한성\'에 대해 의심하여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拙論, [원효의 정토신앙과 사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65. 참조.)
17) 인간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知性(悟 性,Verstand)에 의한 것이다. 지성은 \'의문\'을 그 본질로 하는데, 의심하 는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了解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理 性의 기능으로서의 믿음이다. 이성은 지성에 대한 의심이 본질이다. 지 성의 주관성, 세속성, 유한성을 비판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 이 성에 와서는 지성이 부정되며, 지성의 자기 만족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 각으로서의 믿음이다. 세 번째는 仰信으로서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자 기 긍정의 지성과 자기 부정의 이성과는 달리 자기 능력을 초월한 곳에 서 오는 믿음이며,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며, 믿음이 작용하는 원동력이 法(諸佛) 의 측면에 있는 믿음이다.(水谷 幸正, [如來藏と信], 春秋社, 昭和57, P.123-125. 참조. -講座大乘佛敎6 {如來藏思想}에 수록-) 이와 같은 견 해를 인정한다면 신해는 지성의 단계를 넘어 자기부정의 단계이며, 앙신 은 이 신해를 바탕으로 생기는 자기 초월의 믿음이다.
18) 水谷 幸正 교수는 出家者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신해로 전개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仰信이라 할 수 있다고 하 였으나, (水谷 幸正, 전게논문, PP.119-122. 참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在家信者라고 하여 信解의 과정이 생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해란 難修行이나 경전의 해석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自己 反省에 의해서도 信解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 제18 念佛往生의 願 - 說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無量壽經}, 康僧鎧譯, 大正藏12, P.268상)
20) 정태혁, [현대사회와 정토신앙], {정토학 연구} 창간호, 한국정토학회, 1998, PP.12-13.
21) 한보광 스님은 건봉사 만일염불결사를 여러번 성공리에 이끌었으며, 주 지로 있는 정토사에서도 결사운동을 이끌고 있다.
22) 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29집}, 동국대학 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317.
23) 한국의 최초 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많다. 화랑도를 결사체로 보는 학설이 있고(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 보2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02-309), 화엄에 관한 결사도 있다.(\'台山 五萬眞身條\', {삼국유사}, 大正藏49, P.998중)
24) {삼국유사}, 大正藏49, P.1012상. (景德王代 康州 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 州境創彌陀寺 約万日爲契)
25) 김문경, [신라 삼국시대의 불교결사운동], {史學志}, 제10집, 단국대학교, 1976, P.167. 한보광,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제3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165.
26) 계는 그 모임의 성격이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 되고 있으나, 결사는 계에 비해서 그 종교적 신앙이 투철하고, 개인과 사회의 정화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27) 한보광, 앞의 책, P.165.
28) \'욱면비염불서승\', {삼국유사}, 大正藏49, P.1012상.
29) 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참조.
30) 名字僧의 타락은 일일이 밝힐 수도 있으나, 보조국사 지눌의 탄식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눌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지금 비추어 보아도 그렇 게 과장된 것은 아닐 듯 하다. \"우리들이 朝夕으로 행하는 자취를 돌이 켜 보면 어떠한가. 佛法을 빙자하여 자기자신을 장식하고 사소한 이양의 길로 치닫고 있다. 풍진의 세상에 빠져들어 도덕은 아직 닦지 않고, 옷 과 음식을 낭비한다. 비록 出家를 하였다고 하나 어떻게 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 대저 三界를 떠나고자 하나 속세를 벗어난 수행이 없고 남자의 몸만을 따라서 장부의 뜻이 없다. 위로는 도를 널리 펴는데 어긋 남이 많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며, 사이로는 네가지의 은 혜를 져버렸다. 지눌은 이러한 일을 한탄한지가 오래 되었다. (知訥撰, {勸修定慧結社文},韓佛全4, P.698상.)
31) 욱면비 설화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32) {阿彌陀經}, 鳩摩羅什譯, 大正藏12, P.346하.
33) 정태혁, [원효의 정토왕생신앙의 교학적 근거와 특색], {정토학 연구}, 한국정토학회, 1998, PP.93-96.
34) 위의 책, P.93.
35) 元曉撰, {無量壽經宗要}, 韓佛全1, P.553하.
36) 동아일보, 1999년, 6월, 16일. 40면.
14) 정순일, [大乘六情懺悔考], {元曉聖師의 哲學世界},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PP.402-409. 정순일 교수는 이 부분의 해설에서 {大乘起信論疏}의 四覺(不覺, 相似覺, 隨分覺, 究竟覺)과 비교하여 분석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15) 원효는 歸命을 {大乘起信論疏}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중생의 신체 는 一心(이라는 무한의 근원)에서부터 일어 났기 때문에 歸命이란 근원 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근원을 등지고 바깥의 세계로 향해 흩어져 달려나가기만 한다. 이제 목숨을 들어 이 한 몸을 다 바쳐 그 본래의 일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歸命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又復歸命者還源義 所以者 衆生六根 從一心起 而背自原 馳散六塵 今擧命總攝六情 還歸其本一心之原 故曰歸命. {大乘起信論疏記會本}, 韓 佛全1, P.735상-중.)
16) 信解는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사실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기의 유 한성\'에 대해 의심하여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拙論, [원효의 정토신앙과 사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65. 참조.)
17) 인간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知性(悟 性,Verstand)에 의한 것이다. 지성은 \'의문\'을 그 본질로 하는데, 의심하 는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了解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理 性의 기능으로서의 믿음이다. 이성은 지성에 대한 의심이 본질이다. 지 성의 주관성, 세속성, 유한성을 비판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 이 성에 와서는 지성이 부정되며, 지성의 자기 만족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 각으로서의 믿음이다. 세 번째는 仰信으로서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자 기 긍정의 지성과 자기 부정의 이성과는 달리 자기 능력을 초월한 곳에 서 오는 믿음이며,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며, 믿음이 작용하는 원동력이 法(諸佛) 의 측면에 있는 믿음이다.(水谷 幸正, [如來藏と信], 春秋社, 昭和57, P.123-125. 참조. -講座大乘佛敎6 {如來藏思想}에 수록-) 이와 같은 견 해를 인정한다면 신해는 지성의 단계를 넘어 자기부정의 단계이며, 앙신 은 이 신해를 바탕으로 생기는 자기 초월의 믿음이다.
18) 水谷 幸正 교수는 出家者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신해로 전개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仰信이라 할 수 있다고 하 였으나, (水谷 幸正, 전게논문, PP.119-122. 참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在家信者라고 하여 信解의 과정이 생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해란 難修行이나 경전의 해석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自己 反省에 의해서도 信解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 제18 念佛往生의 願 - 說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無量壽經}, 康僧鎧譯, 大正藏12, P.268상)
20) 정태혁, [현대사회와 정토신앙], {정토학 연구} 창간호, 한국정토학회, 1998, PP.12-13.
21) 한보광 스님은 건봉사 만일염불결사를 여러번 성공리에 이끌었으며, 주 지로 있는 정토사에서도 결사운동을 이끌고 있다.
22) 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29집}, 동국대학 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317.
23) 한국의 최초 결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많다. 화랑도를 결사체로 보는 학설이 있고(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 보2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02-309), 화엄에 관한 결사도 있다.(\'台山 五萬眞身條\', {삼국유사}, 大正藏49, P.998중)
24) {삼국유사}, 大正藏49, P.1012상. (景德王代 康州 善士數十人志求西方 於 州境創彌陀寺 約万日爲契)
25) 김문경, [신라 삼국시대의 불교결사운동], {史學志}, 제10집, 단국대학교, 1976, P.167. 한보광,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제30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165.
26) 계는 그 모임의 성격이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 되고 있으나, 결사는 계에 비해서 그 종교적 신앙이 투철하고, 개인과 사회의 정화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27) 한보광, 앞의 책, P.165.
28) \'욱면비염불서승\', {삼국유사}, 大正藏49, P.1012상.
29) 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참조.
30) 名字僧의 타락은 일일이 밝힐 수도 있으나, 보조국사 지눌의 탄식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눌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지금 비추어 보아도 그렇 게 과장된 것은 아닐 듯 하다. \"우리들이 朝夕으로 행하는 자취를 돌이 켜 보면 어떠한가. 佛法을 빙자하여 자기자신을 장식하고 사소한 이양의 길로 치닫고 있다. 풍진의 세상에 빠져들어 도덕은 아직 닦지 않고, 옷 과 음식을 낭비한다. 비록 出家를 하였다고 하나 어떻게 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 대저 三界를 떠나고자 하나 속세를 벗어난 수행이 없고 남자의 몸만을 따라서 장부의 뜻이 없다. 위로는 도를 널리 펴는데 어긋 남이 많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며, 사이로는 네가지의 은 혜를 져버렸다. 지눌은 이러한 일을 한탄한지가 오래 되었다. (知訥撰, {勸修定慧結社文},韓佛全4, P.698상.)
31) 욱면비 설화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32) {阿彌陀經}, 鳩摩羅什譯, 大正藏12, P.346하.
33) 정태혁, [원효의 정토왕생신앙의 교학적 근거와 특색], {정토학 연구}, 한국정토학회, 1998, PP.93-96.
34) 위의 책, P.93.
35) 元曉撰, {無量壽經宗要}, 韓佛全1, P.553하.
36) 동아일보, 1999년, 6월, 16일. 4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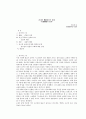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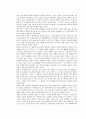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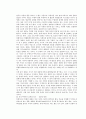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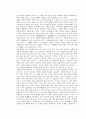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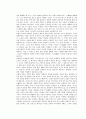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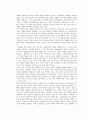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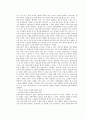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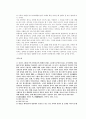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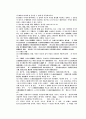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