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수룩한 주인공이 때로 성내고 낙심하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은 이미 그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흥미와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문학사의 맥락으로 보아 이 작품은 해학미를 살려 쓴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사설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되살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 작품 이해
■ \"봄.봄\"의 구성
발단 : 성례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의 갈등
전개 : 장인과 갈등의 심화
절정 : 장인과의 해학적 활극
결말 : 희극적 싸움 끝의 점순이의 태도 변화에 망연해짐(절정 부분 속에 삽입됨)
■ \"봄.봄\"의 특징
내용 :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잇속, 아버지의 행동에 반발하여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의 당돌함과 이중성, 장인의 술수에 대항하나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해학적 갈등이 어우러져 있다.
구성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용하여 \'나\'의 우직함과 순박한 성품과 행동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표현 : 희극적 상황 설정과 유머러스한 토속적 언어 사용이 뛰어나다.
■ \'점순이\'의 역할과 양면성
이 작품에서 \'점순이\'는 자신의 키를 핑계 삼아 혼례를 미루기만 하는 아버지의 처사에 반발하여 어리숙한 \'나\'를 충동질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에 와서는 이제까지의 반대로 아버지를 편드는 쪽으로 그 역할을 바꾼다.
■ \"봄.봄\"의 어법적 특징
우직하고 해학적인 인물인 \'나\'를 내세워 성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장인과의 다툼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골계적이고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토속적이며 원시적이고 자연적이다. 강원도 지방의 사투리가 엮어 내는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물의 어리숙함이나 고지식함이 그것을 통해 적절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 풍자와 해학
풍자와 해학은 웃음을 동반하는 \'현실 드러내기\'의 한 방법이다.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은 대상에 대한 어조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풍자는 인간 생활 특히 같은 시대의 사회적 결함, 악덕, 우행 등을 지적하여 비꼬는 공격적 문예이고, 해학은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과 익살이 들어 있는 문예이다. 풍자는 서구 문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해학은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사설시조 등에 많이 들어 있다. 김유정의 소설은 고전 문학의 해학성을 계승하여 일제 강점기하의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와 함께 토속적 어휘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듬뿍 독자에게 안기고 있다.
▶ 작품 이해
■ \"봄.봄\"의 구성
발단 : 성례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의 갈등
전개 : 장인과 갈등의 심화
절정 : 장인과의 해학적 활극
결말 : 희극적 싸움 끝의 점순이의 태도 변화에 망연해짐(절정 부분 속에 삽입됨)
■ \"봄.봄\"의 특징
내용 :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잇속, 아버지의 행동에 반발하여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의 당돌함과 이중성, 장인의 술수에 대항하나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해학적 갈등이 어우러져 있다.
구성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이용하여 \'나\'의 우직함과 순박한 성품과 행동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표현 : 희극적 상황 설정과 유머러스한 토속적 언어 사용이 뛰어나다.
■ \'점순이\'의 역할과 양면성
이 작품에서 \'점순이\'는 자신의 키를 핑계 삼아 혼례를 미루기만 하는 아버지의 처사에 반발하여 어리숙한 \'나\'를 충동질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에 와서는 이제까지의 반대로 아버지를 편드는 쪽으로 그 역할을 바꾼다.
■ \"봄.봄\"의 어법적 특징
우직하고 해학적인 인물인 \'나\'를 내세워 성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장인과의 다툼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골계적이고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토속적이며 원시적이고 자연적이다. 강원도 지방의 사투리가 엮어 내는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물의 어리숙함이나 고지식함이 그것을 통해 적절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 풍자와 해학
풍자와 해학은 웃음을 동반하는 \'현실 드러내기\'의 한 방법이다.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은 대상에 대한 어조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풍자는 인간 생활 특히 같은 시대의 사회적 결함, 악덕, 우행 등을 지적하여 비꼬는 공격적 문예이고, 해학은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과 익살이 들어 있는 문예이다. 풍자는 서구 문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해학은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사설시조 등에 많이 들어 있다. 김유정의 소설은 고전 문학의 해학성을 계승하여 일제 강점기하의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와 함께 토속적 어휘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듬뿍 독자에게 안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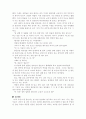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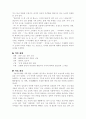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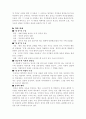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