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순수이성의 사용에 관한 훈련
Ⅲ. 순수이성의 규준
Ⅳ. 순수이성의 건축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Ⅱ. 순수이성의 사용에 관한 훈련
Ⅲ. 순수이성의 규준
Ⅳ. 순수이성의 건축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순수이성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즉 이성의 인식을 역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성적인 것을 다시 수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철학적인 것을 또다시 순수한 철학과 경험적인 철학으로 나눈 후 이상에서 논하였던 바와 같이 형이상학의 체계를 세운 점은 칸트에 있어서 커다란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순수이성의 역사」에 관한 매우 짧으면서도 의의 있는 마지막 절에서 칸트가 관심을 갖는 일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철학적 이론의 서술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철학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성의 법칙에서 발전된 철학적 사고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칸트는 형이상학의 역사적 방향과 변천을 \"세 가지 의도\"
Ibid., B. S. 881.
에서 찾는다.
첫째, \"철학의 대상을 중점에 놓고 볼 때, 자연주의적 사고(감각주의 철학)와 관념론적 사고(지성주의 철학)가 가능하다. 전자는 에피쿠로스를, 후자는 플라톤을 그 노선의 대표자로 칸트는 보고 있다. 또한 전자는 감관(感官)만이 진리와 실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정한 대상은 감성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후자는 오성(悟性)만이 진리와 실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정한 대상은 가상적(可想的)이라는 것이다.
둘째, 순수이성 인식의 원천에 관한 문제를 중점에 놓고 보면, 경험론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에서 인식이
- 231 -
성립한다고 하였고, 지성론자(Noologist)는 이성에서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철학의 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 자연주의 노선과 과학주의 노선을 구분한다. 순수이성의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없이 건전한 이성의 길을 걸으면서 철학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고집하는 자들이다. 과학주의적 방법을 주장한 자들을 볼프처럼 독단적이거나 휴움처럼 회의론적 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나 체계의 이념을 심중에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판적 방법(Kritische Methode)뿐이다. 그것은 칸트가 순수이성의 수많은 시도들을 거친 그의 역사적 발전 가운데서 얻은 철학적 반성의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넷째, 비판적 방법의 본질이 실천이성 우위의 사상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이론 이성의 비판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고, 선험적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의도도 그러한 주장에 귀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결국 실천적이요, 사변이성의 관심조차도 제약된 것임에 불과하며,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이하 K. d. p. V.로 약칭함), (Hambrug :FelixMeiner, 1967), S. 140.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론철학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실천이성의 사고에로 발돋움 해야하고, 이러한 실천이성의 사고가 형이상학적 이념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있어서 「선험적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 결론은 칸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비판을 칸트 사상의 장점과 동시에 공적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첫째 장점으로 보는 점은 형이상학에 있어서 비판의 정신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들은 자기의 인식능력을 무조건으로 믿는데서 과거의 형이상학이 독단적인 허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여기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단과 언어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은 우리들의 인식능력이 자기에게 부과한 중대한 사명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소상히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칸트의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성을 선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자기를 방자와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내세웠던 점과 또 이 때문에 순수이성의 전 철학도 오로지 이 소극적 효용을 문제로 삼았고,
- 232 -
개개의 미망은 검열을 통해서, 오류의 원인은 비판을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도덕적 이념이 신적 존재의 개념을 성립시켰다고 보는 점이다. 이것은 사변적 이성의 신적 존재의 개념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개념이 도덕적인 이성원리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이성의 실천적(도덕적)사용만이 공적을 갖게 된다. 즉, 사변이 공상만 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인식을 우리의 최고 관심과 결합시켜, 이런 인식을 확실히 논증된 교의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성의 본질적 목적에 있어서 단적인 필연적인 전제이도록 하는 공적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형이상학은 인간이성의 일체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다.\"
Ibid., B. S. 897.
라고 보는 점이다. 비록 형이상학이 학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을 도외시하더라도, 형이상학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성의 여러 요소와 최상위의 준칙에 의해서 이성을 고찰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성의 여러 요소와 준칙이란, 약간의 「학」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또 모든 학의 사용에 대해서 그 근저에 두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한 갓 사변으로서 인식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은, 그것의 큰 가치와 품위와 명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칸트에 있어서의 「선험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이성의 완전한 체계를 위한 형식적 조건들을 규정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점들이 우리들의 인식을 철저히 할 수 있겠끔, 즉 사전에 어떠한 오류에도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은 칸트의 큰 공적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 Felix Meiner, (1961)
2. _______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iner, (1967)
3. _______ ,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iner, (1956)
끝으로 「순수이성의 역사」에 관한 매우 짧으면서도 의의 있는 마지막 절에서 칸트가 관심을 갖는 일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철학적 이론의 서술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철학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성의 법칙에서 발전된 철학적 사고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칸트는 형이상학의 역사적 방향과 변천을 \"세 가지 의도\"
Ibid., B. S. 881.
에서 찾는다.
첫째, \"철학의 대상을 중점에 놓고 볼 때, 자연주의적 사고(감각주의 철학)와 관념론적 사고(지성주의 철학)가 가능하다. 전자는 에피쿠로스를, 후자는 플라톤을 그 노선의 대표자로 칸트는 보고 있다. 또한 전자는 감관(感官)만이 진리와 실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정한 대상은 감성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후자는 오성(悟性)만이 진리와 실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정한 대상은 가상적(可想的)이라는 것이다.
둘째, 순수이성 인식의 원천에 관한 문제를 중점에 놓고 보면, 경험론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에서 인식이
- 231 -
성립한다고 하였고, 지성론자(Noologist)는 이성에서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철학의 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 자연주의 노선과 과학주의 노선을 구분한다. 순수이성의 자연주의자들은 과학없이 건전한 이성의 길을 걸으면서 철학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고집하는 자들이다. 과학주의적 방법을 주장한 자들을 볼프처럼 독단적이거나 휴움처럼 회의론적 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나 체계의 이념을 심중에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판적 방법(Kritische Methode)뿐이다. 그것은 칸트가 순수이성의 수많은 시도들을 거친 그의 역사적 발전 가운데서 얻은 철학적 반성의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넷째, 비판적 방법의 본질이 실천이성 우위의 사상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이론 이성의 비판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고, 선험적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의도도 그러한 주장에 귀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결국 실천적이요, 사변이성의 관심조차도 제약된 것임에 불과하며,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이하 K. d. p. V.로 약칭함), (Hambrug :FelixMeiner, 1967), S. 140.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론철학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실천이성의 사고에로 발돋움 해야하고, 이러한 실천이성의 사고가 형이상학적 이념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있어서 「선험적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 결론은 칸트의 사상에 대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비판을 칸트 사상의 장점과 동시에 공적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첫째 장점으로 보는 점은 형이상학에 있어서 비판의 정신을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들은 자기의 인식능력을 무조건으로 믿는데서 과거의 형이상학이 독단적인 허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여기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단과 언어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은 우리들의 인식능력이 자기에게 부과한 중대한 사명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소상히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칸트의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성을 선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자기를 방자와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내세웠던 점과 또 이 때문에 순수이성의 전 철학도 오로지 이 소극적 효용을 문제로 삼았고,
- 232 -
개개의 미망은 검열을 통해서, 오류의 원인은 비판을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도덕적 이념이 신적 존재의 개념을 성립시켰다고 보는 점이다. 이것은 사변적 이성의 신적 존재의 개념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개념이 도덕적인 이성원리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이성의 실천적(도덕적)사용만이 공적을 갖게 된다. 즉, 사변이 공상만 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인식을 우리의 최고 관심과 결합시켜, 이런 인식을 확실히 논증된 교의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성의 본질적 목적에 있어서 단적인 필연적인 전제이도록 하는 공적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형이상학은 인간이성의 일체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다.\"
Ibid., B. S. 897.
라고 보는 점이다. 비록 형이상학이 학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을 도외시하더라도, 형이상학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성의 여러 요소와 최상위의 준칙에 의해서 이성을 고찰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성의 여러 요소와 준칙이란, 약간의 「학」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또 모든 학의 사용에 대해서 그 근저에 두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이상학이 한 갓 사변으로서 인식을 확장시키기보다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은, 그것의 큰 가치와 품위와 명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칸트에 있어서의 「선험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이성의 완전한 체계를 위한 형식적 조건들을 규정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점들이 우리들의 인식을 철저히 할 수 있겠끔, 즉 사전에 어떠한 오류에도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은 칸트의 큰 공적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 Felix Meiner, (1961)
2. _______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iner, (1967)
3. _______ ,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iner,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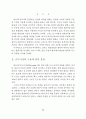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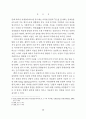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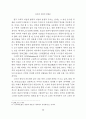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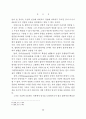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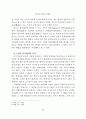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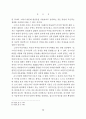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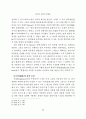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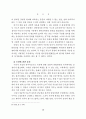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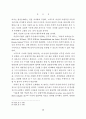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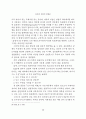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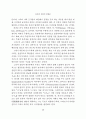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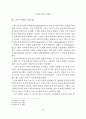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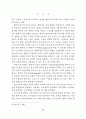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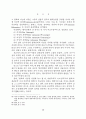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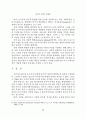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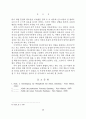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