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한국애니메이션의 역사
3. 일본애니메이션의 역사
4. 한국애니의 과거와 현재 과연 한국 애니의 미래는 있는가?
5. 결론
2. 한국애니메이션의 역사
3. 일본애니메이션의 역사
4. 한국애니의 과거와 현재 과연 한국 애니의 미래는 있는가?
5. 결론
본문내용
는 인물이 가면을 쓰면 샤아 아즈나블 이고 가면을 벗으면 샤아의 강력한 라이벌인 아무로 레이라는 캐릭터라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주흑기사의 파트너로 나오는 여자 역시 가면을 쓰면 가시리아 벗으면 세이라라는 (기시리아는 샤아의 상관이고 세이라는 아무로의 동료이다) 캐릭터를 모방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느낀 황금기는 도금된 황금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캐릭터 디자이너 하나 체계적으로 키우지 않고 우발적으로 만든 캐릭터에 메카닉 디자인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 그저 아무거나 괜찮아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져다 쓰면 그만이라는 아무런 자책감도 없는 그런 몰상식한 발상으로 도금된 황금기였기에 우리의 황금기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그러 들었던 것이다. 캐릭터 및 메카닉 디자인의 도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도금된 황금기 그것이 우리의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황금기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조락 그리고 일본의 약진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점차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은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5공화국의 정권은 문화통제 정책의 하나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SF 애니메이션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TV시리즈의 제작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높아져 가는 애니메이션 팬들의 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초기에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을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단순 하청만이 존재하는 업계로 체질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 어디에서도 TV시리즈를 만들자고 제안해 오지도 않을뿐더러, 제작사 스스로 자기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은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청, 하청이라는 확실한 돈줄을 포기하고 돈도 안 되는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돈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최초의 TV시리즈가 제작되기 시작파면서 까치 시리즈,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자체 제작 노하우 확보는 안중에도 없었던 국내 제작 업계에게 있어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만들 능력은 이미 전무에 가까웠던 것이다. 어차피 많지 않은 제작비가 투입된 TV시리즈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십 수억 원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있어서의 연속된 실패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가를 차갑게 투영해 보여주는 증거였다. 1993년 여름,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슈퍼 차일드\"가 갑자기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고, 1994년에는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한 \"블루시걸\"이 개봉되지만, 이미 눈이 높아진 만화 영화 매니아들이나, 영화평론가, 일반 대중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단지 포르노 영화로서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던 블루시걸만이 관객 동원50만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1995년에 들어서는 \"붉은매(지상월)\"와 \"헝그리 베스트 5(이규형)\",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 개봉된다. 그러나 블루시걸과 슈퍼 차일드의 저급한 동화 퀼리티에 대한 사회적 질책은 이들 세 작품에 일본의 기술 도입을 유도하게 되는데, 붉은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일본 하청을 경험을 가지고 있던 대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적 연출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고, 헝그리 베스트 5는 한술 더 떠서 전제 제작의 3분의 2가 일본의 슬램덩크 제작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사회마저도 일본에서 가질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돌아온 영웅 홍길동\'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캐릭터 디자인과 연출까지 일본인이 맡았고. 심지어 각색 작업에까지 일본인이 참여하는 바람에 결국 95년도의 국산 극장용 만화영화는 \'못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에 불과했던 것이다. 1996년 겨울에 발표된 이현세 원작의 극장용 만화영화 \"아마게돈\"은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제작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흥행에 들어가지만, 꽤 볼만한 그림과 음악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각색 실패로 산만하고, 재미없는 작품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얼어붙어 가던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은 96년 여름에 개봉된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의 비교적 성공적인 흥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회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어 97년 여름은 세 편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연속적으로 개봉되었다. \'전사 라이안\', \'난중일기\', \'임꺽정\'의 세 작품이 극장 개봉되었지만. 그다지 좋은 평을 듣지는 못했다. 이러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덧붙여서, 1997년 겨울에는 두 편의 TV 시리즈가 오랜 제작을 마치고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라젠카\'와 대원에서 제작한 \'녹색전차 해모수\', 두 작품은 비교적 90년대식 애니메이션에 근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 두 작품 모두 그림 면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스토리나 연출 면에서는 여전히 모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8년 봄부터 방영이 시작된 링크 시스템의 \'바이오 캅 윙고\'에 이르러서야 겨우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따름이다.
결 론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환경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력은 세계제일 미국과 일본에 견줄만 하다.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술과 제작자들의 투자로 인한 양질의 좋은 작품의 생산,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창작력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한단계 나아가 세계시장을 노릴수 있을것이다.
한국의 조락 그리고 일본의 약진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점차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은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5공화국의 정권은 문화통제 정책의 하나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SF 애니메이션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TV시리즈의 제작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높아져 가는 애니메이션 팬들의 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나마 초기에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을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단순 하청만이 존재하는 업계로 체질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 어디에서도 TV시리즈를 만들자고 제안해 오지도 않을뿐더러, 제작사 스스로 자기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은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청, 하청이라는 확실한 돈줄을 포기하고 돈도 안 되는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돈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최초의 TV시리즈가 제작되기 시작파면서 까치 시리즈,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자체 제작 노하우 확보는 안중에도 없었던 국내 제작 업계에게 있어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만들 능력은 이미 전무에 가까웠던 것이다. 어차피 많지 않은 제작비가 투입된 TV시리즈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십 수억 원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있어서의 연속된 실패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가를 차갑게 투영해 보여주는 증거였다. 1993년 여름,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슈퍼 차일드\"가 갑자기 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되고, 1994년에는 극장가를 떠들썩하게 한 \"블루시걸\"이 개봉되지만, 이미 눈이 높아진 만화 영화 매니아들이나, 영화평론가, 일반 대중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단지 포르노 영화로서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던 블루시걸만이 관객 동원50만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1995년에 들어서는 \"붉은매(지상월)\"와 \"헝그리 베스트 5(이규형)\", \"돌아온 영웅 홍길동\"이 개봉된다. 그러나 블루시걸과 슈퍼 차일드의 저급한 동화 퀼리티에 대한 사회적 질책은 이들 세 작품에 일본의 기술 도입을 유도하게 되는데, 붉은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일본 하청을 경험을 가지고 있던 대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적 연출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고, 헝그리 베스트 5는 한술 더 떠서 전제 제작의 3분의 2가 일본의 슬램덩크 제작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사회마저도 일본에서 가질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돌아온 영웅 홍길동\'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캐릭터 디자인과 연출까지 일본인이 맡았고. 심지어 각색 작업에까지 일본인이 참여하는 바람에 결국 95년도의 국산 극장용 만화영화는 \'못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에 불과했던 것이다. 1996년 겨울에 발표된 이현세 원작의 극장용 만화영화 \"아마게돈\"은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제작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흥행에 들어가지만, 꽤 볼만한 그림과 음악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각색 실패로 산만하고, 재미없는 작품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얼어붙어 가던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은 96년 여름에 개봉된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의 비교적 성공적인 흥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회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어 97년 여름은 세 편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연속적으로 개봉되었다. \'전사 라이안\', \'난중일기\', \'임꺽정\'의 세 작품이 극장 개봉되었지만. 그다지 좋은 평을 듣지는 못했다. 이러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덧붙여서, 1997년 겨울에는 두 편의 TV 시리즈가 오랜 제작을 마치고 시청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 채널인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라젠카\'와 대원에서 제작한 \'녹색전차 해모수\', 두 작품은 비교적 90년대식 애니메이션에 근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 두 작품 모두 그림 면에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스토리나 연출 면에서는 여전히 모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8년 봄부터 방영이 시작된 링크 시스템의 \'바이오 캅 윙고\'에 이르러서야 겨우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따름이다.
결 론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환경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력은 세계제일 미국과 일본에 견줄만 하다.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발전은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술과 제작자들의 투자로 인한 양질의 좋은 작품의 생산,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창작력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한단계 나아가 세계시장을 노릴수 있을것이다.
추천자료
 (일본영화 감상문) 간장선생과 사무라이픽션을 보고/일본과 한국의 도자기의 비교
(일본영화 감상문) 간장선생과 사무라이픽션을 보고/일본과 한국의 도자기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성문화 비교
한국과 일본의 성문화 비교 한국만화의 일본만화 따라잡기
한국만화의 일본만화 따라잡기 일본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그 차이와 미래
일본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그 차이와 미래  한국과 일본의 FTA관계에 따른 칠례와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FTA관계에 따른 칠례와의 관계 한국음악과 일본음악의 비교
한국음악과 일본음악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PPT자료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PPT자료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일본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본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본문화] 일본의 음식문화 - 음식문화의 특징 및 한국 음식과 비교
[일본문화] 일본의 음식문화 - 음식문화의 특징 및 한국 음식과 비교  [제조업][제조기업][한국 제조기업][미국 제조기업][중국 제조기업]한국의 제조업(제조기업),...
[제조업][제조기업][한국 제조기업][미국 제조기업][중국 제조기업]한국의 제조업(제조기업),... 각 나라별 화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중국,일본,영어,베트남 )발음 습관,한국어 학습시 발...
각 나라별 화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중국,일본,영어,베트남 )발음 습관,한국어 학습시 발... [일본문화의 이해 과제] 일본의 화과자(わがし)와 한국의 한과
[일본문화의 이해 과제] 일본의 화과자(わがし)와 한국의 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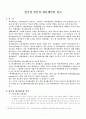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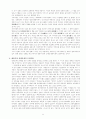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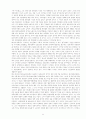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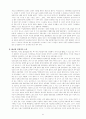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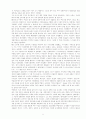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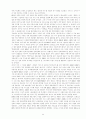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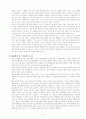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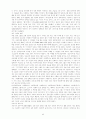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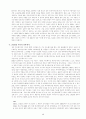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