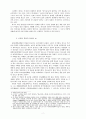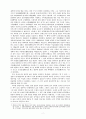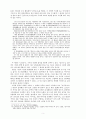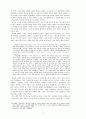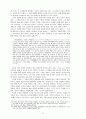목차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시대의 곡절과 일연의 삶
3. 설화로 엮은 산 역사
4. 진정한 불국토로의 길
5.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2. 시대의 곡절과 일연의 삶
3. 설화로 엮은 산 역사
4. 진정한 불국토로의 길
5. 마무리
본문내용
요한 실체다.
) 일연의 불교사상이 민중의 구제를 지향하는 것이었음은 김태영, 김상현 등 여러 논자에 의하여 거듭 논증된 바 있다. 특히 김상현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김상현, 앞의 논문, 43-48면 참조.
경덕왕(景德王) 시절에 강주(康州)--지금의 진주이다. 강주(剛州)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금의 순안이다--의 신도 수십 명이 극락을 구하는 뜻을 두어 고을 경내에 미타사(彌陀寺)를 창건하고, 1만 일을 기약하고 계(契)를 하였다. 이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한 여종이 있어 이름이 욱면(郁面)이었는데,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뜰 가운데 서서 중을 따라 염불하였다. 주인이 그 직분을 모름을 미워하여 매일 곡식 두 섬을 주고 하룻저녁에 찧으라고 하였다. 여종은 일경(一更)에 찧기를 마치고는 절로 가서 염불하는데--속담에 '내 일 바빠서 큰댁 방아 서두른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밤낮을 두고 게으름이 없었다. 그는 뜰의 양 옆에 긴 말뚝을 세운 다음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서 말뚝에 연결해 합장하고는 좌우로 옮기면서 격려하였다. 이때 공중으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있어 "욱면랑은 법당으로 들어 염불하라"고 하였다. 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여종으로 하여금 법당에 들도록 하여 준례대로 정진케 하였다. 얼마 후 서쪽으로부터 하늘의 풍악이 들리더니 여종이 집 서까래를 뚫고 솟아 나가서는 서쪽 교외에 이르러 육신을 버리고 부처님 몸으로 변하여 나타났다. 그는 연대(蓮臺)에 앉아 대광명을 내비치며 천천히 떠나갔는데, 공중에서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은 지금도 뚫어진 자리가 있다고 한다. --이상은 향전(鄕傳)이다--
) 『삼국유사』 권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신분적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층민의 표상으로서의 욱면, 그러나 그는 지극한 신앙심을 통해 산 몸으로 부처가 되었다. 거기에는 이 설화의 전승자로서의 민중의 종교적 구원에 대한 갈망과 집념이 담겨 있다. 그것을 일연이 그대로 살려서 『삼국유사』에 싣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욱면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당대 민중의 구원이라는 높은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본질과 방법론에 있다. 일연에게 있어 구원의 본질이란 기본적으로 고통의 현실으로부터 탈피하여 극락에 가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위의 예에 보듯이 지극한 발원과 수행, 그리고 그에 따라 발휘되는 부처님의 신이한 힘이었다. 현실의 욕망과 영화란 그에게 있어 떨쳐버려야 할 부질없는 것이었다.
) 현세의 욕망이 부질없다는 시각은 유명한 조신(調信)의 꿈에 관한 이야기에 잘 반영돼 있다. 『삼국유사』 권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참조.
현세의 결핍과 고통은 극락에서의 삶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 극락에 갈 수 있다. 지극히 수행하고 발원한다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삼국유사』에 유난히 '신이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삼국유사』의 불교설화들은 부처와 고승의 신이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니와, 그것은 신앙이 낳은 기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위 이야기에서 욱면이 지붕을 뚫고 날아 올라 부처가 되었다는 것도 그 단적인 예다). 이를테면 『삼국유사』는 일종의 신앙 간증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입장은 현실을 극복하는 유효한 논리일 수 있을까? 부처의 권능에 대한 의존을 통해, 기약없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고 모순을 수긍하도록 하는 논리가 아닌가?
아마도 이 문제는 종교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국유사』의 가장 큰 딜렘마가 아닐까 한다. 설화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 그 바탕에는 종교적 세계관이 가로놓여 있었고 재구성된 역사는, 수많은 미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탈현실의 역사, 종교적 기적의 역사로 귀결될 운명을 본질적으로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연과 『삼국유사』의 한계로 규정하기에 앞서 일연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민중의 처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2절에서 언급했듯이 당대 민중은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다. 계속되는 압제와 전란, 싸움과 굶주림 속에서 쓰러지고 있는 백성들……. 말하자면 그것은 그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몸소 피부로 경험한 종교인 일연의 입장에서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란 무엇이었겠는가? 절망을 헤쳐나갈 힘이 되어줄 구원에의 희망과 믿음, 바로 그것이었을 터이다.
신앙을 통한 진정한 불국토의 수립, 그리고 그를 통한 민중의 구원---이는 난세를 살았던 종교인 일연의 지성(至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절망 속의 중생에게 던진 구원의 빛이다. 그가 노구를 마다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삼국유사』를 집필한 참뜻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신 진정한 불국토를 여는 길에 발벗고 나선 고귀한 실천행이었던 것이다.
4. 마무리
조잡하고 허황해 보이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천년이 넘는 민족사를 통째로 되살려내려 한 일연의 원대한 구상은, 훌륭히 성취되었다. 민간의 설화전승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설화 속에 담긴 민중의 인식에 대한 너그러운 포용의 결과였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불국토를 건설하여 고통 속의 중생의 구제하고자 하는 신앙심의 힘이었다. 종교적 편향성을 지닌다는 점은 있지만,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정신사를 이처럼 힘차게 복원한 것은 그 앞에도 뒤에도 없었던 일이다.
『삼국유사』의 편자 일연은 일반적 의미의 작가가 아니다. 그가 수행하고자 한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또는 역사가로서의 소임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문인보다도 더욱 크고 훌륭하게 작가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릴 운명에 있었던 정신적·창조적 유산들이 그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그것을 한데 엮어 그는 고난과 행복, 희망과 믿음이 함께 숨쉬는 광대하고 경이로운 문학세계를 '창조'해냈다.
일연은 고려 후기의 가장 훌륭한 작가 가운데 하나다.
) 일연의 불교사상이 민중의 구제를 지향하는 것이었음은 김태영, 김상현 등 여러 논자에 의하여 거듭 논증된 바 있다. 특히 김상현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김상현, 앞의 논문, 43-48면 참조.
경덕왕(景德王) 시절에 강주(康州)--지금의 진주이다. 강주(剛州)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금의 순안이다--의 신도 수십 명이 극락을 구하는 뜻을 두어 고을 경내에 미타사(彌陀寺)를 창건하고, 1만 일을 기약하고 계(契)를 하였다. 이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한 여종이 있어 이름이 욱면(郁面)이었는데,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뜰 가운데 서서 중을 따라 염불하였다. 주인이 그 직분을 모름을 미워하여 매일 곡식 두 섬을 주고 하룻저녁에 찧으라고 하였다. 여종은 일경(一更)에 찧기를 마치고는 절로 가서 염불하는데--속담에 '내 일 바빠서 큰댁 방아 서두른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밤낮을 두고 게으름이 없었다. 그는 뜰의 양 옆에 긴 말뚝을 세운 다음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꿰어서 말뚝에 연결해 합장하고는 좌우로 옮기면서 격려하였다. 이때 공중으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있어 "욱면랑은 법당으로 들어 염불하라"고 하였다. 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여종으로 하여금 법당에 들도록 하여 준례대로 정진케 하였다. 얼마 후 서쪽으로부터 하늘의 풍악이 들리더니 여종이 집 서까래를 뚫고 솟아 나가서는 서쪽 교외에 이르러 육신을 버리고 부처님 몸으로 변하여 나타났다. 그는 연대(蓮臺)에 앉아 대광명을 내비치며 천천히 떠나갔는데, 공중에서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은 지금도 뚫어진 자리가 있다고 한다. --이상은 향전(鄕傳)이다--
) 『삼국유사』 권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신분적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층민의 표상으로서의 욱면, 그러나 그는 지극한 신앙심을 통해 산 몸으로 부처가 되었다. 거기에는 이 설화의 전승자로서의 민중의 종교적 구원에 대한 갈망과 집념이 담겨 있다. 그것을 일연이 그대로 살려서 『삼국유사』에 싣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욱면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당대 민중의 구원이라는 높은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본질과 방법론에 있다. 일연에게 있어 구원의 본질이란 기본적으로 고통의 현실으로부터 탈피하여 극락에 가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위의 예에 보듯이 지극한 발원과 수행, 그리고 그에 따라 발휘되는 부처님의 신이한 힘이었다. 현실의 욕망과 영화란 그에게 있어 떨쳐버려야 할 부질없는 것이었다.
) 현세의 욕망이 부질없다는 시각은 유명한 조신(調信)의 꿈에 관한 이야기에 잘 반영돼 있다. 『삼국유사』 권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참조.
현세의 결핍과 고통은 극락에서의 삶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 극락에 갈 수 있다. 지극히 수행하고 발원한다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삼국유사』에 유난히 '신이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삼국유사』의 불교설화들은 부처와 고승의 신이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니와, 그것은 신앙이 낳은 기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위 이야기에서 욱면이 지붕을 뚫고 날아 올라 부처가 되었다는 것도 그 단적인 예다). 이를테면 『삼국유사』는 일종의 신앙 간증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입장은 현실을 극복하는 유효한 논리일 수 있을까? 부처의 권능에 대한 의존을 통해, 기약없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통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고 모순을 수긍하도록 하는 논리가 아닌가?
아마도 이 문제는 종교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국유사』의 가장 큰 딜렘마가 아닐까 한다. 설화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 그 바탕에는 종교적 세계관이 가로놓여 있었고 재구성된 역사는, 수많은 미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탈현실의 역사, 종교적 기적의 역사로 귀결될 운명을 본질적으로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연과 『삼국유사』의 한계로 규정하기에 앞서 일연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민중의 처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2절에서 언급했듯이 당대 민중은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다. 계속되는 압제와 전란, 싸움과 굶주림 속에서 쓰러지고 있는 백성들……. 말하자면 그것은 그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몸소 피부로 경험한 종교인 일연의 입장에서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란 무엇이었겠는가? 절망을 헤쳐나갈 힘이 되어줄 구원에의 희망과 믿음, 바로 그것이었을 터이다.
신앙을 통한 진정한 불국토의 수립, 그리고 그를 통한 민중의 구원---이는 난세를 살았던 종교인 일연의 지성(至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절망 속의 중생에게 던진 구원의 빛이다. 그가 노구를 마다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삼국유사』를 집필한 참뜻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신 진정한 불국토를 여는 길에 발벗고 나선 고귀한 실천행이었던 것이다.
4. 마무리
조잡하고 허황해 보이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천년이 넘는 민족사를 통째로 되살려내려 한 일연의 원대한 구상은, 훌륭히 성취되었다. 민간의 설화전승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설화 속에 담긴 민중의 인식에 대한 너그러운 포용의 결과였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불국토를 건설하여 고통 속의 중생의 구제하고자 하는 신앙심의 힘이었다. 종교적 편향성을 지닌다는 점은 있지만,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의 정신사를 이처럼 힘차게 복원한 것은 그 앞에도 뒤에도 없었던 일이다.
『삼국유사』의 편자 일연은 일반적 의미의 작가가 아니다. 그가 수행하고자 한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또는 역사가로서의 소임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문인보다도 더욱 크고 훌륭하게 작가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릴 운명에 있었던 정신적·창조적 유산들이 그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그것을 한데 엮어 그는 고난과 행복, 희망과 믿음이 함께 숨쉬는 광대하고 경이로운 문학세계를 '창조'해냈다.
일연은 고려 후기의 가장 훌륭한 작가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