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규보에 관하여
2. 이규보의 시세계에 관하여
2. 이규보의 시세계에 관하여
본문내용
때려야만 되겠느냐?
소가 네게 무슨 짐이 된다고
도리어 소에게 화를 내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만리 길을 가기도 하니.
너 대신 두 어깨가 피곤하단다.
혀를 헐떡거리며 큰 밭을 갈아 주어
너의 입과 배를 모두 즐기게 해주었네.
이만큼이나 너를
정성껏 섬겨 주었는데도,
너는 게다가
타고 다니기까지 하더구나.
피리를 입에 물고
너는 스스로 즐기지만,
소는 가뜩이나 지쳐서 걸음걸이도 처지는구나.
걸음이 늦다고 게다가 성까지 내서,
회초릴 들어 때린 것이 여러 번일세.
얘야, 때리지 말아라.
소가 가엾구나.
하루아침에 소가 죽으면
네게 무엇이 남겠니?
소 먹이는 아이야,
너는 참말 어리석구나.
무쇠로 만든 소가 아닌데
어찌 더 견디어 내겠느냐?
소를 잘 먹여 튼튼하게 살찌워야할 아이가 오히려 소를 학대하는 것을 빗대어, 당시 관리
들의 학정과 백성의 고통을 시를 통해 재치있게 풍자하고 있다. 백성이 죽어가면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중시하는 이규보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안으로는 나라가 혼란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신종 5년(1202), 경주에서 반란이 있어 군막(軍幕)에서 수제원을 충원하려 했으나 모두 출정하기를 꺼리자 그는 \"내가 비록 유약한 선비이지만 또한 국민이니 국란을 피함이 어찌 장부일까보냐?\"라고 외치고 종군하여 병마녹사로서 수제를 겸하기도 했다. 나라에 대한 충절과 의기가 돋보였던 행동이었다.
壬戌冬十二月從征東幕府行次
天壽寺飮中贈餞客
平生不折春 股. 今日將抽乳虎牙.
破賊朝天參御宴, 紫微宮裡 宣花.
반란군을 토벌하러 나가면서
평생 살면서 메뚜기 다리 하나 건드리지 않았건만
오늘은 어미범 어금니를 뽑겠다고 나섰네.
반란군을 평정하고 임금 베푸신 잔치에 나앉으면
왕궁 안에서 어사화를 꽂겠지.
이규보의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역시 동명왕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서문에서 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 동명왕의 사적을 황당하고 괴이한 일로 치부하고 소홀히 취급한 것을 개탄하고 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적이 황당하고 음란하며 기괴하고 허탄한 일임인데도 백거이의 \'장한가\'로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니, 성(聖)의 이야기인 동명왕의 사적은 더욱 후세 사람들에게 글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때 중국의 위협할 정도로 강대했던 고구려의 시조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남겨 민족의 근원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겠다는 뜻이다. 비록 동명왕편이 무신정권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규보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에는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 마치면서
이규보는 많은 시문을 남겼지만 내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규보라는 한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는 할 수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처음의 무지와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자연과 어우러진 시정, 그 거침없고 당당한 기세, 재치가 담긴 그의 시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규보의 시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 뜻을 펼쳐보고픈 욕구와 초야에 묻혀 술과 시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상을 함께 갖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순이 이규보라는 사람을 세월을 넘어 더욱 인간적으로 와닿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규보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하고 싶다. 이규보가 자호를 백운거사라 고치자 어떤 이가 그 연유를 물었는데 다음의 글은 그의 답이다.
\"... 대저 구름이란 물체는 한가히 떠서 산에도 머물지 않고, 하늘에도 매이지 않으며, 나부껴 동서로 떠다녀 그 형적이 구애받는 바 없네. 경각에 변화하면 그 끝나는 데가 어딘지 알 수 없네. 유연히 펴지는 것은 곧 군자가 세상에 나가는 기상이요, 의연히 걷히는 것은 곧 고인이 세상을 은둔하는 기상이며, 비를 만들어 가뭄을 구제하는 것은 인(仁)이요, 오면 한군데 정착하지 않고 가면 미련을 남기지 않은 것은 통(通)이네. 그리고 빛깔이 푸르거나 붉거나 검은 것은 구름의 정색이 아니요, 오직 화채(華彩)없이 흰 것만이 구름의 정상인 것이네. 덕과 빛깔이 저와 같으니, 만일 저를 사모해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만물에 은덕을 입히고, 집에 들어앉으면 허심탄회하여 그 흰 것을 지키고, 그 정상에 처하여 무성(無聲)·무색(無色)하여 무한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구름이 나인지 내가 구름인지 알 수 없을 것이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소득의 실상에 가깝지 않겠는가?\"
소가 네게 무슨 짐이 된다고
도리어 소에게 화를 내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서
만리 길을 가기도 하니.
너 대신 두 어깨가 피곤하단다.
혀를 헐떡거리며 큰 밭을 갈아 주어
너의 입과 배를 모두 즐기게 해주었네.
이만큼이나 너를
정성껏 섬겨 주었는데도,
너는 게다가
타고 다니기까지 하더구나.
피리를 입에 물고
너는 스스로 즐기지만,
소는 가뜩이나 지쳐서 걸음걸이도 처지는구나.
걸음이 늦다고 게다가 성까지 내서,
회초릴 들어 때린 것이 여러 번일세.
얘야, 때리지 말아라.
소가 가엾구나.
하루아침에 소가 죽으면
네게 무엇이 남겠니?
소 먹이는 아이야,
너는 참말 어리석구나.
무쇠로 만든 소가 아닌데
어찌 더 견디어 내겠느냐?
소를 잘 먹여 튼튼하게 살찌워야할 아이가 오히려 소를 학대하는 것을 빗대어, 당시 관리
들의 학정과 백성의 고통을 시를 통해 재치있게 풍자하고 있다. 백성이 죽어가면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중시하는 이규보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안으로는 나라가 혼란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신종 5년(1202), 경주에서 반란이 있어 군막(軍幕)에서 수제원을 충원하려 했으나 모두 출정하기를 꺼리자 그는 \"내가 비록 유약한 선비이지만 또한 국민이니 국란을 피함이 어찌 장부일까보냐?\"라고 외치고 종군하여 병마녹사로서 수제를 겸하기도 했다. 나라에 대한 충절과 의기가 돋보였던 행동이었다.
壬戌冬十二月從征東幕府行次
天壽寺飮中贈餞客
平生不折春 股. 今日將抽乳虎牙.
破賊朝天參御宴, 紫微宮裡 宣花.
반란군을 토벌하러 나가면서
평생 살면서 메뚜기 다리 하나 건드리지 않았건만
오늘은 어미범 어금니를 뽑겠다고 나섰네.
반란군을 평정하고 임금 베푸신 잔치에 나앉으면
왕궁 안에서 어사화를 꽂겠지.
이규보의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역시 동명왕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서문에서 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 동명왕의 사적을 황당하고 괴이한 일로 치부하고 소홀히 취급한 것을 개탄하고 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적이 황당하고 음란하며 기괴하고 허탄한 일임인데도 백거이의 \'장한가\'로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니, 성(聖)의 이야기인 동명왕의 사적은 더욱 후세 사람들에게 글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때 중국의 위협할 정도로 강대했던 고구려의 시조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남겨 민족의 근원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겠다는 뜻이다. 비록 동명왕편이 무신정권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규보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에는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 마치면서
이규보는 많은 시문을 남겼지만 내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규보라는 한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는 할 수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처음의 무지와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자연과 어우러진 시정, 그 거침없고 당당한 기세, 재치가 담긴 그의 시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규보의 시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 뜻을 펼쳐보고픈 욕구와 초야에 묻혀 술과 시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상을 함께 갖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순이 이규보라는 사람을 세월을 넘어 더욱 인간적으로 와닿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규보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하고 싶다. 이규보가 자호를 백운거사라 고치자 어떤 이가 그 연유를 물었는데 다음의 글은 그의 답이다.
\"... 대저 구름이란 물체는 한가히 떠서 산에도 머물지 않고, 하늘에도 매이지 않으며, 나부껴 동서로 떠다녀 그 형적이 구애받는 바 없네. 경각에 변화하면 그 끝나는 데가 어딘지 알 수 없네. 유연히 펴지는 것은 곧 군자가 세상에 나가는 기상이요, 의연히 걷히는 것은 곧 고인이 세상을 은둔하는 기상이며, 비를 만들어 가뭄을 구제하는 것은 인(仁)이요, 오면 한군데 정착하지 않고 가면 미련을 남기지 않은 것은 통(通)이네. 그리고 빛깔이 푸르거나 붉거나 검은 것은 구름의 정색이 아니요, 오직 화채(華彩)없이 흰 것만이 구름의 정상인 것이네. 덕과 빛깔이 저와 같으니, 만일 저를 사모해 배워서 세상에 나가면 만물에 은덕을 입히고, 집에 들어앉으면 허심탄회하여 그 흰 것을 지키고, 그 정상에 처하여 무성(無聲)·무색(無色)하여 무한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구름이 나인지 내가 구름인지 알 수 없을 것이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소득의 실상에 가깝지 않겠는가?\"
추천자료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세계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세계 만해 한용운의 시적 세계의 특성
만해 한용운의 시적 세계의 특성 '신라초' '동천'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샤머니즘, 유교, 노장사상 등에서 불교로 이어지...
'신라초' '동천'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샤머니즘, 유교, 노장사상 등에서 불교로 이어지... 신라초,동천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샤머니즘, 유교, 노장사상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미당...
신라초,동천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샤머니즘, 유교, 노장사상에서 불교로 이어지는 미당... 박목월 시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화적 시간 및 상징언어
박목월 시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화적 시간 및 상징언어 이용악의 시 세계
이용악의 시 세계 이규보의 삶과 민족 서사시 동명왕편
이규보의 삶과 민족 서사시 동명왕편 황동규 시인의 시 세계관 -풍장을 중심으로
황동규 시인의 시 세계관 -풍장을 중심으로  김현승의 시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작품을 분석 주제의식을 논하시오jo
김현승의 시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작품을 분석 주제의식을 논하시오jo 김현승의 시 세계에 대한 분류 및 각 시기의 주제의식에 대한 대비적인 논의(현대시론)
김현승의 시 세계에 대한 분류 및 각 시기의 주제의식에 대한 대비적인 논의(현대시론) [현대시론]김현승의 시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각 ...
[현대시론]김현승의 시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각 ... [현대시론]김현승 시의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논하...
[현대시론]김현승 시의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누고 시기별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논하... 김현승론 (김현승의 시 세계)
김현승론 (김현승의 시 세계) [인문학] 이재 황윤석의 시 세계
[인문학] 이재 황윤석의 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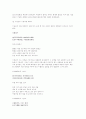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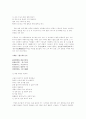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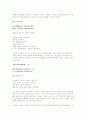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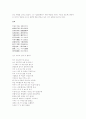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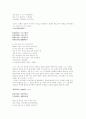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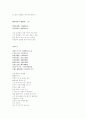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