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회심과 회개의 개념
3. 교회 갱신의 개념
4. 영국의 부흥과 교회 갱신 운동
5. 한국의 부흥과 교회 갱신 운동
6. 결론
2. 회심과 회개의 개념
3. 교회 갱신의 개념
4. 영국의 부흥과 교회 갱신 운동
5. 한국의 부흥과 교회 갱신 운동
6. 결론
본문내용
elical Missions)는 \'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백만 구령 운동\"(The Million Souls Movement)안을 채택했다. 1910년 선천에서 열린 제4회 장로회 독노회도 7인 대표를 선출해서 100만 구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한일 합병된 지 2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처럼 나라를 잃었는데도 백만 구령 운동과 같은 영혼 구원에 전력하도록 함으로써 부흥 운동의 재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교회가 부흥 운동을 재개 또는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1907년 운동은 선교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국 교회는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 선교운동사에서 1907년은 대부흥 운동의 해만 아니라 장로교회 독노회가 조직된 해이며,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해이기도 하다. 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조직한 후에 노회 안에 전도부를 설치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다. 그 첫 전도 사업으로 신학교 졸업생 7명 가운데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2년 후에 장로교회는 최관휼 목사를 불라디보스톡에,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송했으며, 여전도회에서는 이선광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했다. 백만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제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 목사를 서간도에, 방화중 목사를 미국과 맥시코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파송했다.
) S. A. Moffett, The Christians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p. 346.
사실상 장로회신학교 7명의 졸업생 중에 절반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 후에도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 일본, 만주, 러시아 지역으로 파송되어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다졌다. 이처럼 1907년의 교회 부흥 운동을 보면, 폭발적인 회개와 갱신의 열정은 식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운동은 해외 선교 사역으로 이어져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기반을 일찍이 놓은 셈이었다.
6. 결론: 사례 비교
영국의 웨슬레 운동과 한국의 1907년 부흥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우선, 웨슬레 운동은 웨슬레 형제와 조지 휫필드와 같은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고 조직화되었지만 1907년 운동은 몇몇 주동 인물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특정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집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대중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웨슬레 운동은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조직하고 엄격한 율법주의적 규율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1791년에 웨슬레가 사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감리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적어도 70년 동안 지속된 운동이었다. 반면에 1907년 운동은 물론 1903년에 원산에서 여선교사들의 주도 하에 열린 기도회가 그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었으며, 곧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그러든 매우 단기적인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마치 1907년 운동은 그 해에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린 횃불과 같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 운동은 조직화되었는데 비해서 1907년 운동은 비조직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 웨슬레 운동은 협회를 조직해서 평신도 지도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연회, 단, 속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조직화했으며, 평신도들을 안수해서 그러한 조직을 이끄는 담당 지도자로 세웠다. 이 때문에 웨슬레 운동이 영국 국교회와 분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리교회로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조직적 제도적 기반을 운동 기간 중에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907년 운동은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며, 교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연합 집회를 통한 결속을 가져왔다. 또한 1907년 운동은 집회 참석자들을 조직화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각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개최되는 집회가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지 못했다.
두 사례는 이처럼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만 동시에 유사한 점들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두 운동 모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교회를 갱신시키며, 이러한 교회 갱신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두 운동 모두가 회개와 갱신으로 출발한 데는 공통의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18세기의 영국과 1907년의 조선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했다. 그것은 두 사회 모두, 두 교회 모두 어떤 위기 국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18세기의 영국과 영국 교회에는 산업 혁명과 세속적인 사조가 위기를 조성했으며, 1907의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체제의 시작 그리고 봉건 질서의 붕괴와 기존의 유교적 윤리 규범의 해체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사례 모두 위기에서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더 나아가서, 두 사례 모두 회개와 갱신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두 운동은 선교 운동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웨슬레 운동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캐리에 의해 웨슬레 운동은 세계 선교 운동으로 한층 격상되었다. 1907년 운동 역시 연이은 사경회 불길은 잡혔지만 그 때 지펴진 선교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역사를 일궈냈다.
이와 같은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회개, 갱신, 그리고 선교 운동은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회 갱신과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개없는 갱신이 있을 수 없으며, 갱신이 일어나면 반드시 선교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부흥 운동을 재개 또는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1907년 운동은 선교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국 교회는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 선교운동사에서 1907년은 대부흥 운동의 해만 아니라 장로교회 독노회가 조직된 해이며,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해이기도 하다. 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조직한 후에 노회 안에 전도부를 설치하고 전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다. 그 첫 전도 사업으로 신학교 졸업생 7명 가운데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2년 후에 장로교회는 최관휼 목사를 불라디보스톡에,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송했으며, 여전도회에서는 이선광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했다. 백만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김영제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 목사를 서간도에, 방화중 목사를 미국과 맥시코에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파송했다.
) S. A. Moffett, The Christians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p. 346.
사실상 장로회신학교 7명의 졸업생 중에 절반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 후에도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 일본, 만주, 러시아 지역으로 파송되어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다졌다. 이처럼 1907년의 교회 부흥 운동을 보면, 폭발적인 회개와 갱신의 열정은 식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운동은 해외 선교 사역으로 이어져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기반을 일찍이 놓은 셈이었다.
6. 결론: 사례 비교
영국의 웨슬레 운동과 한국의 1907년 부흥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우선, 웨슬레 운동은 웨슬레 형제와 조지 휫필드와 같은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고 조직화되었지만 1907년 운동은 몇몇 주동 인물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특정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집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대중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웨슬레 운동은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조직하고 엄격한 율법주의적 규율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1791년에 웨슬레가 사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 감리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적어도 70년 동안 지속된 운동이었다. 반면에 1907년 운동은 물론 1903년에 원산에서 여선교사들의 주도 하에 열린 기도회가 그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었으며, 곧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그러든 매우 단기적인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마치 1907년 운동은 그 해에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린 횃불과 같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 운동은 조직화되었는데 비해서 1907년 운동은 비조직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 웨슬레 운동은 협회를 조직해서 평신도 지도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연회, 단, 속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조직화했으며, 평신도들을 안수해서 그러한 조직을 이끄는 담당 지도자로 세웠다. 이 때문에 웨슬레 운동이 영국 국교회와 분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리교회로 독자적인 교단을 설립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조직적 제도적 기반을 운동 기간 중에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907년 운동은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며, 교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연합 집회를 통한 결속을 가져왔다. 또한 1907년 운동은 집회 참석자들을 조직화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각성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개최되는 집회가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지 못했다.
두 사례는 이처럼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만 동시에 유사한 점들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두 운동 모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교회를 갱신시키며, 이러한 교회 갱신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두 운동 모두가 회개와 갱신으로 출발한 데는 공통의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18세기의 영국과 1907년의 조선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했다. 그것은 두 사회 모두, 두 교회 모두 어떤 위기 국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18세기의 영국과 영국 교회에는 산업 혁명과 세속적인 사조가 위기를 조성했으며, 1907의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체제의 시작 그리고 봉건 질서의 붕괴와 기존의 유교적 윤리 규범의 해체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사례 모두 위기에서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더 나아가서, 두 사례 모두 회개와 갱신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두 운동은 선교 운동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웨슬레 운동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캐리에 의해 웨슬레 운동은 세계 선교 운동으로 한층 격상되었다. 1907년 운동 역시 연이은 사경회 불길은 잡혔지만 그 때 지펴진 선교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역사를 일궈냈다.
이와 같은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회개, 갱신, 그리고 선교 운동은 이어지는 일련의 연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회 갱신과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개없는 갱신이 있을 수 없으며, 갱신이 일어나면 반드시 선교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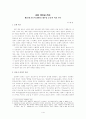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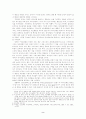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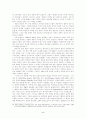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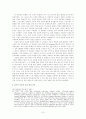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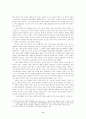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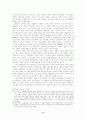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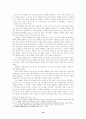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