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헐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
2. 와그너 한국의 아동 생활, Oliphants Ltd., London, 1911.
3.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1895).
4. 왜곡된 견문기
2. 와그너 한국의 아동 생활, Oliphants Ltd., London, 1911.
3.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1895).
4. 왜곡된 견문기
본문내용
과 부 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미덕을 가진 민족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 다. 이밖에도 매장의 풍습과 혼례의 방식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뒤 알데의 기록 중에서 서방인들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린 대목은 한 국의 물산이 풍부하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우수한 모피와 종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약이 발달되어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말도 그는 빠트리지 않았다. 특히 금이 풍부하여 심지어는 옷의 장식까 지도 금으로 입혀 입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장례식은 매우 호화로 우며 많은 부장품을 함께 묻는다는 대목도 서구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한국의 왕릉은 약탈의 일순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에는 과하마라는 특이한 종자의 말이 있는데 이 는 그 말을 타고 과일 나무밑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조랑말을 의 미한다. 땅은 비옥하고 인삼이라는 영약이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 다. 이밖에도 꼬리가 3피트나 되는 닭이 있고 여우의 꼬리털로 만든 붓 이 명품이며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뒤 알데는 서구의 모험가들에게 무한한 약탈심을 부추겼음에 틀림없다. 유태 출신의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E Oppert)가 충남 덕산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기 로 결심한 데에는 이 기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그가 도굴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남긴 \'금단 의 나라 조선 기행\'(1880)이라는 책에는 뒤 알데의 기록이 수없이 인용 되어 있고, 그 길의 안내를 맡았던 사람도 뒤 알데와 마찬가지로 페롱 (Feron)이라는 신부였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의 서구라파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정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특히 서부 개척 시대(gold rush) 가 끝나 태평양 연안에 몰려 바다 너머 동양의 신비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탐험가들로서는 이 책에 써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이야 말로 모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평양 의 왕릉을 도굴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제너널 셔만호 사건(1866)이 발생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한국으로 하여금 쇄국이라는 비상한 조치 를취하게 만들었다. 쇄국 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당시 서세동점 속에서 그것은 위정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었다.
그와 같은 쇄국의 일환으로 조선의 국왕이 취한 정책이 곧 금의 채 광을 법으로 금하는 것이었다. 위정자들은 금이야말로 서구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의 제일 목표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용어로 보석상을 금방이라 부르지 않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은방이라고 불렀던 것도 쇄국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며, 외국인의 약탈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연안 도서로 부터 주민을 소개하는 소위 공도 정책도 이때부터 실시되었고 그 결과 로 연안 어업과 해상권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뒤 알데의 \"조선전\"에 비친 18세기 초엽의 한국의 모습은 서 구의 모험가들로 하여금 약탈의 유혹을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 었다. 그러나 문호 개방과 함께 합법적으로 조선에 상륙하여 조선의 현 실을 목격했을 때 조선에 대한 소문은 과장된 것임을 깨달았고 서서히 조선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결국 대한제국이 멸망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묵시적 방조자가 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뒤 알데의 기록 중에서 서방인들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린 대목은 한 국의 물산이 풍부하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우수한 모피와 종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약이 발달되어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말도 그는 빠트리지 않았다. 특히 금이 풍부하여 심지어는 옷의 장식까 지도 금으로 입혀 입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장례식은 매우 호화로 우며 많은 부장품을 함께 묻는다는 대목도 서구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한국의 왕릉은 약탈의 일순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에는 과하마라는 특이한 종자의 말이 있는데 이 는 그 말을 타고 과일 나무밑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조랑말을 의 미한다. 땅은 비옥하고 인삼이라는 영약이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 다. 이밖에도 꼬리가 3피트나 되는 닭이 있고 여우의 꼬리털로 만든 붓 이 명품이며 각종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뒤 알데는 서구의 모험가들에게 무한한 약탈심을 부추겼음에 틀림없다. 유태 출신의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E Oppert)가 충남 덕산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기 로 결심한 데에는 이 기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그가 도굴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남긴 \'금단 의 나라 조선 기행\'(1880)이라는 책에는 뒤 알데의 기록이 수없이 인용 되어 있고, 그 길의 안내를 맡았던 사람도 뒤 알데와 마찬가지로 페롱 (Feron)이라는 신부였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의 서구라파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정금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특히 서부 개척 시대(gold rush) 가 끝나 태평양 연안에 몰려 바다 너머 동양의 신비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탐험가들로서는 이 책에 써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이야 말로 모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평양 의 왕릉을 도굴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제너널 셔만호 사건(1866)이 발생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한국으로 하여금 쇄국이라는 비상한 조치 를취하게 만들었다. 쇄국 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당시 서세동점 속에서 그것은 위정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서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었다.
그와 같은 쇄국의 일환으로 조선의 국왕이 취한 정책이 곧 금의 채 광을 법으로 금하는 것이었다. 위정자들은 금이야말로 서구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의 제일 목표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용어로 보석상을 금방이라 부르지 않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은방이라고 불렀던 것도 쇄국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며, 외국인의 약탈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연안 도서로 부터 주민을 소개하는 소위 공도 정책도 이때부터 실시되었고 그 결과 로 연안 어업과 해상권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뒤 알데의 \"조선전\"에 비친 18세기 초엽의 한국의 모습은 서 구의 모험가들로 하여금 약탈의 유혹을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 었다. 그러나 문호 개방과 함께 합법적으로 조선에 상륙하여 조선의 현 실을 목격했을 때 조선에 대한 소문은 과장된 것임을 깨달았고 서서히 조선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은 결국 대한제국이 멸망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묵시적 방조자가 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추천자료
 제국주의(帝國主義)
제국주의(帝國主義)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용어정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 종속이론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용어정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 종속이론 원자력제국 - 로버트 융크
원자력제국 - 로버트 융크 몽골세계제국
몽골세계제국 로마제국과 기독교 박해
로마제국과 기독교 박해 영국제국의 형성과 쇠퇴
영국제국의 형성과 쇠퇴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제국주의의 정의, 특징, 고전적 제국주의, 종속이론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제국주의의 정의, 특징, 고전적 제국주의, 종속이론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제국주의의 정의, 특징, 제국주의, 종속이론
제국주의와 종속이론 - 제국주의의 정의, 특징, 제국주의, 종속이론 제국주의 일본인의 정신구조
제국주의 일본인의 정신구조 제국주의 내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암흑의 핵심을 읽고
제국주의 내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암흑의 핵심을 읽고 [그리스 아테네][정치체제][사회계층][살론][그리스 아테네 제국화]그리스 아테네 특징, 그리...
[그리스 아테네][정치체제][사회계층][살론][그리스 아테네 제국화]그리스 아테네 특징, 그리... 문화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 [생산과 사회주의][생산과 마르크스주의][생산과 맑스주의][생산과 자본주의][생산과 제국주...
[생산과 사회주의][생산과 마르크스주의][생산과 맑스주의][생산과 자본주의][생산과 제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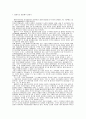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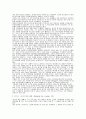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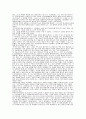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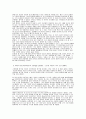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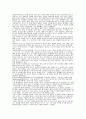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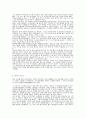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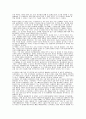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