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기놀이 전승
2. 공기놀이의 여러가지 방법과 자료
3. 현장에서 살펴본 결론
2. 공기놀이의 여러가지 방법과 자료
3. 현장에서 살펴본 결론
본문내용
한 모습으로 전승이 될까 궁금해 할머니와 아이들을 만나보았다. 처음에는 할머니공기와 아이들 공기가 단절되고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태기\'의 많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보태기\'가 자꾸 늘어나는 까닭은 놀이퇴화와 공기놀이를 하는 절대시간이 옛날과 달리 엄청나게 부족한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솜씨\'가 안되니까 생기는 현상이었다.
공기놀이는 여기까지인가 싶었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과 할머니를 만나 \'고비\', \'따로공기\', \'할머니공기의 눈부신 솜씨\', \'할머니공기 속의 이야기 흐름\'을 보고 공기놀이의 지속과 변화의 관계를 읽을 수 있었다. 지속과 변화는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하지, 둘 가운데 하나가 지속이나 변화를 멈추게 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아이공기는 할머니공기의 \'솜씨\'와 \'이야기 흐름\'을 잇고 있었고, 자신들의 공기놀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었다. 이 변화와 창조가 없다면 공기놀이의 지속도 있을 수 없다. 공기놀이에서 보이는 이 변화와 창조야말로 공기놀이의 영원한 지속을 담보해주는 것이다. 할머니공기는 공기놀이 속에 이야기 흐름을 창조했고, 아이공기는 \'고비\'를 만들어 할머니공기 솜씨에 가까이 가려 했고, \'따로공기\'를 만들어 할머니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한 발 앞서가려 해서 공기놀이는 더욱 풍성해졌다. 여기에 나는 가르쳐야만 하는, 사라진 많은 옛날 놀이를 어떻게 지금의 아이들과 만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아주 오래된 숙제를 풀 실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보태기\', \'고비\', \'따로공기\' 사이 또한 변증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퇴화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는 곳에 퇴화가 함께 한다. 퇴화의 길로 공기놀이의 큰 흐름이 가고 있을 때 공기놀이의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은 공기놀이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공기놀이의 전통을 밑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차원의 공기놀이를 창조했다. 많은 아이들이 \'보태기\'를 늘려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고비\'와 \'따로공기\'를 놀고 있었다. 눈물겨운 일이다.
\"공기 받으면 날 가문다.\"는 말이 공기놀이의 재미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농사에 가장 해가 큰, 날 가문다는 재앙에 가까운 말을 듣고도 그만 둘 수 없는 공기놀이의 재미란 컸다. 지금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은 공기놀이를 스스로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를 이 속신어가 잘 설명해준다. 아울러 많은 무리를 무릅쓰고 공기놀이의 솜씨와 차례를 이어 보았다.
놓기→집기→올림이나 공기나 기둥박기→고추장된장이나 꼬깨이→받기→까부리→방충이나 팅금이→빠루나 바지게→밀치기나 빠로→논갈기와 밭갈기→비비기나 쪽쪽이→쌀일기→솥걸기→불때기→밥푸기→밥먹기→물먹기→싸래기나 판치기→알낳기→알품기→알까기→알내리기→닭구둥지리나 닭가두기→굴뚝휘비기나 통시치기→손등치기→재주→채기
공기놀이를 현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기놀이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공기놀이 속에는 세 가닥 이야기 흐름이 있었다. 공기놀이는 단순한 손놀이가 아니다. 공기놀이가 단순한 행위전승이었다면 다른 많은 놀이처럼 전승이 중단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기놀이는 행위전승이면서 구비전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되었다고 본다. 공기놀이 속에 세 가지 이야기 흐름을 찾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하기\'→\'한 가지 물건을 다른 여러 가지 쓰임으로 가지고 놀기\'→\'놀이에 상징과 의미를 붙이기\'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놀이발달 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공기놀이의 세 가지 이야기 흐름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식물의 햇빛이나 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여기 없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고리가 있고, 고리가 잘 이어질 때 아이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공기놀이는 놀이와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논밭을 갈아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먹고, 닭이 알을 낳고 품고 깨고 키우고, 굴뚝을 뚫고 뒷간을 치우는 이야기가 한데 어울려 공기놀이 속에 있다.
아이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노래가 아니더라도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흥얼거린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좀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쭉 뻗어나가다가 휘돌아 나오기도 한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어느새 흥이 나고 신명이 난다. 공기놀이의 솜씨에도 이런 박과 빠르기와 움직임이 살아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빠져들 때 행복을 느낀다.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기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놀이를 즐기기 위해 몰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깊은 참선에 든 선승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몰두할 수 있을 때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마련인데, 아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공기놀이를 만들어냈다.
이런 까닭으로 언니와 누나, 형과 오빠들이 날마다 재미있게 하니까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기놀이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기놀이가 이어져 온 전승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 가리타니 고진(柄谷行人), 「아동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58-159에서 야냐기다 구니오는 어린 아이들이 좀더 큰 아이들의 놀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이 옛 일본 아이들의 놀이법을 계승하기 쉽게 하고 또 잊혀지기 어렵게 한 큰 힘이었다고 썼다. 「아동 풍토기」에서.
시키지 않아도 공기놀이를 스스로 즐기며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또래나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와 함께 하지 않은 놀이는 아이들 세계로 들어와 살아날 수 없다. 다른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오래도록 힘써했기 때문이다. 이야기, 노래,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놀이가 재미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놀이를 여럿이서 자주자주 쉼 없이 애를 써서했기 때문이다. 공기놀이는 바로 그런 놀이이다. 재미를 알고 누리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좀 더 차분한 답사와 공부로 공기놀이의 틈을 채워나가겠다.
공기놀이는 여기까지인가 싶었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과 할머니를 만나 \'고비\', \'따로공기\', \'할머니공기의 눈부신 솜씨\', \'할머니공기 속의 이야기 흐름\'을 보고 공기놀이의 지속과 변화의 관계를 읽을 수 있었다. 지속과 변화는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하지, 둘 가운데 하나가 지속이나 변화를 멈추게 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아이공기는 할머니공기의 \'솜씨\'와 \'이야기 흐름\'을 잇고 있었고, 자신들의 공기놀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었다. 이 변화와 창조가 없다면 공기놀이의 지속도 있을 수 없다. 공기놀이에서 보이는 이 변화와 창조야말로 공기놀이의 영원한 지속을 담보해주는 것이다. 할머니공기는 공기놀이 속에 이야기 흐름을 창조했고, 아이공기는 \'고비\'를 만들어 할머니공기 솜씨에 가까이 가려 했고, \'따로공기\'를 만들어 할머니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한 발 앞서가려 해서 공기놀이는 더욱 풍성해졌다. 여기에 나는 가르쳐야만 하는, 사라진 많은 옛날 놀이를 어떻게 지금의 아이들과 만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아주 오래된 숙제를 풀 실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보태기\', \'고비\', \'따로공기\' 사이 또한 변증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퇴화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는 곳에 퇴화가 함께 한다. 퇴화의 길로 공기놀이의 큰 흐름이 가고 있을 때 공기놀이의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이 있었다. 이 아이들은 공기놀이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공기놀이의 전통을 밑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차원의 공기놀이를 창조했다. 많은 아이들이 \'보태기\'를 늘려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고비\'와 \'따로공기\'를 놀고 있었다. 눈물겨운 일이다.
\"공기 받으면 날 가문다.\"는 말이 공기놀이의 재미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농사에 가장 해가 큰, 날 가문다는 재앙에 가까운 말을 듣고도 그만 둘 수 없는 공기놀이의 재미란 컸다. 지금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은 공기놀이를 스스로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를 이 속신어가 잘 설명해준다. 아울러 많은 무리를 무릅쓰고 공기놀이의 솜씨와 차례를 이어 보았다.
놓기→집기→올림이나 공기나 기둥박기→고추장된장이나 꼬깨이→받기→까부리→방충이나 팅금이→빠루나 바지게→밀치기나 빠로→논갈기와 밭갈기→비비기나 쪽쪽이→쌀일기→솥걸기→불때기→밥푸기→밥먹기→물먹기→싸래기나 판치기→알낳기→알품기→알까기→알내리기→닭구둥지리나 닭가두기→굴뚝휘비기나 통시치기→손등치기→재주→채기
공기놀이를 현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기놀이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려고 한 것이다. 공기놀이 속에는 세 가닥 이야기 흐름이 있었다. 공기놀이는 단순한 손놀이가 아니다. 공기놀이가 단순한 행위전승이었다면 다른 많은 놀이처럼 전승이 중단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기놀이는 행위전승이면서 구비전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되었다고 본다. 공기놀이 속에 세 가지 이야기 흐름을 찾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하기\'→\'한 가지 물건을 다른 여러 가지 쓰임으로 가지고 놀기\'→\'놀이에 상징과 의미를 붙이기\'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놀이발달 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공기놀이의 세 가지 이야기 흐름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식물의 햇빛이나 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여기 없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고리가 있고, 고리가 잘 이어질 때 아이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공기놀이는 놀이와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논밭을 갈아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먹고, 닭이 알을 낳고 품고 깨고 키우고, 굴뚝을 뚫고 뒷간을 치우는 이야기가 한데 어울려 공기놀이 속에 있다.
아이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노래가 아니더라도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흥얼거린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좀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쭉 뻗어나가다가 휘돌아 나오기도 한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어느새 흥이 나고 신명이 난다. 공기놀이의 솜씨에도 이런 박과 빠르기와 움직임이 살아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빠져들 때 행복을 느낀다.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기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놀이를 즐기기 위해 몰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깊은 참선에 든 선승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몰두할 수 있을 때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마련인데, 아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공기놀이를 만들어냈다.
이런 까닭으로 언니와 누나, 형과 오빠들이 날마다 재미있게 하니까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공기놀이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기놀이가 이어져 온 전승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 가리타니 고진(柄谷行人), 「아동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158-159에서 야냐기다 구니오는 어린 아이들이 좀더 큰 아이들의 놀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이 옛 일본 아이들의 놀이법을 계승하기 쉽게 하고 또 잊혀지기 어렵게 한 큰 힘이었다고 썼다. 「아동 풍토기」에서.
시키지 않아도 공기놀이를 스스로 즐기며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또래나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와 함께 하지 않은 놀이는 아이들 세계로 들어와 살아날 수 없다. 다른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오래도록 힘써했기 때문이다. 이야기, 노래,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놀이가 재미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놀이를 여럿이서 자주자주 쉼 없이 애를 써서했기 때문이다. 공기놀이는 바로 그런 놀이이다. 재미를 알고 누리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좀 더 차분한 답사와 공부로 공기놀이의 틈을 채워나가겠다.
추천자료
 한국의 풍속화
한국의 풍속화 비기능용에 대해서
비기능용에 대해서 유야교육과정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야교육과정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한국 민중예술의 흐름
한국 민중예술의 흐름 우리 조상들의 여가생활
우리 조상들의 여가생활 [탈놀이]탈의 연극적 상징성과 미학성에 관한 고찰
[탈놀이]탈의 연극적 상징성과 미학성에 관한 고찰 피아제 이론에 대하여 (인지발달이론)
피아제 이론에 대하여 (인지발달이론) [교육심리학]도덕성 및 성역할 발달에 관한 고찰
[교육심리학]도덕성 및 성역할 발달에 관한 고찰  [절기][세시풍속][24절기]절기의 세시풍속 및 24절기 분석(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
[절기][세시풍속][24절기]절기의 세시풍속 및 24절기 분석(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 [단원 김홍도][풍속화][혜원 신윤복]단원 김홍도의 일생,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풍속화][혜원 신윤복]단원 김홍도의 일생,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단원 김홍도... 겨울 주제, 주제망, 주간 교육 계획안, 현장 학습 계획안, 바깥 놀이 활동 게획안, 교재 교구...
겨울 주제, 주제망, 주간 교육 계획안, 현장 학습 계획안, 바깥 놀이 활동 게획안, 교재 교구... [한국전통문화] 풍속화의 이해와 김흥도의 풍속화 작품 소개(김흥도 풍속화의 특징과 김흥도 ...
[한국전통문화] 풍속화의 이해와 김흥도의 풍속화 작품 소개(김흥도 풍속화의 특징과 김흥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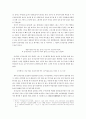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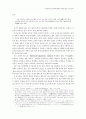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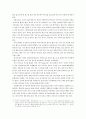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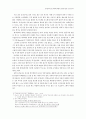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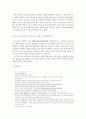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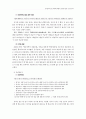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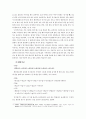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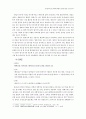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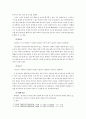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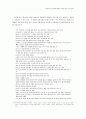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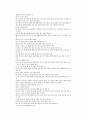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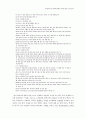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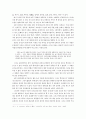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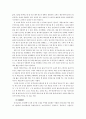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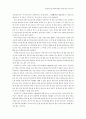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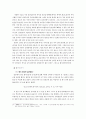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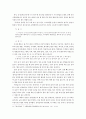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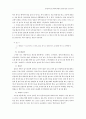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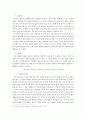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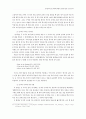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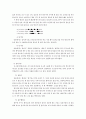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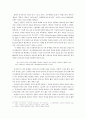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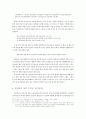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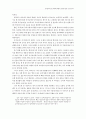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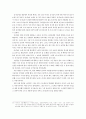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