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지학의 용어
제2장 서지학의 정의 및 용어
2.1 원문서지학(原文書誌學)
2.1.1 정의 및 명칭
2.1.2 중국의 원문서지학 전개
2.1.3 한국의 원문서지학 전개
2.2 체계서지학(體系書誌學)
2.2.1 정의 및 명칭
2.2.2 중국의 체계서지학 전개
2.2.3 한국의 체계서지학 전개
2.2.3.1 판각목록(版刻目錄)
⑴고려시대
⑵조선시대
2.2.3.2 장서목록(藏書目錄)
1)관장목록(官藏目錄)
2)사장목록(私藏目錄)
2.2.3.3 문헌목록(文獻目錄)
2.2.3.4 관찬서목(官撰書目)
2.3 형태서지학(形態書誌學)
2.3.1 정의 및
2.3.2 연구 범위 및 방법
2.3.3 중국의 형태서지학 전개
2.3.4 한국의 형태서지학 전개
제3장 冊의 기원 및 명칭
3.1 冊의 기원
3.1.1 죽간목독(竹簡木牘)
3.1.2 간독(簡牘)의 필사(筆寫)
3.1.4 간독(簡牘)의 편철(編綴)
제4장 책(冊)의 장정(裝訂)
4.1 장정(裝訂) 변천의 개관
4.2 권축장(卷軸裝) 또는 권자본(卷子本)
4.3 절첩장(折帖裝) 또는 선풍엽(旋風葉).
4.4 호접장(蝴蝶裝)
4.5 포배장(包背裝)
4.6 선장(線裝)
제5장 책(冊)의 종류
5.1 책 발달에 따른 종류의 개관
5.2 사본(寫本)
5.3 고본(稿本)
5.2.3 전사본(傳寫本)
5.2.4 사경(寫經)
제2장 서지학의 정의 및 용어
2.1 원문서지학(原文書誌學)
2.1.1 정의 및 명칭
2.1.2 중국의 원문서지학 전개
2.1.3 한국의 원문서지학 전개
2.2 체계서지학(體系書誌學)
2.2.1 정의 및 명칭
2.2.2 중국의 체계서지학 전개
2.2.3 한국의 체계서지학 전개
2.2.3.1 판각목록(版刻目錄)
⑴고려시대
⑵조선시대
2.2.3.2 장서목록(藏書目錄)
1)관장목록(官藏目錄)
2)사장목록(私藏目錄)
2.2.3.3 문헌목록(文獻目錄)
2.2.3.4 관찬서목(官撰書目)
2.3 형태서지학(形態書誌學)
2.3.1 정의 및
2.3.2 연구 범위 및 방법
2.3.3 중국의 형태서지학 전개
2.3.4 한국의 형태서지학 전개
제3장 冊의 기원 및 명칭
3.1 冊의 기원
3.1.1 죽간목독(竹簡木牘)
3.1.2 간독(簡牘)의 필사(筆寫)
3.1.4 간독(簡牘)의 편철(編綴)
제4장 책(冊)의 장정(裝訂)
4.1 장정(裝訂) 변천의 개관
4.2 권축장(卷軸裝) 또는 권자본(卷子本)
4.3 절첩장(折帖裝) 또는 선풍엽(旋風葉).
4.4 호접장(蝴蝶裝)
4.5 포배장(包背裝)
4.6 선장(線裝)
제5장 책(冊)의 종류
5.1 책 발달에 따른 종류의 개관
5.2 사본(寫本)
5.3 고본(稿本)
5.2.3 전사본(傳寫本)
5.2.4 사경(寫經)
본문내용
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사발원경(私發願經)이라 일컬으며, 그 종류는 발원의 내용에 따라 세분된다. 개인이 공덕을 쌓아 부처의 보호와 위력으로 일체의 재앙을 물리치고 수복을 얻고자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공덕경(功德經)이라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극락에서 천도를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명복경(冥福經) 또는 공양경(供養經) 이라 일컫고 있다.
사경의 경문을 쓴 사람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이냐에 따라 일필경(一筆經) 또는 각필경(各筆經)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려사경을 살펴볼 때 개인이 발원하여 사성한 경은 대체로 일필경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각필경은 여러 사람이 경품(經品) 또는 경권(經卷)을 분담하여 사성한 것을 말한다. 각필경에 있어서 一品 또는 一卷씩 나누어 사성한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일품경 또는 일권경이라 일컫기도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돈사(頓寫)하여 완성시키므로 이를 돈사경(頓寫經)이라 일컫기도 한다.
(별도)
관판본(棺板本)/사판본(私板本)/사가판본(私家板本)/사판본(寺板本)
관판본(棺板本)
중앙관서 및 지방관서에서 간인(刊印)한 책을 총칭하여 관판(棺板) 또는 관판본(棺板本)이라 한다. 또 관간본(官刊本), 관본(官本)이라고도 일컫는다.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세조 7년(1461) 6월에 설치되어 성종 2년(1471) 12월에 폐지되기까지 11년간 존속했던 간경도감(刊經都監)이 간인(刊印)한 국역불서(國譯佛書)와 한문불서(漢文佛書)를〈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또는〈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이라 일컫는다.
사찰판본(寺刹板本)
사찰에서 간행한 책을 총칭하여〈사찰판(寺刹板)〉또는〈사찰판본(寺刹板本)〉이라 한다. 사찰이 공양 또는 포교를 위해 간행하거나, 신도들이 공덕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여 간행한 책들이며, 주로 불교경전과 고승의 저술 그리고 불교신앙 및 의식에 필요한 것이 차지하고 있다.
서원판본(書院板本)
유학의 교육기관에는 예부터〈관학(官學)〉과〈사학(私學)〉이 있었으며, 그 중 사학을 〈사숙(私塾)〉,〈학당(學堂)〉,〈서원(書院)〉이라 일컬어 왔다. 그 사학인 서원에서 간인한 책을 바로〈서원판(書院板)〉또는〈서원판본(書院板本)〉이라 한다.
사가판본(私家板本)
개인이 자비로 간인(刊印)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펴낸 책을〈사가판(私家板)〉또는〈사가판본(私家板本)〉이라 일컬으며, 고려시대에는 불서와 문집류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시문집, 전기, 족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각본(坊刻本)
민간이 장사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어낸 책을 종래〈방각본(坊刻本)〉이라 일컬어 왔다. 방(坊)이란 동네 또는 읍리(邑里)의 뜻 이외에 저자(市), 즉 상고무역(商賈貿易)하는 곳을 뜻하며, 여기서는 뒤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뜻으로 방한(坊閒), 방시(坊市), 방사(坊肆), 방고(坊賈)의 용어를 사용한데서 방각본이 관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분 판종
활 자 본
목 판 본
글자위치
(字位)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슴듯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나고, 거꾸로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과 거꾸로 된 것이 없어 비교적 바르다.
글자줄
(字列)
글자줄이 곧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비뚤어졌다.
글자줄이 비교적 정연하다.
글자모양
(字樣)
금속활자에서 동일한 주형으로 만든 것은 꼭 같은 글자모양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활자 만드는 방법이 다른 초기 및 민간의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인 경우는 예외이다.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꼭 같은 글자 모양이 없다. 다만 활자본을 정교하게 번각한 경우에 한하여 비슷한 글자 모양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글자획
(字 )
글자본에 의거 어미자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필요한 수만큼 찍어 부어 내기 때문에 글자획이 고르고 일정하다. 그러나 활자 만드는 방법이 다른 초기 및 민간의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내기 때문에, 글자획의 굵기가 일정치 않고 굵었다 가늘었다 한 것이 대부분이다.
글자사이
(字間)
윗글자와 아랫글자의 사이가 떨어져 있다. 다만 초기의 기술이 미숙했던 활자본에 한하여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획이 서로 엇물린 것이 나타난다.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 획이 서로 맞물린 것이 자주 나타난다.
마멸
(磨滅)
금속활자는 오래 사용하면 글자획이 마멸되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지만 글자획은 붙어 있다. 그러나 목활자는 오래되면 마멸이 심하고 글자획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뭇결이 생긴다.
오래되면 새긴 글자획에 마멸과 나무결이 생기고 심한 것은 글자획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판독하기 어려운 것이 생긴다.
칼자국(刀刻)
또는 너덜이
금속활자는 칼자국이 없고, 주조한 다음 줄로 손질하기 때문에 대체로 글자 끝이 동글동글한 맛이 난다. 민간 활자는 손질이 거칠어 너덜이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만 목활자본에 한하여 글자획에 도각의 흔적과 실수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글자획에 도각의 흔적이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쇠붙이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덜이 같은 것은 없다.
먹색
(墨色)
금속활자본은 먹색이 일반적으로 전하지 않은 편이며, 한 지면에 진하고 엷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활자본은 일반적으로 진한 편이며, 한 지면에 진하고 엷음의 차이가 극단적인 것은 금속활자본과 조건이 같다.
목판본의 먹색은 일반적으로 진한 편이며, 한 지면의 먹색은 진하거나 엷음의 차이없이 순연하다.
반점 또는
번짐
금속활자본은 유연먹을 썼기 때문에 글자의 먹색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반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목활자본은 그렇지 않고 대체로 먹색이 번져 있다.
목판본은 먹색이 진하면서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먹물이 주위에 번져 있다.
어미
(魚尾)
어미와 판심의 좌우계선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고착시킨 인판틀을 사용한 활자본은 예외이다.
목판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어미와 판심의 좌우계선이 붙어 있다.
광곽
(匡郭)
판을 짰기 때문에 광곽의 사주 어딘가에 틈이 있다. 그러나 고착된 인판을 사용한 것은 예외이다.
목판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붙어 있다.
개인이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사발원경(私發願經)이라 일컬으며, 그 종류는 발원의 내용에 따라 세분된다. 개인이 공덕을 쌓아 부처의 보호와 위력으로 일체의 재앙을 물리치고 수복을 얻고자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공덕경(功德經)이라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극락에서 천도를 발원하여 사성한 것을 명복경(冥福經) 또는 공양경(供養經) 이라 일컫고 있다.
사경의 경문을 쓴 사람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이냐에 따라 일필경(一筆經) 또는 각필경(各筆經)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려사경을 살펴볼 때 개인이 발원하여 사성한 경은 대체로 일필경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각필경은 여러 사람이 경품(經品) 또는 경권(經卷)을 분담하여 사성한 것을 말한다. 각필경에 있어서 一品 또는 一卷씩 나누어 사성한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일품경 또는 일권경이라 일컫기도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돈사(頓寫)하여 완성시키므로 이를 돈사경(頓寫經)이라 일컫기도 한다.
(별도)
관판본(棺板本)/사판본(私板本)/사가판본(私家板本)/사판본(寺板本)
관판본(棺板本)
중앙관서 및 지방관서에서 간인(刊印)한 책을 총칭하여 관판(棺板) 또는 관판본(棺板本)이라 한다. 또 관간본(官刊本), 관본(官本)이라고도 일컫는다.
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
세조 7년(1461) 6월에 설치되어 성종 2년(1471) 12월에 폐지되기까지 11년간 존속했던 간경도감(刊經都監)이 간인(刊印)한 국역불서(國譯佛書)와 한문불서(漢文佛書)를〈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또는〈간경도감본(刊經都監本)〉이라 일컫는다.
사찰판본(寺刹板本)
사찰에서 간행한 책을 총칭하여〈사찰판(寺刹板)〉또는〈사찰판본(寺刹板本)〉이라 한다. 사찰이 공양 또는 포교를 위해 간행하거나, 신도들이 공덕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하여 간행한 책들이며, 주로 불교경전과 고승의 저술 그리고 불교신앙 및 의식에 필요한 것이 차지하고 있다.
서원판본(書院板本)
유학의 교육기관에는 예부터〈관학(官學)〉과〈사학(私學)〉이 있었으며, 그 중 사학을 〈사숙(私塾)〉,〈학당(學堂)〉,〈서원(書院)〉이라 일컬어 왔다. 그 사학인 서원에서 간인한 책을 바로〈서원판(書院板)〉또는〈서원판본(書院板本)〉이라 한다.
사가판본(私家板本)
개인이 자비로 간인(刊印)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펴낸 책을〈사가판(私家板)〉또는〈사가판본(私家板本)〉이라 일컬으며, 고려시대에는 불서와 문집류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시문집, 전기, 족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각본(坊刻本)
민간이 장사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어낸 책을 종래〈방각본(坊刻本)〉이라 일컬어 왔다. 방(坊)이란 동네 또는 읍리(邑里)의 뜻 이외에 저자(市), 즉 상고무역(商賈貿易)하는 곳을 뜻하며, 여기서는 뒤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뜻으로 방한(坊閒), 방시(坊市), 방사(坊肆), 방고(坊賈)의 용어를 사용한데서 방각본이 관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분 판종
활 자 본
목 판 본
글자위치
(字位)
글자가 유달리 옆으로 비슴듯하게 기울어진 것이 자주 나타나고, 거꾸로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과 거꾸로 된 것이 없어 비교적 바르다.
글자줄
(字列)
글자줄이 곧바르지 않고 좌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비뚤어졌다.
글자줄이 비교적 정연하다.
글자모양
(字樣)
금속활자에서 동일한 주형으로 만든 것은 꼭 같은 글자모양이 빈번히 나타난다. 그러나 활자 만드는 방법이 다른 초기 및 민간의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인 경우는 예외이다.
동일한 글자라 하더라도 꼭 같은 글자 모양이 없다. 다만 활자본을 정교하게 번각한 경우에 한하여 비슷한 글자 모양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글자획
(字 )
글자본에 의거 어미자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필요한 수만큼 찍어 부어 내기 때문에 글자획이 고르고 일정하다. 그러나 활자 만드는 방법이 다른 초기 및 민간의 금속활자본과 목활자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내기 때문에, 글자획의 굵기가 일정치 않고 굵었다 가늘었다 한 것이 대부분이다.
글자사이
(字間)
윗글자와 아랫글자의 사이가 떨어져 있다. 다만 초기의 기술이 미숙했던 활자본에 한하여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획이 서로 엇물린 것이 나타난다.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 획이 서로 맞물린 것이 자주 나타난다.
마멸
(磨滅)
금속활자는 오래 사용하면 글자획이 마멸되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지만 글자획은 붙어 있다. 그러나 목활자는 오래되면 마멸이 심하고 글자획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뭇결이 생긴다.
오래되면 새긴 글자획에 마멸과 나무결이 생기고 심한 것은 글자획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판독하기 어려운 것이 생긴다.
칼자국(刀刻)
또는 너덜이
금속활자는 칼자국이 없고, 주조한 다음 줄로 손질하기 때문에 대체로 글자 끝이 동글동글한 맛이 난다. 민간 활자는 손질이 거칠어 너덜이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만 목활자본에 한하여 글자획에 도각의 흔적과 실수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글자획에 도각의 흔적이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쇠붙이 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덜이 같은 것은 없다.
먹색
(墨色)
금속활자본은 먹색이 일반적으로 전하지 않은 편이며, 한 지면에 진하고 엷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활자본은 일반적으로 진한 편이며, 한 지면에 진하고 엷음의 차이가 극단적인 것은 금속활자본과 조건이 같다.
목판본의 먹색은 일반적으로 진한 편이며, 한 지면의 먹색은 진하거나 엷음의 차이없이 순연하다.
반점 또는
번짐
금속활자본은 유연먹을 썼기 때문에 글자의 먹색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반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목활자본은 그렇지 않고 대체로 먹색이 번져 있다.
목판본은 먹색이 진하면서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 먹물이 주위에 번져 있다.
어미
(魚尾)
어미와 판심의 좌우계선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고착시킨 인판틀을 사용한 활자본은 예외이다.
목판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어미와 판심의 좌우계선이 붙어 있다.
광곽
(匡郭)
판을 짰기 때문에 광곽의 사주 어딘가에 틈이 있다. 그러나 고착된 인판을 사용한 것은 예외이다.
목판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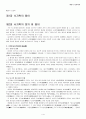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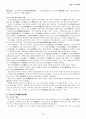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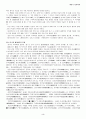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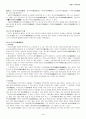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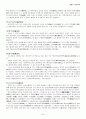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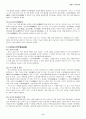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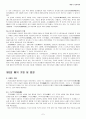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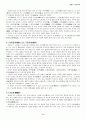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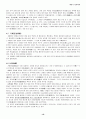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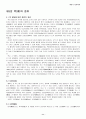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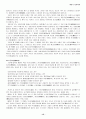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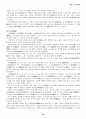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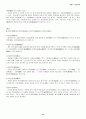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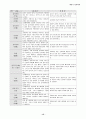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