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생애(生涯).
2. 이제현의 문학관(文學觀)
1). 고려 후기의 사상적(思想的) 배경(背景).
2). 이제현의 유학(儒學) 사상적(思想的) 기조(基調).
3). 이제현의 불교(佛敎) 수용(受容).
4). 이제현의 시(詩)에 대한 인식(認識).
3. 이제현의 문학작품(文學作品)에 반영(反影)된 사상(思想).
1). 이제현의 시세계(詩世界).
2). 소악부(小樂府)
(1) 서경(西京)
(2) 오관산(五冠山)
(3) 월정화(月精花)
(4) 거사련(居士戀)
(5) 사리화(沙里花)
(6) 장암(長巖)
(7) 제위보(濟危寶)
(8) 안동자청(安東紫靑)
(9) 처용(處容)
(10) 정과정(鄭瓜亭)
-완성된 레포트는 아니고 참고자료예요-
2. 이제현의 문학관(文學觀)
1). 고려 후기의 사상적(思想的) 배경(背景).
2). 이제현의 유학(儒學) 사상적(思想的) 기조(基調).
3). 이제현의 불교(佛敎) 수용(受容).
4). 이제현의 시(詩)에 대한 인식(認識).
3. 이제현의 문학작품(文學作品)에 반영(反影)된 사상(思想).
1). 이제현의 시세계(詩世界).
2). 소악부(小樂府)
(1) 서경(西京)
(2) 오관산(五冠山)
(3) 월정화(月精花)
(4) 거사련(居士戀)
(5) 사리화(沙里花)
(6) 장암(長巖)
(7) 제위보(濟危寶)
(8) 안동자청(安東紫靑)
(9) 처용(處容)
(10) 정과정(鄭瓜亭)
-완성된 레포트는 아니고 참고자료예요-
본문내용
까치와 거미를 빌어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까치가 울안 꽃나무 가지에서 지저귀고
거미가 침상에 줄을 늘이니
우리 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에
그 정신이 먼저 사람에게 알리누나
라고 하였다.
정읍사와 선운산가와 그 모티브가 유사하다.(임동권, 한국민요 연구, 반도출판사,1992),
(5) 사리화(沙里花)
가렴 잡세가 번다하고 과중하였으며 토호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이 강탈과 요란을 일삼아 백성들은 곤궁에 빠지고 재정을 손실당하였으므로 이 노래를 지어 참새가 조를 쪼아 먹는다는 말로써 원망하였다.
이 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새야, 노랑 새야!
네 어디서 날아왔기에
일년 지은 이 농사
늙은 홀아비 혼자 갈고 씨 뿌린 줄을 네가 모르고
온 밭 곡식 몽땅 먹고 날아 가느냐?\'
라고 하였다.
농민들의 원성에서 나온 민요였을 것이다.(임동권, 한국민요 연구, 반도출판사,1992),
(6) 장암(長巖)
평장사 두영철이 일찌기 장암으로 귀양갔는데 그 곳에서 한 노인과 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가 소환되어 돌아갈 때 그 노인이 구차하게 벼슬 자리를 탐내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두영철도 그것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직이 올라서 평장사에 이르렀다가 과연 또 죄과에 삐져 귀양가게 되어 지나갈 때 그 노인이 헤어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제현이 시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옹졸한 새도 있구나!
네 어이 그물에 걸렸느냐?
이 새새끼 눈이 어데 붙어 있는지!
가련하다 그물에 걸린 어리석은 새새끼!
라고 하였다.
(7) 제위보(濟危寶)
어떤 부녀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도형(徒刑)을 받아 제위보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에게 그의 손을 잡히였는 바 그 수치를 씻을 길이 없었으므로 이 노래를 지어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였다.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빨래하던 개울 모래터 수양버들 옆에서
내 손 잡고 논정하던 백마 탄 장군
아무리 석달 동안 장마가 진다 한들,
내 손끝에 남은 님의 향기야 가실 수가 있으랴!\'
라고 하였다.
(8) 안동자청(安東紫靑)
여성은 자기 몸으로 한 남편을 섬기는데 한번 자기 몸에 실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한다. 그런 까닭에 이 노래를 지은 것인데, 홍색, 녹색, 청색, 백색 실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타이르면서 자기 몸을 잘 가질 결심을 다지라고 권하는 노래이다.
붉은 실 초록실 그리고 푸른 실
그 모든 잡색실을 왜 쓸가보냐
내 마음 하고자 하는 대로 물들일 수 있기에
내게는 희디흰 실이 제일 좋더라.
(9) 처용(處容)
신라 헌강왕이 학성에서 놀다가 개운포까지 돌아왔을 때 홀연 어떤 한 사람이 기괴한 형용에 이상한 옷을 입고 왕의 앞으로 나와서 노래와 춤으로 왕의 덕을 찬양한 후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 왔다. 자칭 처용이라 부르며 달 밝은 밤마다 저자에서 노래하고 춤추더니 나중에는 그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신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후세 사람도 이상히 여기고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신라 옛 적 처용 노인
저 바다 물 속에서 왔다 하네
자개 이빨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부르며
소리개 어깨, 자주색 소매로
봄바람 맞아 훨훨 춤췄다.\'
라고 하였다.
(10) 정과정(鄭瓜亭)
정과정이란 노래는 내시낭중 정서가 지은 것이다.
정서는 스스로 과정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왕의 외가와 혼인한 관련이 있어서 인종의 사랑을 받았다. 그 후 의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고향 동래로 돌려 보내면서 \'오늘의 걸음은 조정의 공론에 압박되어 하는 일이니 미구에 소환될 것이다\'라고 왕이 말하였다. 정서가 동래에 가 있은 지 오래 되었으나 소환 명령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문고를 어루만지면서 노래 불렀는데 그 가사가 극히 처량하였다.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님 생각하는 눈물
옷깃 적시지 않은 날 없었어라.
봄밤 깊은 산 중의 두견새야!
내 신세도 꼭 너와 같구나!
묻지 말아라! 사람들아
지난 날 나의 잘못을.
다만 내 가슴 알아 주기는
저 조각달과 새벽 별뿐이리라.\'
라고 하였다.
노래의 곡조를 따서 작품명을 삼진작(三眞勺)이라고도 한다. \'아소 님하\'라는 감탄구의 위치가 10구체 향가에 비해 많이 파격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향가가 쇠퇴되어 가던 잔존 형태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내용상 신충의 \'원가\'에 연결시켜지기도 한다.
\'까치가 울안 꽃나무 가지에서 지저귀고
거미가 침상에 줄을 늘이니
우리 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에
그 정신이 먼저 사람에게 알리누나
라고 하였다.
정읍사와 선운산가와 그 모티브가 유사하다.(임동권, 한국민요 연구, 반도출판사,1992),
(5) 사리화(沙里花)
가렴 잡세가 번다하고 과중하였으며 토호들과 권세 잡은 사람들이 강탈과 요란을 일삼아 백성들은 곤궁에 빠지고 재정을 손실당하였으므로 이 노래를 지어 참새가 조를 쪼아 먹는다는 말로써 원망하였다.
이 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새야, 노랑 새야!
네 어디서 날아왔기에
일년 지은 이 농사
늙은 홀아비 혼자 갈고 씨 뿌린 줄을 네가 모르고
온 밭 곡식 몽땅 먹고 날아 가느냐?\'
라고 하였다.
농민들의 원성에서 나온 민요였을 것이다.(임동권, 한국민요 연구, 반도출판사,1992),
(6) 장암(長巖)
평장사 두영철이 일찌기 장암으로 귀양갔는데 그 곳에서 한 노인과 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가 소환되어 돌아갈 때 그 노인이 구차하게 벼슬 자리를 탐내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두영철도 그것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직이 올라서 평장사에 이르렀다가 과연 또 죄과에 삐져 귀양가게 되어 지나갈 때 그 노인이 헤어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제현이 시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옹졸한 새도 있구나!
네 어이 그물에 걸렸느냐?
이 새새끼 눈이 어데 붙어 있는지!
가련하다 그물에 걸린 어리석은 새새끼!
라고 하였다.
(7) 제위보(濟危寶)
어떤 부녀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도형(徒刑)을 받아 제위보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에게 그의 손을 잡히였는 바 그 수치를 씻을 길이 없었으므로 이 노래를 지어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였다.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빨래하던 개울 모래터 수양버들 옆에서
내 손 잡고 논정하던 백마 탄 장군
아무리 석달 동안 장마가 진다 한들,
내 손끝에 남은 님의 향기야 가실 수가 있으랴!\'
라고 하였다.
(8) 안동자청(安東紫靑)
여성은 자기 몸으로 한 남편을 섬기는데 한번 자기 몸에 실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한다. 그런 까닭에 이 노래를 지은 것인데, 홍색, 녹색, 청색, 백색 실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타이르면서 자기 몸을 잘 가질 결심을 다지라고 권하는 노래이다.
붉은 실 초록실 그리고 푸른 실
그 모든 잡색실을 왜 쓸가보냐
내 마음 하고자 하는 대로 물들일 수 있기에
내게는 희디흰 실이 제일 좋더라.
(9) 처용(處容)
신라 헌강왕이 학성에서 놀다가 개운포까지 돌아왔을 때 홀연 어떤 한 사람이 기괴한 형용에 이상한 옷을 입고 왕의 앞으로 나와서 노래와 춤으로 왕의 덕을 찬양한 후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 왔다. 자칭 처용이라 부르며 달 밝은 밤마다 저자에서 노래하고 춤추더니 나중에는 그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신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후세 사람도 이상히 여기고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신라 옛 적 처용 노인
저 바다 물 속에서 왔다 하네
자개 이빨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부르며
소리개 어깨, 자주색 소매로
봄바람 맞아 훨훨 춤췄다.\'
라고 하였다.
(10) 정과정(鄭瓜亭)
정과정이란 노래는 내시낭중 정서가 지은 것이다.
정서는 스스로 과정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왕의 외가와 혼인한 관련이 있어서 인종의 사랑을 받았다. 그 후 의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고향 동래로 돌려 보내면서 \'오늘의 걸음은 조정의 공론에 압박되어 하는 일이니 미구에 소환될 것이다\'라고 왕이 말하였다. 정서가 동래에 가 있은 지 오래 되었으나 소환 명령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문고를 어루만지면서 노래 불렀는데 그 가사가 극히 처량하였다. 이제현이 시로써 표현하기를
\'님 생각하는 눈물
옷깃 적시지 않은 날 없었어라.
봄밤 깊은 산 중의 두견새야!
내 신세도 꼭 너와 같구나!
묻지 말아라! 사람들아
지난 날 나의 잘못을.
다만 내 가슴 알아 주기는
저 조각달과 새벽 별뿐이리라.\'
라고 하였다.
노래의 곡조를 따서 작품명을 삼진작(三眞勺)이라고도 한다. \'아소 님하\'라는 감탄구의 위치가 10구체 향가에 비해 많이 파격적이 되었다는 이유로 향가가 쇠퇴되어 가던 잔존 형태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내용상 신충의 \'원가\'에 연결시켜지기도 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산화환원표준액(0.025N)의 조제
산화환원표준액(0.025N)의 조제 [인공지능]Genetic Algorithm 을 이용해 f(x) = x*sin(10*pi*x)+1.0 의 최대값 구하기
[인공지능]Genetic Algorithm 을 이용해 f(x) = x*sin(10*pi*x)+1.0 의 최대값 구하기 포털은 저물고 웹 2.0이 떴다
포털은 저물고 웹 2.0이 떴다 Web2.0의 기술과 RIA
Web2.0의 기술과 RIA 수치해석(MATLAB 3.0) - Linear system
수치해석(MATLAB 3.0) - Linear system 수치해석(MATLAB 3.0) - Root of equations
수치해석(MATLAB 3.0) - Root of equations 인플루언서 마케팅 - 웹2.0,입소문광고,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
인플루언서 마케팅 - 웹2.0,입소문광고,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 0.1N 염산표준액의 조제 및 표정
0.1N 염산표준액의 조제 및 표정 분석. 실험 - 0.1N NaOH의 역가, 식초의 초산 함량, 과일주스의 유기산 함량, 소금물의 소금 ...
분석. 실험 - 0.1N NaOH의 역가, 식초의 초산 함량, 과일주스의 유기산 함량, 소금물의 소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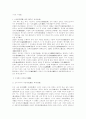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