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우리는 왜 `국가`를 알고자 하는가?
`우리는 왜 `국가`를 알고자 하는가?`?
국가를 규정하는 몇 가지 관점들
2-1.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학습의 의의
2-2. 학습 교안에 대하여
1)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국가론
2) 알튀세르와 풀란차스 그리고 유로코뮤니즘의 국가론
3) 우리 나라의 국가 정치
3. 몇 마디 덧붙이며
`우리는 왜 `국가`를 알고자 하는가?`?
국가를 규정하는 몇 가지 관점들
2-1.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학습의 의의
2-2. 학습 교안에 대하여
1)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국가론
2) 알튀세르와 풀란차스 그리고 유로코뮤니즘의 국가론
3) 우리 나라의 국가 정치
3. 몇 마디 덧붙이며
본문내용
지 않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린 평가는 아니리라고 본다. 교재로 선정된 그들의 글들이 각각 어떤 논의를 제 이론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의 축으로 삼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김영삼정권의 성격규정이나 평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점이 없이 합의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3. 몇 마디 덧붙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구조주의 및 유로코뮤니즘의 국가론 그리고 한국의 국가론 등을 거칠게 - 결코 학술적이라거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 훑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이래의 국가들의 본질과 현상형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논리들과 개념들에 어느 정도 친숙해 질 수가 있었다. 깊이 있는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존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행을 위한 실천을 전제한 최소한의 자기논의는 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람시를 출발로 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고찰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 위의 책, 제1부 그리고 『포스트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등에 실린 관련 논문을 참조할 것.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논의들의 배제는 국가이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이후에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점차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론 학습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정치하고 확대된 시각을 갖추게 할 것이다. 민주주의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논의들과 함께 다양한 이행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 이해의 깊이만을 추구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타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협소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가와 민주주의의 문제가 적어도 情緖적으로 左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해 확장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워서 남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마추어\'인 학회동아리의 세미나는 마냥 그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주제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애써 비판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비판이나 수용은 결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예(비평)론이나, 대중문화론, 난립하는 각종 페미니즘론 그리고 현대철학, 東-西洋의 근현대 역사 등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주제들뿐만 아니라, 미래학이나 환경에 대한 생태론적 논의 등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인 주제들에 대해서와 달리, 정말로 솔직하고 개방적이면서도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들에는 공공연하게 이데올로기적인 마르크스주의를 \'함부로\' 들이댈 수가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경제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잘못된 침투로 인해 고유한 영역을 훼손당하고 있는 분야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벌써 \'流行\'을 벗어난 듯하기는 하지만 대중문화론을 그 일례로 들고 싶다. 물론 그 逆경우도 있을 것이다. \'性정치\'나 \'文化정치\'
미셸 푸코도 미시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접근에는 의외로 신중했다고 한다.
등의 談論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듯하다. 染色體 數가 다른 생물체들을 交配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후의 새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기를 제안(기대)한다.
3. 몇 마디 덧붙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구조주의 및 유로코뮤니즘의 국가론 그리고 한국의 국가론 등을 거칠게 - 결코 학술적이라거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 훑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이래의 국가들의 본질과 현상형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논리들과 개념들에 어느 정도 친숙해 질 수가 있었다. 깊이 있는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존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행을 위한 실천을 전제한 최소한의 자기논의는 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람시를 출발로 한 시민사회론에 대한 고찰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 위의 책, 제1부 그리고 『포스트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등에 실린 관련 논문을 참조할 것.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논의들의 배제는 국가이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이후에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점차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론 학습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정치하고 확대된 시각을 갖추게 할 것이다. 민주주의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논의들과 함께 다양한 이행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 이해의 깊이만을 추구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타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협소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가와 민주주의의 문제가 적어도 情緖적으로 左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해 확장의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워서 남주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마추어\'인 학회동아리의 세미나는 마냥 그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주제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애써 비판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비판이나 수용은 결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예(비평)론이나, 대중문화론, 난립하는 각종 페미니즘론 그리고 현대철학, 東-西洋의 근현대 역사 등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주제들뿐만 아니라, 미래학이나 환경에 대한 생태론적 논의 등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인 주제들에 대해서와 달리, 정말로 솔직하고 개방적이면서도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들에는 공공연하게 이데올로기적인 마르크스주의를 \'함부로\' 들이댈 수가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경제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잘못된 침투로 인해 고유한 영역을 훼손당하고 있는 분야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벌써 \'流行\'을 벗어난 듯하기는 하지만 대중문화론을 그 일례로 들고 싶다. 물론 그 逆경우도 있을 것이다. \'性정치\'나 \'文化정치\'
미셸 푸코도 미시구조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접근에는 의외로 신중했다고 한다.
등의 談論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듯하다. 染色體 數가 다른 생물체들을 交配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후의 새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기를 제안(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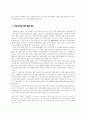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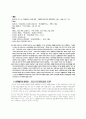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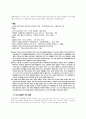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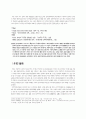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