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끔말
2 몸말
3 맺음말
2 몸말
3 맺음말
본문내용
과 상견(常見)등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설법(說法)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하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집착(執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하살 즉, 대사(大士)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불전해설(佛典解說)\'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p.53 \'소품반야(小品般若) 나십역(羅什譯) 십권(十卷)\' 해설 참조.
4. 중도(中道)를 통한 열반(涅槃)의 경지
다음으로 반야심경에서는 중도(中道)를 말한다. 공의 세계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였다. 생김이 있으면 없어지게 마련이고. 없어지면 또다시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극한 진여(眞如)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가치관은 초월된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논리는 \'인연→공(空)→ 중도\' 라는 도식을 보여 준다. 여기까지는 주로 내 스스로의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리행(自利行)이라고 말하며, 그 다음부터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타행(利他行)이라고 한다. 우선 반야를 가진 중생이 얻는 이익은 열반(涅槃)이다.
열반은 실재의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뇌 망상이 사라진 곳, 그윽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한 삶의 형태이다. 이것은 삼독(三毒 : 食慾. 瞋喪. 愚癡)이 끊어졌다는 의미에서 공이고, 삼학(三學 : 戒學. 定學. 慧學)이 가득 차 있다는 뜻에서 불공(不空)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바로 이 열반의 경지를 얻었으며, 우리의 수행 목표 또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5. 열반에 이르는 문으로서의 반야심경(般若心經)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에 대한 소품반야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어두어야 한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반야바라밀을 수지통독(受持通讀)하면, 혹 전쟁마당의 위급 속에 있더라도 칼과 화살이 마침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반야바라밀은 大神呪요, 無上呪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惡을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惡을 생각하지 않게 하면서 이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면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무슨 부상자가 닥쳐오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외우고 기억하고 행하면 그 불상사(不祥事)가 자취를 감추고 해(害)를 끼치려던 사람도 잘못이 없으므로 물러가 버리고 만다. 아니 반대로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왕국이나 왕자나 그 밖의 권위 있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환희(歡喜)하여 가까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자비심(慈悲心)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 \'불전해설(佛典解說)\'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p.56 \'소품반야(小品般若) 나십역(羅什譯) 십권(十卷)\' 해설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반야바라밀을 신주(神呪)니 명주(明呪)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마력(魔力)이 붙는 문구(文句)거나 쪽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맑고 자비롭고 굳건하고, 고요하고 바른 최고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말미에 있는 진언(眞言)
) 아제아제(揭諦揭諦), 바라아제(婆羅揭諦), 바라승아제(婆羅僧揭諦), 보리사바하(菩提娑婆訶).
은 통상 해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고대의 인도인들은 신비적인 영감(靈感)을 토로한 주문(呪文)들은 해석과 동시에 그 신비성이 상실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 진언 중 가테(gate)는 \'-로 간다\' (to go)의 과거 분사형이고, 스바하(Svaha)는 행운을 비는 축원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갔다! 갔네! 저 언덕에 갔네. 우리 모두 함께 저 (열반의) 언덕에 갔네, 오! 깨달음이여, 축복이 있으라\' 라는 뜻이다. 통상 세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상례이다.
맺음말
반야심경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의 원천(源泉)으로서의 공(空)을 말하고 있다. 또한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한 해탈(解脫),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으며 그로인해 부처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은 나의 구제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듯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반야심경에서는 사람의 해탈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으며 누구든지 깨달음을 통한 열반의 경지, 부처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 대로라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처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
) \'불전해설(佛典解說)\'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p.53 \'소품반야(小品般若) 나십역(羅什譯) 십권(十卷)\' 해설 참조.
4. 중도(中道)를 통한 열반(涅槃)의 경지
다음으로 반야심경에서는 중도(中道)를 말한다. 공의 세계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였다. 생김이 있으면 없어지게 마련이고. 없어지면 또다시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극한 진여(眞如)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가치관은 초월된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논리는 \'인연→공(空)→ 중도\' 라는 도식을 보여 준다. 여기까지는 주로 내 스스로의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리행(自利行)이라고 말하며, 그 다음부터는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타행(利他行)이라고 한다. 우선 반야를 가진 중생이 얻는 이익은 열반(涅槃)이다.
열반은 실재의 세계라기보다는 어떤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번뇌 망상이 사라진 곳, 그윽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한 삶의 형태이다. 이것은 삼독(三毒 : 食慾. 瞋喪. 愚癡)이 끊어졌다는 의미에서 공이고, 삼학(三學 : 戒學. 定學. 慧學)이 가득 차 있다는 뜻에서 불공(不空)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바로 이 열반의 경지를 얻었으며, 우리의 수행 목표 또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5. 열반에 이르는 문으로서의 반야심경(般若心經)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에 대한 소품반야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어두어야 한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반야바라밀을 수지통독(受持通讀)하면, 혹 전쟁마당의 위급 속에 있더라도 칼과 화살이 마침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반야바라밀은 大神呪요, 無上呪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惡을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惡을 생각하지 않게 하면서 이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면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무슨 부상자가 닥쳐오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외우고 기억하고 행하면 그 불상사(不祥事)가 자취를 감추고 해(害)를 끼치려던 사람도 잘못이 없으므로 물러가 버리고 만다. 아니 반대로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왕국이나 왕자나 그 밖의 권위 있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환희(歡喜)하여 가까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자비심(慈悲心)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 \'불전해설(佛典解說)\'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p.56 \'소품반야(小品般若) 나십역(羅什譯) 십권(十卷)\' 해설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반야바라밀을 신주(神呪)니 명주(明呪)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마력(魔力)이 붙는 문구(文句)거나 쪽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맑고 자비롭고 굳건하고, 고요하고 바른 최고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말미에 있는 진언(眞言)
) 아제아제(揭諦揭諦), 바라아제(婆羅揭諦), 바라승아제(婆羅僧揭諦), 보리사바하(菩提娑婆訶).
은 통상 해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고대의 인도인들은 신비적인 영감(靈感)을 토로한 주문(呪文)들은 해석과 동시에 그 신비성이 상실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 진언 중 가테(gate)는 \'-로 간다\' (to go)의 과거 분사형이고, 스바하(Svaha)는 행운을 비는 축원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갔다! 갔네! 저 언덕에 갔네. 우리 모두 함께 저 (열반의) 언덕에 갔네, 오! 깨달음이여, 축복이 있으라\' 라는 뜻이다. 통상 세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상례이다.
맺음말
반야심경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의 원천(源泉)으로서의 공(空)을 말하고 있다. 또한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한 해탈(解脫),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으며 그로인해 부처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은 나의 구제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듯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반야심경에서는 사람의 해탈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으며 누구든지 깨달음을 통한 열반의 경지, 부처가 됨을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 대로라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처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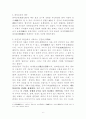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