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필의 위상
2. 형상성과 문학교육론
3. 대상의 의미와 문학교육론
4. 개성의 세계와 문학교육론
5. 수필의 역사적 전개와 문학교육론
6. 문학교육론의 전개를 위하여
2. 형상성과 문학교육론
3. 대상의 의미와 문학교육론
4. 개성의 세계와 문학교육론
5. 수필의 역사적 전개와 문학교육론
6. 문학교육론의 전개를 위하여
본문내용
족의 정기를 읽어 내는 일이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대응 방식으로서 민요를 찾아내고, 시조를 부흥하려 했던 움직임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조국의 山河에 눈을 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민족 정신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역사성과 문학의 역사성을 이해하면서 그 감상의 시선 또한 여기에 주어져야 할 필연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수필이 간명하게 드러내 주는 바를 통해 문학교육의 이론화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암시받는 길이기도 하다.
5. 수필의 역사적 전개와 문학교육론
수필은 그 이론화를 위해 접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왔다. 실제로 문학론에서 가장 소홀한 부분도 이 부분이고, 문학 감상에서도 그저 읽기 자료 정도의 訓 的 독서에 그치고 마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래서 수필은 다소 蕪雜한, 그래서 다소 非文學的인 양식으로 취급되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수필 자체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지 蕪雜性이나 非樣式性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동양의 문학적 전개를 보더라도 수필에 해당하는 양식은 說, 記, 序, 跋, 書 등 매우 다양하며 역사가 悠遠하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표현이 매우 폭넓게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자체의 개성이 참으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러한 다양성이 문학의 여러 양식을 생성시킨 힘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수필의 문학교육론적 미덕은 바로 이 다양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시, 소설, 희곡 등을 문학의 영원 불변하는 정형으로 오해하는 일인데, 수필의 양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사실을 통해서도 문학의 양식은 시대적 삶의 소산이며, 하나의 문화 현상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문학의 양식에 대해 이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문학을 外延이 아닌 內包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다시 말하면 장르의 특성보다는 문학의 본질에서부터 문학교육론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케 해 준다.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장르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문학에 대한 敬遠을 불러 왔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겪은 바 있다.
또한 문학과 일상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필은 많은 시사를 던진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수필가가 출현한 것이 1930년대라고 하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다. 1930년대에 등장한 직업적 수필가로 흔히 李敭河, 金晉燮 등을 드는데, 이들은 다른 문학 작품을 쓰지 않거나 다른 양식에 비해 수필을 더 열심히 썼다는 뜻이지 그것을 원고료를 챙겨 삶을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언제라도 수필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 본 적은 없다.
) 최근에는 수필집 또는 수필적 성격의 글을 모든 책들이 베스트 샐러의 대열에도 끼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작자가 대체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필을 쓴 거의 모든 사람이 선비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또 국문시가 작품을 남긴 鄭澈이나 尹善道 등도 예외없이 수필을 썼다. 오늘날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 옛날에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았던 \'선비\' 또는 \'君子\'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삶의 이상으로 볼 때 그것은 \'市民\' 또는 \'敎養人\'이라는 용어로 대치할
) 김종철, 「교양 독서의 목표」, 『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4, pp. 199-201.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수필을 쓰는 사람을 통틀어 市民 또는 敎養人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수필의 작자가 교양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일은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로 직업의 분화에 따라 작가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형성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문학은 특별한 사람의 所管事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박한 것이지만, 문학교육의 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학은 일상어와 무관하며, 따라서 일상인을 교육하기 위한 일반 보통교육인 국어교육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이다.
이제 그런 착오가 어느 만큼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착각임을 분명히 하는 데도 수필의 작자를 살피는 일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문학이 모든 교양인 및 시민의 소관사임을 분명히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자주적이고 개성적인 삶의 이상을 지닌 모든 사람은 문학의 주역임을 분명히 인식케 하는 문학교육론에 수필은 사실적이고 문화적인 근거가 되어 준다는 데 수필의 문학교육론적 가치가 있다.
6. 문학교육론의 전개를 위하여
수필을 가리켜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說文解字』로 세상사 모두를 풀이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수필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필의 문학성을 의심하게 만든 혐의가 있다. 수필에 대한 접근을 어렵도록 해 준 또 하나의 용어가 \'無形式의 形式\'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수필이 그저 蕪雜한 雜文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 李泰俊의 『文章講話』 이래로 형성된 美文 中心의 글쓰기 문화도 수필을 한갖 손재주 쯤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一助를 하였으며, 서양의 용어법을 빌어다가 重隨筆(essay)이니, 輕隨筆(miscellany)이닌 하는 등의 본질과는 무관한 분류를 시도한 것도 수필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였다. 수필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필은 모름지기 思辨的이고 論理的이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수필론이 아무런 주저없이 주장되기에 이른 것도 그간의 수필에 대한 인식의 소박성과 문학교육론의 미정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수필이 文學論과 文學敎育論의 中核的인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생각의 정당성은 앞에서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본다. 이제 수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문학의 본질에 뿌리를 내린 文學論과 文學敎育論이 활발하고 다채롭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역사성과 문학의 역사성을 이해하면서 그 감상의 시선 또한 여기에 주어져야 할 필연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수필이 간명하게 드러내 주는 바를 통해 문학교육의 이론화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암시받는 길이기도 하다.
5. 수필의 역사적 전개와 문학교육론
수필은 그 이론화를 위해 접근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왔다. 실제로 문학론에서 가장 소홀한 부분도 이 부분이고, 문학 감상에서도 그저 읽기 자료 정도의 訓 的 독서에 그치고 마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래서 수필은 다소 蕪雜한, 그래서 다소 非文學的인 양식으로 취급되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수필 자체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지 蕪雜性이나 非樣式性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동양의 문학적 전개를 보더라도 수필에 해당하는 양식은 說, 記, 序, 跋, 書 등 매우 다양하며 역사가 悠遠하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표현이 매우 폭넓게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자체의 개성이 참으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러한 다양성이 문학의 여러 양식을 생성시킨 힘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수필의 문학교육론적 미덕은 바로 이 다양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시, 소설, 희곡 등을 문학의 영원 불변하는 정형으로 오해하는 일인데, 수필의 양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사실을 통해서도 문학의 양식은 시대적 삶의 소산이며, 하나의 문화 현상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문학의 양식에 대해 이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문학을 外延이 아닌 內包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다시 말하면 장르의 특성보다는 문학의 본질에서부터 문학교육론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케 해 준다.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장르의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문학에 대한 敬遠을 불러 왔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겪은 바 있다.
또한 문학과 일상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필은 많은 시사를 던진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수필가가 출현한 것이 1930년대라고 하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다. 1930년대에 등장한 직업적 수필가로 흔히 李敭河, 金晉燮 등을 드는데, 이들은 다른 문학 작품을 쓰지 않거나 다른 양식에 비해 수필을 더 열심히 썼다는 뜻이지 그것을 원고료를 챙겨 삶을 유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언제라도 수필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 본 적은 없다.
) 최근에는 수필집 또는 수필적 성격의 글을 모든 책들이 베스트 샐러의 대열에도 끼이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작자가 대체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필을 쓴 거의 모든 사람이 선비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또 국문시가 작품을 남긴 鄭澈이나 尹善道 등도 예외없이 수필을 썼다. 오늘날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 옛날에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았던 \'선비\' 또는 \'君子\'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삶의 이상으로 볼 때 그것은 \'市民\' 또는 \'敎養人\'이라는 용어로 대치할
) 김종철, 「교양 독서의 목표」, 『국어교육연구』 창간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4, pp. 199-201.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수필을 쓰는 사람을 통틀어 市民 또는 敎養人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수필의 작자가 교양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일은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로 직업의 분화에 따라 작가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형성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문학은 특별한 사람의 所管事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박한 것이지만, 문학교육의 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학은 일상어와 무관하며, 따라서 일상인을 교육하기 위한 일반 보통교육인 국어교육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이다.
이제 그런 착오가 어느 만큼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착각임을 분명히 하는 데도 수필의 작자를 살피는 일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문학이 모든 교양인 및 시민의 소관사임을 분명히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자주적이고 개성적인 삶의 이상을 지닌 모든 사람은 문학의 주역임을 분명히 인식케 하는 문학교육론에 수필은 사실적이고 문화적인 근거가 되어 준다는 데 수필의 문학교육론적 가치가 있다.
6. 문학교육론의 전개를 위하여
수필을 가리켜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說文解字』로 세상사 모두를 풀이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수필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필의 문학성을 의심하게 만든 혐의가 있다. 수필에 대한 접근을 어렵도록 해 준 또 하나의 용어가 \'無形式의 形式\'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수필이 그저 蕪雜한 雜文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 李泰俊의 『文章講話』 이래로 형성된 美文 中心의 글쓰기 문화도 수필을 한갖 손재주 쯤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一助를 하였으며, 서양의 용어법을 빌어다가 重隨筆(essay)이니, 輕隨筆(miscellany)이닌 하는 등의 본질과는 무관한 분류를 시도한 것도 수필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였다. 수필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필은 모름지기 思辨的이고 論理的이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수필론이 아무런 주저없이 주장되기에 이른 것도 그간의 수필에 대한 인식의 소박성과 문학교육론의 미정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수필이 文學論과 文學敎育論의 中核的인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생각의 정당성은 앞에서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본다. 이제 수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문학의 본질에 뿌리를 내린 文學論과 文學敎育論이 활발하고 다채롭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추천자료
 [문학론][16세기][17세기][친일문학론][현대문학론][문학론][레싱][최재서][조연현 순수문학...
[문학론][16세기][17세기][친일문학론][현대문학론][문학론][레싱][최재서][조연현 순수문학... 문학 해석학의 정의, 문학 해석학의 사상, 리꾀르의 문학 해석학, 문학 해석학의 평가 고찰(...
문학 해석학의 정의, 문학 해석학의 사상, 리꾀르의 문학 해석학, 문학 해석학의 평가 고찰(...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문학교육][상호문화적 학습][키치문학]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의 목적, 문학교육의 과정,...
[문학교육][상호문화적 학습][키치문학]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의 목적, 문학교육의 과정,... [아동문학][장르][교재][민족의식][외국 아동문학]아동문학의 역사, 아동문학의 필요성, 아동...
[아동문학][장르][교재][민족의식][외국 아동문학]아동문학의 역사, 아동문학의 필요성, 아동... [일본문학][토좌일기]일본문학 토좌일기(토사일기)의 의의, 일본문학 토좌일기(토사일기)의 ...
[일본문학][토좌일기]일본문학 토좌일기(토사일기)의 의의, 일본문학 토좌일기(토사일기)의 ... [지역문학][구비문학][지역문학단체][문학운동]지역문학의 개념, 지역문학의 특성, 지역문학...
[지역문학][구비문학][지역문학단체][문학운동]지역문학의 개념, 지역문학의 특성, 지역문학... 온라인문학(사이버문학, 인터넷문학)의 정의와 성격, 온라인문학(사이버문학, 인터넷문학)의 ...
온라인문학(사이버문학, 인터넷문학)의 정의와 성격, 온라인문학(사이버문학, 인터넷문학)의 ... [문학교육][문학수용][열린교육][문학교육의 과제]문학교육의 특성, 문학교육의 구조, 문학교...
[문학교육][문학수용][열린교육][문학교육의 과제]문학교육의 특성, 문학교육의 구조, 문학교... 문학의 개념, 문학의 자율성, 문학의 기능, 문학창작교육(소설창작교육)의 이념, 문학창작교...
문학의 개념, 문학의 자율성, 문학의 기능, 문학창작교육(소설창작교육)의 이념, 문학창작교... [교육론][소학교육론][인간교육론][도덕교육론][민속극교육론][발전교육론][음악교육론][소학...
[교육론][소학교육론][인간교육론][도덕교육론][민속극교육론][발전교육론][음악교육론][소학...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학)의 의의,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학)의 특성,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학)의 의의,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학)의 특성, 낭만주의문학(낭만파문... 흥부전의 교육론 적 접근
흥부전의 교육론 적 접근 [민족문학론] - 해방 후 민족문학론과 비평교육의 과제,민족문학론의 비평교육적 인식,해방이...
[민족문학론] - 해방 후 민족문학론과 비평교육의 과제,민족문학론의 비평교육적 인식,해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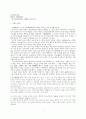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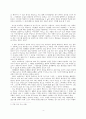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