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다도의 역사
2. 다도의 정신세계
3. 다도의 예법
4. 일본 전통 다도(茶道)
5. 다도에 사용되는 도구
6. 다회를 여는 방식
7. 다실과 정원, 그리고 다회 풍경
2. 다도의 정신세계
3. 다도의 예법
4. 일본 전통 다도(茶道)
5. 다도에 사용되는 도구
6. 다회를 여는 방식
7. 다실과 정원, 그리고 다회 풍경
본문내용
숯불을 피우면 손님들은 숯불이 피는 모습을 감상한다. 주인은 향을 피워 정취를 돋운다. 이어서 준비해두웠던 회석요리를 내어 손님을 대접한다. 회석요리는 잔칫상의 잘 차린 풍성한 요리와 달리, 일시적으로 허기를 달랠 정도 분량의 간단한 식사로 밥 한 주먹, 반찬 한두 가지, 국 한 그릇으로 차린 조촐한 상차람을 말한다. 회석요리를 먹을 때는 술을 곁들이게 되는데,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록 조금만 마신다. 회석요리를 다 먹은 후에 주인은 다과를 낸다. 손님들은 다과를 다 먹은 후에 일단 정원으로 나간다. 중간 휴식을 위한 것이다.
손님들이 나가서 쉬는 사이에 주인은 다실에 걸어두었던 족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꽃을 장식하고 차를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면 주인은 걸어두었던 징을 쳐서 손님들에게 들어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린다. 손님들은 다시 손을 씻고 차례대로 다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주인은 먼저 맛이 진한 차인 농차를 낸다. 이로리에 새로 숯을 얹어 숯불을 다시 일구고 다과는 낸 뒤, 이번에는 맛이 엷은 차인 박차를 낸다. 이 동안에 손님과 주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시도 지속 주인이 다도구나 다실에 대한 감상도 이야기하며 다회를 즐긴다.
보통 다회를 한 차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 시간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손님의 수는 다석 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섯 명 이상 되면 이야깃거리가 분산되거나 손님들이 편을 갈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옆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회에서 무엇을 이야깃거리로 삼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로 창시자의 한 사람인 다케노 조오가 교훈하기를 \"다실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잡담은 금한다.\"고 했다. 다실에서는 금전에 관한 이야기, 남녀관계 이야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등은 금기 사항이다. 시나 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적인 이야깃거리로 삼으며 다실을 통해서 풍류를 즐겨야 한다고 했다.
다실에는 반드시 족자를 걸거나 꽃꽂이를 장식해 둔다. 다실은 차를 마사는 공가닝자 예술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도회지 한가운데 있는 다실의 경우, 다실을 나서면 곧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라고 해도, 다실 안에서는 깊은 산중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 들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다실의 공간은 \'시중에 있는 산거\'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실에 들어감으로써 번접한 일상생활로부터 단정되러, 정신적으로 해방된 예술세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실에서 주인과 손님 또는 손님과 손님의 만남은 매우 소중한 만남으로 여겨야 한다는 정신을 일기일회라 한다. 가령 아무리 여러 번 똑같은 주객이 자리를 함께한다 해도 오늘과 같은 이 자리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며, 그때의 당신이 이미 아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다 해도, 그때의 나와 당신은 지금과 같지 아니하다. 이를 생각하면 만남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은 만사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하며, 손님 또한 이 자리가 두 번 다시없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아서 중인이 객의 취향 등 여러모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회를 진행하여 준 것에 대해 지니심으로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 이것을 일기일회라고 한다. 장난 삼아 차 한잔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찻주전자(다관)
잎차를 우려내는 그릇-다관. 불위에 직접 올려 물을 끓이는 것이 아니며,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 위에달린 윗손잡이형, 뒤에달린 뒷손잡이형, 옆손잡이형으로 구분된다.
찻잔
차를 마시는 잔으로 잔, 구, 종, 완등의 형태가 있다. 찻잔의 모양은 입구쪽이 바닥보다 약간 넓은 것이 마시기에 편하며 흰색 찻잔은 차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찻사발
차잎을 곱게 분말로 만든 말차를 내는 그릇. 다완, 차완이라고 한다
물식힘사발
차의 제맛을 내기 위해 끓인 찻물을 식히는데 사용하는 그릇-숙우. 재탕이나 삼탕의 차를 낼때나 손님이 많을 때 차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식힘사발 또는 귓대사발이라고도 한다.
물버림사발
차를 낼 때 예열을 했던 물이나 남은 차를 버리는 그릇으로 물 버림사발이라고도 하고 개수그릇이라고도 한다
차호
차를 낼 때 찻통의 차를 우릴 만큼만 넣어두는 작은 항아리. 뚜껑 모양에 따라 차호와 차합으로 구분된다.
뚜껑받침
다관 뚜껑이나 차호의 뚜껑을 받쳐 놓는 다구
차거름망
차를 다관에서 따를 때 작은 찻잎 찌꺼기를 걸러주는 다구. 표주박에 망을 씌워 체로 만든것과 대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다.
차칙
차를 다관에 넣을 때 사용하는 찻숟가락 용도의 다구. 대나무의 절반을 쪼개어 만들거나 대나무 뿌리로 만든 것이 있다.
차탁
찻잔받침으로 도자기나 대나무, 등나무, 향나무 등으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 것이 찻잔과 부딪칠 때 충격과 소리를 방지하여 더 좋다. 모양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다.
차선
찻가루와 끓인 물을 저어서 거품을 내어 차와 물이 잘 섞이도록 사용하는 다구. 대나무의 쪼개짐에 따라 80본, 100본, 120본이 있다.
차선꽂이
차선을 꽂아 놓는 다구로 사용후 차선의 모양을 잡아주며 물기가 손잡이 쪽으로 흐르게 하여 곰팡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차선 모양에 잘 맞는 차선 꽂이를 선택해야 하천의 형태를 변함 없 이 잘 보관할 수 있다.
차시
찻통의 차를 떠서 다관에 옮기는 다구. 대나무와 일반 나무를 수저처럼 깎아서 사용하거나 주칠을 한 수저가 사용되기도 한다.찻숟가락이라고도 한다. 말차를 낼 때의 차시는 주칠을 한 차시를 쓰는데 대나무 겉애가 안쪽으로 말아져 가루가 차시에 묻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
차포
찻상 위에 까는 것으로 차를 낼 때 물이 흘러도 차포에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면으로 된 것은 차포라고 하며 대나무나 등나무 껍질로 만든 것은 차석이라고 한다.
차긁개
다관에 우려낸 차찌꺼기를 꺼내기 편리하도록 만든 다구.
차반
찻잔을 담아 나르기 위한 반으로 굽이 없는 쟁반형이 있다.
손님들이 나가서 쉬는 사이에 주인은 다실에 걸어두었던 족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꽃을 장식하고 차를 준비한다. 준비가 끝나면 주인은 걸어두었던 징을 쳐서 손님들에게 들어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린다. 손님들은 다시 손을 씻고 차례대로 다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주인은 먼저 맛이 진한 차인 농차를 낸다. 이로리에 새로 숯을 얹어 숯불을 다시 일구고 다과는 낸 뒤, 이번에는 맛이 엷은 차인 박차를 낸다. 이 동안에 손님과 주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시도 지속 주인이 다도구나 다실에 대한 감상도 이야기하며 다회를 즐긴다.
보통 다회를 한 차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 시간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손님의 수는 다석 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섯 명 이상 되면 이야깃거리가 분산되거나 손님들이 편을 갈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옆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회에서 무엇을 이야깃거리로 삼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로 창시자의 한 사람인 다케노 조오가 교훈하기를 \"다실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잡담은 금한다.\"고 했다. 다실에서는 금전에 관한 이야기, 남녀관계 이야기, 정치에 관한 이야기 등은 금기 사항이다. 시나 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적인 이야깃거리로 삼으며 다실을 통해서 풍류를 즐겨야 한다고 했다.
다실에는 반드시 족자를 걸거나 꽃꽂이를 장식해 둔다. 다실은 차를 마사는 공가닝자 예술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도회지 한가운데 있는 다실의 경우, 다실을 나서면 곧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라고 해도, 다실 안에서는 깊은 산중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 들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다실의 공간은 \'시중에 있는 산거\'와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실에 들어감으로써 번접한 일상생활로부터 단정되러, 정신적으로 해방된 예술세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실에서 주인과 손님 또는 손님과 손님의 만남은 매우 소중한 만남으로 여겨야 한다는 정신을 일기일회라 한다. 가령 아무리 여러 번 똑같은 주객이 자리를 함께한다 해도 오늘과 같은 이 자리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며, 그때의 당신이 이미 아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다 해도, 그때의 나와 당신은 지금과 같지 아니하다. 이를 생각하면 만남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은 만사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하며, 손님 또한 이 자리가 두 번 다시없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아서 중인이 객의 취향 등 여러모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회를 진행하여 준 것에 대해 지니심으로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 이것을 일기일회라고 한다. 장난 삼아 차 한잔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찻주전자(다관)
잎차를 우려내는 그릇-다관. 불위에 직접 올려 물을 끓이는 것이 아니며,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 위에달린 윗손잡이형, 뒤에달린 뒷손잡이형, 옆손잡이형으로 구분된다.
찻잔
차를 마시는 잔으로 잔, 구, 종, 완등의 형태가 있다. 찻잔의 모양은 입구쪽이 바닥보다 약간 넓은 것이 마시기에 편하며 흰색 찻잔은 차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찻사발
차잎을 곱게 분말로 만든 말차를 내는 그릇. 다완, 차완이라고 한다
물식힘사발
차의 제맛을 내기 위해 끓인 찻물을 식히는데 사용하는 그릇-숙우. 재탕이나 삼탕의 차를 낼때나 손님이 많을 때 차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식힘사발 또는 귓대사발이라고도 한다.
물버림사발
차를 낼 때 예열을 했던 물이나 남은 차를 버리는 그릇으로 물 버림사발이라고도 하고 개수그릇이라고도 한다
차호
차를 낼 때 찻통의 차를 우릴 만큼만 넣어두는 작은 항아리. 뚜껑 모양에 따라 차호와 차합으로 구분된다.
뚜껑받침
다관 뚜껑이나 차호의 뚜껑을 받쳐 놓는 다구
차거름망
차를 다관에서 따를 때 작은 찻잎 찌꺼기를 걸러주는 다구. 표주박에 망을 씌워 체로 만든것과 대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다.
차칙
차를 다관에 넣을 때 사용하는 찻숟가락 용도의 다구. 대나무의 절반을 쪼개어 만들거나 대나무 뿌리로 만든 것이 있다.
차탁
찻잔받침으로 도자기나 대나무, 등나무, 향나무 등으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 것이 찻잔과 부딪칠 때 충격과 소리를 방지하여 더 좋다. 모양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이 있다.
차선
찻가루와 끓인 물을 저어서 거품을 내어 차와 물이 잘 섞이도록 사용하는 다구. 대나무의 쪼개짐에 따라 80본, 100본, 120본이 있다.
차선꽂이
차선을 꽂아 놓는 다구로 사용후 차선의 모양을 잡아주며 물기가 손잡이 쪽으로 흐르게 하여 곰팡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차선 모양에 잘 맞는 차선 꽂이를 선택해야 하천의 형태를 변함 없 이 잘 보관할 수 있다.
차시
찻통의 차를 떠서 다관에 옮기는 다구. 대나무와 일반 나무를 수저처럼 깎아서 사용하거나 주칠을 한 수저가 사용되기도 한다.찻숟가락이라고도 한다. 말차를 낼 때의 차시는 주칠을 한 차시를 쓰는데 대나무 겉애가 안쪽으로 말아져 가루가 차시에 묻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
차포
찻상 위에 까는 것으로 차를 낼 때 물이 흘러도 차포에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면으로 된 것은 차포라고 하며 대나무나 등나무 껍질로 만든 것은 차석이라고 한다.
차긁개
다관에 우려낸 차찌꺼기를 꺼내기 편리하도록 만든 다구.
차반
찻잔을 담아 나르기 위한 반으로 굽이 없는 쟁반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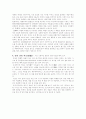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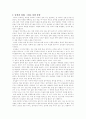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