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교의 유래
2. 유교에 관하여
3 대학(大學)
4. 유교의 윤리사상
5. 제사(祭祀)의 종류 및 의식
6. 유교와 가족 제도
7. 유교의 학문적 변천
8. 유학과 현재 우리들의 삶과 관련성에 대하여
2. 유교에 관하여
3 대학(大學)
4. 유교의 윤리사상
5. 제사(祭祀)의 종류 및 의식
6. 유교와 가족 제도
7. 유교의 학문적 변천
8. 유학과 현재 우리들의 삶과 관련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상산학파(象山學派)라 한다.
3. 양명학(陽明學)
양명학은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이론에 치우친 면을 비판하고 실천을 통하여 마음의 이치를 깨닫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본원유교(本源儒敎)의 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학문적 경향은 명나라의 왕수인(王守仁, 1472-1528)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육구연의 영향을 받아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내세웠다. 이러한 학풍은 한동안 각광을 받기는 했으나, 주자학이 여전히 유학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4. 고증학(考證學)
고증학이란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사실을 토대로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입장으로 유교의 고전적 경서들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고증하는 실학사상이 지배적인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학풍은 명나라 말에 발생하여 청나라에 들어와 새학풍으로 자리잡았다. 이때 기여한 학자로서는 고염무(顧炎武), 염약거(閻若據), 황종희(潢宗羲), 모기령(毛奇齡), 주이존(朱이尊), 왕선지(王船之), 안원(顔元) 등이 있다. 고증학은 유교경전에 대하여 사학, 천문, 지리, 문자, 성운(聲韻), 제도 등의 방면에 걸쳐 정확히 고증하는 경향이었으므로 각 방면이 전문화되어 금문학(今文學), 금석학(金石學), 문자학, 문헌학으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문적 결실은 청나라 건륭(乾隆)황제 때 대총서로서 발간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5. 춘추공양학파와 중화사상
춘추공양학파는 청나라 말에 성행한 학문적 경향으로서 춘추(春秋)의 공양전(公羊傳)을 근거로 이념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漢) 민족의 우월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을 표방한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의 계기는 청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간 한(漢) 민족이 정치적으로는 대항하지는 못하나 학문적으로 유교경전의 이념적인 면을 찾아 주체의식을 기르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한민족이 문화적으로 우세하며 중심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청나라말 강유위(康有爲, 1858-1972)는 불전족회(不纏足會 : 전족의 풍습을 없애고 독립운동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구풍악속(舊風惡俗)의 타파를 부르짖고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브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이념적 정신을 제공하였다. 그는 모든 경건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공자는 중국을 구해낸 교주(敎主)로서 서양의 종교적 체계를 갖추어 공자교(孔子敎)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학과 현재 우리들의 삶과 관련성에 대하여
디지털 법보 <2001.12. 26 / 637호>
논설위원 (신규탁(연세대 교수)) 칼럼 -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역사나 인간의 삶이란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변화는 그럴만한 원인과 인연들의 관계 맺음이 형성되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인과의 고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자 인생관이다. 그리고 그 인과의 고리는 개인과 개인이 모인 집단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고대사회를 이끌던 철학이었던 유교는 발판을 잃었다. 과거제도의 폐지와 축을 같이하여 “사서 삼경”은 이미 지식인의 필수 교양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토플”이나 “토익”이 대신하고 있다. 관·혼·상·제의 의례들에 더 이상 유교가 관여할 틈이 없다. 가면 갈수록 유교는 과거의 유물로서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1000 여 년을 지배해 온 유학의 사상이, 겨우 50 여 년 정도에 완전히 사라질리 는 없다. 남성 중심의 사고나 권위주의적 사회구조 등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다. 이런 문화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수동적인 의미에서 정리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학은 우리 역사에서 긴 세월 속에서 사회와 개인의 삶에 속속들이 배어들어 그것들의 유기적 통합을 관장해 왔다. 새 시대에는 이것에 상응하는 유기적 통합의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예견해 보기도 한다. 거기여는 반드시 지난날에 대한 검토가 수반된다. 지난 50 여 년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유교를 대신하는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통합의 철학이 물러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와 기독교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는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처음에는 이 변화에 대하여 매우 당황을 했었다. 그 결과 내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서 변화를 찾기보다는 표면적인 대응에 그친 점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일요법회가 것이다. 양력을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자연 그렇게 바뀌었다. 왜 절에서 법회를 하는지 역사적 불교적 되물음을 던지기에 앞서 우선 시작하고 봤어야 했다. 찬불가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각각 일요예배나 찬송가에서 모방해 온 것이다. 주지스님을 투표로 선출하고 종단의 대표나 종무담당자를 선임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었다. 예산을 세우고 급료를 지급하는 것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등 기도비를 매월 내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이었다.
막상 이러한 변화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문화와 신문화를 일대일로 갈아 끼는 방식이 많았다. 사회의 구조와 그것을 떠받치는 철학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분명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리하여 헌 집을 수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때움질 공사를 하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숨을 돌려 총체적 계획을 해야 할 때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앞선 사람들의 지혜 덩어리인 전통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워 가야 할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변화를 자신과 주변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진행하면 그 생명은 더욱 번성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마냥 남만을 따라서 변화했다가는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3. 양명학(陽明學)
양명학은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이론에 치우친 면을 비판하고 실천을 통하여 마음의 이치를 깨닫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본원유교(本源儒敎)의 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학문적 경향은 명나라의 왕수인(王守仁, 1472-1528)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육구연의 영향을 받아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내세웠다. 이러한 학풍은 한동안 각광을 받기는 했으나, 주자학이 여전히 유학의 주류를 차지하였다.
4. 고증학(考證學)
고증학이란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사실을 토대로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입장으로 유교의 고전적 경서들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고증하는 실학사상이 지배적인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학풍은 명나라 말에 발생하여 청나라에 들어와 새학풍으로 자리잡았다. 이때 기여한 학자로서는 고염무(顧炎武), 염약거(閻若據), 황종희(潢宗羲), 모기령(毛奇齡), 주이존(朱이尊), 왕선지(王船之), 안원(顔元) 등이 있다. 고증학은 유교경전에 대하여 사학, 천문, 지리, 문자, 성운(聲韻), 제도 등의 방면에 걸쳐 정확히 고증하는 경향이었으므로 각 방면이 전문화되어 금문학(今文學), 금석학(金石學), 문자학, 문헌학으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문적 결실은 청나라 건륭(乾隆)황제 때 대총서로서 발간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5. 춘추공양학파와 중화사상
춘추공양학파는 청나라 말에 성행한 학문적 경향으로서 춘추(春秋)의 공양전(公羊傳)을 근거로 이념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한(漢) 민족의 우월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을 표방한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의 계기는 청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간 한(漢) 민족이 정치적으로는 대항하지는 못하나 학문적으로 유교경전의 이념적인 면을 찾아 주체의식을 기르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한민족이 문화적으로 우세하며 중심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청나라말 강유위(康有爲, 1858-1972)는 불전족회(不纏足會 : 전족의 풍습을 없애고 독립운동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구풍악속(舊風惡俗)의 타파를 부르짖고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브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이념적 정신을 제공하였다. 그는 모든 경건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공자는 중국을 구해낸 교주(敎主)로서 서양의 종교적 체계를 갖추어 공자교(孔子敎)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학과 현재 우리들의 삶과 관련성에 대하여
디지털 법보 <2001.12. 26 / 637호>
논설위원 (신규탁(연세대 교수)) 칼럼 -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역사나 인간의 삶이란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변화는 그럴만한 원인과 인연들의 관계 맺음이 형성되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인과의 고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자 인생관이다. 그리고 그 인과의 고리는 개인과 개인이 모인 집단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고대사회를 이끌던 철학이었던 유교는 발판을 잃었다. 과거제도의 폐지와 축을 같이하여 “사서 삼경”은 이미 지식인의 필수 교양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토플”이나 “토익”이 대신하고 있다. 관·혼·상·제의 의례들에 더 이상 유교가 관여할 틈이 없다. 가면 갈수록 유교는 과거의 유물로서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1000 여 년을 지배해 온 유학의 사상이, 겨우 50 여 년 정도에 완전히 사라질리 는 없다. 남성 중심의 사고나 권위주의적 사회구조 등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다. 이런 문화는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수동적인 의미에서 정리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학은 우리 역사에서 긴 세월 속에서 사회와 개인의 삶에 속속들이 배어들어 그것들의 유기적 통합을 관장해 왔다. 새 시대에는 이것에 상응하는 유기적 통합의 철학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예견해 보기도 한다. 거기여는 반드시 지난날에 대한 검토가 수반된다. 지난 50 여 년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유교를 대신하는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통합의 철학이 물러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와 기독교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는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처음에는 이 변화에 대하여 매우 당황을 했었다. 그 결과 내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서 변화를 찾기보다는 표면적인 대응에 그친 점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일요법회가 것이다. 양력을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자연 그렇게 바뀌었다. 왜 절에서 법회를 하는지 역사적 불교적 되물음을 던지기에 앞서 우선 시작하고 봤어야 했다. 찬불가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각각 일요예배나 찬송가에서 모방해 온 것이다. 주지스님을 투표로 선출하고 종단의 대표나 종무담당자를 선임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었다. 예산을 세우고 급료를 지급하는 것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등 기도비를 매월 내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이었다.
막상 이러한 변화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문화와 신문화를 일대일로 갈아 끼는 방식이 많았다. 사회의 구조와 그것을 떠받치는 철학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분명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리하여 헌 집을 수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때움질 공사를 하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숨을 돌려 총체적 계획을 해야 할 때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앞선 사람들의 지혜 덩어리인 전통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워 가야 할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변화를 자신과 주변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진행하면 그 생명은 더욱 번성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마냥 남만을 따라서 변화했다가는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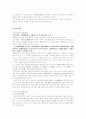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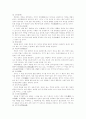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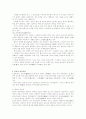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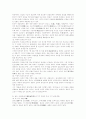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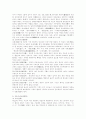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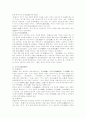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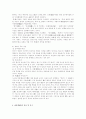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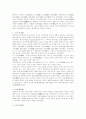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