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국사기 편찬사
(1)삼국사기 편찬사
(2)편찬 참여자
(3) 편찬에 이용된 자료
(4) 편찬 당시의 시대상
(5) 편찬의 목적
(6)삼국사기의 내용
(7) 삼국사기의 서술특징
(8) 현존하는 판본
2 삼국사기의 역사적 성격
(1)삼국사기 편찬사
(2)편찬 참여자
(3) 편찬에 이용된 자료
(4) 편찬 당시의 시대상
(5) 편찬의 목적
(6)삼국사기의 내용
(7) 삼국사기의 서술특징
(8) 현존하는 판본
2 삼국사기의 역사적 성격
본문내용
적인 세력권을 인정하려고 한 사실은 당시 칭제건원론자(稱帝乾元論者)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 되는 까닭이라고 보아야 한다. 백제 관계 기사에도 김부식의 그와 같은 편견으로 삭제 인멸된 부분이 있었을 것은 물론이다. 고구려와 수당관계사(隋唐關係史)의 전개는 북방 새외민족(塞外民族)과 연결되어 중국에 압력을 강화하는 고구려와 중국과의 투쟁이 그것이었으니 고구려의 세력권을 인정하면 『만약 고구려와 더불어 예를 다툰다면 서방의 오랑캐가 어찌 우러러 볼 것인가?』라 한 것과 같이 중국 세력권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신라계인인 김부식은 그러한 당시의 외교관계의 성격에는 외면한 채로, 그리고 위에 말한 사료에는 눈을 감은 채로 기타의 중국측 사료에 의하여 고구려의 항쟁을 비난하는 입장에 섰던 것이니 저절로 사대적인 성격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이다.
김부식의 고대적 체질의 부인과 유교사관의 확립이라는 사학의 성격은 스스로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의 시대폭도 제한하게 되어 저절로 고조선사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얼른 생각하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가 오제(五帝)로부터의 역사 줄거리를 정리하여 한 대사(漢代史) 위에 붙인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고대 문화전통의 체질을 부인하는 입장으로서는 정치기사가 결여되고 신화만이 남아있는 고조선 관계의 전승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신라를 정통으로 잡으려는 그의 입장에서는 『삼국유사』 왕력(王曆)에서 고구려 주몽(朱夢)을 단군지자(檀君之子)라 한 것과 같은 고구려를 정통으로 잡는 고구려계 중심의 전승에는 동조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고조선사의 서술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에 가장 뒤늦은 신라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잡은 것은 진흥왕 6년에 『국사(國史)』를 편찬할 때의 일이든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의 일로 생각되나 『삼국사기』에서는 이것의 불합리를 묵과하고 그 전승을 그대로 채록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고병익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의 인식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삼국사기』는 개인의 사찬이 아니라 사관들의 사찬물이라는 점과 전통적 수사(修史)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관찬에 있어서는 사실(史實)의 날조와 첨삭(添削)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김부식의 사론을 분석해 보면 조선왕조 초기의 관찬사서보다는 유교적 명분론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덜 몰입해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상대적으로 『삼국사기』가 보다 객관성과 자주성 그리고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입장은 이기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교적 도덕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 사관으로 서술된 최초의 업적이며, 따라서 설화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구삼국사』는 물론 편찬의 연대가 뒤늦은 『삼국유사』보다도 오히려 발전된 역사의식과 역사서술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신형식도 긍정론의 입장에서『삼국사기』를 평가하고 있다. 즉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에 있어서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객관적 서술자세를 취하였고 기존 사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과 방언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법속을 지켜주었다고 하였다. 결국 『삼국사기』는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로서 새로운 중세사관의 길을 연 최초의 것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당시로서는 발전된 역사인식, 역사서술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슐츠(Shults)는 『삼국사기』가 사대적인가 자주적인가 하는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떠나 인종대 고려사회의 위기를 반영하여 왕권의 통치권을 확고히 계승할 보다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고려 지배층의 정통성과 고려의 고유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삼국사기』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삼국사기』의 가장 중요한 비판의 대상을 바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포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는 『삼국사기』가 유교적 사대관념에 사로잡혀 자주의식을 몰각하고 고대사의 진취적인 전통을 폄하하여 서술함으로써 길이 후세에 해독을 끼쳤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종교·학술·정치·풍속의 각 방면에 노예성을 낳게 한 \'서경전역(西京轉役 : 묘청의 난)\'의 패배로 인하여 한국사는 독립 진취성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대주의가 팽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사대주의자인 김부식에 의해 사료가 임의로 날조 개작되었다고 『삼국사기』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김철준은 고려사회가 그 전통적 국풍(國風)을 유지하고 있던 초기와는 달리, 중기로 오면서 중앙의 문벌귀족이 북진정책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 체질을 버리고 유교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기층사회와 괴리된 지배욕 속에서 편찬한 것이 『삼국사기』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식적 퇴영적 입장에서 서술된 『삼국사기』는 고려사회가 가지는 전통문화의 체질을 부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삼국시대가 가진 고대문화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성도 『삼국사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서술한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신라중심의 역사편찬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한국사상 북쪽에 있었던 발해를 무시하였고 고려의 정통성의 근거로 신라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하였다.
『삼국사기』는 바로 이러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지배층의 입장이 역사기록에 반영되어 나타난 사서였다. 그런 점에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유교적 역사관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는 한국 역사학 발전의 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편찬목적 때문에, 『삼국사기』는 우리의 고대사회가 어떤 힘에 의헤 유지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깊은 천착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료의 인멸, 전통적인 요소의 홀시, 사대적 성향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한계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계인인 김부식은 그러한 당시의 외교관계의 성격에는 외면한 채로, 그리고 위에 말한 사료에는 눈을 감은 채로 기타의 중국측 사료에 의하여 고구려의 항쟁을 비난하는 입장에 섰던 것이니 저절로 사대적인 성격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이다.
김부식의 고대적 체질의 부인과 유교사관의 확립이라는 사학의 성격은 스스로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의 시대폭도 제한하게 되어 저절로 고조선사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얼른 생각하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가 오제(五帝)로부터의 역사 줄거리를 정리하여 한 대사(漢代史) 위에 붙인 것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고대 문화전통의 체질을 부인하는 입장으로서는 정치기사가 결여되고 신화만이 남아있는 고조선 관계의 전승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신라를 정통으로 잡으려는 그의 입장에서는 『삼국유사』 왕력(王曆)에서 고구려 주몽(朱夢)을 단군지자(檀君之子)라 한 것과 같은 고구려를 정통으로 잡는 고구려계 중심의 전승에는 동조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고조선사의 서술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에 가장 뒤늦은 신라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잡은 것은 진흥왕 6년에 『국사(國史)』를 편찬할 때의 일이든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의 일로 생각되나 『삼국사기』에서는 이것의 불합리를 묵과하고 그 전승을 그대로 채록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고병익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는 당시의 객관적 조건의 인식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삼국사기』는 개인의 사찬이 아니라 사관들의 사찬물이라는 점과 전통적 수사(修史)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관찬에 있어서는 사실(史實)의 날조와 첨삭(添削)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김부식의 사론을 분석해 보면 조선왕조 초기의 관찬사서보다는 유교적 명분론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덜 몰입해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상대적으로 『삼국사기』가 보다 객관성과 자주성 그리고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입장은 이기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교적 도덕주의에 입각한 합리주의 사관으로 서술된 최초의 업적이며, 따라서 설화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구삼국사』는 물론 편찬의 연대가 뒤늦은 『삼국유사』보다도 오히려 발전된 역사의식과 역사서술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신형식도 긍정론의 입장에서『삼국사기』를 평가하고 있다. 즉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에 있어서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객관적 서술자세를 취하였고 기존 사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과 방언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법속을 지켜주었다고 하였다. 결국 『삼국사기』는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로서 새로운 중세사관의 길을 연 최초의 것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당시로서는 발전된 역사인식, 역사서술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슐츠(Shults)는 『삼국사기』가 사대적인가 자주적인가 하는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떠나 인종대 고려사회의 위기를 반영하여 왕권의 통치권을 확고히 계승할 보다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고려 지배층의 정통성과 고려의 고유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삼국사기』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삼국사기』의 가장 중요한 비판의 대상을 바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포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는 『삼국사기』가 유교적 사대관념에 사로잡혀 자주의식을 몰각하고 고대사의 진취적인 전통을 폄하하여 서술함으로써 길이 후세에 해독을 끼쳤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신채호는 우리나라의 종교·학술·정치·풍속의 각 방면에 노예성을 낳게 한 \'서경전역(西京轉役 : 묘청의 난)\'의 패배로 인하여 한국사는 독립 진취성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대주의가 팽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사대주의자인 김부식에 의해 사료가 임의로 날조 개작되었다고 『삼국사기』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김철준은 고려사회가 그 전통적 국풍(國風)을 유지하고 있던 초기와는 달리, 중기로 오면서 중앙의 문벌귀족이 북진정책을 비롯한 전통적 사회 체질을 버리고 유교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기층사회와 괴리된 지배욕 속에서 편찬한 것이 『삼국사기』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식적 퇴영적 입장에서 서술된 『삼국사기』는 고려사회가 가지는 전통문화의 체질을 부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삼국시대가 가진 고대문화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성도 『삼국사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서술한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신라중심의 역사편찬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한국사상 북쪽에 있었던 발해를 무시하였고 고려의 정통성의 근거로 신라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하였다.
『삼국사기』는 바로 이러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지배층의 입장이 역사기록에 반영되어 나타난 사서였다. 그런 점에서 『삼국사기』에 나타난 유교적 역사관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는 한국 역사학 발전의 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편찬목적 때문에, 『삼국사기』는 우리의 고대사회가 어떤 힘에 의헤 유지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깊은 천착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료의 인멸, 전통적인 요소의 홀시, 사대적 성향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한계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천자료
 고구려 5부 체제의 성립과 그 구조
고구려 5부 체제의 성립과 그 구조 월명사와 도솔가, 처용랑과 망해사의 내용풀이와 배경설화, 작품 해석의 문학적 관점, 민속학...
월명사와 도솔가, 처용랑과 망해사의 내용풀이와 배경설화, 작품 해석의 문학적 관점, 민속학... 임나일본부의 정의 및 임나일본부설의 몇가지 치명적인 결함
임나일본부의 정의 및 임나일본부설의 몇가지 치명적인 결함 거문고의 역사,구조,조율과 음역
거문고의 역사,구조,조율과 음역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국문학] 고전문학의 종류별 정의와 설명(향가,속요,시조,가사..) [인문과학] 사기열전을 읽고 나서
[인문과학] 사기열전을 읽고 나서 후삼국 시대의 사회 변천 고찰 - 신분제 변동을 중심으로 -
후삼국 시대의 사회 변천 고찰 - 신분제 변동을 중심으로 - 신라 유학과 설총, 최치원
신라 유학과 설총, 최치원 삼국시대 교육, 통일신라 교육, 고려시대 교육의 각각의 특징과 내용 분석
삼국시대 교육, 통일신라 교육, 고려시대 교육의 각각의 특징과 내용 분석 고려 전기의 문학과 작가
고려 전기의 문학과 작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일 고려 귀족문화의 발달과 통일신라의 발전
고려 귀족문화의 발달과 통일신라의 발전  기말고사 일본문화의 이해
기말고사 일본문화의 이해 향가 혹은 사뇌가의 성격에 대하여
향가 혹은 사뇌가의 성격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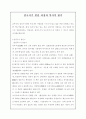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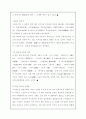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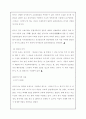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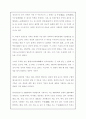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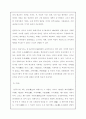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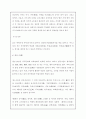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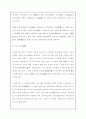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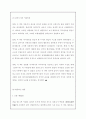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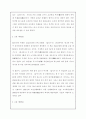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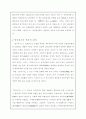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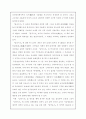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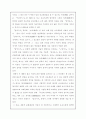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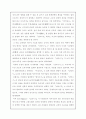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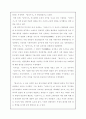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