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홍길동전>의 간략한 줄거리......
2.임란 이후 소설에 나타난 사회수용양상
3.소설양식
4.《홍길동전》에 나타난 현실문제
5.《홍길동전》에서의 논란거리
6. 홍길동전의 주제
7.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의
2.임란 이후 소설에 나타난 사회수용양상
3.소설양식
4.《홍길동전》에 나타난 현실문제
5.《홍길동전》에서의 논란거리
6. 홍길동전의 주제
7.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의
본문내용
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길동이 왕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획득한 채 조선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서 독자적인 사회를 만든다는 \'홍길동전\'의 결말은 이러한 의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결국 왕의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의식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동기를 촉발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홍길동전》에서의 논란거리
\'홍길동전\' 작품생산의 현장인 역사적 현실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당대의 현실을 작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작자 논란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蛟山 許筠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것은 동시대의 후배인 澤堂 李植(1584∼1647)의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어 \'수호전\'에 비겼다.\"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다.
\'홍길동전\'에 관한 언급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들어서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이 아니라는 견해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는 것은 그의 문우관계와 그의 행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확실해진다.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임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
허균과 서자의 관계
「규사(葵史)(1858년 역대 서얼사실을 기록한 책)
중국소설 「水滸傳」의 영향
「유재론(遺才論)」과 「홍길동전」
「호민론(豪民論)」과 「홍길동전」
원본의 국문본 여부
\'홍길동전\'은 국문본이 널리 읽혔으나, 원본이 국문본 이었던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전하는 것은 경판본·안성판본·완판본의 판본과 國文 및 漢文 필사본, 그리고 활자본이 전해 온다. 이 중 한문 필사본은 그것이 한문으로 쓰여졌고,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異本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원본이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내고 있다.
한문 필사본은 완판본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부연되어 있고, 그 결과 허균의 의식에서 멀어졌으며. 한문의 문체도 허균의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조잡한 것이어서 후대에 이루어진 또 다른 이본으로 추정된다. 문집에 실린 허균의 한문소설은 허균의 작품이 틀림없고, 원본 시비가 필요 없지만, 문집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본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은 \'홍길동전\'은 전국에서 널리 읽혀졌다.
이것은 이 작품이 원래부터 국문소설이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허균이 국문으로 지어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은밀하게 퍼뜨렸던 소설이 작품자체의 흥미와 공감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얻어 작가가 잊혀져 후대에 개작이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국문소설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실재인물 洪吉同과의 관계
\'홍길동전\'은 역사상 실재인물인 洪吉同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라는 說이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연산군 6년(1500) 11월에 잡은 强盜 洪吉同은 \'홍길동전\'이 있기 전의 한 전설형의 인물로서, 이로 인해 하나의 \'傳\'으로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王朝實錄」연산군수에 강도 홍길동에 관한 기록은 이러한다. \'童\'字와 \'同\'字의 차이지만 한글로는 둘 다 홍길동이다.
『강도 洪吉同은 玉實子를 붙이고 붉은 띠를 두르고 堂上官차림의 高官이 되어 첨지행세를 했다. 따라서 버젓이 관청 출입을 하며 온갖 짓을 다했다. 그리고 대낮에 떼를 지어서 횡행하는데, 모두 무장을 하였다. 』
이런 洪吉同을 지방의 수령들조차 존대했으니, 그의 세력은 대단했다고 한다. 곧 홍길동은 도적떼의 괴수로서 재주가 비상하여 \'홍길동이 재주\'라는 속담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홍길동은 林巨正과 같은 義賊이라고 추측되는데, 이조시대에는 이런 도적이 심심하지 않게 나탄자서 조정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洪吉同事件이 가장 컸었다. 연산군시대의 도적 洪吉同이 잡힌 지 13년 후인 中宗 8년(1513)의 「實錄」은 洪吉同을 회상시키며 경계하도록 기록하고 있으니, 도적의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許筠이 지었던 \'洪吉童傳\'의 主人公이 이 실재했던 洪吉同을 모델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가 없다. 특히 「왕조실록」은 관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록 의적이라 하더라도 강도로 규정해 버렸을 것이고 따라서 洪吉同의 의협적인 강도 행위(탐관오리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는 전혀 알아볼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런 영웅적인 도둑의 괴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은 구승되어 전했을 것이니 , 혹시 \'홍길동전\'의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허균이 \'洪吉童傳\'을 지었다면, 당시만 해도 홍길동의 기억은 새로왔을 것이고, 또 작품명이 \'홍길동전\'이라는 데서 수긍이 간다.
홍길동전의 주제
제 1주제가 적서차별의 폐지를 고주하고, 제 2주제가 무위도식하는 토호들의 가렴주구와 지방 수령들의 불의를 숙청하고, 빈민을 구제하려는 데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은 딴 여러 고대소설의 주제에 비하여 특이한 몇 가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첫째, 어떤 고대소설보다도 주제의 항구성이 강렬하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의 사회문제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무관심하던 적서문제를 들추어 내어 그 차별의 폐지를 문학 작품으로 고주한 것은 우리의 문학사는 물론이요, 세계 문학사상에도 그 예가 드문 것이다. 셋째, 홍길동전도 그 비극의 시발이 가정에 있는 것이지만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정소설과는 특이한 혁신적 의의를 갖고 있다.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의
\'홍길동전\'은 국문 소설의 효시가 되며,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금오신화\'이후의 전기적 성격을 탈피하고 비로소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상의 의의를 지닌다. 暇傳·傳奇에서 탈피하여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전통이 최조로 소설화된, 사실성이 크게 부각된 소설 형태를 갖추었음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은 내용상 저항 정신이 반영된 평민 문학으로서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을 낳게 하고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사회 소설의 선구적 작품이므로, 고전 중 특히 해외 진출 사상이나 계급 타파, 사회 제도의 개혁 및 빈민 구제 등의 교훈성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홍길동전》에서의 논란거리
\'홍길동전\' 작품생산의 현장인 역사적 현실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당대의 현실을 작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작자 논란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蛟山 許筠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것은 동시대의 후배인 澤堂 李植(1584∼1647)의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어 \'수호전\'에 비겼다.\"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다.
\'홍길동전\'에 관한 언급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들어서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이 아니라는 견해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라는 것은 그의 문우관계와 그의 행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확실해진다.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임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
허균과 서자의 관계
「규사(葵史)(1858년 역대 서얼사실을 기록한 책)
중국소설 「水滸傳」의 영향
「유재론(遺才論)」과 「홍길동전」
「호민론(豪民論)」과 「홍길동전」
원본의 국문본 여부
\'홍길동전\'은 국문본이 널리 읽혔으나, 원본이 국문본 이었던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전하는 것은 경판본·안성판본·완판본의 판본과 國文 및 漢文 필사본, 그리고 활자본이 전해 온다. 이 중 한문 필사본은 그것이 한문으로 쓰여졌고,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異本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원본이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내고 있다.
한문 필사본은 완판본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부연되어 있고, 그 결과 허균의 의식에서 멀어졌으며. 한문의 문체도 허균의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조잡한 것이어서 후대에 이루어진 또 다른 이본으로 추정된다. 문집에 실린 허균의 한문소설은 허균의 작품이 틀림없고, 원본 시비가 필요 없지만, 문집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본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은 \'홍길동전\'은 전국에서 널리 읽혀졌다.
이것은 이 작품이 원래부터 국문소설이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허균이 국문으로 지어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은밀하게 퍼뜨렸던 소설이 작품자체의 흥미와 공감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얻어 작가가 잊혀져 후대에 개작이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국문소설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실재인물 洪吉同과의 관계
\'홍길동전\'은 역사상 실재인물인 洪吉同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라는 說이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연산군 6년(1500) 11월에 잡은 强盜 洪吉同은 \'홍길동전\'이 있기 전의 한 전설형의 인물로서, 이로 인해 하나의 \'傳\'으로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王朝實錄」연산군수에 강도 홍길동에 관한 기록은 이러한다. \'童\'字와 \'同\'字의 차이지만 한글로는 둘 다 홍길동이다.
『강도 洪吉同은 玉實子를 붙이고 붉은 띠를 두르고 堂上官차림의 高官이 되어 첨지행세를 했다. 따라서 버젓이 관청 출입을 하며 온갖 짓을 다했다. 그리고 대낮에 떼를 지어서 횡행하는데, 모두 무장을 하였다. 』
이런 洪吉同을 지방의 수령들조차 존대했으니, 그의 세력은 대단했다고 한다. 곧 홍길동은 도적떼의 괴수로서 재주가 비상하여 \'홍길동이 재주\'라는 속담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홍길동은 林巨正과 같은 義賊이라고 추측되는데, 이조시대에는 이런 도적이 심심하지 않게 나탄자서 조정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洪吉同事件이 가장 컸었다. 연산군시대의 도적 洪吉同이 잡힌 지 13년 후인 中宗 8년(1513)의 「實錄」은 洪吉同을 회상시키며 경계하도록 기록하고 있으니, 도적의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許筠이 지었던 \'洪吉童傳\'의 主人公이 이 실재했던 洪吉同을 모델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가 없다. 특히 「왕조실록」은 관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록 의적이라 하더라도 강도로 규정해 버렸을 것이고 따라서 洪吉同의 의협적인 강도 행위(탐관오리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는 전혀 알아볼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런 영웅적인 도둑의 괴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은 구승되어 전했을 것이니 , 혹시 \'홍길동전\'의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허균이 \'洪吉童傳\'을 지었다면, 당시만 해도 홍길동의 기억은 새로왔을 것이고, 또 작품명이 \'홍길동전\'이라는 데서 수긍이 간다.
홍길동전의 주제
제 1주제가 적서차별의 폐지를 고주하고, 제 2주제가 무위도식하는 토호들의 가렴주구와 지방 수령들의 불의를 숙청하고, 빈민을 구제하려는 데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은 딴 여러 고대소설의 주제에 비하여 특이한 몇 가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첫째, 어떤 고대소설보다도 주제의 항구성이 강렬하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의 사회문제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무관심하던 적서문제를 들추어 내어 그 차별의 폐지를 문학 작품으로 고주한 것은 우리의 문학사는 물론이요, 세계 문학사상에도 그 예가 드문 것이다. 셋째, 홍길동전도 그 비극의 시발이 가정에 있는 것이지만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정소설과는 특이한 혁신적 의의를 갖고 있다.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의
\'홍길동전\'은 국문 소설의 효시가 되며,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금오신화\'이후의 전기적 성격을 탈피하고 비로소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상의 의의를 지닌다. 暇傳·傳奇에서 탈피하여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전통이 최조로 소설화된, 사실성이 크게 부각된 소설 형태를 갖추었음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은 내용상 저항 정신이 반영된 평민 문학으로서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을 낳게 하고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사회 소설의 선구적 작품이므로, 고전 중 특히 해외 진출 사상이나 계급 타파, 사회 제도의 개혁 및 빈민 구제 등의 교훈성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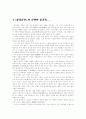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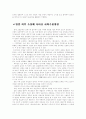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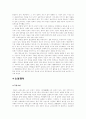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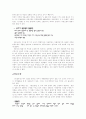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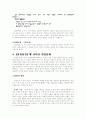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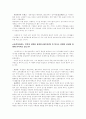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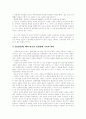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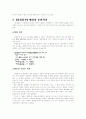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