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청동기 시대의 묘제
1. 석관묘
2. 지석묘(支石墓).
2>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묘제의 개관
1. 석관묘
2. 지석묘(支石墓).
2>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묘제의 개관
본문내용
등 몇 가지 형식이 있다. 경주 시내에는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곳곳에 솟아 있어 당시 신라의 힘과 부를 상징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금관총, 금령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이 있으며, 여기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로 미루어 당시 신라 왕족·귀족들의 사치와 부를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과는 달리 5-6세기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그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많은 유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4)가야시대
가야의 무덤은 대개 완만한 구릉 위에 입지하며, 구릉의 능선을 따라 조영된 대형분을 중심으로 소형분이 그 주위를 둘러싸듯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야전기에는 삼한시대 후기부터 유행하던 덧널무덤이 여전히 주된 묘제를 이룬다. 지배계층의 무덤인 대형분의 경우, 주곽(主槨)과 일직선상으로 부곽(副槨)이 딸린 형태가 일반화 되며, 4세기 후반대가 되면 순장풍습(殉葬風習)도 유행한다. 그러나 5세기대가 되면 점차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으로 대체되어 대형분의 주묘제로까지 채용되게 된다. 가야후기가 되면 가야지역에서는 높은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高塚古墳)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또 일자로 배치되던 부곽은 주곽속에 포함되어 돌덧널이 족고 길어지게 되거나, 주곽의 옆에 병렬(竝列)하여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세기말-6세기대 이후가 되면, 특히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수혈계 앞트기식돌방무덤(竪穴系橫口式石室墓)이 나타나고, 또 점차 앞트기식(橫口式)·굴식(橫穴式) 돌방무덤이 확산되어 가는데, 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간 결과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백제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가야가 멸망한 6세기 후반대에는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소멸되고 완전히 앞트기식·굴식 돌방무덤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들에는 출입시설이 있어서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무덤의 개념은 가족묘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부장품을 매우 적게 매납하는 박장풍습(薄葬風習)이 나타난다. 이는 무덤 자체로써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종래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무덤은 돌방무덤[석실분], 돌무덤[석총], 화장무덤[화장묘] 등이 있다. 돌방무덤은 6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돌무지덧널무덤과 같이 평야 지대에 만들어졌으나, 곧 경주 분지 주변의 구릉 지대로 옮겨간다. 깬 돌을 쌓아 올려 꼭대기에 한 장의 판석을 덮은 형식으로 봉토 주위에 석물(石物)을 배치하기도 한다. 돌방무덤 중에는 십이지신상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십이지신상은 당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에서는 봉토 둘레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한 무덤은 없다. 이것은 당에서 얻은 요소를 신라화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그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통일신라시대의 고분들은 통일 전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달리 도굴이 쉬워 출토 유물이 많지 않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발전으로 화장이 유행하였으며, 유골을 넣기 위한 뼈항아리[骨壺]가 만들어졌고 화장묘 형식이 통일 신라 시대에 유행하였다.
4)가야시대
가야의 무덤은 대개 완만한 구릉 위에 입지하며, 구릉의 능선을 따라 조영된 대형분을 중심으로 소형분이 그 주위를 둘러싸듯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야전기에는 삼한시대 후기부터 유행하던 덧널무덤이 여전히 주된 묘제를 이룬다. 지배계층의 무덤인 대형분의 경우, 주곽(主槨)과 일직선상으로 부곽(副槨)이 딸린 형태가 일반화 되며, 4세기 후반대가 되면 순장풍습(殉葬風習)도 유행한다. 그러나 5세기대가 되면 점차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으로 대체되어 대형분의 주묘제로까지 채용되게 된다. 가야후기가 되면 가야지역에서는 높은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高塚古墳)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또 일자로 배치되던 부곽은 주곽속에 포함되어 돌덧널이 족고 길어지게 되거나, 주곽의 옆에 병렬(竝列)하여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세기말-6세기대 이후가 되면, 특히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수혈계 앞트기식돌방무덤(竪穴系橫口式石室墓)이 나타나고, 또 점차 앞트기식(橫口式)·굴식(橫穴式) 돌방무덤이 확산되어 가는데, 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간 결과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백제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가야가 멸망한 6세기 후반대에는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소멸되고 완전히 앞트기식·굴식 돌방무덤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들에는 출입시설이 있어서 추가장(追加葬)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무덤의 개념은 가족묘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부장품을 매우 적게 매납하는 박장풍습(薄葬風習)이 나타난다. 이는 무덤 자체로써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종래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무덤은 돌방무덤[석실분], 돌무덤[석총], 화장무덤[화장묘] 등이 있다. 돌방무덤은 6세기경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돌무지덧널무덤과 같이 평야 지대에 만들어졌으나, 곧 경주 분지 주변의 구릉 지대로 옮겨간다. 깬 돌을 쌓아 올려 꼭대기에 한 장의 판석을 덮은 형식으로 봉토 주위에 석물(石物)을 배치하기도 한다. 돌방무덤 중에는 십이지신상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십이지신상은 당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에서는 봉토 둘레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한 무덤은 없다. 이것은 당에서 얻은 요소를 신라화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그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통일신라시대의 고분들은 통일 전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달리 도굴이 쉬워 출토 유물이 많지 않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발전으로 화장이 유행하였으며, 유골을 넣기 위한 뼈항아리[骨壺]가 만들어졌고 화장묘 형식이 통일 신라 시대에 유행하였다.
추천자료
 삼국시대 교육 사상가
삼국시대 교육 사상가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삼국시대회화
삼국시대회화 한국미술사 시험문제 및 답안 -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의 불상
한국미술사 시험문제 및 답안 -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까지의 불상 삼국시대의 문화발달과정
삼국시대의 문화발달과정 삼국시대의 무용
삼국시대의 무용 삼국시대의 교육(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
삼국시대의 교육(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 한국 경호의 역사 - 경호의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한국 경호의 역사 - 경호의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우리나라 고대문명의 초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건국 이전까지의 문화와 유적에 대한 자료조...
우리나라 고대문명의 초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건국 이전까지의 문화와 유적에 대한 자료조... 6.25전쟁 교훈과 과제과 삼국시대 수, 당과의 전쟁과 교훈을 약술하라
6.25전쟁 교훈과 과제과 삼국시대 수, 당과의 전쟁과 교훈을 약술하라 [한국사의 재조명] 삼국시대의 왕릉 - 무열왕릉(신라) & 무령왕릉(백제) & 악3호분(...
[한국사의 재조명] 삼국시대의 왕릉 - 무열왕릉(신라) & 무령왕릉(백제) & 악3호분(... 삼국시대 정치 행정 체제
삼국시대 정치 행정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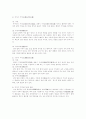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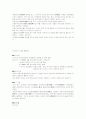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