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천문학의 역사
2. 우리 선조들의 천문 관념
3. 한국의 천문학사
4. 천문의기
5. 우주론
6. 역법
2. 우리 선조들의 천문 관념
3. 한국의 천문학사
4. 천문의기
5. 우주론
6. 역법
본문내용
제 같은 경우에는 천지가 어지러이 뒤섞여 있다가 특정 시간에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며 개벽하여 만물이 생겨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주창생과 진화에 대한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대 우주론의 내용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한편 전 우주의 창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와 달과 같은 천체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도 있다. 대표적 예가 남매일월신화이다. 남매는 하늘에 올라 해와 달이 되었다가 누이가 밤길이 무서워 오빠와 자리를 바꾸는 내용이다. 마지막 내용은 천지와 일월과 남녀를 같은 음양관계의 등식으로 볼 때 남매의 자리바꿈은 하늘과 땅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남매로서 살고 있던 때를 미분화된 원초적 우주 상태로 본다면 이 신화 역시 천지개벽형 신화의 형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신화의 이본(異本)에는 삼 남매의 막내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천체기원의 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 있다. 또한 여러 문헌을 통해 건국과 인류기원에 대한 신화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전해지는 우주의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주관들이다. 우리나라의 천문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우주구조론은 개천설(蓋天說)과 혼천설(渾天設)이다. 개천설은 하늘은 원, 땅은 네모나게 생겼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설로서 하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뒤에 하늘과 땅 모두 곡면이고 북극부분이 높은 삿갓 모양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였다. 이 우주관은 고구려 고분의 일월성신도나 석굴암의 천장 등을 통해 우리의 고대 천문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혼천설은 우주의 모습이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새알과 같다는 생각이다. 하늘은 남북극을 지나는 축을 둘레로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일월성신이 따라 돈다는 모형이다. 모두 우주의 모양과 운행을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모형화한 이론들로서 우주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실상을 깨우치려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양천문학은 17세기 초 조선 인조 대에 중국을 통해 서양천문서들이 들어오면서 소개되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티코 브라헤 등의 우주구조와 운행 모형이 전통적 우주관인 혼천설을 대체하게 되었다.
6.역법
천문학은 하늘의 주기적인 현상을 관측하여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관측의 계획을 세워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여 천체현상을 예보하는 과정에서 역이 발전하였다. 또한 역(曆)은 인류의 농경생활로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 주의의 주기적인 자연환경이나 달과 태양의 운동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였다.
역법은 태양이나 달의 운동과 같은 천체의 천문학적 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과거 오랜동안 사용한 역법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었다. 태음태양력은 달에 의한 삭망월과 태양에 의한 회귀년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역법의 근본이 된다. 즉, 음력의 성분인 삭(朔)과 양력의 성분인 기(氣)를 기본 요소로 하여 기와 삭을 맞추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중국의 역법은 해와 달에 의한 단순한 음양력(陰陽曆)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한(漢)나라의 태초력(太初曆) 이후부터는 음양력의 추산 뿐만아니라 일월식(日月食)의 추보(推步)와 오행성의 운행과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내용의 천체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 대(漢代)에 들어서 왕조의 교체에 따라 \"정삭(定朔)을 고친다\"라는 원리가 확립되었고 그 후 왕조의 교체에 따라 천명사상(天命思想)에 입각한 개력(改曆)이 행하여졌다. 개력의 주된 내용은 윤달을 넣는 방법인 치윤법(置閏法)과 크고 작은 달의 배치법 그리고 절기(節氣)와 삭을 정하는 방법과 1년이나 1달의 길이 등을 나타내는 천문 상수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개력의 과정을 통하여 역 계산의 방법과 천문 상수 값들이 점차 개량되고 정밀화하였다. 그리고 관측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와 달의 운동에 빠르고 느림의 현상이 있다는 사실과 황도와 백도의 교점이 이동하며 동지 때 태양의 위치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등이 발견되면서 관측으로 얻은 값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즉 중국의 역법은 정확한 관측과 이를 처리하는 계산 기술의 발달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
과거로부터 시작된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탐구는 21세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아는 것에 비해 모르는 것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도 현재의 우리처럼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의 흔적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농사, 항해에 천문학을 이용하였고, 천문 현상 발견의 흔적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미지의 현상들이 주술적으로 표현되어 점성술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천문학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날씨의 변화와 예측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농경 문화에서 농사할 시기를 알려 주는 것이 군주로서의 의무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시켰다. 그리고 별이라는 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그것을 숭배하였으며,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 시대의 첨성대를 보면 천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주술적인 면이 엿보인다. 삼국 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천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측기구를 만들었다. 위치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천문 현상을 발견한 흔적이 여러 서적에서 보인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발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조선의 \'칠정산\'이나, \'일성정시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맞는 천문학을 발달시켰다. 비록 일제시대 이후 천문학의 발달이 뒤쳐졌지만,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천문학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천문학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선진의 기술을 배워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더욱 수준이 높은 기술로 발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전 우주의 창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와 달과 같은 천체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도 있다. 대표적 예가 남매일월신화이다. 남매는 하늘에 올라 해와 달이 되었다가 누이가 밤길이 무서워 오빠와 자리를 바꾸는 내용이다. 마지막 내용은 천지와 일월과 남녀를 같은 음양관계의 등식으로 볼 때 남매의 자리바꿈은 하늘과 땅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남매로서 살고 있던 때를 미분화된 원초적 우주 상태로 본다면 이 신화 역시 천지개벽형 신화의 형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신화의 이본(異本)에는 삼 남매의 막내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천체기원의 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 있다. 또한 여러 문헌을 통해 건국과 인류기원에 대한 신화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전해지는 우주의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주관들이다. 우리나라의 천문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우주구조론은 개천설(蓋天說)과 혼천설(渾天設)이다. 개천설은 하늘은 원, 땅은 네모나게 생겼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설로서 하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뒤에 하늘과 땅 모두 곡면이고 북극부분이 높은 삿갓 모양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였다. 이 우주관은 고구려 고분의 일월성신도나 석굴암의 천장 등을 통해 우리의 고대 천문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혼천설은 우주의 모습이 하늘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새알과 같다는 생각이다. 하늘은 남북극을 지나는 축을 둘레로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일월성신이 따라 돈다는 모형이다. 모두 우주의 모양과 운행을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모형화한 이론들로서 우주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실상을 깨우치려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양천문학은 17세기 초 조선 인조 대에 중국을 통해 서양천문서들이 들어오면서 소개되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티코 브라헤 등의 우주구조와 운행 모형이 전통적 우주관인 혼천설을 대체하게 되었다.
6.역법
천문학은 하늘의 주기적인 현상을 관측하여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관측의 계획을 세워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여 천체현상을 예보하는 과정에서 역이 발전하였다. 또한 역(曆)은 인류의 농경생활로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 주의의 주기적인 자연환경이나 달과 태양의 운동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였다.
역법은 태양이나 달의 운동과 같은 천체의 천문학적 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과거 오랜동안 사용한 역법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었다. 태음태양력은 달에 의한 삭망월과 태양에 의한 회귀년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역법의 근본이 된다. 즉, 음력의 성분인 삭(朔)과 양력의 성분인 기(氣)를 기본 요소로 하여 기와 삭을 맞추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중국의 역법은 해와 달에 의한 단순한 음양력(陰陽曆)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한(漢)나라의 태초력(太初曆) 이후부터는 음양력의 추산 뿐만아니라 일월식(日月食)의 추보(推步)와 오행성의 운행과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내용의 천체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 대(漢代)에 들어서 왕조의 교체에 따라 \"정삭(定朔)을 고친다\"라는 원리가 확립되었고 그 후 왕조의 교체에 따라 천명사상(天命思想)에 입각한 개력(改曆)이 행하여졌다. 개력의 주된 내용은 윤달을 넣는 방법인 치윤법(置閏法)과 크고 작은 달의 배치법 그리고 절기(節氣)와 삭을 정하는 방법과 1년이나 1달의 길이 등을 나타내는 천문 상수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었고 개력의 과정을 통하여 역 계산의 방법과 천문 상수 값들이 점차 개량되고 정밀화하였다. 그리고 관측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와 달의 운동에 빠르고 느림의 현상이 있다는 사실과 황도와 백도의 교점이 이동하며 동지 때 태양의 위치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등이 발견되면서 관측으로 얻은 값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즉 중국의 역법은 정확한 관측과 이를 처리하는 계산 기술의 발달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
과거로부터 시작된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탐구는 21세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아는 것에 비해 모르는 것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도 현재의 우리처럼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의 흔적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농사, 항해에 천문학을 이용하였고, 천문 현상 발견의 흔적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미지의 현상들이 주술적으로 표현되어 점성술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천문학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날씨의 변화와 예측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농경 문화에서 농사할 시기를 알려 주는 것이 군주로서의 의무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시켰다. 그리고 별이라는 것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그것을 숭배하였으며,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 시대의 첨성대를 보면 천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주술적인 면이 엿보인다. 삼국 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천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측기구를 만들었다. 위치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천문 현상을 발견한 흔적이 여러 서적에서 보인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발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조선의 \'칠정산\'이나, \'일성정시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맞는 천문학을 발달시켰다. 비록 일제시대 이후 천문학의 발달이 뒤쳐졌지만,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천문학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천문학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선진의 기술을 배워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더욱 수준이 높은 기술로 발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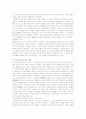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