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작품 분석
3. 울타리 밖 삶의 비애
4. `순응`과 `저항` 사이의 시학
5. 현대의 유행가 `서방님`과 비교
6. 결 론
2. 작품 분석
3. 울타리 밖 삶의 비애
4. `순응`과 `저항` 사이의 시학
5. 현대의 유행가 `서방님`과 비교
6. 결 론
본문내용
어나고자 하는 자의식의 발로이며, 남성 중심의 성 의식에 대한 전복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홍랑의 시조는 기녀의 삶의 실체가 그대로 묻어나 자아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그들만의 진솔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투영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의 시학을 이루고 있다.
5. 현대의 유행가 \"서방님\"과 비교
처음부터 잘못택했었던 그대의 잘못인거죠
미워요 괜한 투정이죠 사실 내맘도 병들어가고 있죠
늘 그대 볼 수 있게 이대로 눈을 감고 달이 되어 살고 싶어요
서방님 내 서방님 알아주세요
정든님 넓은 가슴 멍들게 할 주제 못 되니 노여워말아요 견뎌내야죠
처음부터 떨치지 못했던 소녀의 잘못인거죠 우리의 잘못인 거죠
서방님 내 서방님 용서하세요
무엇이 또 그 누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노여워 말아요 기다려야죠
처음부터 사랑해도 좋을 그런 날이 오겠죠
난 언제라도 그대뿐이에요 시간이 끝에 닿아도
다시 산다해도 그댈 따르겠어요 그댈 기다려요 그런 날이 오겠죠
-이소은 <서방님> 중-
이 유행가도 기녀를 화자로 해서 쓴 것이라 하는데 홍랑의 시조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볼 수 있다.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창밖의 \'묏버들\'처럼 님의 옆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 유행가에서도 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거라고 믿고 있다. 또, 홍랑 시조의 배경이 되는 조선조 남성 중심 지배 집단의 문화 속에서 무언의 집단으로서 또는 소외된 집단으로서 여염집에서조차 추방당해 기녀 집단이라는 틀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던 기녀들의 비애가 잘 드러나 있다.
6. 결 론
사대부가의 규방에서 추방되어 즉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자로 기녀의 삶은 조선조 사회의 성적 장치라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과 등치를 이룬다. 이러한 현실적 삶은 비애가 크면 컸지 만족함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기녀들이 체감하는 억압 의식이나 갈등 양상들은 이중적으로 가중되어 텍스트에 묻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이 비애감으로, 때로는 비애감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벗어나고자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 자아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를 찾아가는 행로는 기녀들의 현실 속에서 너무도 힘든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 즉 환경을 받아들여 오히려 인간으로서 남성과 대립이 아닌 조화를 추구하면서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놓이고 있다.
이처럼 남성 중심의 문화는 기녀에게는 이중적으로 억압 의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글쓰기를 통해 표출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적 환경 즉 기방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자각과 탐구로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 양면성을 드러내는 기녀의 텍스트는‘순응’과‘저항’사이에서 시학을 이루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페미니스트 시학의 측면에서 이론을 실제적인 작품과 연관시켜 그 동안 우리 여성들조차 의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간과되었던 것들을 다시 끌어내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여성문학사의 기술에 있어서 의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고전 문학 가운데 여성의 작품에 대해서 여성 시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문학사의 기술에서 여성 문학이 자리하는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2.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 문정배, 홍원 명기 홍랑, 미래문화사, 2001
4. 최철호, 기녀시조에 나타난 한의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기녀시조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러한 홍랑의 시조는 기녀의 삶의 실체가 그대로 묻어나 자아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그들만의 진솔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투영된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의 시학을 이루고 있다.
5. 현대의 유행가 \"서방님\"과 비교
처음부터 잘못택했었던 그대의 잘못인거죠
미워요 괜한 투정이죠 사실 내맘도 병들어가고 있죠
늘 그대 볼 수 있게 이대로 눈을 감고 달이 되어 살고 싶어요
서방님 내 서방님 알아주세요
정든님 넓은 가슴 멍들게 할 주제 못 되니 노여워말아요 견뎌내야죠
처음부터 떨치지 못했던 소녀의 잘못인거죠 우리의 잘못인 거죠
서방님 내 서방님 용서하세요
무엇이 또 그 누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노여워 말아요 기다려야죠
처음부터 사랑해도 좋을 그런 날이 오겠죠
난 언제라도 그대뿐이에요 시간이 끝에 닿아도
다시 산다해도 그댈 따르겠어요 그댈 기다려요 그런 날이 오겠죠
-이소은 <서방님> 중-
이 유행가도 기녀를 화자로 해서 쓴 것이라 하는데 홍랑의 시조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볼 수 있다.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창밖의 \'묏버들\'처럼 님의 옆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 유행가에서도 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거라고 믿고 있다. 또, 홍랑 시조의 배경이 되는 조선조 남성 중심 지배 집단의 문화 속에서 무언의 집단으로서 또는 소외된 집단으로서 여염집에서조차 추방당해 기녀 집단이라는 틀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던 기녀들의 비애가 잘 드러나 있다.
6. 결 론
사대부가의 규방에서 추방되어 즉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자로 기녀의 삶은 조선조 사회의 성적 장치라는 특수한 문화적 환경과 등치를 이룬다. 이러한 현실적 삶은 비애가 크면 컸지 만족함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기녀들이 체감하는 억압 의식이나 갈등 양상들은 이중적으로 가중되어 텍스트에 묻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이 비애감으로, 때로는 비애감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벗어나고자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 자아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아를 찾아가는 행로는 기녀들의 현실 속에서 너무도 힘든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 즉 환경을 받아들여 오히려 인간으로서 남성과 대립이 아닌 조화를 추구하면서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 놓이고 있다.
이처럼 남성 중심의 문화는 기녀에게는 이중적으로 억압 의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글쓰기를 통해 표출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적 환경 즉 기방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자각과 탐구로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 양면성을 드러내는 기녀의 텍스트는‘순응’과‘저항’사이에서 시학을 이루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페미니스트 시학의 측면에서 이론을 실제적인 작품과 연관시켜 그 동안 우리 여성들조차 의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간과되었던 것들을 다시 끌어내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여성문학사의 기술에 있어서 의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고전 문학 가운데 여성의 작품에 대해서 여성 시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문학사의 기술에서 여성 문학이 자리하는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2.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 문정배, 홍원 명기 홍랑, 미래문화사, 2001
4. 최철호, 기녀시조에 나타난 한의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기녀시조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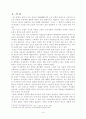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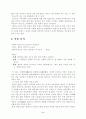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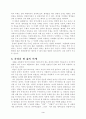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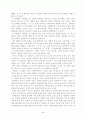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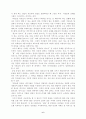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