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참고자료
1. 백강구 전쟁
2. 의문의 지원병 파병
3. 백제왕실과의 일본천왕과의 관계
4. 백제인의 일본권력장악
마치면서.....
참고자료
1. 백강구 전쟁
2. 의문의 지원병 파병
3. 백제왕실과의 일본천왕과의 관계
4. 백제인의 일본권력장악
마치면서.....
본문내용
는 그의 장남 모대왕자와 함께 일찍부터 왜국의 백제왕부에 건너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나라의 백제왕부가 오우진천황(4세기 말경~5세기 초엽) 때부터 이미 나라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우진천황 때에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인 아직기왕자, 오경박사 왕인 등이 왜왕실에 건너가서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 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제22대 왕인 문주왕이 재위 2년 만에 살해되었고, 이어서 문주왕의 장남인 삼근왕(477~479년 재위)이 제23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마저 재위 2년 만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서거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자 왜 왕실에 살고 있던 문주왕의 생질이자 삼근왕과는 사촌간인 모대왕자가 백제 제24대 왕인 동성왕(479~501년 재위)으로 추대된다. 이에는 모대왕자의 아버지인 곤지왕자(문주왕의 동생)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곤지왕자는 장남인 모대왕자를 백제 왕도인 웅진(곰나루, 지금의 공주)으로 보내 백제 본국의 왕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곤지왕자는 아들인 동성왕이 서거한 후에는 그의 둘째 손자인 사마(동성왕의 차남)를 다시 백제 본국에 보내 동성왕의 후사를 잇게 했다. 바로 그가 백제 제25대 왕인 무령왕(501~523년 재위)이다. 또한 곤지왕자는 셋째 손자인 오호도(동성왕의 삼남)를 왜 왕실의 천황으로 앉혔는데, 바로 게이타이천황(500~531년 재위)이다.
또한 무령왕과 게이타이천황이 친형제임은 고대 금석문이 입증하고 있다. 무령왕이 서기 503년에 아우인 게이타이천황을 위해 왜나라로 보낸 청동거울인‘인물화상경’이 그것이다. 이 청동거울이 ‘인물화상경’이라 불리는 것은 왕이며 왕족 등 말을 타고 있는 9명의 인물이 거울에 양각돼 있기 때문인데, 백제의 기마문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무령왕이 아우에게 보내주려고 만든 ‘인물화상경’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인물화상경’은 지름이 19.8cm인 둥근 청동제 거울인데, 바깥 둘레를 따라 빙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
“서기 503년 8월10일, 대왕(백제 무령왕)시대, 남동생인 왕(게이타이천황, 오호도)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무령왕의 이름)께서 아우의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노라. 개중비직과 예인 금주리 등 두 사람을 파견하며, 최고급 구리쇠 200한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도다.”
이 명문은 무령왕이 친동생 게이타이천황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살라는 염원을 담은 것으로 형제간의 뜨거운 우애가 물씬 느껴진다. 백제 무령왕은 개로왕의 동생 곤지왕자의 손자인것이다.
곤지왕자의 후손인 무령왕과 게이타이 천황의 혈연관계를 밝힌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을 근거로 백제왕족과 왜왕들의 계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 본국에서는 곤지왕자의 아들이자 문주왕의 조카인 동성왕(제24대)→동성왕의 차남인 무령왕(제25대)→무령왕의 왕자인 성왕(제26대)→성왕의 장남인 위덕왕(제27대)과 차남인 혜왕(제28대)→혜왕의 장남인 법왕(제29대)→법왕의 왕자인 무왕(제30대)→무왕의 장남인 의자왕(제31대)으로 법통이 이어진다.
백제왕부인 왜나라 쪽에서는 동성왕의 삼남인 게이타이천황→게이타이천황의 장남인 안칸천황, 차남인 센카천황, 또 다른 아들인 킨메이천황→킨메이천황의 형제 자매들인 비다쓰천황, 요우메이천황, 스천황, 스이코천황→(한 대를 건너뛰고) 비다쓰천황의 손자인 죠메이천황→죠메이천황의 태자인 텐치천황으로 혈맥이 이어진다. 한일 양국의 왕 계보에 따르면 동성왕의 7대손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되고, 동성왕의 6대손이 왜나라의 죠메이천황이 된다. 죠메이천황은 나라의 백제강가에다 백제궁을 지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의자왕의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또 죠메이천황의 아들인 텐치천황은 당연히 의자왕과 같은 항렬의 형제간이 된다.
그렇기에 의자왕의 백제가 망하게 되자, 텐치천황은 그 당시 왜 왕실에서 살고 있던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을 본국 백제로 보내 왕위를 계승하도록 지원했던 것이다.
4. 백제인의 일본권력장악
그럼 어떻게 해서 백제인들이 일본의 권력을 잡을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단적인 예를 소가노마치라는 사람에게서 찾을수 있다. 한국에서의 이름은 목례만치, 그는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웅진으로 천도할 때 절대적인 공을 세운 귀족으로 공을 세운 뒤 역사기록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열도로 망명해가서 소가지역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서 세력을 부식시켜 나가는데 6세기말에는 일본조정 왜조정이 강대한 호족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렇다면 백제출신이었던 목례만치는 이국 땅 왜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 6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갔는데 이 기술자들을 전부 소가씨가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것이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로는 선진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 갈수 있었다. 또한 백제문화는 왜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소가노가문은 권력을 잡을수 있었던 것이다.또한 그는 이 권력을 이용 두딸을 29대 천황인 힌메이와 결혼시킨다. 이렇게 천황의 외척이 됨으로써 왜정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정도의 막강한 위치에 올라갈수 있게 된것이다.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쓰고 보니 무척이나 한국인의 시각에서 쓴 것 같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들은 모두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것들을 모아 쓴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인들은 신빙성 조차 없는 것들로 어떻게든 깍아내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왠지 그들이 더욱 더 초라하게만 보인다.
요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창 시끄럽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럴만도 하다. 조금이라도 일본인임에 대해 긍지를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눈가림식으로 갈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나름대로 매우 뿌듯했다. 나 자신이 생각해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담에 쓸때는 좀더 잘 쓸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홀가분하다 ^.^
그런데 백제 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제22대 왕인 문주왕이 재위 2년 만에 살해되었고, 이어서 문주왕의 장남인 삼근왕(477~479년 재위)이 제23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마저 재위 2년 만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서거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자 왜 왕실에 살고 있던 문주왕의 생질이자 삼근왕과는 사촌간인 모대왕자가 백제 제24대 왕인 동성왕(479~501년 재위)으로 추대된다. 이에는 모대왕자의 아버지인 곤지왕자(문주왕의 동생)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곤지왕자는 장남인 모대왕자를 백제 왕도인 웅진(곰나루, 지금의 공주)으로 보내 백제 본국의 왕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곤지왕자는 아들인 동성왕이 서거한 후에는 그의 둘째 손자인 사마(동성왕의 차남)를 다시 백제 본국에 보내 동성왕의 후사를 잇게 했다. 바로 그가 백제 제25대 왕인 무령왕(501~523년 재위)이다. 또한 곤지왕자는 셋째 손자인 오호도(동성왕의 삼남)를 왜 왕실의 천황으로 앉혔는데, 바로 게이타이천황(500~531년 재위)이다.
또한 무령왕과 게이타이천황이 친형제임은 고대 금석문이 입증하고 있다. 무령왕이 서기 503년에 아우인 게이타이천황을 위해 왜나라로 보낸 청동거울인‘인물화상경’이 그것이다. 이 청동거울이 ‘인물화상경’이라 불리는 것은 왕이며 왕족 등 말을 타고 있는 9명의 인물이 거울에 양각돼 있기 때문인데, 백제의 기마문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무령왕이 아우에게 보내주려고 만든 ‘인물화상경’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인물화상경’은 지름이 19.8cm인 둥근 청동제 거울인데, 바깥 둘레를 따라 빙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
“서기 503년 8월10일, 대왕(백제 무령왕)시대, 남동생인 왕(게이타이천황, 오호도)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무령왕의 이름)께서 아우의 장수를 염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노라. 개중비직과 예인 금주리 등 두 사람을 파견하며, 최고급 구리쇠 200한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도다.”
이 명문은 무령왕이 친동생 게이타이천황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살라는 염원을 담은 것으로 형제간의 뜨거운 우애가 물씬 느껴진다. 백제 무령왕은 개로왕의 동생 곤지왕자의 손자인것이다.
곤지왕자의 후손인 무령왕과 게이타이 천황의 혈연관계를 밝힌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을 근거로 백제왕족과 왜왕들의 계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 본국에서는 곤지왕자의 아들이자 문주왕의 조카인 동성왕(제24대)→동성왕의 차남인 무령왕(제25대)→무령왕의 왕자인 성왕(제26대)→성왕의 장남인 위덕왕(제27대)과 차남인 혜왕(제28대)→혜왕의 장남인 법왕(제29대)→법왕의 왕자인 무왕(제30대)→무왕의 장남인 의자왕(제31대)으로 법통이 이어진다.
백제왕부인 왜나라 쪽에서는 동성왕의 삼남인 게이타이천황→게이타이천황의 장남인 안칸천황, 차남인 센카천황, 또 다른 아들인 킨메이천황→킨메이천황의 형제 자매들인 비다쓰천황, 요우메이천황, 스천황, 스이코천황→(한 대를 건너뛰고) 비다쓰천황의 손자인 죠메이천황→죠메이천황의 태자인 텐치천황으로 혈맥이 이어진다. 한일 양국의 왕 계보에 따르면 동성왕의 7대손이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되고, 동성왕의 6대손이 왜나라의 죠메이천황이 된다. 죠메이천황은 나라의 백제강가에다 백제궁을 지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의자왕의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또 죠메이천황의 아들인 텐치천황은 당연히 의자왕과 같은 항렬의 형제간이 된다.
그렇기에 의자왕의 백제가 망하게 되자, 텐치천황은 그 당시 왜 왕실에서 살고 있던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을 본국 백제로 보내 왕위를 계승하도록 지원했던 것이다.
4. 백제인의 일본권력장악
그럼 어떻게 해서 백제인들이 일본의 권력을 잡을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단적인 예를 소가노마치라는 사람에게서 찾을수 있다. 한국에서의 이름은 목례만치, 그는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웅진으로 천도할 때 절대적인 공을 세운 귀족으로 공을 세운 뒤 역사기록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열도로 망명해가서 소가지역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서 세력을 부식시켜 나가는데 6세기말에는 일본조정 왜조정이 강대한 호족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렇다면 백제출신이었던 목례만치는 이국 땅 왜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 6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갔는데 이 기술자들을 전부 소가씨가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것이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로는 선진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 갈수 있었다. 또한 백제문화는 왜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소가노가문은 권력을 잡을수 있었던 것이다.또한 그는 이 권력을 이용 두딸을 29대 천황인 힌메이와 결혼시킨다. 이렇게 천황의 외척이 됨으로써 왜정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정도의 막강한 위치에 올라갈수 있게 된것이다.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쓰고 보니 무척이나 한국인의 시각에서 쓴 것 같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들은 모두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것들을 모아 쓴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인들은 신빙성 조차 없는 것들로 어떻게든 깍아내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왠지 그들이 더욱 더 초라하게만 보인다.
요즘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창 시끄럽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럴만도 하다. 조금이라도 일본인임에 대해 긍지를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눈가림식으로 갈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나름대로 매우 뿌듯했다. 나 자신이 생각해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담에 쓸때는 좀더 잘 쓸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홀가분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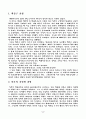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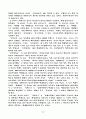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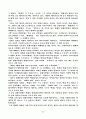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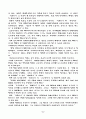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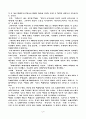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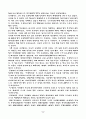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