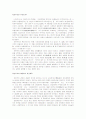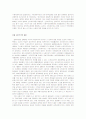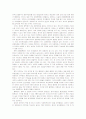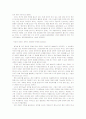목차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 자본주의의 태동 이후 지금까지
3. 현재 자본주의의 폐단
4.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가야할 길
2. 자본주의의 태동 이후 지금까지
3. 현재 자본주의의 폐단
4.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가야할 길
본문내용
없었다면 순식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헤지펀드의 존재는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인해 저임금을 찾아 생산시설을 제3세계로 옮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 그토록 많은 수의 사무직 노동자와 블루칼라를 '시대의 패배자'로 만든 것이 사무자동화나 공장자동화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류의 미래는 과학의 지혜로운 운영에 달려있다.'
생각해 볼 것은 과학과 '돈벌이'와의 관계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수 천년동안 이 둘은 서로 무관하게 발전해 왔다. 진리탐구를 위한 인간의 호기심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출현과 동시에 과학은 기묘한 발전 양상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과학이 자본주의에 종속적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노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팔기 위해, 또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왔다. 기업은 시장성이 없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국가 역시 '발전'과 무관한 투자는 제한했다. 한 마디로 과학기술은 자본의 통제를 받아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방법으로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이끌어 온 자본을 배반하고 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자신의 모태인 자본주의를 파괴시키고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밀레니엄 버그는 대표적인 사례. 최근의 위기를 봐도 이같은 현상은 눈에 띈다. 이윤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던 자본주의가 그것에 의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를 줄인다는 점은 전통적인 브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관계를 급속도로 해체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과학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자본을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기업간 혹은 국가간 경쟁을 부추기며 미래의 사업성을 내다보고, 즉 불확실성 속에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 자본을 쓰라고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과학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자본에는 국가와 노동자가, 자유주의에는 복지주의가 브레이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브레이크를 거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과학의 발전을 더디게 해야 한다는 종교단체의 얘기는 공허하게 허공을 메아리칠 뿐이다. 90년 시작된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에는 이미 수 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5년에는 특정 박테리아의 DNA 전체에 대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다.
인류 전체의 기원을 달성하려는 과학을 단순한 '돈벌이'로 종속시키려 했던 자본은 21세기 그 대가를 응징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번 세기 중반 경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과학은 자칫 자본주의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종속시켜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의 미래는 과학의 지혜로운 운영에 달려있다.'
생각해 볼 것은 과학과 '돈벌이'와의 관계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까지, 수 천년동안 이 둘은 서로 무관하게 발전해 왔다. 진리탐구를 위한 인간의 호기심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출현과 동시에 과학은 기묘한 발전 양상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과학이 자본주의에 종속적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노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팔기 위해, 또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왔다. 기업은 시장성이 없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국가 역시 '발전'과 무관한 투자는 제한했다. 한 마디로 과학기술은 자본의 통제를 받아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방법으로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이끌어 온 자본을 배반하고 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자신의 모태인 자본주의를 파괴시키고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밀레니엄 버그는 대표적인 사례. 최근의 위기를 봐도 이같은 현상은 눈에 띈다. 이윤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던 자본주의가 그것에 의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를 줄인다는 점은 전통적인 브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관계를 급속도로 해체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과학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자본을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마저 있다. 기업간 혹은 국가간 경쟁을 부추기며 미래의 사업성을 내다보고, 즉 불확실성 속에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 자본을 쓰라고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과학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자본에는 국가와 노동자가, 자유주의에는 복지주의가 브레이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브레이크를 거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과학의 발전을 더디게 해야 한다는 종교단체의 얘기는 공허하게 허공을 메아리칠 뿐이다. 90년 시작된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에는 이미 수 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5년에는 특정 박테리아의 DNA 전체에 대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다.
인류 전체의 기원을 달성하려는 과학을 단순한 '돈벌이'로 종속시키려 했던 자본은 21세기 그 대가를 응징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번 세기 중반 경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과학은 자칫 자본주의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종속시켜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