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전법
2. 병작반수와 농장의 부활
2. 병작반수와 농장의 부활
본문내용
나타난 또 하나의 주목할 현상은 양반관료, 지방행정의 실무자인 아전 및 지방유력자들의 대토지집적이 현저히 증진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에 이어서 만주족이 침략해 오자 전쟁에 의한 혼란기가 오랜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혼란기는 탐욕스런 양반관료, 아전 및 지방유력자들에게 그들의 토지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란으로 인하여 피점령지의 토지대장은 거의 소실되었다. 적군의 점령을 면한 지역에 있어서도 토지대장은 많은 손상을 입었다. 이 토지대장이 소실 혹은 손상됨으로써 토지의 소유관계가 매우 애매하게 되었다. 토지대장은 다시 재작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협잡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향호들이 전적의 손실에 편승하여 토지를 강점하고 농민은 땅을 빼앗겨 실농(失農)하기에 이르렀다. 또 권력자 중에는 국가에 대한 조세와 기타의 부담을 포탈하기 위하여 자기의 토지를 감량하여 보고하거나 혹은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이른바 음법(陰法)을 감행하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쟁 직후의 토지조사에 의하면, 전전의 전국경작지 면적이 150여만결이었던 것이 전후에는 30만 결 정도로 격감한다. 이것은 전쟁에 의한 경작지의 손상이 막대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지만, 또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토지의 은닉도 상당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여러 가지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토지를 확대하고 그 결과 더욱 더 많은 재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재부의 축적은 또 그들의 토지를 확대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권력기관 및 권력자들의 대토지소유가 팽창한 반면, 조상 전래의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의 수가 늘어났다. 농민의 손을 떠난 토지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자들에게 점유되었다.
조선 전기의 면적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농업생산에 있어 자가경영보다는 소작제경영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농촌에 있어서의 토지경영은 아마 소작제 위주로 전화된 것 같다. 이것은 전국의 경작지 중에서 많은 부분의 토지가 일부 소수의 지주들 손에 집중되고 농민은 농토를 상실하여 차차 몰락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의 몰락현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금속화폐의 일반적 통용이 또 큰 작용을 하고 있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금속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그것은 재래의 봉건적 자연경제를 점차로 해체시키고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속화폐가 일반상품의 유통에 도입되자 그것은 농민의 소비생활을 크게 자극하여 그들의 빈약한 생계를 더욱 더 파탄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주들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그 희생이 된 농민들은 결국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금속화폐가 재래의 자연경제의 농촌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다 할 권력의 배경이 없이 순수한 경제적 활동과 노력 경영적인 수완과 재능으로 부를 축적한 농촌 내부의 부농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국가기관 혹은 대지주의 토지를 비교적 헐한 지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빌려 몰락한 농민의 유휴노동력을 고용해서 그 토지를 경작하고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다. 부농에 의하여 고용된 경작자는 일종의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띤 농민으로서 이러한 농민이 농촌 내부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 경영형의 부농은 그들이 지주가 되어 지주형의 농업을 경영하는 일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함에 더 큰 관심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근대적 농업경영의 한 맹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도 전국경작지의 면적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전이었다. 일반농민의 경작지뿐 아니라 소작제에 의하여 경영되는 양반·관료·지방유력자들의 소유지도 민전으로 간주되었다. 소작제에 의하여 경영하는 지주는 대개 양반 향호층이었다. 그러나 지주의 자격이 반드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심지어는 노예가 양반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납속수직(納粟授職)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조선 후기부터라고 생각한다.
민전의 소유자는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에 따라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또 공부 역역, 그리고 기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잡세를 부담하였다. 조세는 곡물로써 바치고 공부는 지방토산물로써 바쳤다. 그런데 17세기의 후반기에 대동법(大同法)이 보급된 이후부터는 종래 지방토산물로써 바치던 공부도 조세와 같이 곡물로써 바치게 되었는데, 이때 대체로 조세는 1결에 4두요, 대동미(大同米)는 1결에 12두의 비율이었다.
영문둔전·아문둔전·궁방전은 면부면세(免賦免稅), 즉 대동미 등의 잡부와 조세가 면제되어 있었다. 단, 영문둔전과 아문둔전은 18세기 후반기(영조 34년, 1758)부터는 면부(免賦)·출세(出稅)로 법제가 변하였는데, 이러한 법제의 변경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밖에 전기부터 내려온 지방관청에서 경영하는 관둔전(官屯田)·아무전(衙務田) 등과 교통의 중로(中路)에 설정된 역전·원전이 있었고, 학교전·능묘전·제전이 있었다. 이들 토지는 국가의 공적기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므로 면세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명목의 토지들은 이른바 각종 면세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각종 면세전은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한 것이어서 1807년(순조 7) 당시의 기준으로 전국토지의 8.2%에 해당하는 11만8584결이었다. 여기에는 전국토지의 약 6%에 해당하는 영문둔전·아문둔전·궁방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자를 합친 면세전의 액수는 전국토지의 14%를 능가한다.
면세·면역의 특전이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명목의 토지에는 세부(稅賦)의 포탈을 목적으로 많은 민전이 투탁되었다. 이러한 투탁전은 명목은 어떻든간에 실제적으로는 민전이었으므로 뒤에 내려와서는 소유관계에 많은 혼란이 생겨 소속이 불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는 19세기 후반기에 격동하는 근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었다.
전란으로 인하여 피점령지의 토지대장은 거의 소실되었다. 적군의 점령을 면한 지역에 있어서도 토지대장은 많은 손상을 입었다. 이 토지대장이 소실 혹은 손상됨으로써 토지의 소유관계가 매우 애매하게 되었다. 토지대장은 다시 재작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협잡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향호들이 전적의 손실에 편승하여 토지를 강점하고 농민은 땅을 빼앗겨 실농(失農)하기에 이르렀다. 또 권력자 중에는 국가에 대한 조세와 기타의 부담을 포탈하기 위하여 자기의 토지를 감량하여 보고하거나 혹은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이른바 음법(陰法)을 감행하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쟁 직후의 토지조사에 의하면, 전전의 전국경작지 면적이 150여만결이었던 것이 전후에는 30만 결 정도로 격감한다. 이것은 전쟁에 의한 경작지의 손상이 막대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지만, 또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토지의 은닉도 상당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여러 가지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토지를 확대하고 그 결과 더욱 더 많은 재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재부의 축적은 또 그들의 토지를 확대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권력기관 및 권력자들의 대토지소유가 팽창한 반면, 조상 전래의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의 수가 늘어났다. 농민의 손을 떠난 토지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자들에게 점유되었다.
조선 전기의 면적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농업생산에 있어 자가경영보다는 소작제경영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농촌에 있어서의 토지경영은 아마 소작제 위주로 전화된 것 같다. 이것은 전국의 경작지 중에서 많은 부분의 토지가 일부 소수의 지주들 손에 집중되고 농민은 농토를 상실하여 차차 몰락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의 몰락현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금속화폐의 일반적 통용이 또 큰 작용을 하고 있었다. 17세기 중엽 이후 금속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그것은 재래의 봉건적 자연경제를 점차로 해체시키고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속화폐가 일반상품의 유통에 도입되자 그것은 농민의 소비생활을 크게 자극하여 그들의 빈약한 생계를 더욱 더 파탄으로 이끌어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주들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그 희생이 된 농민들은 결국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금속화폐가 재래의 자연경제의 농촌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다 할 권력의 배경이 없이 순수한 경제적 활동과 노력 경영적인 수완과 재능으로 부를 축적한 농촌 내부의 부농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국가기관 혹은 대지주의 토지를 비교적 헐한 지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빌려 몰락한 농민의 유휴노동력을 고용해서 그 토지를 경작하고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다. 부농에 의하여 고용된 경작자는 일종의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띤 농민으로서 이러한 농민이 농촌 내부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 경영형의 부농은 그들이 지주가 되어 지주형의 농업을 경영하는 일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함에 더 큰 관심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근대적 농업경영의 한 맹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도 전국경작지의 면적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전이었다. 일반농민의 경작지뿐 아니라 소작제에 의하여 경영되는 양반·관료·지방유력자들의 소유지도 민전으로 간주되었다. 소작제에 의하여 경영하는 지주는 대개 양반 향호층이었다. 그러나 지주의 자격이 반드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심지어는 노예가 양반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납속수직(納粟授職)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 조선 후기부터라고 생각한다.
민전의 소유자는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에 따라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또 공부 역역, 그리고 기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잡세를 부담하였다. 조세는 곡물로써 바치고 공부는 지방토산물로써 바쳤다. 그런데 17세기의 후반기에 대동법(大同法)이 보급된 이후부터는 종래 지방토산물로써 바치던 공부도 조세와 같이 곡물로써 바치게 되었는데, 이때 대체로 조세는 1결에 4두요, 대동미(大同米)는 1결에 12두의 비율이었다.
영문둔전·아문둔전·궁방전은 면부면세(免賦免稅), 즉 대동미 등의 잡부와 조세가 면제되어 있었다. 단, 영문둔전과 아문둔전은 18세기 후반기(영조 34년, 1758)부터는 면부(免賦)·출세(出稅)로 법제가 변하였는데, 이러한 법제의 변경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밖에 전기부터 내려온 지방관청에서 경영하는 관둔전(官屯田)·아무전(衙務田) 등과 교통의 중로(中路)에 설정된 역전·원전이 있었고, 학교전·능묘전·제전이 있었다. 이들 토지는 국가의 공적기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므로 면세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명목의 토지들은 이른바 각종 면세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각종 면세전은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한 것이어서 1807년(순조 7) 당시의 기준으로 전국토지의 8.2%에 해당하는 11만8584결이었다. 여기에는 전국토지의 약 6%에 해당하는 영문둔전·아문둔전·궁방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자를 합친 면세전의 액수는 전국토지의 14%를 능가한다.
면세·면역의 특전이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명목의 토지에는 세부(稅賦)의 포탈을 목적으로 많은 민전이 투탁되었다. 이러한 투탁전은 명목은 어떻든간에 실제적으로는 민전이었으므로 뒤에 내려와서는 소유관계에 많은 혼란이 생겨 소속이 불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는 19세기 후반기에 격동하는 근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었다.
추천자료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 개항이전의 조선의 모습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 개항이전의 조선의 모습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의 한문학에 대한 이해와 고찰
조선 건국과 조선 초기의 한문학에 대한 이해와 고찰 전기소설 입장에서 살펴 본 주생전 연구
전기소설 입장에서 살펴 본 주생전 연구 조선의 정책과정과 정치제도
조선의 정책과정과 정치제도 조선(보수)과 한겨레(진보) 논조 비교하여 평가
조선(보수)과 한겨레(진보) 논조 비교하여 평가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분석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분석 조선시대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조선시대의 경제, 문화, 정치, 외교 [토지제도][고대사회][고구려][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광복이후]고대사회의 토지제도...
[토지제도][고대사회][고구려][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광복이후]고대사회의 토지제도... [조선시대][조선][공예][회화][성리학][양명학][농민통제][신분제도]조선시대(조선) 공예, 조...
[조선시대][조선][공예][회화][성리학][양명학][농민통제][신분제도]조선시대(조선) 공예, 조... [농학 발달][농서편찬][농서간행][조선후기 농업][산림경제][색경]농학의 발달에 따른 농서편...
[농학 발달][농서편찬][농서간행][조선후기 농업][산림경제][색경]농학의 발달에 따른 농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조선시대 음악
조선시대 음악  무원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과학수사
무원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과학수사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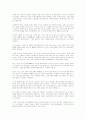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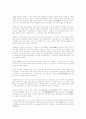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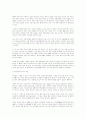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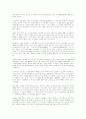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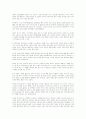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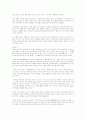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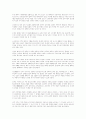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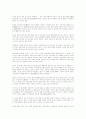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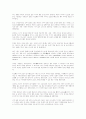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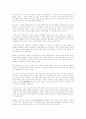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