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조선의 정치․행정기구
표①조선시대 관제도 (2)
1.조선시대 정책집행기관 (3)
2.의정부사서제와 6조직계제 (7)
Ⅱ.조선시대 정치행정 체제 모형
표②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산출모형으로
파악한 조선의 정치 행정체제 모형 (8)
Ⅲ붕당(朋黨)
1.붕당에 대한 설명 (9)
표③붕당의 분열형태 (10)
2.사림(士林)과 훈구(勳舊) (10)
3.붕당정치의 성립배경 (10)
4.붕당정치 - 당쟁의 특징 (11)
5.붕당이 조선의 정치에 미친 영향 (11)
표④붕당의 분열 (12~13)
Ⅳ조선의 군사제도
1.시대별 분류 (14)
2.조선시대 군역제도(18)
Ⅴ조선시대 지방행정
표⑤지방행정 조직도 (19)
1.지방관의 위상 (21)
표①조선시대 관제도 (2)
1.조선시대 정책집행기관 (3)
2.의정부사서제와 6조직계제 (7)
Ⅱ.조선시대 정치행정 체제 모형
표②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산출모형으로
파악한 조선의 정치 행정체제 모형 (8)
Ⅲ붕당(朋黨)
1.붕당에 대한 설명 (9)
표③붕당의 분열형태 (10)
2.사림(士林)과 훈구(勳舊) (10)
3.붕당정치의 성립배경 (10)
4.붕당정치 - 당쟁의 특징 (11)
5.붕당이 조선의 정치에 미친 영향 (11)
표④붕당의 분열 (12~13)
Ⅳ조선의 군사제도
1.시대별 분류 (14)
2.조선시대 군역제도(18)
Ⅴ조선시대 지방행정
표⑤지방행정 조직도 (19)
1.지방관의 위상 (21)
본문내용
(鄕任)에는 지방의 토착 유력자인 향반(鄕班)이 임용되었다. 향임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관리가 아니라, 지방 유지로서의 지식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행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향소는 조선 초기에 한때 수령과 대립해 중앙집권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어 폐지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489년(성종 20)에는 이를 개혁해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게 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향소는 수령에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하였다. 임원을 향임, 혹은 감관(監官)·향정(鄕正)이라 했는데, 주·부에는 4, 5인, 군에는3인, 현에는 2인을 두는 것이 통례였다. 지방의 사인(士人) 신분층 중에서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사람을 좌수로, 그 다음 사람을 별감으로 선거해 수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임기는 대개 2년인데, 수령이 바뀌면 다시 선출할 수도 있었다. 향임도 6방을 나누어 맡았다. 좌수가 이방과 병방을, 좌별감이 호방과 예방을, 우별감이 형방과 공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향소와 아울러 주목되는 것으로, 경재소(京在所) 혹은 경소(京所)라는 기관이 있었다. 지방의 연고자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연락을 꾀하는 동시에 향소와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임원으로는 당상(堂上)·별감 등이 있었다. 위에서 말한 향소와 경재소가 양반 신분층을 중심으로 운영된 데 대해 향리 신분층이 운영하는 연락기관으로 서울에서 지방관청의 편의를 돕는 경저리(京邸吏), 혹은 경주인(京主人)이라는 것이 있었다. 또한, 각 지방관청과 감영을 연락하는 영저리(營邸吏), 혹은 영주인(營主人)도 있었다. 한편, 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방의 자치적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향약(鄕約)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 향소의 활동이 부진하자 이를 보강하기위해 실시된 것이 향약이었다. 향약은 일찍이 중국 송대(宋代)부터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제정,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향약을 받아들여 실시한 것은 조광조(趙光祖)가 집권하고 있던 1517년(중종 12)부터였다. 이 때의 향약 주석(注釋)에 의하면, 임원인 도약정(都約正)은 유향소(留鄕所)의 좌수, 부약정(副約正)은 유향소의 별감이라는 데에서 향약과 향소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 뒤 향약의 성과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556년(명종 11) 이황(李滉)이 세운 〈예안향약 禮安鄕約〉, 1571년(선조 4) 이이(李珥)가 세운 〈서원향약 西原鄕約〉, 1577년에 역시 이이가 세운〈해주향약 海州鄕約〉등을 거치면서 이들 명현들의 영향력에 힘입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향약은 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향소처럼 행정적인 성격의 기구는 아니었다. 그리고 구성이나 규칙 등도 각 지방의 향약마다 달랐다. 그러나 선행(善行)이 있는 사람은 지방관을 거쳐 조정에까지 알리게 하고, 악행(惡行)이 있는 사람은 처벌하게 하는 등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향약은 주현(주縣)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소규모의 향약으로 적용의 지역적 범위를 좁혀서 동약(洞約)·동계(洞契) 등이 실시된 곳도 많았다. 주현의 밑에 있었던 면·사·방의 장(長)은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면임(面任)·방수(坊首)·방장(坊長)·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정장(里正長)·관령(管領) 등 그 명칭이 많았고, 또 그 아래의 동·이·촌의 장도 존위(尊位)·약수(約首)·동수(洞首)·동장(洞長)·이정(里正)·두민(頭民)·좌상(座上)·영좌(領座)·통수(統首) 등 호칭이 여러 가지였다. 이들이 하던 일은 주현의 행정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특히 조세의 납부를 지휘하는 등 지방관청의 심부름이 주였다.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은 주현까지여서, 면 이하는 지방자치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향소의 좌수·별감의 천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 계통상으로는 수령보다는 향소 또는 향약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호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이 추대되어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자치(自治)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뒤에는 지방관청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점차 그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지방의 각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서울의 각 방에는 관령(管領)을 각각 두었다. 그 설치 목적은 주로 호구(戶口)를 파악하고, 또한 이웃끼리 서로 돕는 자치적인 조직을 갖추자는 데 있었다.
지방관의 위상
조선 시대에서 지방관은 소국의 제왕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이덕일) 지방관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군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수령고소금지법은 지방관의 활동에 많은 자유를 주게 된다.
지방관의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방지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두게 된다. 그리하여 관찰사의 경우 그 임기가 1년으로 매우 짧았다. 또한 상피제도가 있어 지방관은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해야만 했다. 지방관은 자신이 모르는 생소한 곳에서 근무하고 적응되면 짧은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조선사회에서는 수령의 횡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Ⅰ.조선의 정치행정기구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박영규 - 들녘
인터넷 사이트 http://dic.search.naver.com/
http://1392.org/
조선왕 독살사건 - 이덕일-다산초당
Ⅱ.조선시대 정치행정 체제 모형
조선 전기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택-단국대학교
Ⅲ붕당(朋黨)
당쟁으로 본 조선역사 - 이덕일-석필
조선시대 당쟁사 - 이상무- 동방미디어
Ⅳ조선의 군사제도
조선정치제도사- 장국종-한국문화사
오백년 전 관청이야기- 국민대학교 박물관
Ⅴ조선시대 지방행정
http://kin.naver.com/open100
http://blog.naver.com/ghwhq329?Redirect
http://kin.naver.com/db/detail.
조선 선비 살해사건-이덕일-다산초당
향소는 조선 초기에 한때 수령과 대립해 중앙집권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어 폐지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489년(성종 20)에는 이를 개혁해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게 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향소는 수령에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하였다. 임원을 향임, 혹은 감관(監官)·향정(鄕正)이라 했는데, 주·부에는 4, 5인, 군에는3인, 현에는 2인을 두는 것이 통례였다. 지방의 사인(士人) 신분층 중에서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사람을 좌수로, 그 다음 사람을 별감으로 선거해 수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임기는 대개 2년인데, 수령이 바뀌면 다시 선출할 수도 있었다. 향임도 6방을 나누어 맡았다. 좌수가 이방과 병방을, 좌별감이 호방과 예방을, 우별감이 형방과 공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향소와 아울러 주목되는 것으로, 경재소(京在所) 혹은 경소(京所)라는 기관이 있었다. 지방의 연고자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연락을 꾀하는 동시에 향소와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임원으로는 당상(堂上)·별감 등이 있었다. 위에서 말한 향소와 경재소가 양반 신분층을 중심으로 운영된 데 대해 향리 신분층이 운영하는 연락기관으로 서울에서 지방관청의 편의를 돕는 경저리(京邸吏), 혹은 경주인(京主人)이라는 것이 있었다. 또한, 각 지방관청과 감영을 연락하는 영저리(營邸吏), 혹은 영주인(營主人)도 있었다. 한편, 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방의 자치적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향약(鄕約)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 향소의 활동이 부진하자 이를 보강하기위해 실시된 것이 향약이었다. 향약은 일찍이 중국 송대(宋代)부터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제정,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의 향약을 받아들여 실시한 것은 조광조(趙光祖)가 집권하고 있던 1517년(중종 12)부터였다. 이 때의 향약 주석(注釋)에 의하면, 임원인 도약정(都約正)은 유향소(留鄕所)의 좌수, 부약정(副約正)은 유향소의 별감이라는 데에서 향약과 향소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 뒤 향약의 성과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556년(명종 11) 이황(李滉)이 세운 〈예안향약 禮安鄕約〉, 1571년(선조 4) 이이(李珥)가 세운 〈서원향약 西原鄕約〉, 1577년에 역시 이이가 세운〈해주향약 海州鄕約〉등을 거치면서 이들 명현들의 영향력에 힘입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향약은 향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향소처럼 행정적인 성격의 기구는 아니었다. 그리고 구성이나 규칙 등도 각 지방의 향약마다 달랐다. 그러나 선행(善行)이 있는 사람은 지방관을 거쳐 조정에까지 알리게 하고, 악행(惡行)이 있는 사람은 처벌하게 하는 등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향약은 주현(주縣)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소규모의 향약으로 적용의 지역적 범위를 좁혀서 동약(洞約)·동계(洞契) 등이 실시된 곳도 많았다. 주현의 밑에 있었던 면·사·방의 장(長)은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면임(面任)·방수(坊首)·방장(坊長)·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정장(里正長)·관령(管領) 등 그 명칭이 많았고, 또 그 아래의 동·이·촌의 장도 존위(尊位)·약수(約首)·동수(洞首)·동장(洞長)·이정(里正)·두민(頭民)·좌상(座上)·영좌(領座)·통수(統首) 등 호칭이 여러 가지였다. 이들이 하던 일은 주현의 행정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특히 조세의 납부를 지휘하는 등 지방관청의 심부름이 주였다.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은 주현까지여서, 면 이하는 지방자치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향소의 좌수·별감의 천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 계통상으로는 수령보다는 향소 또는 향약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는 호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이 추대되어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자치(自治)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뒤에는 지방관청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점차 그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지방의 각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서울의 각 방에는 관령(管領)을 각각 두었다. 그 설치 목적은 주로 호구(戶口)를 파악하고, 또한 이웃끼리 서로 돕는 자치적인 조직을 갖추자는 데 있었다.
지방관의 위상
조선 시대에서 지방관은 소국의 제왕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이덕일) 지방관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군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수령고소금지법은 지방관의 활동에 많은 자유를 주게 된다.
지방관의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방지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두게 된다. 그리하여 관찰사의 경우 그 임기가 1년으로 매우 짧았다. 또한 상피제도가 있어 지방관은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해야만 했다. 지방관은 자신이 모르는 생소한 곳에서 근무하고 적응되면 짧은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조선사회에서는 수령의 횡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된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Ⅰ.조선의 정치행정기구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박영규 - 들녘
인터넷 사이트 http://dic.search.naver.com/
http://1392.org/
조선왕 독살사건 - 이덕일-다산초당
Ⅱ.조선시대 정치행정 체제 모형
조선 전기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택-단국대학교
Ⅲ붕당(朋黨)
당쟁으로 본 조선역사 - 이덕일-석필
조선시대 당쟁사 - 이상무- 동방미디어
Ⅳ조선의 군사제도
조선정치제도사- 장국종-한국문화사
오백년 전 관청이야기- 국민대학교 박물관
Ⅴ조선시대 지방행정
http://kin.naver.com/open100
http://blog.naver.com/ghwhq329?Redirect
http://kin.naver.com/db/detail.
조선 선비 살해사건-이덕일-다산초당
추천자료
 한국과 영국의 정부비교
한국과 영국의 정부비교 정책학원론_정부의 성과급제도와 정책분석
정책학원론_정부의 성과급제도와 정책분석 [청소년복지][복지]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교육의 목표 및 지도방향, 청소년복지의 내용, 청소...
[청소년복지][복지]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교육의 목표 및 지도방향, 청소년복지의 내용, 청소... [정부재정][정부재정정책][정부재정 특성][정부재정 기능][정부재정 구성][정부재정 범위][재...
[정부재정][정부재정정책][정부재정 특성][정부재정 기능][정부재정 구성][정부재정 범위][재... [정책학개론] 탈북자 문제와 정부정책 (탈북자의 현황분석, 탈북의 원인 및 방법, 탈북자 문...
[정책학개론] 탈북자 문제와 정부정책 (탈북자의 현황분석, 탈북의 원인 및 방법, 탈북자 문... [벤처창업][벤처창업 설립지원제도][벤처창업 정부지원정책]벤처창업의 정의, 벤처창업의 법...
[벤처창업][벤처창업 설립지원제도][벤처창업 정부지원정책]벤처창업의 정의, 벤처창업의 법...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mb정권,부동산시장및정책
이명박정부부동산정책,mb정권,부동산시장및정책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
무역과 투자에 관한 정부정책(무역 및 투자관련 정책목표, 무역정책관련 세계환경변화, 무역...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생활속의 경제]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의 재정, 정부지출정책, 조세, 조세와...
[생활속의 경제]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의 재정, 정부지출정책, 조세, 조세와... 정부정책론- 경제성장성책,성장정책의 필요성,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기술진보와 ...
정부정책론- 경제성장성책,성장정책의 필요성,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기술진보와 ... 실업 및 일자리 문제 사회복지적대책(정부실업정책, 실업정책문제점, 실업자현황)
실업 및 일자리 문제 사회복지적대책(정부실업정책, 실업정책문제점, 실업자현황) [정부정책관리(政府政策管理)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정부정책관리(政府政策管理)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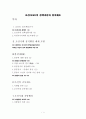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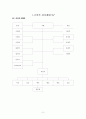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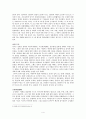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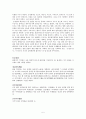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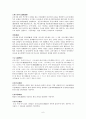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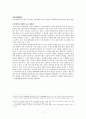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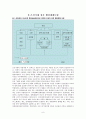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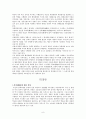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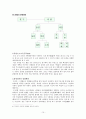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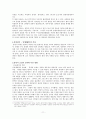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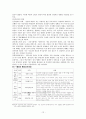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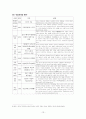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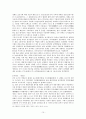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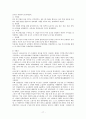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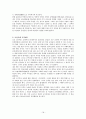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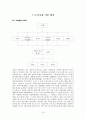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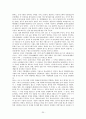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