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롤로그
2. 중국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 티베트
1) 주권논쟁과 티베트
2) 13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독립
3) 달라이 라마의 개혁 실패와 티베트의 운명
3. 티베트 문화권
1) 티베트의 어의와 그 지리적 개념
2) 토번 왕국과 티베트 민족의 형성
3) 티베트 불교교단의 정치세력화와 5세 달라이 라마 정권의 출현
4. 원명청조(元明淸朝)와 티베트
1) 후빌라이 칸과 팍파
2) 명대 조공체제와 티베트
3) 6세 달라이라마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청조의 티베트 통치 확립
5.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과 한장문화론(漢藏文化論)
2. 중국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 티베트
1) 주권논쟁과 티베트
2) 13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독립
3) 달라이 라마의 개혁 실패와 티베트의 운명
3. 티베트 문화권
1) 티베트의 어의와 그 지리적 개념
2) 토번 왕국과 티베트 민족의 형성
3) 티베트 불교교단의 정치세력화와 5세 달라이 라마 정권의 출현
4. 원명청조(元明淸朝)와 티베트
1) 후빌라이 칸과 팍파
2) 명대 조공체제와 티베트
3) 6세 달라이라마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청조의 티베트 통치 확립
5.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과 한장문화론(漢藏文化論)
본문내용
려 겔룩파는 청조라는 거대한 시주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겔룩파의 안정적이고 광범한 발전을 약속받았다.
사실 현재 몽골이나 청해에 남아 있는 겔룩파 사원은 대부분 강희(康熙) 연간 이후 주로 건륭(乾隆)·가경(嘉慶) 연간에 세워진 것들이며, 겔룩파 계통의 활불들이 각지에서 성장했던 것도 청조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당시 청조의 티베트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티베트는 청조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게 달라이 라마 정권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만약 5세 달라이 라마에게 청해 호쇼트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티베트 문화권 전체에 겔룩파가 전파되고, 달라이 라마가 정교(政敎)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을까?
달라이 라마 정권은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몽골과 청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3세에서 5세 달라이 라마에 이르는 시기, 복전과 시주 관계의 확대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영향권은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고, 각지의 시주와 달라이 라마 정권의 이익이 일치하는 한 이 정치적 연합은 순조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정치적 연합이 하나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청조가 달라이 라마 정권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번부(藩部)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계속>
5.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과 한장문화론(漢藏文化論)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래 중국정부는 ‘오족공화국가건설(五族共和國家建設)’이라는 중화민국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고, 각 민족은 자치구를 조직하고 각자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각 소수민족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중화민족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였다.
오늘날 중화의 개념은 이렇게 확대되어 버렸다. 그러나 티베트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했다. 서장의 장족은 중화대가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중원의 한족과 민족적·문화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 중국인이 티베트를 보는 시각 즉, 한장문화론이다. 먼저 중국학계는 티베트와 티베트 이외의 중국, 즉 한족을 중심으로 한 동부 제 민족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양자가 동일한 근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인류학·고고학·언어학 등을 통해 티베트와 그 주변에 거주하던 현재 장족의 조상들이 중원의 민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족과 장족의 문화가 같은 근원에서 발생했으며, 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보는 한장문화론은 특히 티베트가 중원 왕조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았던 시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것을 문화적 종속론의 근거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 간략하나마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복사(甲骨卜辭) 중에 강(羌)에 관련된 복사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국어(國語)》 《좌전(左傳)》의 기록을 바탕으로 강족이 화하(華夏)와 근원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화하족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황제(黃帝), 염제(炎帝) 중 염제가 강족(羌族)의 선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황하 상류인 감숙성(甘肅省) 임조(臨?), 청해성(靑海省) 황중현(湟中縣)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저족(?族) 경우는 하남성(河南省) 앙소(仰韶)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관계가 철저하게 중원의 민족을 중심에 두고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융(西戎) 또는 저강(?羌)이라고 언급된 민족과 그 분포지역은 황하 상류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현재 장족의 주체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인 것이다.
실제로 강저를 포괄해서 일컫는 서융이라는 말은 특정 민족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한족의 세계관이 넓어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한장문화론의 일부 내용은 상당히 엉성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장문화론의 기원은 1930년대로 소급된다. 당시 중국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지역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티베트 민족의 원류를 논하는 글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장일원론’은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을 이끌었던 주요한 논점이었다.
앞서 몽장위원회가 성립되고, 서방(西防)회의가 열렸던 시기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의 발전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민족학,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견해는 이후 티베트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한족문화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학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티베트학 학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를 보는 주도적 시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았다. 거기에는 티베트가 중국이어야 하는 근거도 있었고, 티베트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다.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와 국제기구간에 마찰이 있음을 알고 있다. 대외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이러한 인권문제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현재 티베트는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고 인민해방군에 의해 접수되던 당시보다 분명 안정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을 꼽으라면 티베트를 빠뜨릴 수 있을까? 중국의 서부 개발은 티베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만약 중국정부가 관광지로서의 티베트 개발에만 주력하고, 교육이나 기간산업 건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티베트의 다음 세대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는가? 아직도 중화대가정에는 적서(嫡庶)의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가?
사실 인도 망명 정부도 많은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봉건적 신분구조와 그 잔재를 어떻게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가, 개혁할 수 있는가가 분명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양자의 소리를 모두 귀기울여 들어봐야 할 것 같다.r
사실 현재 몽골이나 청해에 남아 있는 겔룩파 사원은 대부분 강희(康熙) 연간 이후 주로 건륭(乾隆)·가경(嘉慶) 연간에 세워진 것들이며, 겔룩파 계통의 활불들이 각지에서 성장했던 것도 청조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당시 청조의 티베트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티베트는 청조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게 달라이 라마 정권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만약 5세 달라이 라마에게 청해 호쇼트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티베트 문화권 전체에 겔룩파가 전파되고, 달라이 라마가 정교(政敎)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었을까?
달라이 라마 정권은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몽골과 청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3세에서 5세 달라이 라마에 이르는 시기, 복전과 시주 관계의 확대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영향권은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고, 각지의 시주와 달라이 라마 정권의 이익이 일치하는 한 이 정치적 연합은 순조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정치적 연합이 하나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청조가 달라이 라마 정권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번부(藩部)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계속>
5.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과 한장문화론(漢藏文化論)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래 중국정부는 ‘오족공화국가건설(五族共和國家建設)’이라는 중화민국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고, 각 민족은 자치구를 조직하고 각자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각 소수민족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중화민족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였다.
오늘날 중화의 개념은 이렇게 확대되어 버렸다. 그러나 티베트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했다. 서장의 장족은 중화대가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중원의 한족과 민족적·문화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 중국인이 티베트를 보는 시각 즉, 한장문화론이다. 먼저 중국학계는 티베트와 티베트 이외의 중국, 즉 한족을 중심으로 한 동부 제 민족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양자가 동일한 근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인류학·고고학·언어학 등을 통해 티베트와 그 주변에 거주하던 현재 장족의 조상들이 중원의 민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족과 장족의 문화가 같은 근원에서 발생했으며, 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보는 한장문화론은 특히 티베트가 중원 왕조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았던 시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것을 문화적 종속론의 근거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 간략하나마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복사(甲骨卜辭) 중에 강(羌)에 관련된 복사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국어(國語)》 《좌전(左傳)》의 기록을 바탕으로 강족이 화하(華夏)와 근원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화하족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황제(黃帝), 염제(炎帝) 중 염제가 강족(羌族)의 선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황하 상류인 감숙성(甘肅省) 임조(臨?), 청해성(靑海省) 황중현(湟中縣)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저족(?族) 경우는 하남성(河南省) 앙소(仰韶)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관계가 철저하게 중원의 민족을 중심에 두고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융(西戎) 또는 저강(?羌)이라고 언급된 민족과 그 분포지역은 황하 상류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현재 장족의 주체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인 것이다.
실제로 강저를 포괄해서 일컫는 서융이라는 말은 특정 민족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한족의 세계관이 넓어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한장문화론의 일부 내용은 상당히 엉성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장문화론의 기원은 1930년대로 소급된다. 당시 중국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지역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티베트 민족의 원류를 논하는 글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장일원론’은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을 이끌었던 주요한 논점이었다.
앞서 몽장위원회가 성립되고, 서방(西防)회의가 열렸던 시기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930년대 중국 티베트학의 발전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민족학,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견해는 이후 티베트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한족문화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학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티베트학 학자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를 보는 주도적 시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았다. 거기에는 티베트가 중국이어야 하는 근거도 있었고, 티베트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다.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와 국제기구간에 마찰이 있음을 알고 있다. 대외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이러한 인권문제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에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현재 티베트는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고 인민해방군에 의해 접수되던 당시보다 분명 안정적인 발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을 꼽으라면 티베트를 빠뜨릴 수 있을까? 중국의 서부 개발은 티베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만약 중국정부가 관광지로서의 티베트 개발에만 주력하고, 교육이나 기간산업 건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티베트의 다음 세대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는가? 아직도 중화대가정에는 적서(嫡庶)의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가?
사실 인도 망명 정부도 많은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봉건적 신분구조와 그 잔재를 어떻게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가, 개혁할 수 있는가가 분명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양자의 소리를 모두 귀기울여 들어봐야 할 것 같다.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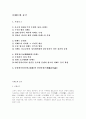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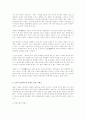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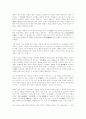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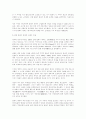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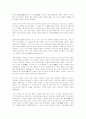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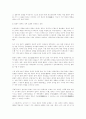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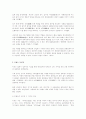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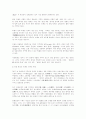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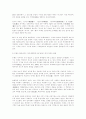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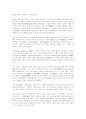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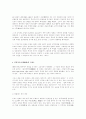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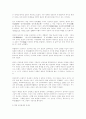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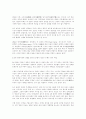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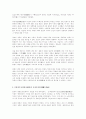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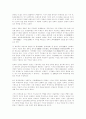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