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임나'라는 이름의 기원
II. 임나의 위치
Ⅲ. 임나일본부의 존속시기
Ⅳ. 임나일본부의 조직
Ⅴ. 임나일본부설의 성격
Ⅵ. 임나일본부에 관한 한 ·일 연구상황
II. 임나의 위치
Ⅲ. 임나일본부의 존속시기
Ⅳ. 임나일본부의 조직
Ⅴ. 임나일본부설의 성격
Ⅵ. 임나일본부에 관한 한 ·일 연구상황
본문내용
地方豪族과의 관련이 있는 왜인이거나 또는 왜인을 자칭한 임나인이었으므로 임나일본부는 임나에 있는 왜인 거류집단 내지 위 왜집단을 통치하는 자치기관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學說이 왜의 임나 정벌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논리를 출발한 것은 그만큼 정밀한 사료고증과정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데 왜인계통의 居住集團이 가야의 변경지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을 다스리는 자치기관도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의 위치는 안라국에 있으며 안라구에는 안라왕이 따로 있었으므로 일본부의 군현은 신라 백제와 가야연맹의 접경지대에 흩어져 있고 그 자치기관은 가야 중심지의 하나인 안라에 있었다는 것이 常識的으로 통하지 않는 논리라고 하겠다.
(4)外交使節設의 問題點
또한 임나일본부의 性格을 단순히 가야와 왜 사이의 외교교섭을 맡는 사신단 또는 외교기관으로 부는 연구경향도 있다. 그 내부에서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임나일본부는 왜가 안라에 임시 파견한 개개의 사신 또는 사신집단이라고 보는 사신단설, 왜가 아닌 별개의 왜가 가야에 파견하였던 외교 관인의 잔존형태라고 보는 잔존관인설, 임나가 대왜외교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外部官署라는 임나관서설 등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도 외부세력에 이한 임나지역 군사정벌이나 支配를 상정하지 않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임시로 파견된 사신 또는 사신집단이라면 사신으로서의 意思傳達을 마치고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日本부서인 적신은 적어도 12년 이상을 안라 한곳에서 滯留하다가 거기서 죽은 것을 나타나고 그 휘하의 길비신 .하내직 등도 거의 비슷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안라 지역에서 活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왕권이 그들을 안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신단설로는 이러한 現象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殘存官人設과 같이 임나일본부가 흠명천황으로 대변되는 대화의 왜가 아닌 구주나 길용지방의 왜정권에서 파견된 官人들이었다 한다면 백제가 그들의 처지에 대항 대화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 백제는 임나일본부 관인의 일원인 이나기 마부를 본처로 보내도록 대화의 왜정권에게 要請하고 있으며 적신의 후임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나관서설에서 임나일본부가 신라의 왜전과 같은 性格으로서 임나가 설치한 외무관서하고 본 것은 임나의 主體的 설치 의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아무리 대왜의 外交를 주로 擔當한다고 하더라도 임나의 관서라면 임나인 관리가 위주로 되어야 할텐데 흠명기15년 12월조의 백제가 왜에 보낸 국서에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대신에 \'재안라제왜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명칭이 「百濟本紀」 계통의 원사료의 기제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임나일본부의 관리는 모두 일단 왜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임나가 설치한 순수한 외무관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Ⅵ. 임나일본부에 관한 한 ·일 연구상황
1. 일본학계
敗戰직후 에가미는 日本考古學의 成果들을 綜合하여 한 ·일관계사에 응용하여 \"기마 민족 정복 왕조설\"을 하여 동북아시아 계통의 기마 민족이 한동안 남한을 지배하다가 진왕의 자손이 4세기초에 일본 북큐수로 건너가 왜한(倭韓)연합왕조를 건국하고 스진천황이 되었으며, 5세기초에는 그의 자손인 오진천황이 북큐수에서 기나이로 진출하여 야마토(大和)왕조를 창시한 후, 일본열도를 통합하고 한반도남부를 경영하다가, 7세기 중엽이후 손을 땠다는고 주장했다.
2. 북한학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북한의 김석형은「일본서기」와 일본 고고학 자료들을 가지고 日本列島 내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일 關係詞 領域을 개척하여 이른바■■분국설■■을 내놓았다. 임나일본부는 6세기초이래 백제계통의 소국으로 보이는 야마토 政權에 의하여 통일되기 시작한 시기에 야마토 왜 왕권의 기비지방의 임나소국에서의 지배기관이었다고 보 았다.
1970년대에 들어 기존의 南韓 경영설에 대한 反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노우에는 「일본서기」의 사료계통의 원정을 추출해내어 분석하는 方法論을 써서 좀더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광개토왕비문」의 왜군이나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관계기사들은, 왜인을 자칭하는 임나의 한 토착세력이 일본의 중앙귀족이나 지방호족과 관계를 가진 것에 의하여 그 세력을 확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학자의 연구 결과 중에서 왜왕권의 임나지배를 부인한 최초의 것으로서 주목된다.
3. 한국학계
천관우 선생은■■백제군사령부설■■을 제기하여 4세기 중엽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제국을 군사정벌하여 백제권에 편입시킨 이후 6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을 統治하였으며, \'任那日本部\'란 곧 백제가 가야지역에 파견하여 군대의 사령부였다는 것이다.
1996년에 발표된 스즈기의 著書 「고대왜국과 조선제국」이다. 여기서 6세기 전반 왜왕권은 한반도의 금속. 문물을 수입하는 대신에 백제에의 병사파견, 무기공급과 같은 군사력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백제의 ■■용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는 基本的으로 자립한 왕권사이의 동맹관계이나, 백제가 왜왕에게 볼모를 보내고 왜군의 파견을 구한 시기의 관계는 왜국을 주 백제를 종으로 하는■■從屬的 同盟■■關係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라에 있었던■■임나일본부■■즉 왜왕이 파견한 軍事力을 가진 \'제왜신\'은 왜왕의 통제아래 있었고, 왜왕권이 안라의 軍司 ·外交에 관여한 형적이 있었으므로, 왜왕권과 안라의 관계는■■종속적 동맹■■에서 진일보한 종속형태라고 하였다. 결론의 내용은 30여년동안 百濟와 안라가 왜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그러나 그의 근거는 왜왕권의 軍隊가 안라에서 1년간 自立的인 활동을 하였다는 不確實하고 미약한 증거와, 왜국에 居住하던 百濟의 고위귀족을 「일본서기」에서 종종 ■■質■■로 기록한 常套的 表現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그의 結論은 客觀的 事實性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하였다.
참 고 문 헌
『가야연맹사』, 김태식, 일조각, 1993
역사비평의 \"광개토왕릉과 임나일본부설\", 김태식
위의 學說이 왜의 임나 정벌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논리를 출발한 것은 그만큼 정밀한 사료고증과정에 힘입은 것이다. 그런데 왜인계통의 居住集團이 가야의 변경지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을 다스리는 자치기관도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의 위치는 안라국에 있으며 안라구에는 안라왕이 따로 있었으므로 일본부의 군현은 신라 백제와 가야연맹의 접경지대에 흩어져 있고 그 자치기관은 가야 중심지의 하나인 안라에 있었다는 것이 常識的으로 통하지 않는 논리라고 하겠다.
(4)外交使節設의 問題點
또한 임나일본부의 性格을 단순히 가야와 왜 사이의 외교교섭을 맡는 사신단 또는 외교기관으로 부는 연구경향도 있다. 그 내부에서도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임나일본부는 왜가 안라에 임시 파견한 개개의 사신 또는 사신집단이라고 보는 사신단설, 왜가 아닌 별개의 왜가 가야에 파견하였던 외교 관인의 잔존형태라고 보는 잔존관인설, 임나가 대왜외교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外部官署라는 임나관서설 등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도 외부세력에 이한 임나지역 군사정벌이나 支配를 상정하지 않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임시로 파견된 사신 또는 사신집단이라면 사신으로서의 意思傳達을 마치고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日本부서인 적신은 적어도 12년 이상을 안라 한곳에서 滯留하다가 거기서 죽은 것을 나타나고 그 휘하의 길비신 .하내직 등도 거의 비슷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안라 지역에서 活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왜왕권이 그들을 안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신단설로는 이러한 現象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殘存官人設과 같이 임나일본부가 흠명천황으로 대변되는 대화의 왜가 아닌 구주나 길용지방의 왜정권에서 파견된 官人들이었다 한다면 백제가 그들의 처지에 대항 대화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 백제는 임나일본부 관인의 일원인 이나기 마부를 본처로 보내도록 대화의 왜정권에게 要請하고 있으며 적신의 후임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나관서설에서 임나일본부가 신라의 왜전과 같은 性格으로서 임나가 설치한 외무관서하고 본 것은 임나의 主體的 설치 의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아무리 대왜의 外交를 주로 擔當한다고 하더라도 임나의 관서라면 임나인 관리가 위주로 되어야 할텐데 흠명기15년 12월조의 백제가 왜에 보낸 국서에는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대신에 \'재안라제왜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명칭이 「百濟本紀」 계통의 원사료의 기제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임나일본부의 관리는 모두 일단 왜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임나가 설치한 순수한 외무관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Ⅵ. 임나일본부에 관한 한 ·일 연구상황
1. 일본학계
敗戰직후 에가미는 日本考古學의 成果들을 綜合하여 한 ·일관계사에 응용하여 \"기마 민족 정복 왕조설\"을 하여 동북아시아 계통의 기마 민족이 한동안 남한을 지배하다가 진왕의 자손이 4세기초에 일본 북큐수로 건너가 왜한(倭韓)연합왕조를 건국하고 스진천황이 되었으며, 5세기초에는 그의 자손인 오진천황이 북큐수에서 기나이로 진출하여 야마토(大和)왕조를 창시한 후, 일본열도를 통합하고 한반도남부를 경영하다가, 7세기 중엽이후 손을 땠다는고 주장했다.
2. 북한학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북한의 김석형은「일본서기」와 일본 고고학 자료들을 가지고 日本列島 내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일 關係詞 領域을 개척하여 이른바■■분국설■■을 내놓았다. 임나일본부는 6세기초이래 백제계통의 소국으로 보이는 야마토 政權에 의하여 통일되기 시작한 시기에 야마토 왜 왕권의 기비지방의 임나소국에서의 지배기관이었다고 보 았다.
1970년대에 들어 기존의 南韓 경영설에 대한 反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노우에는 「일본서기」의 사료계통의 원정을 추출해내어 분석하는 方法論을 써서 좀더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광개토왕비문」의 왜군이나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관계기사들은, 왜인을 자칭하는 임나의 한 토착세력이 일본의 중앙귀족이나 지방호족과 관계를 가진 것에 의하여 그 세력을 확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학자의 연구 결과 중에서 왜왕권의 임나지배를 부인한 최초의 것으로서 주목된다.
3. 한국학계
천관우 선생은■■백제군사령부설■■을 제기하여 4세기 중엽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제국을 군사정벌하여 백제권에 편입시킨 이후 6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을 統治하였으며, \'任那日本部\'란 곧 백제가 가야지역에 파견하여 군대의 사령부였다는 것이다.
1996년에 발표된 스즈기의 著書 「고대왜국과 조선제국」이다. 여기서 6세기 전반 왜왕권은 한반도의 금속. 문물을 수입하는 대신에 백제에의 병사파견, 무기공급과 같은 군사력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백제의 ■■용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는 基本的으로 자립한 왕권사이의 동맹관계이나, 백제가 왜왕에게 볼모를 보내고 왜군의 파견을 구한 시기의 관계는 왜국을 주 백제를 종으로 하는■■從屬的 同盟■■關係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라에 있었던■■임나일본부■■즉 왜왕이 파견한 軍事力을 가진 \'제왜신\'은 왜왕의 통제아래 있었고, 왜왕권이 안라의 軍司 ·外交에 관여한 형적이 있었으므로, 왜왕권과 안라의 관계는■■종속적 동맹■■에서 진일보한 종속형태라고 하였다. 결론의 내용은 30여년동안 百濟와 안라가 왜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그러나 그의 근거는 왜왕권의 軍隊가 안라에서 1년간 自立的인 활동을 하였다는 不確實하고 미약한 증거와, 왜국에 居住하던 百濟의 고위귀족을 「일본서기」에서 종종 ■■質■■로 기록한 常套的 表現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그의 結論은 客觀的 事實性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하였다.
참 고 문 헌
『가야연맹사』, 김태식, 일조각, 1993
역사비평의 \"광개토왕릉과 임나일본부설\", 김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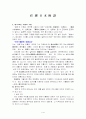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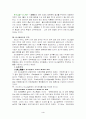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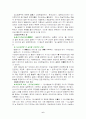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