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1946년 이전의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1. 공무원과 결사 자유
2. 공무원 조합권의 인정에 관한 문제의 논의
III. 프랑스 공무원의 조합권 인정과 노동조합의 결성
1. 공무원조합의 합법적 승인
2. 공무원조합의 법적체제
IV. 맺는말
II. 1946년 이전의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1. 공무원과 결사 자유
2. 공무원 조합권의 인정에 관한 문제의 논의
III. 프랑스 공무원의 조합권 인정과 노동조합의 결성
1. 공무원조합의 합법적 승인
2. 공무원조합의 법적체제
IV. 맺는말
본문내용
)
주23) L\'article 15 du decret du 29 juillet 1964 et l\'article 18 du decret du 14 mars 1964.
주24) L\'article 10 de la loi du 13 juillet 1972.
주25) C. E., 5 novembre 1976, Lyon-Caen, Rec. p.472.
_ 또한 조합원인 공무원은 그 지위가 조합간부이건 아니건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le devoird\' obeissance su superieur hierarchique)를 면할 수는 없다.주26)
주26) 앞의 주21)에서 언급한 Etienne사건과 Frischmann사건 참조.
_ 셋째, 공무원조합권은 공무의 필요성(les necessites du service)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면제와 관련해서 생겨난다. 행정기관은 공무원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업무의 면제를 특별히 허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상 조합의 활동(l\'interet du service)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27)
주27) C. E., 23 decembre 1964, Lefrere, Rec. p.663.
IV. 맺는말
_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공무원에게 조합권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지 않다. 물론 과거에는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던 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1946년부터는 합법적으로 공무원의 조합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는 이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_ 공무원이란 국민의 공공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야말로 공복으로서의 조건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이익의 증진은 이제 더 이상 상급기관의 자위적인 행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법이 공무원 조합을 인정하게 된 출발점이다.
[288] _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무 그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조합에서 대화 상대자는 사용주(le patron)가 아니라 정부(le gouvernement)라는 점을 들어, 조합활동이 공무원사회내에서는 특수한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무원조합권의 행사로 공무원 보수문제 등에 있어서 서로간의 협상형식으로 차츰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 프랑스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조합단체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_ 여기서 또한 프랑스 공무원조합활동은 분명히 그 자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계성이 바로 프랑스 공무원조합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_ 끝으로, 프랑스 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조합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까지는 50여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또한 오늘날까지 공무원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조합권의 행사와 잘 조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입법 판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23) L\'article 15 du decret du 29 juillet 1964 et l\'article 18 du decret du 14 mars 1964.
주24) L\'article 10 de la loi du 13 juillet 1972.
주25) C. E., 5 novembre 1976, Lyon-Caen, Rec. p.472.
_ 또한 조합원인 공무원은 그 지위가 조합간부이건 아니건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le devoird\' obeissance su superieur hierarchique)를 면할 수는 없다.주26)
주26) 앞의 주21)에서 언급한 Etienne사건과 Frischmann사건 참조.
_ 셋째, 공무원조합권은 공무의 필요성(les necessites du service)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이미 앞에서 언급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면제와 관련해서 생겨난다. 행정기관은 공무원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업무의 면제를 특별히 허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상 조합의 활동(l\'interet du service)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27)
주27) C. E., 23 decembre 1964, Lefrere, Rec. p.663.
IV. 맺는말
_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공무원에게 조합권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지 않다. 물론 과거에는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던 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1946년부터는 합법적으로 공무원의 조합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는 이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_ 공무원이란 국민의 공공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야말로 공복으로서의 조건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이익의 증진은 이제 더 이상 상급기관의 자위적인 행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법이 공무원 조합을 인정하게 된 출발점이다.
[288] _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무 그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조합에서 대화 상대자는 사용주(le patron)가 아니라 정부(le gouvernement)라는 점을 들어, 조합활동이 공무원사회내에서는 특수한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무원조합권의 행사로 공무원 보수문제 등에 있어서 서로간의 협상형식으로 차츰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 프랑스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조합단체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_ 여기서 또한 프랑스 공무원조합활동은 분명히 그 자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계성이 바로 프랑스 공무원조합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_ 끝으로, 프랑스 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조합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까지는 50여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또한 오늘날까지 공무원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조합권의 행사와 잘 조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입법 판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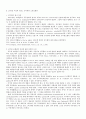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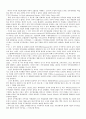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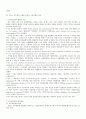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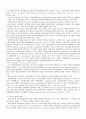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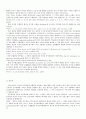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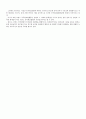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