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약정담보물권성
2. 우선변제권성
3. 부종성
4. 수반성
5. 불가분성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약정담보물권성
2. 우선변제권성
3. 부종성
4. 수반성
5. 불가분성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본문내용
필의 토지의 전부 또는 공유지분의 전부를 압류·환가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A와 B의 공유인 부동산 중 A의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분할로 저당권설정자인 A의 단독소유로 된 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위하고 있다.
2. 建物
一棟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主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共有部分의 지분은 專有部分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優劣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3. 地上權과 傳貰權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
Ⅳ. 被擔保債權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한느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채권도 채무불이행시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가액은 이를 산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140조, 제143조).
Ⅴ.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1.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제649조). 이 제도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이 인정한 유일한 법정저당권이다. 법정저당권의 성립시기는 압류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다.
2.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666조). 이 제도는 부동산공사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도급인의 동의나 등기없이 법률상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2. 建物
一棟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主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共有部分의 지분은 專有部分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優劣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3. 地上權과 傳貰權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
Ⅳ. 被擔保債權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한느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채권도 채무불이행시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가액은 이를 산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140조, 제143조).
Ⅴ.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1.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제649조). 이 제도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이 인정한 유일한 법정저당권이다. 법정저당권의 성립시기는 압류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다.
2.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666조). 이 제도는 부동산공사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도급인의 동의나 등기없이 법률상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인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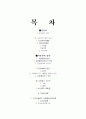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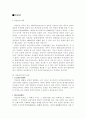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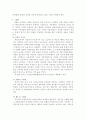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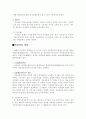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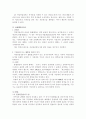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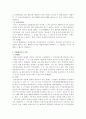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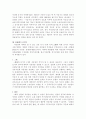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