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염상섭 단편소설 특징
염상섭의 중기 단편
결론
염상섭의 중기 단편
결론
본문내용
어떤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이미 38선의 경비초소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미군 병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해방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권영민, 앞의책, pp.322-323 참조.
「38선」과 「모략」의 경우에서 보듯 작가 염상섭은 자신의 공백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체험의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다른 소설에서 찾을 수 없는 소설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의 중기 단편인 「해방의 아들」「38선」 계열 이후의 작품들은 「盜難難」「移徙」「양과자갑」등으로 해방 이후의 세태 풍속을 그리는 것으로 집중된다. 그나마 가졌던 역사의식이 이들 작품군 에서는 급격하게 희박해져 해방의 의미는 풍속의 차원으로 숨어버린다.
이러한 풍속에의 복귀가 해방 이후의 피난과 정착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복귀의 과정은 38선을 넘을 때까지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아들」계열의 소설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보다는 시대의 증언에 기울어진 전형적인 과도기의 소설이다. 이것은 이 시기 소설의 공통점으로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에 힘을 쏟은 작품들 역시 오늘의 안목으로 보면 시대의 증언 계통의 작품으로 해석된다. 역사를 객관화하기에는 시대의 격변 양상이 그만큼 격렬했고 그 격렬한 시대의 파고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권영민, 앞의책, p.205.
결론
지금까지 염상섭의 해방 직후의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염상섭의 작품활동은 거의 다 자기 체험의 정리 작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이합과 재회를 거듭해야 하는 민족의 현실을 놓고, 염상섭은 일단 어떠한 이념적 지향도 그 선택을 유보하였다. 그는 결코 흥분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비판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해방 직후부터 겪어야 했던 개인적 체험을 담담하게 기술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패망한 일본에 대한 증오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결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의 이념적 지향이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가 만주에서 서울에까지 돌아온 과정 자체가 이념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듯이 그의 소설 속에서도 그러한 귀환의 과정은 본래적인 삶에의 복귀 이외에 다른 뜻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상섭의 태도는 당시 이념적인 회색분자 또는 중간파로 지목되기 충분한 것인데, 오히려 염상섭 자신에게는 이러한 태도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참고 문헌
권영민, 「廉想涉全集」, 민음사, 1987.
권영민, 「염상섭전집 - 중기단편」, 민음사, 1987.
김우창,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뿌리 깊은 나무』, 1976.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 일지사, 1985.
김종균,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74.
유종호, 「한국 리얼리즘의 限界」, 민음사, 1982.
권영민, 앞의책, pp.322-323 참조.
「38선」과 「모략」의 경우에서 보듯 작가 염상섭은 자신의 공백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체험의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다른 소설에서 찾을 수 없는 소설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의 중기 단편인 「해방의 아들」「38선」 계열 이후의 작품들은 「盜難難」「移徙」「양과자갑」등으로 해방 이후의 세태 풍속을 그리는 것으로 집중된다. 그나마 가졌던 역사의식이 이들 작품군 에서는 급격하게 희박해져 해방의 의미는 풍속의 차원으로 숨어버린다.
이러한 풍속에의 복귀가 해방 이후의 피난과 정착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복귀의 과정은 38선을 넘을 때까지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아들」계열의 소설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보다는 시대의 증언에 기울어진 전형적인 과도기의 소설이다. 이것은 이 시기 소설의 공통점으로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에 힘을 쏟은 작품들 역시 오늘의 안목으로 보면 시대의 증언 계통의 작품으로 해석된다. 역사를 객관화하기에는 시대의 격변 양상이 그만큼 격렬했고 그 격렬한 시대의 파고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권영민, 앞의책, p.205.
결론
지금까지 염상섭의 해방 직후의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염상섭의 작품활동은 거의 다 자기 체험의 정리 작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이합과 재회를 거듭해야 하는 민족의 현실을 놓고, 염상섭은 일단 어떠한 이념적 지향도 그 선택을 유보하였다. 그는 결코 흥분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비판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이 해방 직후부터 겪어야 했던 개인적 체험을 담담하게 기술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패망한 일본에 대한 증오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결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의 이념적 지향이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가 만주에서 서울에까지 돌아온 과정 자체가 이념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듯이 그의 소설 속에서도 그러한 귀환의 과정은 본래적인 삶에의 복귀 이외에 다른 뜻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상섭의 태도는 당시 이념적인 회색분자 또는 중간파로 지목되기 충분한 것인데, 오히려 염상섭 자신에게는 이러한 태도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참고 문헌
권영민, 「廉想涉全集」, 민음사, 1987.
권영민, 「염상섭전집 - 중기단편」, 민음사, 1987.
김우창,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뿌리 깊은 나무』, 1976.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사」, 일지사, 1985.
김종균,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74.
유종호, 「한국 리얼리즘의 限界」, 민음사,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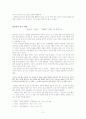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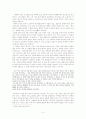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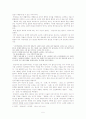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