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해조
2. 《빈상설》내면적 갈등의 제양상
3. 《구마검》무속적 세계와 합리적 세계의 갈등
Ⅲ 결론
Ⅱ 본론
1. 이해조
2. 《빈상설》내면적 갈등의 제양상
3. 《구마검》무속적 세계와 합리적 세계의 갈등
Ⅲ 결론
본문내용
하게 살았다.
이 작품은 악인 모해형이다. 미신타파는 고대소설의 주제와 일치한다. 公案類 소설이다.
) 이동
이러한 점에서 개화사상의 한 조목인 반미신사상이 좀 더 확대 발전되고 계승되었더라면 한국의 개화사상은 더욱 성숙하였을 것이라는 임화의 견해는
) 임화, \"개설조선신문학사\"(2회), 「인문평론」,5권제14호 참조.
설득력을 얻게 된다.
6)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장면
또한 이 작품은 미신타파의 주제의식 이외에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장면이 주목할만 하다.
문쟝이춈회의쳐리힝싶건을칭계로가부표를밧아죵다슈취결힝다딪「(…)그아힝로뎡힝다것이엇더한고여러일가가일시에한마딪말로가힝오이다」(…)문쟝이여러사링에게가부를무르니힝한일구동성(一口同聲)으로만호말을잔셩힝다지라(「구마검」,pp.66-67.아세아전집⑤)
이러한 회의장면이나, 함진해의 양자 함종표를 법률전문학교에 보내어 평리원 판사가 되게 하여 사건처리를 재판에 의해 하도록 설정한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작가의 또 다른 지향적 욕구인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빈상설」을 바라보는 두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근대적 정신이 결여되고, 구소설적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새로울 것 없는 신소설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소설적 요소와 근대정신의 각성을 적절한 혼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로 보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이용남 교수의 논의의 정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첫째, 「빈상설」은 전통적 윤리관과 근대적 각성의 혼합구조이다.
둘째, 전통적 윤리관인 유교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봉건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면이 보이기도 하며, 이 작품의 주역인 여성들에 대한 여성관도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여 구소설적 요소를 보이기도 한다.
셋째, 근대적 각성은 신결혼관과 해외유학을 포함한 과도기적 시대상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내고 있다.
해외유학은 현실도피를 위한 유학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과도기적 시대상은 부패한 관리를 사회 고발하는 것과 근대적 재판형식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빈상설」은 \'축첩으로 인한 가정비극\'을 제재로 하면서 축첩제도에 대한 근대적 비판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 李龍男, 「韓國近代文學과 作家意識」, 1997, pp.38∼39.
위의 정리를 살펴보면 「빈상설」은 구소설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빈상설」을 혼합에 실패한 소설로 본다는 것은 많은 신소설적 요소들이 그 자리를 잃어간다. 이 작품에 나온 신소설적 요소들은 단순히 구소설에 혼합이 잘못된 불순물이 아니라 구소설의 전통적 윤리관속에서도 근대적 정신의 각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여줘야 하는지 잘 나타내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해조는 「구마검」을 통해 개화기 시대 사조인 개화계몽의 의지를 펼치고 민중의 생활원리로서 널리 퍼져 있는 민간신앙을 소재로 하여 과학적 합리주의의 고양을 주창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작품은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조의 선과 악의 구분은 개화와 미개화의 이분법이다. 작가는 무당이나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을 무조건 미개인이며 문명개화를 저해하는 악습적 요소를 맹신하는 인물로서 파악하는 데 이는 남의 것에 대한 맹목적 흠모와 더불어 자기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하의 감정을 드러난 것이다. 무당을 좋아하는 집에는 의례히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조가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고관의 대표적 발상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통해 \'우리의 개화기의 작가들에게는 남의 것을 받아 받아들이기에 앞선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없었다\'
) 천이두, 「개화기문학에의 한 반성」, 『신문학과 시대의식』, 1981
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이는 이해조가 우리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민간신앙에 대한 직설적 부정 그 이면에 우주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고와 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마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문화와 서구문화로 대변되는 두 인물군의 대립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한 「구마검」은 무속적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로 전이되는 시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속이 담겨있는 비합리성을 노출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신소설적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대소설적 구성요소가 엿보이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은 악인 모해형이다. 미신타파는 고대소설의 주제와 일치한다. 公案類 소설이다.
) 이동
이러한 점에서 개화사상의 한 조목인 반미신사상이 좀 더 확대 발전되고 계승되었더라면 한국의 개화사상은 더욱 성숙하였을 것이라는 임화의 견해는
) 임화, \"개설조선신문학사\"(2회), 「인문평론」,5권제14호 참조.
설득력을 얻게 된다.
6)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장면
또한 이 작품은 미신타파의 주제의식 이외에 민주주의 방식의 회의장면이 주목할만 하다.
문쟝이춈회의쳐리힝싶건을칭계로가부표를밧아죵다슈취결힝다딪「(…)그아힝로뎡힝다것이엇더한고여러일가가일시에한마딪말로가힝오이다」(…)문쟝이여러사링에게가부를무르니힝한일구동성(一口同聲)으로만호말을잔셩힝다지라(「구마검」,pp.66-67.아세아전집⑤)
이러한 회의장면이나, 함진해의 양자 함종표를 법률전문학교에 보내어 평리원 판사가 되게 하여 사건처리를 재판에 의해 하도록 설정한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작가의 또 다른 지향적 욕구인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빈상설」을 바라보는 두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근대적 정신이 결여되고, 구소설적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새로울 것 없는 신소설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소설적 요소와 근대정신의 각성을 적절한 혼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로 보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이용남 교수의 논의의 정리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첫째, 「빈상설」은 전통적 윤리관과 근대적 각성의 혼합구조이다.
둘째, 전통적 윤리관인 유교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봉건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면이 보이기도 하며, 이 작품의 주역인 여성들에 대한 여성관도 전통적 미덕을 강조하여 구소설적 요소를 보이기도 한다.
셋째, 근대적 각성은 신결혼관과 해외유학을 포함한 과도기적 시대상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내고 있다.
해외유학은 현실도피를 위한 유학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과도기적 시대상은 부패한 관리를 사회 고발하는 것과 근대적 재판형식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빈상설」은 \'축첩으로 인한 가정비극\'을 제재로 하면서 축첩제도에 대한 근대적 비판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 李龍男, 「韓國近代文學과 作家意識」, 1997, pp.38∼39.
위의 정리를 살펴보면 「빈상설」은 구소설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빈상설」을 혼합에 실패한 소설로 본다는 것은 많은 신소설적 요소들이 그 자리를 잃어간다. 이 작품에 나온 신소설적 요소들은 단순히 구소설에 혼합이 잘못된 불순물이 아니라 구소설의 전통적 윤리관속에서도 근대적 정신의 각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여줘야 하는지 잘 나타내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해조는 「구마검」을 통해 개화기 시대 사조인 개화계몽의 의지를 펼치고 민중의 생활원리로서 널리 퍼져 있는 민간신앙을 소재로 하여 과학적 합리주의의 고양을 주창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작품은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조의 선과 악의 구분은 개화와 미개화의 이분법이다. 작가는 무당이나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을 무조건 미개인이며 문명개화를 저해하는 악습적 요소를 맹신하는 인물로서 파악하는 데 이는 남의 것에 대한 맹목적 흠모와 더불어 자기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하의 감정을 드러난 것이다. 무당을 좋아하는 집에는 의례히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조가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고관의 대표적 발상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통해 \'우리의 개화기의 작가들에게는 남의 것을 받아 받아들이기에 앞선 우리 자신의 것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없었다\'
) 천이두, 「개화기문학에의 한 반성」, 『신문학과 시대의식』, 1981
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이는 이해조가 우리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민간신앙에 대한 직설적 부정 그 이면에 우주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고와 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마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문화와 서구문화로 대변되는 두 인물군의 대립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한 「구마검」은 무속적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로 전이되는 시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속이 담겨있는 비합리성을 노출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신소설적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고대소설적 구성요소가 엿보이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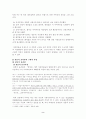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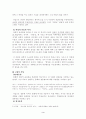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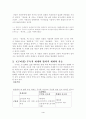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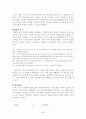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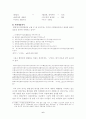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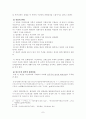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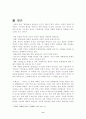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