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동진귀족의 성격
2) 東晋 貴族 南北人의 關係
- 대립적인 측면에서 -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Ⅱ. 本 論
1) 동진귀족의 성격
2) 東晋 貴族 南北人의 關係
- 대립적인 측면에서 -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수 있었으니 결국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북인우위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結 論
4세기 초 東晋王朝 성립 이래로 門閥貴族體制가 확립되어 갔다. 이 문벌귀족 내에는 家格 출신지역 등으로 여러 계층으로 분류된다. 크게 분류하면 강남 토착호족과 북방으로부터의 流寓貴族의 두 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상, 사회상에서 후자가 전자의 上位에 위치하고 전자는 南朝 문벌귀족에서도 二流 이하의 下級階層이 대두하고 兩者의 우열을 판가름한 것은 양말 陳草의 혼란이다. 이 소란 과정에서 王謝二氏를 비롯한 門閥 貴族은 流離, 敗梁 해서 살아남은 자는 극히 적었다. 여기서 인적 구성면에서 門閥 貴族制의 쇠퇴를 간파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東晋 官僚의 출신지역을 통해서 보면 종래의 下流貴族으로 대우받던 강남 土着 出身의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北方 出身者와의 비율이 반반으로 되고 있다. 江南 土豪出身 중에서도 양주 출신이 8할을 점하고 官僚 전체비로는 3할 7푼이 되고 있다. 그래서 晋 王朝는 江南 土着勢力 특히 그 중에서도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土豪勢力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門閥體制下에서 중앙관계 중앙귀족사회에서 억압, 소외되었던 호족, 또는 하위 계층의 대두는 尙書省 고급 관료 중에서도 역력히 보이고 특히 武將들은 門閥 貴族의 권외에 존재했던 豪族 土豪 出身이다. 이들은 宗族, 私附뿐만 아니라. 향리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諸勢力을 기반으로 軍事力을 결집, 전란을 극복하고 관료, 귀족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李公範, 『南朝貴族社會의 硏究』延世大學校 박사(학위), 1984, P 107
偉景亂에서 陳朝의 성립에 걸쳐 호족 토호층의 진출은 南朝 門閥貴族 體制에 대한 반항 또는 비판의 움직임으로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陳朝의 정치사회는 호족적 下級 貴族 武將들이 主役을 담당하고 전통적인 名文貴族은 무대의 장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豪族土豪層이 政治社會面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했다고 해서 이것은 곧 사회의 일대 전환이나 社會革命이리고 보는 데에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호족층이 기성 문벌귀족 체제하에서 억압되었다가 전란을 기회로 武功을 세우고 또 왕조 수립에 참여해서 군주와 밀접히 결탁해서 그들 자신이 문벌귀족체제 속에 포용되어 근본적으로 문벌귀족 체제를 부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남인들은 결코 어떠한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북인의 대립에서 주권권을 쥐고자 하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南朝의 명문고족은 역사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門閥 尊重의 餘風은 남아있다. 신흥세력이 문벌체제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도 아니고 신흥층 자체가 문벌귀족체제에 진출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결국 진 왕조 종래의 문벌귀족에 대체해서 下級貴族 내지 豪族土豪層이 문무 고위 관료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지배계급 내부의 지배층 지위의 전열이지 사회혁명이나 사회전환으로 볼 수 있는 질적 변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북인귀족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남인귀족에게 동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의 이민족 정권이었던 북내인 귀족이 결코 정신적으로 무조건 강남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념과 염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인귀족보다 우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중원회복이라는 염원하에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져버리지 못했던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내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문화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 측면에서 동진 귀족사회에서의 북인귀족과 남인귀족에 대한 평가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朴亭寬, 『東晋貴族硏究』, 崇田大學校 박사(학위), 1982.
谷川道雄 외 6명, 『日本의 中國史論爭』신서원, 1996,
李公範, 『南朝貴族社會의 硏究』延世大學校 박사(학위), 1984
중국사연구회, 『중국통사』, 청년사, 1993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4
김한국 외 2명, 『동아시아 연표』, 영민사, 1993
서울대학교 출판부, 『講座中國史-Ⅱ』, 지식산업사, 1995
琴地樹 『東晋 南北人 貴族의 地緣的 對立問題』 慶北大學校 박사(학위), 1983
목 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동진귀족의 성격
2) 東晋 貴族 南北人의 關係
- 대립적인 측면에서 -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結 論
4세기 초 東晋王朝 성립 이래로 門閥貴族體制가 확립되어 갔다. 이 문벌귀족 내에는 家格 출신지역 등으로 여러 계층으로 분류된다. 크게 분류하면 강남 토착호족과 북방으로부터의 流寓貴族의 두 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상, 사회상에서 후자가 전자의 上位에 위치하고 전자는 南朝 문벌귀족에서도 二流 이하의 下級階層이 대두하고 兩者의 우열을 판가름한 것은 양말 陳草의 혼란이다. 이 소란 과정에서 王謝二氏를 비롯한 門閥 貴族은 流離, 敗梁 해서 살아남은 자는 극히 적었다. 여기서 인적 구성면에서 門閥 貴族制의 쇠퇴를 간파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東晋 官僚의 출신지역을 통해서 보면 종래의 下流貴族으로 대우받던 강남 土着 出身의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北方 出身者와의 비율이 반반으로 되고 있다. 江南 土豪出身 중에서도 양주 출신이 8할을 점하고 官僚 전체비로는 3할 7푼이 되고 있다. 그래서 晋 王朝는 江南 土着勢力 특히 그 중에서도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土豪勢力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門閥體制下에서 중앙관계 중앙귀족사회에서 억압, 소외되었던 호족, 또는 하위 계층의 대두는 尙書省 고급 관료 중에서도 역력히 보이고 특히 武將들은 門閥 貴族의 권외에 존재했던 豪族 土豪 出身이다. 이들은 宗族, 私附뿐만 아니라. 향리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諸勢力을 기반으로 軍事力을 결집, 전란을 극복하고 관료, 귀족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李公範, 『南朝貴族社會의 硏究』延世大學校 박사(학위), 1984, P 107
偉景亂에서 陳朝의 성립에 걸쳐 호족 토호층의 진출은 南朝 門閥貴族 體制에 대한 반항 또는 비판의 움직임으로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陳朝의 정치사회는 호족적 下級 貴族 武將들이 主役을 담당하고 전통적인 名文貴族은 무대의 장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豪族土豪層이 政治社會面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했다고 해서 이것은 곧 사회의 일대 전환이나 社會革命이리고 보는 데에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호족층이 기성 문벌귀족 체제하에서 억압되었다가 전란을 기회로 武功을 세우고 또 왕조 수립에 참여해서 군주와 밀접히 결탁해서 그들 자신이 문벌귀족체제 속에 포용되어 근본적으로 문벌귀족 체제를 부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남인들은 결코 어떠한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북인의 대립에서 주권권을 쥐고자 하였을 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南朝의 명문고족은 역사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門閥 尊重의 餘風은 남아있다. 신흥세력이 문벌체제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도 아니고 신흥층 자체가 문벌귀족체제에 진출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결국 진 왕조 종래의 문벌귀족에 대체해서 下級貴族 내지 豪族土豪層이 문무 고위 관료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지배계급 내부의 지배층 지위의 전열이지 사회혁명이나 사회전환으로 볼 수 있는 질적 변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북인귀족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남인귀족에게 동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의 이민족 정권이었던 북내인 귀족이 결코 정신적으로 무조건 강남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념과 염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인귀족보다 우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중원회복이라는 염원하에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져버리지 못했던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내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문화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 측면에서 동진 귀족사회에서의 북인귀족과 남인귀족에 대한 평가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朴亭寬, 『東晋貴族硏究』, 崇田大學校 박사(학위), 1982.
谷川道雄 외 6명, 『日本의 中國史論爭』신서원, 1996,
李公範, 『南朝貴族社會의 硏究』延世大學校 박사(학위), 1984
중국사연구회, 『중국통사』, 청년사, 1993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4
김한국 외 2명, 『동아시아 연표』, 영민사, 1993
서울대학교 출판부, 『講座中國史-Ⅱ』, 지식산업사, 1995
琴地樹 『東晋 南北人 貴族의 地緣的 對立問題』 慶北大學校 박사(학위), 1983
목 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동진귀족의 성격
2) 東晋 貴族 南北人의 關係
- 대립적인 측면에서 -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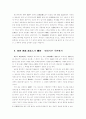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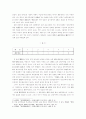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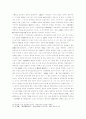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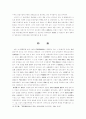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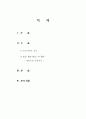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