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후삼국의 쟁패에 있어서 후백제는 항상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왕건은 유화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平和主義者였다. 이로 인하여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으로부터 여러 번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신라 왕실을 비롯하여 각지의 勢力者가 고려로 기울어지게 하는 데는 그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王建은 견훤의 무력주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력으로 대결하기도 하였으며 작전 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먼저 해군을 보내어 南海岸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후백제의 배후를 교란, 견제하고, 일본과의 내왕을 차단하였으며, 西海岸으로는 강력한 海軍을 내왕시켜 후백제가 중국의 오월·후당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여 후백제를 포위, 고립시켰다.
외교적인 면 외에 내적으로는 소백산맥을 이용한 남진정책이 있었다. 즉 王建은 상주에서부터 성주합천을 거쳐 진주에 이르는 전략 선을 확보함으로써 후백제 포위를 완성하고 新羅 일대를 고려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였다. 반대로 견훤은 동진 정책을 취하였다. 즉 상주에서부터 안동 쪽으로 연결되는 전략 선을 마련함으로써 고려의 후백제 包圍정책을 방해하고 신라일대를 후백제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두 정책이 충동하는 경상도 서북부의 상주를 비롯하여 안동·합천·진주 등지에서 자주 큰 전투가 벌어졌으며, 最後의 승리는 고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고려와 후백제와의 쟁패는 新羅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930년 후백제 군이 안동에서 크게 격파되면서 주도권은 高麗에게 넘어갔다. 이어서 934년에는 후백제의 정면을 공격하여 웅진 이북의 30여성을 점령하여 대세를 결정지었다. 이때 후백제에서는 왕위계승으로 인하여 내분이 일어나 아들 신검·양검·용검 등이 아버지 견훤을 유폐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에 견훤은 3개월 뒤에 탈출하여 高麗에 항복하여 1000년 사직을 끝맺게 되었다. 드디어 936년 고려 태조는 10만 대군으로 후백제를 공격하여 신검 등의 항복을 받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리하여 後三國시대의 혼란은 끝나고 새로운 통일된 민족의 歷史가 시작되었다.
http://www.koreandb.net/General/person/p151_00746.htm
▶ 후삼국에서의 신라의 입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다. 통일 이후 좀 더 발전하기보다는 호족들의 다툼과 왕권의 약화로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골품제의 모순이 거의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후삼국에서 신라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백제와 후고구려(태봉)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어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좀 더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라의 후삼국에서의 입지는 좀 더 넓어졌을 것 같다.
후백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는 것에서 놀랐다. 그 전에는 단순히 견훤이라는 농민 출신의 장군이 나라를 세웠다가, 내분으로 나라가 망한 것 정도로 알았는데, 후삼국이 한창 대립할 때 가장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후백제의 외교적인 특성과 군사적인 우수함, 영토 경쟁에 있어서 거의 우세함 등을 알았다. 그러나 내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후백제는 신라의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고 신라적인 특성들을 많이 지녔다는 측면이 태봉과 대조적이다. 그건 아마 견훤은 부농 출신의 장군으로 신라를 그리 미워할 이유가 없었고, 태봉을 세운 궁예는 몰락귀족(왕족) 출신으로 반신라적인 경향을 강하게 띤 것이 아닐까 싶다.
태봉은 위의 두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나라인 것 같다. 일단 궁예가 반신라적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다른 체제를 가지게 되고, 다른 정치특성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나라 보다 좀 더 왕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백제 못지 않게 궁예는 영토확장에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간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궁예가 폭정으로 밀려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평화주의적이라
전쟁에 약해서 처음엔 후백제에게 많이 밀렸다. 하지만 후백제의 내분으로 왕건은 군사상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서 결국 삼국을 통일한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 격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 같지만, 후고구려는 그만큼 우수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궁예가 나중에 폭정을 하긴 했지만, 후고구려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관료체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외교에 있어서는 후백제에 뒤지는 것 같지만, 독자적으로 관료체제를 만들고 백성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본다.
3. 결론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 세 나라는 짧은 세월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보였다. 나라간의 상호 협력과 견제, 종교문제 등 짧은 기간동안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무척 혼란하고 힘든 시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과도기적인 시대에서는 새로 건설된 나라의 특성과 더 나아가서 새로 건설된 나라의 미래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고려가 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호족 세력들을 아우르고 백성들을 위해 노력한 왕건의 정책이 그 당시로서는 현명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래도 만약 후백제가 고려 대신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우리의 역사도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후백제가 고려 대신으로 중세를 이끌었다면, 외교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외국 문물을 좀 더 잘 받아드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다. 이처럼 역사상의 한 가지의 사실만 바뀌어도 우리의 미래는 참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Reference, 내가 읽은 서적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탐구당문화사, 1996
* 이기백, 한국사신론-후삼국 부분, 삼신문화사 , 1999
실제로 후삼국의 쟁패에 있어서 후백제는 항상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왕건은 유화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平和主義者였다. 이로 인하여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으로부터 여러 번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신라 왕실을 비롯하여 각지의 勢力者가 고려로 기울어지게 하는 데는 그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王建은 견훤의 무력주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력으로 대결하기도 하였으며 작전 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먼저 해군을 보내어 南海岸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후백제의 배후를 교란, 견제하고, 일본과의 내왕을 차단하였으며, 西海岸으로는 강력한 海軍을 내왕시켜 후백제가 중국의 오월·후당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여 후백제를 포위, 고립시켰다.
외교적인 면 외에 내적으로는 소백산맥을 이용한 남진정책이 있었다. 즉 王建은 상주에서부터 성주합천을 거쳐 진주에 이르는 전략 선을 확보함으로써 후백제 포위를 완성하고 新羅 일대를 고려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였다. 반대로 견훤은 동진 정책을 취하였다. 즉 상주에서부터 안동 쪽으로 연결되는 전략 선을 마련함으로써 고려의 후백제 包圍정책을 방해하고 신라일대를 후백제의 지배 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두 정책이 충동하는 경상도 서북부의 상주를 비롯하여 안동·합천·진주 등지에서 자주 큰 전투가 벌어졌으며, 最後의 승리는 고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고려와 후백제와의 쟁패는 新羅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930년 후백제 군이 안동에서 크게 격파되면서 주도권은 高麗에게 넘어갔다. 이어서 934년에는 후백제의 정면을 공격하여 웅진 이북의 30여성을 점령하여 대세를 결정지었다. 이때 후백제에서는 왕위계승으로 인하여 내분이 일어나 아들 신검·양검·용검 등이 아버지 견훤을 유폐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에 견훤은 3개월 뒤에 탈출하여 高麗에 항복하여 1000년 사직을 끝맺게 되었다. 드디어 936년 고려 태조는 10만 대군으로 후백제를 공격하여 신검 등의 항복을 받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리하여 後三國시대의 혼란은 끝나고 새로운 통일된 민족의 歷史가 시작되었다.
http://www.koreandb.net/General/person/p151_00746.htm
▶ 후삼국에서의 신라의 입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다. 통일 이후 좀 더 발전하기보다는 호족들의 다툼과 왕권의 약화로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골품제의 모순이 거의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후삼국에서 신라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백제와 후고구려(태봉)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어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좀 더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라의 후삼국에서의 입지는 좀 더 넓어졌을 것 같다.
후백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는 것에서 놀랐다. 그 전에는 단순히 견훤이라는 농민 출신의 장군이 나라를 세웠다가, 내분으로 나라가 망한 것 정도로 알았는데, 후삼국이 한창 대립할 때 가장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후백제의 외교적인 특성과 군사적인 우수함, 영토 경쟁에 있어서 거의 우세함 등을 알았다. 그러나 내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후백제는 신라의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고 신라적인 특성들을 많이 지녔다는 측면이 태봉과 대조적이다. 그건 아마 견훤은 부농 출신의 장군으로 신라를 그리 미워할 이유가 없었고, 태봉을 세운 궁예는 몰락귀족(왕족) 출신으로 반신라적인 경향을 강하게 띤 것이 아닐까 싶다.
태봉은 위의 두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나라인 것 같다. 일단 궁예가 반신라적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다른 체제를 가지게 되고, 다른 정치특성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나라 보다 좀 더 왕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백제 못지 않게 궁예는 영토확장에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간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궁예가 폭정으로 밀려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평화주의적이라
전쟁에 약해서 처음엔 후백제에게 많이 밀렸다. 하지만 후백제의 내분으로 왕건은 군사상 우세한 위치를 차지해서 결국 삼국을 통일한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 격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 같지만, 후고구려는 그만큼 우수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궁예가 나중에 폭정을 하긴 했지만, 후고구려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관료체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외교에 있어서는 후백제에 뒤지는 것 같지만, 독자적으로 관료체제를 만들고 백성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본다.
3. 결론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 세 나라는 짧은 세월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보였다. 나라간의 상호 협력과 견제, 종교문제 등 짧은 기간동안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무척 혼란하고 힘든 시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과도기적인 시대에서는 새로 건설된 나라의 특성과 더 나아가서 새로 건설된 나라의 미래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고려가 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호족 세력들을 아우르고 백성들을 위해 노력한 왕건의 정책이 그 당시로서는 현명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래도 만약 후백제가 고려 대신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우리의 역사도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후백제가 고려 대신으로 중세를 이끌었다면, 외교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외국 문물을 좀 더 잘 받아드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다. 이처럼 역사상의 한 가지의 사실만 바뀌어도 우리의 미래는 참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Reference, 내가 읽은 서적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탐구당문화사, 1996
* 이기백, 한국사신론-후삼국 부분, 삼신문화사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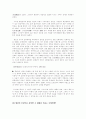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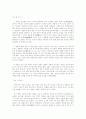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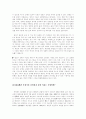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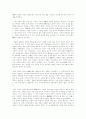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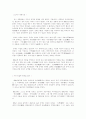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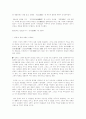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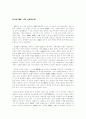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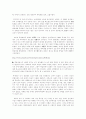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