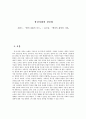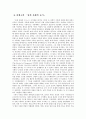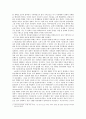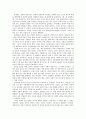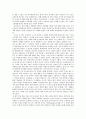목차
1. 서론
2. 피렌느의 『중세 유럽의 도시』
3. 포스탄의 『중세의 경제와 사회』
4. 결론
2. 피렌느의 『중세 유럽의 도시』
3. 포스탄의 『중세의 경제와 사회』
4. 결론
본문내용
형태로 부여함에 따라, 많은 도시들은 시민들의 상업 활동에서의 공동 행위를 취하기 위한 단체인 '상인 길드'나 '상인 조합'을 설립할 권리를 획득하였고, 대부분의 규모 큰 도시들은 도시의 경제적 활동 가운데 주된 분야들을 각각 지배하는 업종별 길드들을 가지게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길드들은 훗날 여러 상인 조합들의 모체가 되어, 이러한 상인 조합들은 영국의 대외 무역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세력으로 자라기에 이른다.
중세가 막을 내릴 무렵, 상인 조직들이 영국의 대외 교역을 대부분 떠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직들로는 깔레의 양모 수출상 조합(the Company of the Staple of Calais)와 해외에 기반을 둔 모험상인 조합(the Company of Merchant Adventurers)가 있다. 모험상인 조합과 양모 수출상 조합은 둘 모두, 전문적인 용어로 '취체(regulated)'조합, 즉 그 자체가 집단적으로 교역에 종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개 상인들의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었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해외 원정 판매에 대해 상인들은 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상품을 선적함으로써 운임과 위험 부담을 분담하였다. 영국에서는 상업 및 금융 자본주의가 대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그 싹을 틔우지 못하였고, 이처럼 집단적으로 상업과 재정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와 독점이라는 중세적 정신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취체 조합들이 자본가들로부터 자리를 물려 받게 되었다.
4. 결론
두 책을 읽으면서 주목한 것은, 상공업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도시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주지하였듯이, 도시 성장의 요인을 단면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으며, 봉건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요소의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굳이 비중을 둔다면 나는 경제적 요인, 맑스의 유물사관에 따른다면 하부구조의 변동이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봉건제의 붕괴와 상공업 자치도시의 발달)의 변동을 조장하였다고 생각한다. 포스탄이 말한대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도시의 성장에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속적 신분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제한은 결국 농토에 기반한 영주와 농노간의 물적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은 곧 중세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고, 13~14세기의 봉건반동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경제체제가 이전의 장원경제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었기 때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건 사회의 상공업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봉건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구조적 붕괴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시대의 중심지가 도시로 자리 이동함으로써 이후의 자본주의의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중세가 막을 내릴 무렵, 상인 조직들이 영국의 대외 교역을 대부분 떠맡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직들로는 깔레의 양모 수출상 조합(the Company of the Staple of Calais)와 해외에 기반을 둔 모험상인 조합(the Company of Merchant Adventurers)가 있다. 모험상인 조합과 양모 수출상 조합은 둘 모두, 전문적인 용어로 '취체(regulated)'조합, 즉 그 자체가 집단적으로 교역에 종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개 상인들의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었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해외 원정 판매에 대해 상인들은 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상품을 선적함으로써 운임과 위험 부담을 분담하였다. 영국에서는 상업 및 금융 자본주의가 대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그 싹을 틔우지 못하였고, 이처럼 집단적으로 상업과 재정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와 독점이라는 중세적 정신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취체 조합들이 자본가들로부터 자리를 물려 받게 되었다.
4. 결론
두 책을 읽으면서 주목한 것은, 상공업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도시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주지하였듯이, 도시 성장의 요인을 단면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으며, 봉건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요소의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굳이 비중을 둔다면 나는 경제적 요인, 맑스의 유물사관에 따른다면 하부구조의 변동이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봉건제의 붕괴와 상공업 자치도시의 발달)의 변동을 조장하였다고 생각한다. 포스탄이 말한대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도시의 성장에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속적 신분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제한은 결국 농토에 기반한 영주와 농노간의 물적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은 곧 중세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고, 13~14세기의 봉건반동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경제체제가 이전의 장원경제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었기 때문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건 사회의 상공업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봉건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구조적 붕괴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으며, 시대의 중심지가 도시로 자리 이동함으로써 이후의 자본주의의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