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음과 같다:
_ ① 피해자가 使用者인 경우에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被害者側의 과실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즉 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될 것이다.
_ ② 피해자가 親權者 등 保護監督者인 경우에 피보호자인 未成年者 등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755조가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_ ③ 그밖에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에 설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제3자의 過失은 被害者側의 과실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289] 동차소유자로서 운전자인 제3자의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제3자(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운전자의 過失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된다. 이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가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_ ④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직접)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死者의 과실은 被害者側 過失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제3자가 사망한 경우에, 死者(제3자)의 유족이 자신의 扶養權 침해, 葬禮費 지출, 기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死者(제3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의 손해는 死者의 손해에서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 민법 제765조의 적용가능성
_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판례가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법정대리인 등의 과실과,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민법 제765조를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_ 법정대리인 등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는 사안들은 피해자인 유아 자신에게 부주의한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최소한 사리변식능력이 존재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참작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주151)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해행위 태양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290] 피해자에게 사리변식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주151)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보다도 피해자인 유아의 부주의한 행위태양 또는 손해발생에의 기여도가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판례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過失相計能力으로 事理辨識能力을 요구하면서도,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으로써 애초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_ 한편 나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가해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독일 및 스위스는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형평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독일민법 제829조, 스위스채무법 제54조 제1항), 이들 규정들은 과실상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이들 규정을 과실상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責任無能力者 인 피해자의 경우 면책이 원칙이며, 이들 규정의 적용에 의한 형평책임은 예외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責任無能力者에 의한 손해원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평이 이를 정당화하는(rechtfertigt)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형평이 이를 요구하고(erfordert) 있어야 한다고 한다.주152) 또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기여정도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양당사자의 재산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주153) 특히 원칙적으로 \'責任保險\'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전보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의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인 피해자에게 유추적용할 여지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한다.주154)
주152) Greger, Zivilrechtliche Haftung im Strassenverkehr(1985), 9, Rd.13; BGH NJW 1969,1762; BGH VersR 1973,925
주153) Lange, 전게서, 10 IV 4; BGH NJW 1969,1762 이하
주154) Greger, 전게서(주 152), 9 Rd.13; BGHZ 73,190; BGH VersR 1973,925; BGH VersR 1982,441
_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에게 예외적으로 형평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주155) 독일 및 스위스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유사한 배려는 민법 제765조에 의해서[291] 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막대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한, 가해자의 \"生計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765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경감정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피해자(유아)의 부주의한 행위의 태양, 손해발생에의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155) 주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제정 당시 民法草案(改府案)은 제750조에서 責任無能力者의 衡平責任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民法案審議 과정에서 삭제의견이 제시되고, 국회에서의 제2讀會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동 규정은 원래 독일민법 제829조와 스위스채무법 제54조 제1항 등을 참조한 것인데, 동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점에서, 責任無能力者를 특히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_ 다만 그동안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는 대부분 교통사고로 유아가 손해를 입은 사안이고, 이들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65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_ ① 피해자가 使用者인 경우에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被害者側의 과실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즉 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될 것이다.
_ ② 피해자가 親權者 등 保護監督者인 경우에 피보호자인 未成年者 등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755조가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_ ③ 그밖에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에 설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제3자의 過失은 被害者側의 과실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289] 동차소유자로서 운전자인 제3자의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제3자(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운전자의 過失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된다. 이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가 과실상계에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_ ④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직접)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死者의 과실은 被害者側 過失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제3자가 사망한 경우에, 死者(제3자)의 유족이 자신의 扶養權 침해, 葬禮費 지출, 기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死者(제3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의 손해는 死者의 손해에서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 민법 제765조의 적용가능성
_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판례가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법정대리인 등의 과실과,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민법 제765조를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_ 법정대리인 등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는 사안들은 피해자인 유아 자신에게 부주의한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최소한 사리변식능력이 존재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참작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주151)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해행위 태양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290] 피해자에게 사리변식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주151)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보다도 피해자인 유아의 부주의한 행위태양 또는 손해발생에의 기여도가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판례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過失相計能力으로 事理辨識能力을 요구하면서도,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으로써 애초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_ 한편 나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가해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독일 및 스위스는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형평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독일민법 제829조, 스위스채무법 제54조 제1항), 이들 규정들은 과실상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이들 규정을 과실상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責任無能力者 인 피해자의 경우 면책이 원칙이며, 이들 규정의 적용에 의한 형평책임은 예외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責任無能力者에 의한 손해원인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평이 이를 정당화하는(rechtfertigt)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형평이 이를 요구하고(erfordert) 있어야 한다고 한다.주152) 또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기여정도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양당사자의 재산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주153) 특히 원칙적으로 \'責任保險\'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전보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의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인 피해자에게 유추적용할 여지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한다.주154)
주152) Greger, Zivilrechtliche Haftung im Strassenverkehr(1985), 9, Rd.13; BGH NJW 1969,1762; BGH VersR 1973,925
주153) Lange, 전게서, 10 IV 4; BGH NJW 1969,1762 이하
주154) Greger, 전게서(주 152), 9 Rd.13; BGHZ 73,190; BGH VersR 1973,925; BGH VersR 1982,441
_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에게 예외적으로 형평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주155) 독일 및 스위스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유사한 배려는 민법 제765조에 의해서[291] 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막대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한, 가해자의 \"生計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765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경감정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피해자(유아)의 부주의한 행위의 태양, 손해발생에의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155) 주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제정 당시 民法草案(改府案)은 제750조에서 責任無能力者의 衡平責任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民法案審議 과정에서 삭제의견이 제시되고, 국회에서의 제2讀會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동 규정은 원래 독일민법 제829조와 스위스채무법 제54조 제1항 등을 참조한 것인데, 동조항을 채택하지 않은 점에서, 責任無能力者를 특히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_ 다만 그동안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는 대부분 교통사고로 유아가 손해를 입은 사안이고, 이들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65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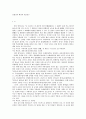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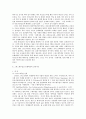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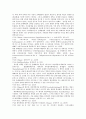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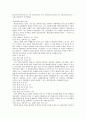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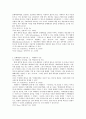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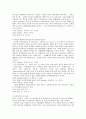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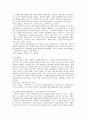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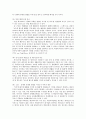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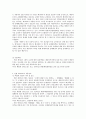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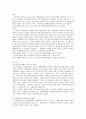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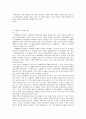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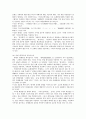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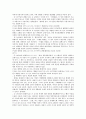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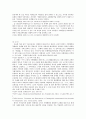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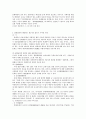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