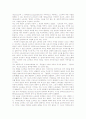목차
Ⅰ. 서 언
Ⅱ.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Ⅲ. 영국에서의 근대적 소유권사상의 전개과정
Ⅳ. 결 어
Ⅱ.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Ⅲ. 영국에서의 근대적 소유권사상의 전개과정
Ⅳ. 결 어
본문내용
the State (London/Edinburgh, 1884, D. Macgrae 편, Penguin Books, 1969 재출판), 71면 이하.
_ 이리하여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소유권의 '배타적 자유'는 소유계급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무제약적인 자유를 안겨주고, 비소유계급에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자기책임의 부담을 지운다. 공동체주의적 물권이든, 아니면 보충적 차원의 생존권적 물권이든 복지권이든 혹은 도덕적 자선의무이든 혹은 재산에 대한 국의 규제이든 부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 인간들의 사회적 연대성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에 개인들 간의 냉혹한 무한경쟁이 들어선 것이다.주47)
주47) 물론 소유권의 개념이 이 단계에서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국의 자본주의도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후 소유권의 개인주의적 배타적 성격과 노동계급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본주의 냉혹함도 완화되어 갔다. 그러한 개혁적인 사상가의 대표로서 J. S. 밀을 들 수 있다. 밀은 특히 토지에 있어서는 사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공개념을 주창하였으며, 또 기업의 형태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없는 조합(association)식의 기업형태를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밀의 개혁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세일,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개혁론." 조순 외, 『존 스튜어트 밀 연구』(민음사, 1992), 155-188면 참조.
[185]
Ⅳ. 결 어
_ 소유권보장과 사회보장은 대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별개의 뿌리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그 양자는 같은 원천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서양중세의 공동체주의적 물권체계에서 소유권은 결코 배타적인 자유가 아니었으며, 공동체적의 원리와 구성원들의 생존권에 의해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한 소유권체계 속에는 사회보장의 의무와 공유적 물권이 내재되어 있었다.주48)
주48) 중세의 소유권은 결코 단순한 '자유'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유에는 항상 의무가 따랐다. 그것이 봉건제의 특성이다. 장원의 소유자는 장원농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 안전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인 반면 생계는 이른바 하급소유권으로 보장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김상용,『토지소유권 법사상』(민음사, 1995), 52면의 중세 레엔(Lehen)제에 대한 설명을 참조. 중세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의 분할소유권 제도에 대하여는 윤철홍, 앞의 책, 33면 이하 참조. 한편 시민적 자유주의 소유권이론과 대비되는 의무의 제한을 받는 게르만적 소유권론에 대하여는 K.Kroeschell(양창수 역), "게르만적 소유권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법학』 제34권 1호(서울대, 1993), 205-240면 참조.
_ 그 후 시장경제의 형성과 맞물려 소유권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에 내재한 사회적 제약, 사회 연대적 조건은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중세의 공유권적 요소는 필요권이라는 긴급피난적인 물권과 무해사용권이라는 좁은 범위로 제한되고, 이어서 물권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회보장적 요구 즉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복지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가 복지권이라는 법적 형식도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 인식되어, 단지 자선이라는 도덕적 의무만이 남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 도덕적 성격까지도 부정된다. 그리하여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배타적 자유'는 가난과 재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데에서 완성을 본다.
_ 이렇게 생존권적 물권과 복지권이 부정되고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배타적 자유가 승리를 구가하면서 자본주의는 커다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 다수 대중의 삶은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개인주의적 소유권을 정면에서[186] 부정하는 사회주의가 발흥하였다. 주지하듯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적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소유 혹은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며, 또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의미하는 자유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체계이다. 개인주의적 재산법체계인 자본주의는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재산법체계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극단적인 '배타적 자유'로서의 소유권체계는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확고하고도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수정자본주의 즉 복지국가의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_ 현대 복지국가의 소유권 개념 즉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소유권에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동체적 소유라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유권제도에 내재한 공동체주의적 본질을 되살린 것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배타적 자유'로서의 재산법체계는 인류 역사상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로부터 오는 빈곤의 확대는 일류가 결코 감내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이다.
_ 그러나 다시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자본주의권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존중이 강조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득세하고 있다. 즉 근대의 개인주의적 소유권과 그 '배타적 자유'의 이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금융거래가 자유화되고 그 기법도 다양해져 이제 경제는 온통 투기적 금융거래의 도박판처럼 되었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생산성 증대라는 투자의 원리가 부의 착복이라는 투기의 논리에 압도되어 버렸다.
_ 경제적 차원의 부족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사회보장이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정신과 사소유권의 특정이 분쟁 및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주장은 음미할 만하다. 그러나 그 소유의 자유가 사회적 생산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투기적 자산운용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찬성할 수 없다. 현대의 금융자본주의의 이기주의와 비생산성은 어느덧 한계에 다다른 듯이 보인다. 현재 지구상에 고도성장의 자기도취 속에 세계적 빈곤이 음습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는 지나친 비관일까?
_ 이리하여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소유권의 '배타적 자유'는 소유계급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무제약적인 자유를 안겨주고, 비소유계급에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자기책임의 부담을 지운다. 공동체주의적 물권이든, 아니면 보충적 차원의 생존권적 물권이든 복지권이든 혹은 도덕적 자선의무이든 혹은 재산에 대한 국의 규제이든 부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 인간들의 사회적 연대성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에 개인들 간의 냉혹한 무한경쟁이 들어선 것이다.주47)
주47) 물론 소유권의 개념이 이 단계에서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국의 자본주의도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후 소유권의 개인주의적 배타적 성격과 노동계급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본주의 냉혹함도 완화되어 갔다. 그러한 개혁적인 사상가의 대표로서 J. S. 밀을 들 수 있다. 밀은 특히 토지에 있어서는 사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공개념을 주창하였으며, 또 기업의 형태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없는 조합(association)식의 기업형태를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밀의 개혁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세일,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개혁론." 조순 외, 『존 스튜어트 밀 연구』(민음사, 1992), 155-188면 참조.
[185]
Ⅳ. 결 어
_ 소유권보장과 사회보장은 대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별개의 뿌리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그 양자는 같은 원천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서양중세의 공동체주의적 물권체계에서 소유권은 결코 배타적인 자유가 아니었으며, 공동체적의 원리와 구성원들의 생존권에 의해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한 소유권체계 속에는 사회보장의 의무와 공유적 물권이 내재되어 있었다.주48)
주48) 중세의 소유권은 결코 단순한 '자유'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유에는 항상 의무가 따랐다. 그것이 봉건제의 특성이다. 장원의 소유자는 장원농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 안전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인 반면 생계는 이른바 하급소유권으로 보장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김상용,『토지소유권 법사상』(민음사, 1995), 52면의 중세 레엔(Lehen)제에 대한 설명을 참조. 중세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의 분할소유권 제도에 대하여는 윤철홍, 앞의 책, 33면 이하 참조. 한편 시민적 자유주의 소유권이론과 대비되는 의무의 제한을 받는 게르만적 소유권론에 대하여는 K.Kroeschell(양창수 역), "게르만적 소유권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법학』 제34권 1호(서울대, 1993), 205-240면 참조.
_ 그 후 시장경제의 형성과 맞물려 소유권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에 내재한 사회적 제약, 사회 연대적 조건은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중세의 공유권적 요소는 필요권이라는 긴급피난적인 물권과 무해사용권이라는 좁은 범위로 제한되고, 이어서 물권적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회보장적 요구 즉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복지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다가 복지권이라는 법적 형식도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 인식되어, 단지 자선이라는 도덕적 의무만이 남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 도덕적 성격까지도 부정된다. 그리하여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배타적 자유'는 가난과 재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데에서 완성을 본다.
_ 이렇게 생존권적 물권과 복지권이 부정되고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배타적 자유가 승리를 구가하면서 자본주의는 커다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 다수 대중의 삶은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개인주의적 소유권을 정면에서[186] 부정하는 사회주의가 발흥하였다. 주지하듯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적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소유 혹은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며, 또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의미하는 자유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체계이다. 개인주의적 재산법체계인 자본주의는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재산법체계의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극단적인 '배타적 자유'로서의 소유권체계는 완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확고하고도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수정자본주의 즉 복지국가의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_ 현대 복지국가의 소유권 개념 즉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소유권에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동체적 소유라는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유권제도에 내재한 공동체주의적 본질을 되살린 것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배타적 자유'로서의 재산법체계는 인류 역사상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로부터 오는 빈곤의 확대는 일류가 결코 감내할 수 없는 재앙인 것이다.
_ 그러나 다시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자본주의권에서도 복지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존중이 강조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득세하고 있다. 즉 근대의 개인주의적 소유권과 그 '배타적 자유'의 이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금융거래가 자유화되고 그 기법도 다양해져 이제 경제는 온통 투기적 금융거래의 도박판처럼 되었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생산성 증대라는 투자의 원리가 부의 착복이라는 투기의 논리에 압도되어 버렸다.
_ 경제적 차원의 부족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사회보장이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개인주의적 소유권의 정신과 사소유권의 특정이 분쟁 및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주장은 음미할 만하다. 그러나 그 소유의 자유가 사회적 생산주체로서의 책임감과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투기적 자산운용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찬성할 수 없다. 현대의 금융자본주의의 이기주의와 비생산성은 어느덧 한계에 다다른 듯이 보인다. 현재 지구상에 고도성장의 자기도취 속에 세계적 빈곤이 음습하게 자라나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는 지나친 비관일까?